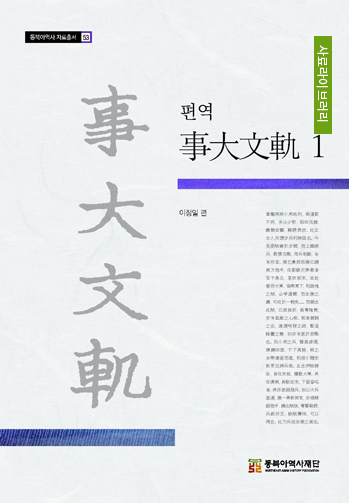진주 지역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오유충(吳惟忠)의 무고를 변무(辨誣)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5. 本國申辨吳遊擊被誣咨
발신: 조선국왕
사유: 무고를 변호하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살펴보건대, 저번 만력 21년(1593) 1월 내 제도도순찰사 김명원(金命元), 제독 사후배신 한응인(韓應寅), 평안도관찰사 이원익(李元翼)이 보고했습니다.
[김명원 등] 본월 초6일에 제독이 3영(營)의 장졸을 거느리고 평양성(平壤城) 밖에 주둔하고 먼저 남병(南兵)으로 하여금 모란봉 위로 전진하여 교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적이 몰래 우영(右營)을 기습하여 남병이 일제히 화전(火箭)을 쏘니 적이 놀라 달아났습니다. 초8일에 제독이 제장을 독려하여 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남병을 통솔하는 이 중에 유격 오(유충)주 001가 있어 성 서쪽 구석의 공격을 주도했고 먼저 올라 격파, 함락하니 적은 마침내 흩어졌습니다. 바야흐로 그 격전[鏖戰]에서 적의 검과 창이 수풀처럼 늘어서 있었고 탄환을 쏘는 것이 빗발 같았지만 유격은 적의 탄환을 맞고서 용기를 더욱 크게 하여 군사들이 성을 오르도록 지휘했으니 공이 여러 진영 중 으뜸이었습니다.
[조선국왕] 이어서 본년 7월 내 체찰사 유성륭(柳成隆)주 002이 치계했습니다.
[유성룡] 6월 29일 왜적이 진주(晉州)를 공격하여 함락하니 여러 군읍이 와해됐고 적병이 흩어져 초계군(草溪郡)으로 들어가 관사와 여염을 분탕했습니다. 유격 오(유충)가 남병을 통솔하여 선산(善山)과 봉계(鳳溪)로부터 밤을 새워 치달아 고령(高靈)과 초계의 경계에서 진수하고 파절하니 적이 마침내 머뭇거리며 후퇴하여 고령과 합천(陜川)으로 감히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이에 성주(星州) 이상의 제읍(諸邑)을 이로 인하여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주 003
[조선국왕] 또한 본년 11월 내 제도도순찰사 권율(權慄)이 치계했습니다.
[도순찰사 권율]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성윤문(成允門)과 좌도(경상좌도) 조방장 홍계남(洪季男)이 차례대로 비보(飛報)했습니다.
[성윤문·홍계남] 초2일경에 많은 숫자의 왜적이 두 갈래로 나누어 고성현·당항포(党項浦)·장현(墻峴)에서 전진하여 다시 진주 지역을 침범하겠다며 성언(聲言)했습니다. 선봉이 본국(조선) 군사에게 사상을 입어 후퇴하니, 적들이 곧장 창원(昌原)·김해(金海)·웅천(熊川)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기(起)는 울산(蔚山)의 서생포(西生浦)로부터 전진하여 들어와 경주부(慶州府)에서 북쪽으로 30리를 지나 천병(天兵)의 영채(營寨)를 돌아 나와 본부(경주부) 안강현(安康縣)에 이르러 크게 살해와 약탈을 저지르고 양도(糧道)를 끊기를 꾀했습니다. 이어서 초탐하던 천병과 교전하여 (천병)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본국의 군사가 천병과 협력하여 격퇴하고 (안강을) 탈환하니 포로가 된 남자와 부녀가 125명이었습니다. 총병 낙(상지)주 004과 유격 오(유충)가 이윽고 경주의 성자(城子)를 진수하니 적이 다시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당직이 살펴보건대, 소방이 불행하여 잔혹한 재난을 입어 종사가 거의 끊어지고 강역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으나 오로지 우리 황상(皇上)의 천지부모와도 같은 은혜에 의지하여 군신 상하가 보존되어 이어질 수 있었으니 오늘날 한결같이 감읍할 따름이며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매번 생각하건대, 상황에 따라 적을 압도하여 이기되 서로 힘을 모아 공을 이룸으로써 성천자(聖天子)의 지극한 뜻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원수(元帥) 및 여러 장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수차에 두드러진 명성은 남병(南兵)을 통솔한 유격 오(유충)에 있으니 평양 전투에서 자신을 잊고 힘껏 싸워 적의 탄환을 맞음에 이르러서도 더욱 용기를 내서 앞다투어 무찔러 마침내 예봉을 꺾고 적진과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적을 추적하여 남쪽으로 내려간 데에 미쳐서는 요해지에 주둔하며 적의 선봉을 차단하여 적으로 하여금 크게 멋대로 날뛰지 못하게 했기에 전라·강원 두 도의 보전은 또한 모두 절병(浙兵)주 005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초탐하는 군사가 안강의 전투에서 많은 왜적을 만나 조금 사상[折損]을 입기는 하였으나 적 역시 피로해져 밤을 틈타 도망갔으니 그 공이 또한 큽니다. 한 모퉁이 사이에서 진(鎭)을 지킬 때 험한 길에서 이슬을 맞고 추위와 더위를 두루 거쳤으니 큰 공적과 애쓴 노고는 여러 영보다 배가 됩니다. 소방의 인민이 의지하기를 우뚝한 장성처럼 든든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 유언(流言)이 호랑이를 만들어 내듯주 006 실상이 가려져 공훈을 생각하기는커녕 처벌이 더해졌습니다. 당직이 이를 듣고 마음속으로 놀라되 그 연고는 알지 못하지만 사정의 허실은 모든 이목이 바라보고 있고 공론(公論)의 소재는 본디 속일 수 없기에 진실로 애써 분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방의 경주에서 밀양(密陽)까지는 약 3일거리이고 안강은 또한 경주에서 (더) 북쪽으로 30여 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바로 내지(內地)와 관계되는데, 지금 이르기를 본국(조선)의 기민(飢民)이 밀양을 약탈했고 유격 오(유충)가 공을 탐하여 강을 건너 가벼이 싸웠다가 패하였다고 합니다. 아!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적이 만약 듣고 안다면 어찌 몰래 웃지 않겠습니까. 비록 적이 진실로 모두 바다를 건너갔고 단지 위협을 받은 본국의 기민만이 남아있다면 팔거(八莒)에 반년 동안 주둔하는 천병이 부산(釜山)을 수백 리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전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적추(賊酋) 기요마사(淸正)주 007는 울산의 서생포에 있고, 유키나가(行長)는 웅천의 제포(薺浦)에 있으며 다른 각각의 적은 양산(梁山)·언양(彦陽)·기장(機張)·동래(東萊)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습니다. 좌우수군절도사영의 임랑포(林郞浦)·두모포(豆毛浦)·부산포·영등포(永登浦)·장문포(場門浦)의 군읍 진보(鎭堡) 수십여 구역에서 성을 수축하고 해자를 파며, 군량을 운반하고 군사를 훈련하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장구하게 주둔하려는 계획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저들은) 화친을 가장하여 간계를 꾸밈이 날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 안강을 침범한 것은 과연 청정의 군사이니 안강과 영일(迎日)을 염탐한 후 군량을 조금 운반하여 군사를 매복, 엄습해서 우리의 향도(餉道)를 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유격 오(유충)가 때에 맞춰 차단하지 않았다면 경상좌도 일대 및 강원도의 보장(保障)은 이미 와해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게보(揭報)에 갖추어 싣기를 지극히 상세하고 지극히 명확하게 해 두었으니, 소방에서 그 공에 감사함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천혼(天閽)주 008은 더욱 멀고 사설(辭說)은 정확하지 않아 만 리나 떨어진 변방의 사정을 시원하게 드러낼 길이 없으니 당직은 대분(戴盆)주 009의 아래에서 더욱 통절한 마음뿐입니다. 삼가 귀원이 요좌(遼左)에 안림하고 있으니 소방의 실정과 관계된 일을 이치상 마땅히 전보(轉報)하여 고핵(考覈)의 근거로 삼아 주십시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검토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좌에 부임하여 안찰 중인 순안요동도찰원, 요동 전 지역을 선무 중인 순무요동도찰원, 변경 부근까지 출병하여 군무를 경리 중인 총독병부에 보냅니다.
만력 22년 2월 초10일.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