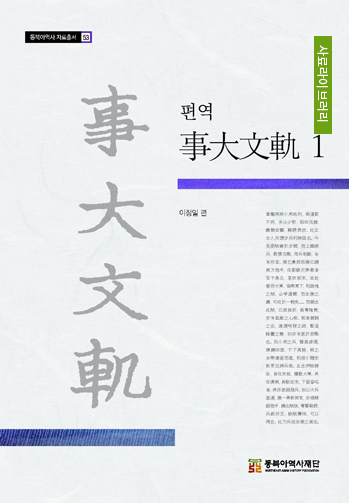정예병을 조발(調發)하여 잔적(殘賊)을 소탕하고 후환을 없애기를 청하는 조선국왕의 자문(咨文)
58. 本國請剿餘賊以絶後患
발신: 조선국왕
사유: 급히 정예병을 조발하여 남은 적을 초멸하고 후환을 끊을 것을 간청하는 일입니다.
[조선국왕] 함경도순찰사(咸鏡道巡察使) 홍세공(洪世恭)이 치계했습니다.
[홍세공] 영흥진절제도위(永興鎭節制度尉) 이여량(李汝良)이 신보(申報)에서 아뢰었습니다.
[이여량] 생포한 왜적 1명을 보내왔기에 역심(譯審)하여 여여씨(汝汝氏)의 공초를 얻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여씨] 일본의 관백이 올해(1593년) 3월 동안 세 섬에서 신병을 조발하여 절반은 적을 저지하는 데에 돕도록 하고 절반은 연해 지방을 공략할 것이다.
[조선국왕] 또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이정형(李廷馨)이 치계했습니다.
[이정형] 주회인(走回人)의 공초를 얻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회인] 경성의 왜적들이 (일부가) 진영을 옮겨 과천현(果川縣) 지역으로 도강하여 주둔한 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어서 함경도에서 왜적이 무리를 거두어 도성으로 입성하여 용산에 영채를 셋으로 나누어 주둔하고 있으니, 왜노가 성세를 서로 의지하며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조선국왕] 또한 호조판서(戶曹判書) 이성중(李誠中)이 치계했습니다.
[이성중]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해운으로 미두 2만여 석을 운반하여 이미 임진강 어귀의 동파참(東坡站)에 도착하여 (명의) 대군에 보름 정도 조처할 수 있는 군량을 인계했습니다.
[조선국왕] 또한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유근(柳根)이 치계했습니다.
[유근] 경성에서 도망한 노약자들이 김포(金浦) 통진현(通津縣) 등 강 연안으로 흩어져 가 있는 곳에서, 끼니가 부족한 까닭으로 죽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적들이 아직 유둔(留屯)하고 있어 방비[隄備]가 지금 시급한데, 전토(田土)가 내버려져 경작의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조선국왕] 갖춘 장계를 당직(當職)이 살펴보건대 왕사(王師)가 동쪽으로 내려와 위세를 떨치니 견고한 험독(險瀆)주 001도 한 번 북을 울려 평정했습니다. 적은 마땅히 혼백을 잃고 무리를 이끌어 남쪽으로 도망가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나 다시 경성에 모여 장차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주 002과 같은 계책을 도모하여 동서로 외쳐 개미떼, 벌떼와 같이 모여들고 있으며 또한 저 적의 흉추(兇酋)가 새로운 군사를 더하여 연해 지방을 침범하려 합니다. 지금 천시가 따뜻해져 바로 순풍이 부는 시기로 접어들었으니 간계가 아직 그치지 않아 다시 천주(天誅)를 요청한다 해도 벌, 전갈과 같은 저들의 독이 혹여 작년보다 더 심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더욱이 잔폐된 백성이 난을 겪으며 굶어죽은 자들이 들에 가득 차 동쪽은 농사철을 놓쳐 기름진 땅이 장차 거칠어졌음에도 가호마다 거두어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뽑듯이 하면서 천리 밖에서부터 곡식을 실어와 지공하여 보름 정도의 군량을 비축했으니 마땅히 때에 맞추어 전진하여 남은 적을 초멸하고 다시 생길 독기를 바다에서 막아 유민들의 다 죽게 된 목숨을 살려야 합니다. 이어 생각건대 소방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비탈과 수렁이 열 군데 중 여덟아홉은 되니 이로움이 보전(步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조에서 조발한 보병은 진퇴와 격자(擊刺)의 오묘함으로 오랑캐[醜鯷]들에게 백 번을 이겼으니 번거롭겠지만 귀부에서 소방의 위태로움을 가엾게 여기고 사기(事機)의 어려움을 통촉하여 이 대첩의 기세를 타고 저들이 아직 합세하지 못한 시기에 맞추어 급히 본병(本兵)을 조발하여 성야(星夜)와 같이 나아오게 하여 이 남은 도적들을 눌러 남김없이 초멸하소서. 그리하여 효경(梟獍)과 같은 무리들로 하여금 한 척의 배도 돌아갈 수 없게 하고 삼한의 조금 남은 백성들이 다시 편안히 농사짓고 살 수 있게 해주소서. 만약 시세를 핑계로 시일을 늦추어 저들이 간계를 조장하여 다시 멋대로 침범하도록 놓아둔다면 우리를 어물전[魚肆]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니주 003 후회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살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병부분사에 보냅니다.
만력 21년 3월 8일.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