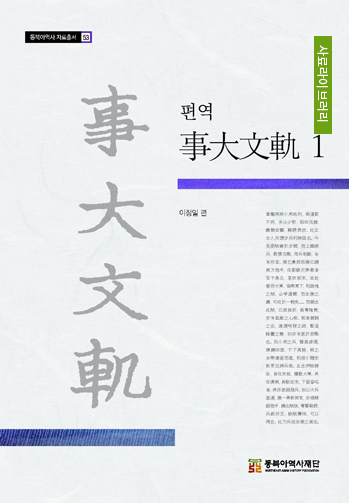평양을 수복한 승전에 대해 감사하는 조선국왕의 주문(奏文)
38. 天兵克復平壤奏
38. 天兵克復平壤奏주 001
朝鮮國王臣姓諱 謹奏,
爲 仰仗皇威, 克復平壤, 飛報捷音 事.
該 萬曆二十一年正月初九日 陪臣諸道都體察使柳成龍 馳啓.
據 諸道都巡察使金命元 呈.
該 平安道觀察使李元翼 申.
本月初六日, 有欽差提督薊遼保定山東等處防海禦倭軍務緫兵官都督同知李如松, 統率大勢官軍, 直抵平壤城外, 部分諸將, 圍抱本城. 有倭賊二千餘名, 登城北牡丹峯, 建靑白旗, 發喊放砲. 又有倭賊一萬餘名, 擺立城上, 前植鹿角柵子, 擁楯揚劒, 勢甚猖獗. 又有倭賊四五千名, 建大將旗, 鳴鼓吹螺, 巡視城中, 指揮諸賊. 本城裏外設險, 勢難遽攻, 緫兵收軍回營. 本日寅夜, 有倭賊約주 002三千餘名, 含주 003枚潛出襲주 004楊元, 都督李如栢, 都指揮張世爵等營, 被本官等統兵殺退. 初七日夜, 有주 005倭賊約八百餘名, 復斫都督李如栢營, 又被本官殺退. 初八日黎明, 総兵焚香卜日得吉, 喫飯訖, 與三營將官, 分統各該將領官軍人等, 擺陣於七星含毬普通等門外. 緫兵領親兵二百餘騎, 往來指揮, 將士踴躍,주 006 咸思盡力. 辰時分주 007諸軍鱗次漸進, 各㨾火器, 一時齊發, 聲震天地, 大野晦㝠. 火箭一枝, 著密德土窟, 俄而赤焰주 008亘天, 延爇殆盡. 守陴倭賊, 亂用鉛丸湯水石塊, 以死拒守. 又用長槍大刀, 向外齊刃, 森如蝟毛. 総兵手斬畏怯者一名, 號示陣前, 諸軍鼓噪薄城. 負麻牌持矛戟, 相雜齊進, 或發射放炮, 或仰剌守陴之賊, 賊不能支吾, 稍自引退. 緫兵挺身先登, 督諸將進入. 天兵一起주 009與本國官軍, 入含毬門, 一起入普通門, 一起登密德東城,주 010 騎步雲集, 四面砍殺, 衆賊崩潰. 天兵當陣斬獲首級一千二百八十五顆, 內査, 有賊酋平秀忠平鎭信宗逸等二十五人首級.주 011 生擒倭賊二名幷通事張大膳, 奪獲馬二千九百八十五匹,주 012 得獲倭器四百五十二件,주 013 救出本國被擄男婦一千一十五名口.주 014 天兵乘勝縱火, 悉燒房屋, 衆賊投竄, 被燒死者, 約一萬餘名,주 015 臭聞一十餘里. 餘賊躱入風月樓小城, 緫兵督運柴草, 四面堆積, 仍用火箭飛射, 一時焚燒, 俱成灰燼. 又有餘賊跳城過江, 氷陷溺死者, 不記其數.주 016 七星普通牡丹等處諸賊, 仍據土窟, 堅固難拔. 総兵收兵傳食曰, 賊必夜遁, 就遣副総兵參將等官, 李寧祖承訓葛逢夏等, 領兵埋伏. 緫兵同揚李張三副將,주 017 由大路追趕, 本賊四散遁去, 被寧주 018等伏路邀截. 斬獲首級三百五十九顆, 生擒倭賊三名. 餘賊棄甲抛戈, 驚亂遁走, 岊嶺迤西, 悉底蕩平.
臣竊念, 平壤一府, 實本國舊都, 城池險固, 而兇賊豨突, 據爲窟穴. 卽目天兵進討, 一鼓蕩破, 梟獍餘孽, 逃命無所. 本國再造之機,주 019 實在於此. 臣與李元翼等, 督運各處蒭주 020粮, 進入本城, 聽候督府調用外, 緣係捷音事理, 爲此, 具啓. 等因.주 021
臣據此. 參詳, 小邦軍兵脆弱, 日久愈削, 兼且平壤城險, 未易收復. 臣주 022日夜憂煎, 不知死所, 欽蒙聖明天地父母. 曲念先故, 不以臣失職而加罪, 命調南北精兵, 以拯濟小邦塗炭. 慮軍犒之乏, 則先賜銀兩, 憂粮草之缺, 則陸續飛輓. 士卒暴露於野, 驢騾顚損於道, 以臣之故, 貽戚天朝, 至於如此, 臣感激怔營, 若無所措. 竊照,주 023 王師有征, 天吏無敵. 乃於本年正月初八日壬戌, 進攻平壤, 不崇朝而城破, 除焚溺斬殺之外, 餘賊喪魄逃遁. 其軍威之盛, 戰勝之速, 委前史所未有. 臣與大小陪臣, 初聞捷音, 不覺涕淚之交下. 玆蓋聖天子盛德誕敷, 神武遠暢, 而名公贊謨, 本兵運籌. 侍郞宋주 024專心機務, 指揮주 025方略, 謀猷克合, 用集殊功. 緫兵李주 026誓師慷慨, 義氣動人, 軍行所過, 秋毫無犯, 臨陣督戰, 身先列校. 至於鉛彈주 027擊馬, 火毒熏身, 色不怖而愈厲. 克城之日, 祭箕子而先封其墓, 恤瘡痍而遍釂陣亡, 宣布德意, 慰問孤寡, 雖裵度之平淮西, 曹彬之下江南, 無以過此. 副參遊擊都司以下, 各該將領等官, 闞如虓虎如神助勢, 至有巨石滾下, 而拒之直上者, 丸入胷膛주 028而鏖殺未已者. 小邦將士주 029袖手駭縮, 莫敢助力於其間,주 030 徒觀其鐵騎所蹴飛塵驀野. 火箭所及, 赤焰彌天, 礟觸列柵, 則决若吹毛, 槍剌守陴, 則捷若飛鶻. 腥烟漫空, 流血渾江, 天地爲之擺裂, 山淵爲之反覆. 彼賊之鳥銃湯石, 政猶螗臂拒轍, 無敢抵敵. 臣竊念, 平壤一城, 實伊精兵器械之處, 臣竭一道之力, 經年莫規. 而克復之後, 聞其所設守備, 則决非小邦兵力所可攻陷. 天威一震, 列屯望風, 已成破竹之勢, 黃海以東, 不戰自却, 舊都指日可復, 宗社次第汛掃. 臣思先靈地下之感, 念遺黎其蘇之望, 悲哀喜幸, 惝怳難雙. 雖欲報答生成, 實難爲圖. 抑臣之所大快주 031者, 念惟小醜跳梁, 自大於鱗介之鄕, 昧天之威, 屢肆狂言, 臣常痛之. 今者, 鬼啓其衷, 自取天誅, 其海讋島慄, 惴惴주 032然不敢喘息者, 殆終無주 033遺育, 是豈徒雪小邦之羞, 實亦彰百王之烈矣. 臣又聞之, 有願曲遂, 天地之大德, 所懷必達, 臣子之至情. 臣念今兇賊被勦, 專出주 034天師, 而於小邦, 則未始有一毫創也. 渠見天將旋師, 國內孤弱, 再逞反噬之計, 則其禍益甚, 而益難防矣. 臣恐復勤聖上東顧之憂, 而重微臣失禦之罪也. 伏乞聖慈, 憐海隅孑遺之民, 終天朝子惠之仁,주 035 著令督府, 量抽江浙炮手주 036五千名, 仍付一二將官, 分屯沿海要害釜山等處若干月. 一以教訓小邦軍民, 一以消戢梟獍兇謀, 則臣庶可永仗天威, 收拾餘燼, 以備其後矣. 臣旣復邦土,주 037 又望善後, 極知僭猥, 罪固難貰, 而天朝俯恤, 旣有加於內服, 下邦控訴, 敢自外於一家, 臣益增隕越焉. 臣一面泒撥人畜, 督運糧草, 一面調集兵馬, 恊同王師, 以圖進取京城, 又備咸鏡向西之賊. 臣擬待收復訖, 卽주 038還京城, 迎勞官軍, 仍將前後受恩緣由, 別行稱謝外, 緣係仰仗皇威, 克復平壤, 飛報捷音事理. 爲此, 謹具奏聞.
右謹奏聞. 萬曆二十一年二月初十日. 朝鮮國王臣姓諱.
李好閔製. 有禮部咨.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 각주 019)
- 각주 020)
- 각주 021)
- 각주 022)
- 각주 023)
- 각주 024)
- 각주 025)
- 각주 026)
- 각주 027)
- 각주 028)
- 각주 029)
- 각주 030)
- 각주 031)
- 각주 032)
- 각주 033)
- 각주 034)
- 각주 035)
- 각주 036)
- 각주 037)
- 각주 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