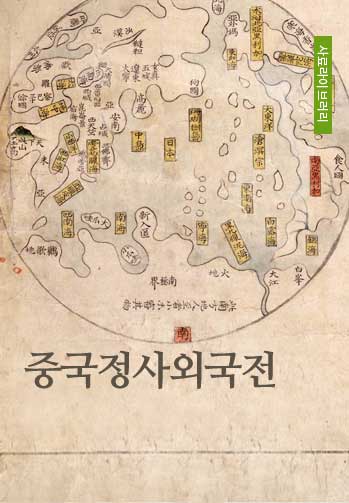황제(皇帝)의 교화를 칭송하며 바치는 공물
“제가 생각하건대 신은 미천하기가 하루살이[蠛蠓]나 추구(芻狗)주 001
삼문(三文) 등도 따로 진주 6천 6백 량과 향약 3천 31백 근을 헌상했다.
각주 001)

와 같고, 대대로 오랑캐 땅에 거한지라, 이곳이 중원의 풍속으로부터 워낙 멀어서 식견도 밝지 못하여 예물을 가지고 찾아뵐 수도 없었습니다. 근자에야 저는 [황제에 대한] 칭송이 멀리까지 이르렀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스럽게도 나이가 이미 연로하여 친히 옥백(玉帛)주 002의 예에 참여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차갑고 어두운 바다가 아득히 갈라놓아 건너가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감히 충심을 호소하며 멀리서 궁궐을 바라볼 뿐입니다. 토산물을 공물로 삼음은 땅강아지나 개미가 누린내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조공[委質]주 003을 통해 군주를 섬김은 마치 해바라기나 향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가 특별사신[專使]등 52명을 파견하여 토산품을 받치고 진공하니, 진주적삼과 진주모자가 각각 하나씩이고, 진주가 2만 1천 1백 량, 상아가 6십 주, 유향이 6십 근입니다.”芻狗: 고대에 제사 때 사용하던 ‘풀로 엮은 개’라는 의미이다. 芻狗는 제사가 끝나면 바로 용도폐기하기 때문에 미천하고 쓸모없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상용된다. 『老子』에는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라는 구문이 보이는데 魏源은 本義에서 “結芻爲狗, 用之祭祀, 旣畢事則棄而踐之.”라고 밝힌바 있다. 비슷한 용례가 『莊子』 「天運」편에도 보인다. “夫芻狗之未陳也, 盛以篋衍, 巾以文繡, 屍祝齊戒以將之; 及其已陳也, 行者踐其首脊, 蘇者取而爨之而已.” 이에 대해 陸德明은 釋文에서 李頤의 말을 인용하여 “芻狗, 結芻爲狗, 巫祝用之.”라고 밝힌 바 있다.

삼문(三文) 등도 따로 진주 6천 6백 량과 향약 3천 31백 근을 헌상했다.
-
각주 001)
芻狗: 고대에 제사 때 사용하던 ‘풀로 엮은 개’라는 의미이다. 芻狗는 제사가 끝나면 바로 용도폐기하기 때문에 미천하고 쓸모없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상용된다. 『老子』에는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라는 구문이 보이는데 魏源은 本義에서 “結芻爲狗, 用之祭祀, 旣畢事則棄而踐之.”라고 밝힌바 있다. 비슷한 용례가 『莊子』 「天運」편에도 보인다. “夫芻狗之未陳也, 盛以篋衍, 巾以文繡, 屍祝齊戒以將之; 及其已陳也, 行者踐其首脊, 蘇者取而爨之而已.” 이에 대해 陸德明은 釋文에서 李頤의 말을 인용하여 “芻狗, 結芻爲狗, 巫祝用之.”라고 밝힌 바 있다.
- 각주 002)
- 각주 003)
색인어
- 이름
- 삼문(三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