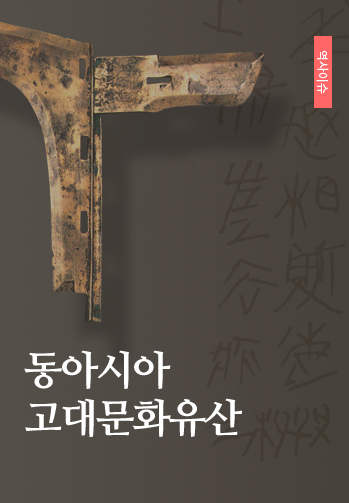장군총
將軍墳/JYM0001
입지
용산 남쪽 기슭의 산비탈에 위치해 있다.
유적개관
2003년 장군총에 대한 전면적인 측량과 서쪽 건축유적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장군총은 전형적인 계단식 적석총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화강암 석재로 쌓아올렸다. 기단의 평균 길이는 32.22m이며, 7단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는 13.7m이고, 고분 주위로는 3개의 호석들이 받치고 있다. 묘실은 셋째 계단 위에 지어져 있으며, 묘도 입구는 다섯째 단 계단 중앙에 마련되어 있다. 묘실은 장방형이며 관대가 2개 위치한다. 배수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며, 강돌로 묘역을 만들었으며, 북쪽에는 배장묘 2기, 제사지 1곳, 적석 유구 1곳이 있으며, 서남쪽에는 능사지 1곳이 위치한다.
유물개관
와당, 각종 기와, 황유 도기편, 철기(착, 도, 겸, 말굽 등), 등
참고문헌
「集安高句麗王陵」, 2004
해설
우산하고분군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고구려의 초대형 계단적석총이다. 고구려 적석총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적석총의 축조기술상 가장 완성된 형식이다. 중국 길림성 집안의 국내성으로부터 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으며, 초대형 적석총 중 가장 동쪽에 있다. 일찍부터 현지 주민들이 장군총이라 불렀고 동방의 금자탑이라고도 지칭되는데 1966년 JYM0001호로 편호되었다. 집안 시가지에서 동쪽으로 7.5km 떨어진 용산 남록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쪽 1.5km에 임강총, 서남쪽 2km에 광개토왕비와 태왕릉이 있다. 고분은 산기슭의 평탄면에 계단상으로 축조했다. 현재 각 변의 길이는 동변 30.15m, 남변 30.75m, 서변 31.1m, 북변 31.25m로서 본래 정방형이다. 먼저 지면을 파서 그 안에 작은 강돌이나 산돌을 채워 기초를 다진 후 커다란 지대석을 놓아 한 변 32.3m 전후의 기단부를 조성하고 그 외곽에는 두께 10~16cm인 커다란 강돌을 너비 3~4m로 채워 침식 등에 의한 붕괴를 방지했다. 그런 다음 기단부 위의 가장 외곽에 거대한 화강암 장대석을 3~4단 쌓아 제1층 계단을 조성하고 내부를 강돌과 산돌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총 7층의 계단을 축조했다. 아래쪽 계단석의 크기는 길이 2.4~3.5m, 두께 0.9m 전후로 가장 큰 것은 길이 5.7m, 너비 1.12m에 이른다. 모든 계단석은 아주 정치하게 가공했는데, 가장자리에 턱을 만들어 위쪽 계단석이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계간 둘레에는 커다란 보호석을 각 면마다 3개씩 세워놓았고, 각 층의 계단을 안으로 1m 정도 들여쌓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계단 축조에 사용된 장대석은 모두 1,177매인데 현재 31매가 결실되어 1,146매만 남아 있다. 7층 계단 위 정상부의 높이는 지표에서 13.07m인데, 백회를 섞은 흙으로 봉하였다. 정상부 가장자리 계단석의 윗면에는 둥근 홈이 일정 간격으로 파여 있는데, 철제 연결고리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목조구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인데 정상부에 위치한 천추총이나 태왕릉과 달리 제3층 계단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현실의 한 변은 543~550cm로서 거의 정방형이며, 높이는 510cm로서 잘 다듬은 장대석을 안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6단으로 쌓아올렸다. 평행고임을 한 다음 거대한 천장석 1매로 상부를 덮었다. 바닥에는 판석을 깔고 길이 320~325cm, 너비 130~145cm, 높이 38~45cm인 관대 2개를 50cm 간격으로 놓았다. 입구는 제5층 계단에 위치하여 연도가 아래쪽으로 경사져 있는데,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길이 830cm, 너비 200~275cm, 높이 140~220cm인 연도를 조성했다. 고분 주위 바닥에는 너비 30m전후로 강돌을 깔았으며, 서남쪽 30m 거리에서 돌로 쌓은 낮은 담장이 발견되어 원래 능원을 둘러싼 담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기의 배장묘와 제대로 불리는 석축시설도 확인되었다. 배장묘는 1930년 조사보고서에서는 장군총의 북쪽으로 동서방향으로 일직선으로 4, 5기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두 기만이 확인된다. 1호 배장묘는 장군총 동북모서리에서 43m 떨어져 있으며, 한 변 9.22m, 높이 4.62m로 규모는 작지만 축조방식은 장군총과 거의 동일하다. 2호 배장묘는 1호 배장묘 서북쪽 35m 거리에 위치했는데, 한 변 9.57m로 계단의 일부와 그 아래 기단부만 남아 있지만 축조양식은 장군총과 거의 동일하다. 2호 배장묘 서북쪽으로 제대라 불리는 석축시설이 이어지는데, 길이 58m, 너비 8m, 높이 0.3~0.8m로서 둘레에 다듬은 돌로 단을 쌓고 그 내부를 강돌과 깬 산돌로 채웠다. 또한 서남쪽 100m 거리에서는 담장과 문지, 배수구 등을 갖춘 남북 길이 100m, 동서 너비 40m 전후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붉은색 기와 및 와당 등이 출토되었고 장군총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장군총에서는 일찍이 연화문와당과 기와편, 철제 연결고리, 금동제 비녀 등이 출토되었는데 최근 발굴과정에서도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장군총 남측 흙더미에서 금동제 머리장식, 철제 연결고리, 연화문와당, 암키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1, 2호 배장묘에서는 연화문와당과 각종 기와편을 비롯하여 철제 끌, 집게, 정, 칼, 말편자, 황색유약을 바른 도기 잔편 등이 수습되었고, 제대에서는 순금제 귀고리와 바닥에 못이 있는 금동제 신발, 고리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편 가운데 ‘小’, ‘魚’, ‘十’, ‘申’, ‘大’ 등의 명문(銘文)이 새겨진 경우도 있다. 장군총은 적석총 축조기술상 가장 완성된 형식으로 그 축조양상이나 배장묘로 보아 왕릉임이 확실하다. 이에 종래 산록에 위치했음을 근거로 산상왕릉으로 비정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국내성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광개토왕이나 마지막으로 즉위한 장수왕의 왕릉으로 비정한다. 장수왕릉으로 해석하는 경우, 고구려에서 수릉제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릉이란 무덤을 대규모로 조영하고 많은 부장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권력자가 생전에 스스로 만든 무덤을 가리킨다. 즉 장수왕이 평양천도 전 국내성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무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에 수릉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장군총을 광개토왕릉으로 볼 경우, 장군총과 광개토왕비 및 태왕릉과의 관계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