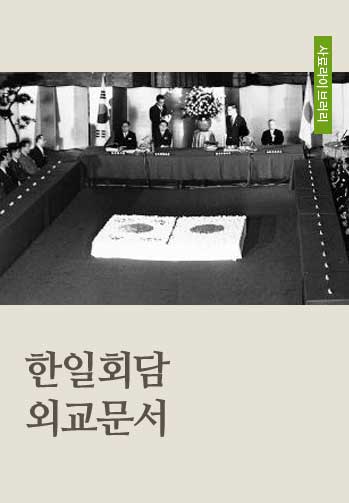二.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締結(체결) 時(시)의 韓國(한국)의 立場(입장)
二.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締結(체결) 時(시)의 韓國(한국)의 立場(입장)
一.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
A.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에서 獨逸(독일)의 敗北(패배)으로 獨逸(독일) 領土(영토)의 一部(일부)가 獨立(독립)한 포-랜드國(국)이 이 直接(직접) 本(본) 條約(조약) 締結(체결) 當事國(당사국)이 되였다. 또는 獨立(독립)의 一部(일부) 獨立(독립)이 않이고 그 第一次大戰(제1차대전)의 結果(결과)로 獨立(독립)된 첵고스르바기아國(국)도 亦是(역시) 「獨立(독립)을 承認(승인)함」이라 宣言的(선언적) 規定(규정)만 하여 있고 그 實(실)은 各各(각각) 戰勝國(전승국) 立場(입장)에서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에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이 一員(일원)으로 行動(행동)하였다.
B1.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前文(전문)에 「中心(중심)되는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美英佛伊日(미영불이일)]은 오지리君主國(군주국) 領土(영토)의 一部(일부)로 合倂(합병)하였든 「첵고스로바키아」國(국)을 自由獨立(자유독립) 及(급) 同盟國(동맹국)으로서 旣(기)이 承認(승인)하야」 또은 前記(전기) 諸國(제국)은 오지리君主國(군주국) 領土(영토)의 一部分(일부분)과 셀비야國(국) 領土(영토)를 結合(결합)할 것을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國(국)이란 名稱(명칭) 아래 自由獨立(자유독립) 及(급) 同盟國(동맹국)으로 承認(승인)하야……」 이들 國家(국가)의 政府(정부)에 對(대)하야 正義(정의)와 衡平(형평)에 合致(합치)하는 □續的(□속적) 基礎(기초)를 附與(부여)할 必要(필요)가 있음으로」 하여 첵고스로바키아國(국) 及(급)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國(국)은 直接(직접) 條約(조약) 締結(체결) 當事國(당사국)이 되었다. 그리고 同(동) 第四十六條(제46조) 第五十七條(제57조)에서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이 임이 取(취)한 措處(조처)에 따라…… 完全(완전)한 獨立(독립)을 承認(승인)함」이라 하여 本(본) 條約(조약)에서 오지리國(국)의 承認(승인)을 規定(규정)하였다.
B2. 對항가리講和條約(대항가리강화조약)에는 前文(전문)에 아무 規定(규정)이 없이 本文(본문) 第四十一條(제41조)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國(국)의 獨立(독립) 第四十八條(제48조)로 첵고스로바키아國(국)의 獨立(독립)을 承認(승인)하고 이 兩國(양국)이 모다 正式(정식) 條約(조약) 調印國(조인국)이 되었다.
卽(즉) B1, B2 오지리 항가리 君主國(군주국)에 對(대)하여 交戰國家(교전국가)가 아니면서 直接(직접) 講和條約(강화조약) 調印國(조인국)이 된 나라는 希臘(희랍), 폴추칼[以上(이상) 國交(국교) 斷切(단절)], 큐-바, 니카라과, 波蘭(파란),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 첵고스로바키아 以上(이상) 七個(7개) 國(국)이다. 그 中(중) 波蘭國(파란국)의 調印(조인)은 法的(법적) 根據(근거)보다 政治的(정치적) 根據(근거)가 크다.
二.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
A.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에는 그 前文(전문)에는 아무 規定(규정)도 업시 本文(본문) 第二十七條(제27조)에서 알바니아國(국) 第三十三條(제33조)에서 에듸오피아國(국)의 獨立(독립) 承認(승인)이라는 規定(규정)뿐이다.
連合國(연합국) 全部(전부)나 調印國(조인국)이 아니고 單純(단순)히 講和會議(강화회의)에 參加(참가)한 國家(국가)가 알바니아, 오지리, 큐-바, 埃及(애급), 이란, 이락, 멕시고, 豪州(호주)의 八個(8개) 國(국)이며 特(특)히 알바니아, 오지리 兩國(양국)은 今次大戰(금차대전)의 終結(종결)로써 獨立(독립)을 回復(회복)한 國家(국가)이다. 多數(다수) 國家(국가)가 講和條約(강화조약)을 締結(체결)하는 例(예)는 第一次大戰(제1차대전)의 現象(현상)이며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와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의 調印國(조인국)의 構成(구성)이 다른 点(점)은 前者(전자)는 形式上(형식상) 全(전) 參加國(참가국) 會議主義(회의주의)를 取(취)하였으나 그 內容(내용)은 美英佛伊日(미영불이일)의 五大强國(5대강국)에서 一致(일치)된 点(점)을 全體會議(전체회의)에 提出(제출)하여 形式的(형식적) 全體一致(전체일치)를 본 後(후)로 準備會議(준비회의)가 僅僅(근근) 六回(6회)에 끝이고 小國(소국)은 各(각) 委員會(위원회)에서 自己(자기)에 關(관)한 意見(의견)만 陳述(진술)하였을 뿐이고 全體會議(전체회의)에서도 草案(초안)을 票決(표결)에 定(정)하지 않고 그 草案(초안) 全部(전부)는 獨逸(독일)에 提示(제시)하기 前日(전일)의 全體會議(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發表(발표)하였다.
그리고 後者(후자)는 美英佛中(미영불중)쏘의 五大國(5대국)이 理事國(이사국)이 되여 처음부터 大國中心主義(대국중심주의)로 全體會議(전체회의)를 形式上(형식상)으로는 認定(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이 五大國(5대국) 間(간)에서도 伊太利(이태리)와 直接戰鬪(직접전투)가 있든 家(가)가 하야 美英佛(미영불)쏘의 四理事國(4이사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항가리아에 對(대)하여서는 英佛(영불)쏘 三理事國(3이사국), 휘랜드는 英(영)쏘 兩(양) 理事國(이사국)만이 隨時(수시) 利益關係事項(이익관계사항)만 그 關係國(관계국)을 招請(초청)하야 草案(초안) 作成(작성)해 가지고 各各(각각) 相當(상당)한 兵力(병력)으로써 積極的(적극적) 戰鬪(전투)를 連合國(연합국)이라 하여 上記(상기) 五大國(5대국) 外(외)의 十六個(16개) 國(국)으로 構成(구성)한 會議(회의)에 草案(초안) 審議(심의)를 勸告(권고)하야 審議(심의)한 後(후) 最終(최종)의 決定(결정)도 亦是(역시) 上記(상기) 四, 三, 二(4, 3, 2)의 各(각) 國家(국가) 間(간)에서 마음대로 하여 버리고 條約(조약) 效力(효력) 發生(발생)도 四, 三, 二國(4, 3, 2국)의 批准(비준)만으로 直時(직시) 發行(발행)한다 하였다.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있어 美英(미영)의 態度(태도)가 쏘聯(련)의 妨害工作(방해공작)의 豫防策(예방책)으로 여러가지 方法(방법)을 講究(강구)했으나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時(시)의 四, 三, 二式(4, 3, 2식)보다 多數決方式(다수결방식)으로 갈 듯하다.
今次大戰(금차대전)에서 對日宣戰布告(대일선전포고) 한 國家(국가)는 알젠징, 濠州(호주), 白耳義(백이의), 보리바아, 부라질, 빌-白露(백로), 카나다, 세이롱, 智利(지리), 中國(중국), 큐-바, 첵고스르바기아, 도미나가, 엘쿠아돌, 埃及(애급), 살바돌, 에듸오피아, 法國(법국), 希臘(희랍), 과데마라, 하이듸, 온두라스, 印度(인도), 이란, 이락, 伊太利(이태리), 레바논, 리베리아, 베루, 比律賓(비율빈), 波蘭(파란), 사우지아라비아, 시리아, 土耳其(토이기), 우크라이나, 南阿弗加(남아불가), 쏘聯(련), 英國(영국), 美國(미국), 울과이, 베네귀라 以上(이상) 五十個(50개) 國(국)이며 對日休戰條約(대일휴전조약) 調印國(조인국)은 美(미), 英(영), 中(중), 쏘, 法(법), 加(가), 比(비), 波(파), 新(신), 西(서), 蘭(란), 加(가), 印(인), 파키스탄, 빌마의 十二個(12개) 國(국)이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日(2일) 以後(이후) 急變(급변)하는 極東情勢(극동정세)에 있어 米쏘英中(미쏘영중) 四大國(4대국) 中心主義(중심주의)는 □□□□하고 또 對日休戰條約(대일휴전조약) 參加國(참가국)안도 現實(현실)에 符合(부합)치 않고 結局(결국) 極東委員會(극동위원회) 構成(구성)이 中心(중심)인 듯하다. 여기에 韓國(한국) 立場(입장)은 今後(금후) 極東要員會(극동요원회)에 參加(참가)한다면 別(별) 問題(문제)다. 그렀치 않은 限(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의 調印(조인) 當事國(당사국)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締結(체결) 前(전)에 太平洋軍事同盟(태평양군사동맹)이 締結(체결)될 可能性(가능성)이 濃厚(농후)하고 다시 이 同盟(동맹)이 結成(결성)되지 않는다 하더래도 日本(일본)의 安全保障(안전보장)이 重要(중요)한 立場(입장)에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이 締結(체결)될 時(시) 韓國(한국)의 發言權(발언권)도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의 重要視(중요시)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政治的(정치적) 立場(입장)에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對(대)한 韓國(한국)의 立場(입장)을 有利(유리)하게 誘導(유도)하여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規定(규정)되는 事項(사항)으로써 韓國(한국) 內(내)의 對日感情(대일감정)을을 緩和(완화)하여 將來(장래)의 韓國(한국) 安全保障(안전보장)과 韓日(한일) 間(간)의 善隣關係(선린관계)를 保持(보지)하여야 할 것이다.
一.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
A.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에서 獨逸(독일)의 敗北(패배)으로 獨逸(독일) 領土(영토)의 一部(일부)가 獨立(독립)한 포-랜드國(국)이 이 直接(직접) 本(본) 條約(조약) 締結(체결) 當事國(당사국)이 되였다. 또는 獨立(독립)의 一部(일부) 獨立(독립)이 않이고 그 第一次大戰(제1차대전)의 結果(결과)로 獨立(독립)된 첵고스르바기아國(국)도 亦是(역시) 「獨立(독립)을 承認(승인)함」이라 宣言的(선언적) 規定(규정)만 하여 있고 그 實(실)은 各各(각각) 戰勝國(전승국) 立場(입장)에서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에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이 一員(일원)으로 行動(행동)하였다.
B1.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前文(전문)에 「中心(중심)되는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美英佛伊日(미영불이일)]은 오지리君主國(군주국) 領土(영토)의 一部(일부)로 合倂(합병)하였든 「첵고스로바키아」國(국)을 自由獨立(자유독립) 及(급) 同盟國(동맹국)으로서 旣(기)이 承認(승인)하야」 또은 前記(전기) 諸國(제국)은 오지리君主國(군주국) 領土(영토)의 一部分(일부분)과 셀비야國(국) 領土(영토)를 結合(결합)할 것을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國(국)이란 名稱(명칭) 아래 自由獨立(자유독립) 及(급) 同盟國(동맹국)으로 承認(승인)하야……」 이들 國家(국가)의 政府(정부)에 對(대)하야 正義(정의)와 衡平(형평)에 合致(합치)하는 □續的(□속적) 基礎(기초)를 附與(부여)할 必要(필요)가 있음으로」 하여 첵고스로바키아國(국) 及(급)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國(국)은 直接(직접) 條約(조약) 締結(체결) 當事國(당사국)이 되었다. 그리고 同(동) 第四十六條(제46조) 第五十七條(제57조)에서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이 임이 取(취)한 措處(조처)에 따라…… 完全(완전)한 獨立(독립)을 承認(승인)함」이라 하여 本(본) 條約(조약)에서 오지리國(국)의 承認(승인)을 規定(규정)하였다.
B2. 對항가리講和條約(대항가리강화조약)에는 前文(전문)에 아무 規定(규정)이 없이 本文(본문) 第四十一條(제41조)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國(국)의 獨立(독립) 第四十八條(제48조)로 첵고스로바키아國(국)의 獨立(독립)을 承認(승인)하고 이 兩國(양국)이 모다 正式(정식) 條約(조약) 調印國(조인국)이 되었다.
卽(즉) B1, B2 오지리 항가리 君主國(군주국)에 對(대)하여 交戰國家(교전국가)가 아니면서 直接(직접) 講和條約(강화조약) 調印國(조인국)이 된 나라는 希臘(희랍), 폴추칼[以上(이상) 國交(국교) 斷切(단절)], 큐-바, 니카라과, 波蘭(파란), 셀부 그로아-드 스로베-누, 첵고스로바키아 以上(이상) 七個(7개) 國(국)이다. 그 中(중) 波蘭國(파란국)의 調印(조인)은 法的(법적) 根據(근거)보다 政治的(정치적) 根據(근거)가 크다.
二.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
A.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에는 그 前文(전문)에는 아무 規定(규정)도 업시 本文(본문) 第二十七條(제27조)에서 알바니아國(국) 第三十三條(제33조)에서 에듸오피아國(국)의 獨立(독립) 承認(승인)이라는 規定(규정)뿐이다.
連合國(연합국) 全部(전부)나 調印國(조인국)이 아니고 單純(단순)히 講和會議(강화회의)에 參加(참가)한 國家(국가)가 알바니아, 오지리, 큐-바, 埃及(애급), 이란, 이락, 멕시고, 豪州(호주)의 八個(8개) 國(국)이며 特(특)히 알바니아, 오지리 兩國(양국)은 今次大戰(금차대전)의 終結(종결)로써 獨立(독립)을 回復(회복)한 國家(국가)이다. 多數(다수) 國家(국가)가 講和條約(강화조약)을 締結(체결)하는 例(예)는 第一次大戰(제1차대전)의 現象(현상)이며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와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의 調印國(조인국)의 構成(구성)이 다른 点(점)은 前者(전자)는 形式上(형식상) 全(전) 參加國(참가국) 會議主義(회의주의)를 取(취)하였으나 그 內容(내용)은 美英佛伊日(미영불이일)의 五大强國(5대강국)에서 一致(일치)된 点(점)을 全體會議(전체회의)에 提出(제출)하여 形式的(형식적) 全體一致(전체일치)를 본 後(후)로 準備會議(준비회의)가 僅僅(근근) 六回(6회)에 끝이고 小國(소국)은 各(각) 委員會(위원회)에서 自己(자기)에 關(관)한 意見(의견)만 陳述(진술)하였을 뿐이고 全體會議(전체회의)에서도 草案(초안)을 票決(표결)에 定(정)하지 않고 그 草案(초안) 全部(전부)는 獨逸(독일)에 提示(제시)하기 前日(전일)의 全體會議(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發表(발표)하였다.
그리고 後者(후자)는 美英佛中(미영불중)쏘의 五大國(5대국)이 理事國(이사국)이 되여 처음부터 大國中心主義(대국중심주의)로 全體會議(전체회의)를 形式上(형식상)으로는 認定(인정)치 않을 뿐 아니라 이 五大國(5대국) 間(간)에서도 伊太利(이태리)와 直接戰鬪(직접전투)가 있든 家(가)가 하야 美英佛(미영불)쏘의 四理事國(4이사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항가리아에 對(대)하여서는 英佛(영불)쏘 三理事國(3이사국), 휘랜드는 英(영)쏘 兩(양) 理事國(이사국)만이 隨時(수시) 利益關係事項(이익관계사항)만 그 關係國(관계국)을 招請(초청)하야 草案(초안) 作成(작성)해 가지고 各各(각각) 相當(상당)한 兵力(병력)으로써 積極的(적극적) 戰鬪(전투)를 連合國(연합국)이라 하여 上記(상기) 五大國(5대국) 外(외)의 十六個(16개) 國(국)으로 構成(구성)한 會議(회의)에 草案(초안) 審議(심의)를 勸告(권고)하야 審議(심의)한 後(후) 最終(최종)의 決定(결정)도 亦是(역시) 上記(상기) 四, 三, 二(4, 3, 2)의 各(각) 國家(국가) 間(간)에서 마음대로 하여 버리고 條約(조약) 效力(효력) 發生(발생)도 四, 三, 二國(4, 3, 2국)의 批准(비준)만으로 直時(직시) 發行(발행)한다 하였다.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있어 美英(미영)의 態度(태도)가 쏘聯(련)의 妨害工作(방해공작)의 豫防策(예방책)으로 여러가지 方法(방법)을 講究(강구)했으나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時(시)의 四, 三, 二式(4, 3, 2식)보다 多數決方式(다수결방식)으로 갈 듯하다.
今次大戰(금차대전)에서 對日宣戰布告(대일선전포고) 한 國家(국가)는 알젠징, 濠州(호주), 白耳義(백이의), 보리바아, 부라질, 빌-白露(백로), 카나다, 세이롱, 智利(지리), 中國(중국), 큐-바, 첵고스르바기아, 도미나가, 엘쿠아돌, 埃及(애급), 살바돌, 에듸오피아, 法國(법국), 希臘(희랍), 과데마라, 하이듸, 온두라스, 印度(인도), 이란, 이락, 伊太利(이태리), 레바논, 리베리아, 베루, 比律賓(비율빈), 波蘭(파란), 사우지아라비아, 시리아, 土耳其(토이기), 우크라이나, 南阿弗加(남아불가), 쏘聯(련), 英國(영국), 美國(미국), 울과이, 베네귀라 以上(이상) 五十個(50개) 國(국)이며 對日休戰條約(대일휴전조약) 調印國(조인국)은 美(미), 英(영), 中(중), 쏘, 法(법), 加(가), 比(비), 波(파), 新(신), 西(서), 蘭(란), 加(가), 印(인), 파키스탄, 빌마의 十二個(12개) 國(국)이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日(2일) 以後(이후) 急變(급변)하는 極東情勢(극동정세)에 있어 米쏘英中(미쏘영중) 四大國(4대국) 中心主義(중심주의)는 □□□□하고 또 對日休戰條約(대일휴전조약) 參加國(참가국)안도 現實(현실)에 符合(부합)치 않고 結局(결국) 極東委員會(극동위원회) 構成(구성)이 中心(중심)인 듯하다. 여기에 韓國(한국) 立場(입장)은 今後(금후) 極東要員會(극동요원회)에 參加(참가)한다면 別(별) 問題(문제)다. 그렀치 않은 限(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의 調印(조인) 當事國(당사국)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締結(체결) 前(전)에 太平洋軍事同盟(태평양군사동맹)이 締結(체결)될 可能性(가능성)이 濃厚(농후)하고 다시 이 同盟(동맹)이 結成(결성)되지 않는다 하더래도 日本(일본)의 安全保障(안전보장)이 重要(중요)한 立場(입장)에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이 締結(체결)될 時(시) 韓國(한국)의 發言權(발언권)도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의 重要視(중요시)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政治的(정치적) 立場(입장)에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對(대)한 韓國(한국)의 立場(입장)을 有利(유리)하게 誘導(유도)하여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에 規定(규정)되는 事項(사항)으로써 韓國(한국) 內(내)의 對日感情(대일감정)을을 緩和(완화)하여 將來(장래)의 韓國(한국) 安全保障(안전보장)과 韓日(한일) 間(간)의 善隣關係(선린관계)를 保持(보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