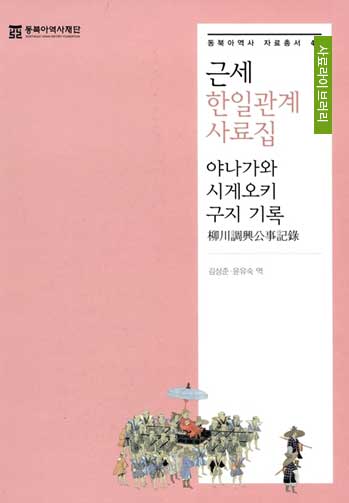통신사의 명단과 수행원
정사(正使) 통정대부이조참의지제교(通政大夫吏曹參議知製敎) 조엄(趙曮)
부사(副使) 통정대부행홍문관전륜지제교겸경연시독관춘추관편수관(通政大夫行弘文館典輪知製敎兼慶筵侍讀官春秋館編修官) 이인배(李仁培)
종사관(從事官) 통정대부행홍문관교리지제교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通政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慶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김상익(金相翊)
상상관(上々官) 3명
상판사(上判事) 3명
학사(學士) 1명
제술관(製述官) 1명
서기(書記) 3명
압물판사(押物判事) 4명
양의(良醫) 1명
의(醫) 2명
사자관(寫字官) 2명
화사(畵士) 1명
양상(佯倘) 3명
별파진(別破陣)주 001
각주 001)

3명조선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었으나, 일반적으로 별파군(別破軍) 또는 별파진이라고 했다. 1687년에 제도화한 군대이며, 화포(火咆)를 주로 다루고 화기장방(火器藏放)과 화약고(火藥庫)의 입직을 담당했다.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되었고, 각 아문에 소속되었다. 통신사행 때, 군관(軍官)을 겸한 2명의 별파진이 파견되었다. 예(例)에 따라 군관이 겸직하였으므로 별파진겸군관(別破陣兼軍官)이라고도 하였고, 일본에서 통신사절단을 구분하는 등급 가운데 상관(上官)에 속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마상재(馬上才) 2명
이마(理馬)주 002
각주 002)

1명사행 때 말을 다루거나 돌보는 사람. 모두 체아직(遞兒職)으로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있다. 차상관(次上官) 혹은 차관(次官)에 속한다. 1427년 전의감(典醫監) 의원들에게 우마의방서(牛馬醫方書)를 배우게 하여 사복시에서 수의사 역할을 맡게 하면서 또 이마에게도 마의방(馬醫方)의 약명과 치료술을 전수하여 질병을 치료하게 했다. 사행 때 대개 1명의 이마가 수행했다. 공예단(公禮單)으로 준마(駿馬)를 준비했을 경우 부산에 도착하면 이마가 소통사 1명 및 선격(船格) 1명과 함께 먼저 쓰시마로 건너갔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곡마승(曲馬乘) 2명
기선장(騎船將)주 003
각주 003)

3명조선후기 통신사와 문위행이 일본에 도항할 때 타고 간 기선(騎船)의 선장. 기선은 삼사 등 사행원이 타는 배를 말한다. 통신사행 때 사절단이 정사·부사·종사관을 중심으로 각각 제일선(第一船)·제이선(第二船)·제삼선(第三船)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선장 역시 각 배마다 한 명씩 배치되었다. 기선장은 복선장과 마찬가지로 주로 부산·동래·경상좌수영 출신으로 차출되고, 차출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장교(將校)를 맡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해로에 익숙하고, 다른 원역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자를 뽑았다. 기선장은 차상관(次上官)에 속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도훈도(都訓道) 3인 흡창(吸唱) 6인
하선장(下船將) 3인 사령(使令) 18인
예사직[禮事直] 3인 취수(吹手)주 004 18인
청직[聽直]주 005 3인 도척(刀尺) 6인
반전직[盤纏直]주 006
각주 006)

3인 포수(炮手) 6인사행 경비인 노자(路資)나 사행 중에 쓰는 물건을 지키는 사람. 사신반전(使臣盤纏)이라고도 하고, 노자나 물건을 지키는 사람을 반전직(盤纏直) 혹은 반전차지(盤纏次知)라고도 한다. 통신사행 때 반전은 통상 1~3명이 수행했다. 여비로 쓰는 은자(銀子)를 반전은자(盤纏銀子)라고 하는데, 호조에서 은자를 지급해 주면 대하(貸下)했다가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관례에 따라 갚았다. 그 밖에도 반전증미(盤纏贈米)·반전예단(盤纏禮單)·반전응자(盤纏鷹子)·반전잡물(盤纏雜物) 등이 있으며, 별도의 여비로 별반전(別盤纏)이 있다. 반전은 예단(禮單)·복물(卜物)·잡물(雜物) 등과 함께 부기선(副騎船)에 실어 운반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소통사(小通事) 10인 독기[纛旗] 기수 6인
소동(小童) 18인 형명기(形名旗) 기수 6인
절월(節鉞) 4인 기수(籏手) 8인
일행노자(一行奴子)주 007
각주 007)

6인 삼사 관노자(官奴子) 6인노자(奴子)는 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간 노복(奴僕), 즉 사내종으로, 중관(中官)에 속한다. 노자를 사노자(私奴子)와 일행노자(一行奴子)로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노자에 사노자를 포함하여 일컫기도 한다. 사노자를 줄여 사노(私奴)라고도 한다. 삼사신과 당상관이 각각 2명을 거느리고, 상통사 이하부터 마상재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1명씩 거느린다. 『증정교린지』에는 노자의 총인원이 52명으로 나와 있고, 『통문관지』에는 49명으로 나와 있는데, 『통문관지』의 노자 인원수는 당상역관 1인과 압물관(押物官) 1인의 노자 3명이 빠진 수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1)
조선후기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된 특수병종. 본래는 별파군진(別破軍陣)이었으나, 일반적으로 별파군(別破軍) 또는 별파진이라고 했다. 1687년에 제도화한 군대이며, 화포(火咆)를 주로 다루고 화기장방(火器藏放)과 화약고(火藥庫)의 입직을 담당했다. 무관잡직(武官雜職)으로 편성되었고, 각 아문에 소속되었다. 통신사행 때, 군관(軍官)을 겸한 2명의 별파진이 파견되었다. 예(例)에 따라 군관이 겸직하였으므로 별파진겸군관(別破陣兼軍官)이라고도 하였고, 일본에서 통신사절단을 구분하는 등급 가운데 상관(上官)에 속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2)
-
각주 003)
조선후기 통신사와 문위행이 일본에 도항할 때 타고 간 기선(騎船)의 선장. 기선은 삼사 등 사행원이 타는 배를 말한다. 통신사행 때 사절단이 정사·부사·종사관을 중심으로 각각 제일선(第一船)·제이선(第二船)·제삼선(第三船)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선장 역시 각 배마다 한 명씩 배치되었다. 기선장은 복선장과 마찬가지로 주로 부산·동래·경상좌수영 출신으로 차출되고, 차출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장교(將校)를 맡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해로에 익숙하고, 다른 원역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자를 뽑았다. 기선장은 차상관(次上官)에 속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사행 경비인 노자(路資)나 사행 중에 쓰는 물건을 지키는 사람. 사신반전(使臣盤纏)이라고도 하고, 노자나 물건을 지키는 사람을 반전직(盤纏直) 혹은 반전차지(盤纏次知)라고도 한다. 통신사행 때 반전은 통상 1~3명이 수행했다. 여비로 쓰는 은자(銀子)를 반전은자(盤纏銀子)라고 하는데, 호조에서 은자를 지급해 주면 대하(貸下)했다가 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관례에 따라 갚았다. 그 밖에도 반전증미(盤纏贈米)·반전예단(盤纏禮單)·반전응자(盤纏鷹子)·반전잡물(盤纏雜物) 등이 있으며, 별도의 여비로 별반전(別盤纏)이 있다. 반전은 예단(禮單)·복물(卜物)·잡물(雜物) 등과 함께 부기선(副騎船)에 실어 운반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7)
노자(奴子)는 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간 노복(奴僕), 즉 사내종으로, 중관(中官)에 속한다. 노자를 사노자(私奴子)와 일행노자(一行奴子)로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노자에 사노자를 포함하여 일컫기도 한다. 사노자를 줄여 사노(私奴)라고도 한다. 삼사신과 당상관이 각각 2명을 거느리고, 상통사 이하부터 마상재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1명씩 거느린다. 『증정교린지』에는 노자의 총인원이 52명으로 나와 있고, 『통문관지』에는 49명으로 나와 있는데, 『통문관지』의 노자 인원수는 당상역관 1인과 압물관(押物官) 1인의 노자 3명이 빠진 수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