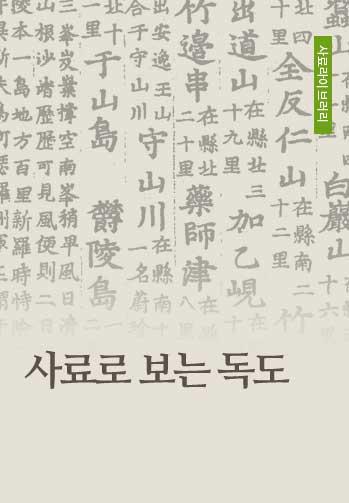영의정 유상운이 안용복의 죄와 관서 우박의 재해, 참하의 변통 등에 대해 말하다
사료해설
1696년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에 갔다가 귀국한 안용복의 처벌을 둘러싸고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대체적인 내용은 안용복이 법을 위반하고 타국에 건너간 것은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처리를 대마도에 통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일본이 조일 양국이 합의한 표류민 송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시킨 행위는 당시 조일간에 약속한 교섭체제를 위반한 것이므로 대마도에 간 문위행(問慰行)을 통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며, 문위행이 귀국한 후에 안용복을 처벌해도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정부가 대마도가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영토화를 주도하였음을 인지하고, 나아가 조일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원문
○庚辰/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曰: “安龍福不畏法禁, 生事他國, 罪不可容貸。 且彼國解送漂海人, 必自對馬島, 例也, 而直自其處出送, 不可不以此明白言及, 而龍福姑待渡海譯官還來後, 置斷宜矣。” 左議政尹趾善亦以爲然。 刑曹判書金鎭龜曰: “臣以領相之言, 往問右議政徐文重, 以爲: ‘此事所關不輕。 自古交隣之事, 初似微細, 末或至大。 對馬島若聞龍福之事, 必憾怒我國。 宜先通報, 而囚龍福等, 以待彼中消息, 然後論斷。’ 判府事申翼相以爲: ‘通告對馬島, 似不可已, 而聽其所言後處置, 有同稟令, 一邊通告, 一邊處斷, 似當。’ 云矣。” 上問諸臣。 諸臣皆以爲: “龍福罪狀難貸。 先通島主後, 更觀事機而處斷爲宜。” 上曰: “龍福之罪, 決不可貸, 亦不可不通告馬島。 渡海譯官還來後處之可矣。” 尙運請問議于南九萬、尹趾完, 允之。 尙運曰: “李仁成製疏, 其罪亦重, 而若論首、從, 仁成爲從, 宜斷以次律。 其餘只爲漁採而去, 當置而不論矣。” 上可之。 尙運陳: “關西淸北, 又被雹災, 將成赤地。 海西收米, 捧留本道, 直送關西, 而其數不及於春、夏賑資。 待諸道年分上來, 必以一萬五千石爲限, 入送淸北, 似不可已。” 上從之。 尙運以崔錫鼎箚參下變通事稟裁, 上曰: “參下察訪, 滿四十五朔, 遷轉六品之後, 仍以其窠, 定爲參上之職, 參奉變通事, 與他大臣相議處之。” 尙運稟庶孽稱號事, 吏曹判書崔錫鼎, 請以業儒、業武, 爲庶孽文、武之稱, 上從之。 尙運曰: “庶孽陞六品者, 竝許三曹, 則有混淆之弊, 如有表表可稱者, 銓曹宜從公議收用。” 上可之。 上問武臣通擬承旨事, 兵曹判書閔鎭長言: “科場久不試講, 以致士夫業武者不得參。 因此人才乏少, 不得養望。” 尙運、趾善仍言試講之有效, 上曰: “間間試講, 吏曹亦可採公議通擬也。”
번역문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켰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저 나라에서 표해인(漂海人)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대마도(對馬島)에서 하는 것이 규례인데, 곧바로 그곳에서 내보냈으니, 이것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안용복은 도해 역관(渡海譯官)이 돌아온 뒤에 처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도 그렇게 말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신(臣)이 영상(領相)의 말에 따라 우의정(右議政) 서문중(徐文重)에게 가서 물었더니,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예전부터 교린(交隣)에 관한 일은 처음에는 작은 듯하다가 끝에 가서는 매우 커진다. 대마도에서 안용복의 일을 들으면, 우리 나라에 원한(怨恨)을 품을 것이니 먼저 통보하고, 안용복 등을 가두고서 저들의 소식을 기다린 뒤에 논단(論斷)해야 할 것이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신익상(申翼相)은, ‘대마도에 통고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하나, 그 말을 들은 뒤에 처치하면 품령(稟令)과 같으니, 한편으로 통고하고 한편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신(諸臣)에게 물었다. 제신이 다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상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도주(島主)에게 통고한 뒤에 다시 사기(事機)를 보아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대마도에 통고하지 않을 수도 없다. 도해 역관이 돌아온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유상운이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에게 문의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
“이인성(李仁成)은 소(疏)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또한 무거우나,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논한다면 이인성은 종범이 되니, 차율(次律)로 결단하여야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는 고기잡이하러 갔을 뿐이니,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유상운이 아뢰기를,
“관서(關西)의 청북(淸北)은 또 우박의 재해를 입어서 정차 적지(赤地)가 될 것이니, 해서(海西)에서 거둔 쌀을 본도(本道)에서 받아두었다가 곧바로 관서로 보내고, 그 수가 봄·여름의 진자(賑資)에 미치지 못하면, 제도(諸道)의 연분(年分)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반드시 1만 5천 석(石)을 한정하여 청북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상운이, 최석정(崔錫鼎)이 차자(箚子)로 아뢴 참하(參下)를 변통하는 일을 품재(品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하(參下)인 찰방(察訪)은 만 45삭(朔)에 6품(品)으로 옮긴 뒤에 그대로 그 벼슬자리를 참상의 벼슬로 정하고, 참봉(參奉)을 변통하는 일은 다른 대신과 상의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유상운이 서얼(庶孽)의 칭호에 관한 일을 품재하였는데, 이조 판서(吏曹判書) 최석정(崔錫鼎)이 업유(業儒)·업무(業武)를 문(文)·무(武) 서얼의 칭호로 삼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상운이 말하기를,
“서얼로서 6품에 오른 자를 모두 삼조(三曹)의 벼슬에 통하도록 허가하면 혼란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뚜렷이 일컬을 만한 자가 있으면 전조(銓曹)에서 공론에 따라 거두어 임용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임금이 무신(武臣)을 승지(承旨)에 통의(通擬)하는 일을 묻자,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말하기를,
“과장(科場)에서 오랫동안 강서(講書)를 시험하지 않아서 사부(士夫)로서 무사(武事)를 익히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문에 인재가 모자라서 양망(養望)9056) 하지 못합니다.”
하고, 유상운·윤지선도 이어서 강서를 시험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따금 강서를 시험하고, 이조(吏曹)에서도 공론에 따라 통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용복(安龍福)은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켰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저 나라에서 표해인(漂海人)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대마도(對馬島)에서 하는 것이 규례인데, 곧바로 그곳에서 내보냈으니, 이것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안용복은 도해 역관(渡海譯官)이 돌아온 뒤에 처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도 그렇게 말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신(臣)이 영상(領相)의 말에 따라 우의정(右議政) 서문중(徐文重)에게 가서 물었더니,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예전부터 교린(交隣)에 관한 일은 처음에는 작은 듯하다가 끝에 가서는 매우 커진다. 대마도에서 안용복의 일을 들으면, 우리 나라에 원한(怨恨)을 품을 것이니 먼저 통보하고, 안용복 등을 가두고서 저들의 소식을 기다린 뒤에 논단(論斷)해야 할 것이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신익상(申翼相)은, ‘대마도에 통고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하나, 그 말을 들은 뒤에 처치하면 품령(稟令)과 같으니, 한편으로 통고하고 한편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신(諸臣)에게 물었다. 제신이 다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상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도주(島主)에게 통고한 뒤에 다시 사기(事機)를 보아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대마도에 통고하지 않을 수도 없다. 도해 역관이 돌아온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유상운이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에게 문의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
“이인성(李仁成)은 소(疏)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또한 무거우나, 수범(首犯)·종범(從犯)을 논한다면 이인성은 종범이 되니, 차율(次律)로 결단하여야 마땅합니다. 그 나머지는 고기잡이하러 갔을 뿐이니,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유상운이 아뢰기를,
“관서(關西)의 청북(淸北)은 또 우박의 재해를 입어서 정차 적지(赤地)가 될 것이니, 해서(海西)에서 거둔 쌀을 본도(本道)에서 받아두었다가 곧바로 관서로 보내고, 그 수가 봄·여름의 진자(賑資)에 미치지 못하면, 제도(諸道)의 연분(年分)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반드시 1만 5천 석(石)을 한정하여 청북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상운이, 최석정(崔錫鼎)이 차자(箚子)로 아뢴 참하(參下)를 변통하는 일을 품재(品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하(參下)인 찰방(察訪)은 만 45삭(朔)에 6품(品)으로 옮긴 뒤에 그대로 그 벼슬자리를 참상의 벼슬로 정하고, 참봉(參奉)을 변통하는 일은 다른 대신과 상의하여 처치하라”
하였다. 유상운이 서얼(庶孽)의 칭호에 관한 일을 품재하였는데, 이조 판서(吏曹判書) 최석정(崔錫鼎)이 업유(業儒)·업무(業武)를 문(文)·무(武) 서얼의 칭호로 삼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상운이 말하기를,
“서얼로서 6품에 오른 자를 모두 삼조(三曹)의 벼슬에 통하도록 허가하면 혼란한 폐단이 있을 것이니, 뚜렷이 일컬을 만한 자가 있으면 전조(銓曹)에서 공론에 따라 거두어 임용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임금이 무신(武臣)을 승지(承旨)에 통의(通擬)하는 일을 묻자,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이 말하기를,
“과장(科場)에서 오랫동안 강서(講書)를 시험하지 않아서 사부(士夫)로서 무사(武事)를 익히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때문에 인재가 모자라서 양망(養望)9056) 하지 못합니다.”
하고, 유상운·윤지선도 이어서 강서를 시험하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따금 강서를 시험하고, 이조(吏曹)에서도 공론에 따라 통의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