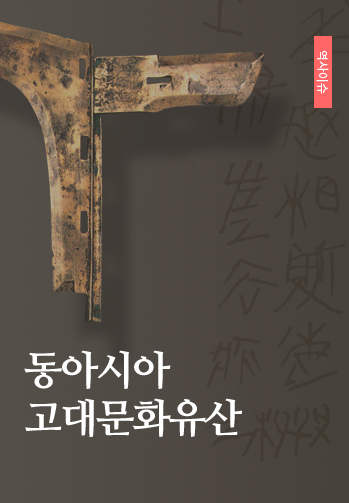평성궁터 목간
平城宮터 木簡
유적개관
710년 겐메이왕[元明天皇]이 헤이조쿄(지금의 나라)로 천도하면서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를 열며 세운 궁궐의 터로, 사키정[佐紀町]에 자리 잡고 있다. 헤이안시대의 궁성인 평성궁터에서 발해와 관련된 목간이 두 점 출토되었다. 하나는 東二坊坊間路 서측구(西側溝)에서 1988년에 출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성궁 남면 大垣에서 1966년도에 출토된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발해사' 목간이라 하고 후자를 '견고려사' 목간이라 한다. 전자는 장방형으로 너비 8.5cm, 두께 0.7cm이고, 현재 남아있는 길이는 8cm이다. 이것은 정식 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그려진 나무판 위에 글씨를 연습한 것이다. 발견된 곳은 장옥왕 저택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여기에서 출토된 220점의 목간은 화동 8년(715)부터 천평 원년(729) 사이의 것이며 이중에서도 천평 원년의 목간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서 발해 사신이 왔던 시기는 발해와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던 727년 뿐이다. 따라서 발해사는 구체적으로 고제덕 일행을 가리킨다. 후자는 길이24.8cm, 너비 2cm, 두께 0.4cm인 목간에 모두 22자가 쓰여 있다. 여기서 칭한 고려는 발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견고려사 즉 견발해사는 천평 보자 2년(758) 9월 18일에 발해사신 양승경 일행과 함께 귀국한 소야전수 일행을 가리킨다.
해설
헤이죠쿄[平城京]는 일본 나라[奈良]현 나라[奈良]시 사키[佐紀]정(町)에 위치한다.
헤이죠쿄는 나라 시대(710~794)의 대부분 기간(710~740, 745~784)때 일본의 수도였다. 몬무[文武]에 의해 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헤이죠쿄로의 천도 문제의 심의가 시작되었고 다음해인 겐메이[元明]에 의해 공식적인 조가 내려지면서 710년 천도가 단행되었다. 헤이죠쿄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되었다. 740년 쇼무[聖武]에 의해 구니쿄[恭仁京]나 나니와쿄[難波京]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745년 다시 이 곳으로 환도하였다. 784년 간무[桓武]가 헤이안[平安]으로 천도하기까지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헤이죠쿄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 모양으로 중앙의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좌우가 나뉜다. 전체 규모는 동서 길이 약 4.3㎞, 남북으로 약 4.7㎞ 정도이다.
헤이죠쿄 유적에서 발해의 목간이 2개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헤이죠쿄 유적 좌경(左京) 3조(三條) 2방(二坊)의 동쪽에 접하는 동2방(東二坊) 방 사이의 도로 서쪽 구역에서 출토되었다. 다른 하나는 헤이죠쿄 동남쪽 구석진 곳의 남면 큰 벽의 북쪽을 동으로 흐르는 동서 구(溝)에서 출토되었다.
먼저 첫 번째 목간은 장방형으로 너비 8.5cm, 두께 0.7cm이고, 현재 남아있는 길이는 8cm이다. 목간이 없어진 부분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의 형태는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인 것이다. 내용으로 보아 정식 문서가 아니라 나무판 위에 글씨를 연습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중 ‘발해사(渤海使)’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다. 이 목간이 발견된 곳은 나가야[長屋]왕의 저택으로 밝혀진 구역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나가야[長屋]왕의 저택으로 밝혀진 구역에서 발굴된 220점의 목간은 대체로 715년에서 729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발해사’라고 기록된 목간은 이 기간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추정한다면 발해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처음 수립되었던 727년뿐이다. 이 때의 발해사신단은 고제덕(高齊德) 일행으로 보이며 이들 일행은 공식적인 외교활동과 교역활동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목간은 길이 24.8cm, 너비 2cm, 두께 0.4cm로 모두 22자가 쓰여 있다. “의견고려사회래 천평보자이년십월입팔일 진이계서(依遣高麗使廻來天平寶字二年十月卄八日進二階敍)”라 되어 있는데, 고려에 파견된 사신단이 일을 완수하고 귀국하였으므로, 천평보자(天平寶字) 2년(758) 10월 28일 위계를 두 개 올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고려는 발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견고려사’는 오노다모리[小野田守]를 말한다. 오노다모리 일행은 758년 9월 18일에 발해사신인 양승경(楊承慶) 일행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한 바 있다. 이 목간을 통해 일본이 발해를 고려로 칭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를 고려라고 칭한 경우는 『속일본기』에서의 기록과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악구궐실병출납장(樂具闕失幷出納帳)〉이라는 문서, 그리고 이 목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이죠쿄는 나라 시대(710~794)의 대부분 기간(710~740, 745~784)때 일본의 수도였다. 몬무[文武]에 의해 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헤이죠쿄로의 천도 문제의 심의가 시작되었고 다음해인 겐메이[元明]에 의해 공식적인 조가 내려지면서 710년 천도가 단행되었다. 헤이죠쿄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되었다. 740년 쇼무[聖武]에 의해 구니쿄[恭仁京]나 나니와쿄[難波京]로 옮겨가기도 했지만, 745년 다시 이 곳으로 환도하였다. 784년 간무[桓武]가 헤이안[平安]으로 천도하기까지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헤이죠쿄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 모양으로 중앙의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좌우가 나뉜다. 전체 규모는 동서 길이 약 4.3㎞, 남북으로 약 4.7㎞ 정도이다.
헤이죠쿄 유적에서 발해의 목간이 2개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헤이죠쿄 유적 좌경(左京) 3조(三條) 2방(二坊)의 동쪽에 접하는 동2방(東二坊) 방 사이의 도로 서쪽 구역에서 출토되었다. 다른 하나는 헤이죠쿄 동남쪽 구석진 곳의 남면 큰 벽의 북쪽을 동으로 흐르는 동서 구(溝)에서 출토되었다.
먼저 첫 번째 목간은 장방형으로 너비 8.5cm, 두께 0.7cm이고, 현재 남아있는 길이는 8cm이다. 목간이 없어진 부분이 있으며 나머지 부분의 형태는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인 것이다. 내용으로 보아 정식 문서가 아니라 나무판 위에 글씨를 연습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중 ‘발해사(渤海使)’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다. 이 목간이 발견된 곳은 나가야[長屋]왕의 저택으로 밝혀진 구역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 나가야[長屋]왕의 저택으로 밝혀진 구역에서 발굴된 220점의 목간은 대체로 715년에서 729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발해사’라고 기록된 목간은 이 기간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추정한다면 발해와 일본의 외교관계가 처음 수립되었던 727년뿐이다. 이 때의 발해사신단은 고제덕(高齊德) 일행으로 보이며 이들 일행은 공식적인 외교활동과 교역활동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목간은 길이 24.8cm, 너비 2cm, 두께 0.4cm로 모두 22자가 쓰여 있다. “의견고려사회래 천평보자이년십월입팔일 진이계서(依遣高麗使廻來天平寶字二年十月卄八日進二階敍)”라 되어 있는데, 고려에 파견된 사신단이 일을 완수하고 귀국하였으므로, 천평보자(天平寶字) 2년(758) 10월 28일 위계를 두 개 올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고려는 발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견고려사’는 오노다모리[小野田守]를 말한다. 오노다모리 일행은 758년 9월 18일에 발해사신인 양승경(楊承慶) 일행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한 바 있다. 이 목간을 통해 일본이 발해를 고려로 칭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를 고려라고 칭한 경우는 『속일본기』에서의 기록과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악구궐실병출납장(樂具闕失幷出納帳)〉이라는 문서, 그리고 이 목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