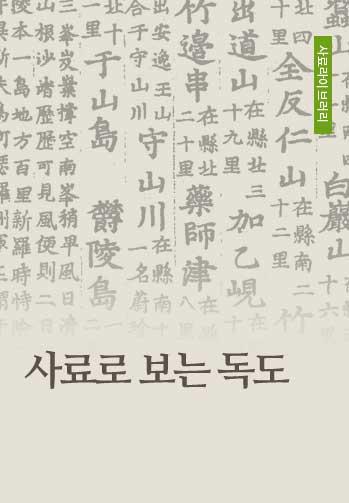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다
사료해설
울릉도 수토관이 순찰할 때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나무를 벌채하여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원감사 임한수(林翰洙)가 올린 장계를 토대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고종에게 올린 보고이다. 울릉도에 일본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고 나무를 벌채해 가는 등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다. 보고를 받은 통리기무아문은 이에 두 가지의 대책을 건의하였다. 하나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몰래 나무를 채벌해 실어가는 것은 변경 왕래 금지를 어기는 것이므로 동래부의 왜관을 통해서 일본 외무성에 서계(書契)를 보내 항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울릉도를 더 이상 빈 땅으로 버려둘 수 없으므로, 부호군(副護軍)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에 임명하여 현지로 파견하여 지형과 방수(防守)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되, 보고를 기다려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고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날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되었다. 이는 조선 정부가 태종대 이래 460여 년간 유지해 왔던 울릉도의 쇄환·수토정책의 폐기함께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 강화로 영토정책을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원문
統理機務衙門啓: “卽見江原監司林翰洙狀啓, 則枚擧鬱陵島搜討官所幸, 以爲: ‘看審之際, 有何伐木, 積置海岸, 剪頭着黑衣者七名, 坐其傍。 故以書問之, 則答「以日本人, 而伐木, 將送于元山、釜山」爲言。 彼舶去來, 挽近無常, 指點此島, 不無其弊。 請令統理機務衙門稟處’矣。 封山自是重地, 搜討亦有定式。 而彼人之潛斫暗輸, 邊禁攸關, 不容不嚴防乃已。 將此事實, 撰出書契, 下送萊館, 轉致于日本外務省。 而第伏念是島處在淼茫之中, 任他空曠甚屬疎虞, 其形止要害之何如, 防守緊密之何如, 合有周審而裁處。 副護軍李奎遠, 鬱陵島檢察使差下, 使之從近馳往, 到底商度, 具意見修啓, 以爲稟覆何如?” 又啓: “卽見東萊府使金善根所報, 則枚擧梁山郡守移文, 以爲‘行止殊常漢二名捉致, 究問, 則一是大邱人, 一是日本人。 而我國人禹秉延, 本以邪徒逋踪, 「今春入倭館, 留宿於伊東倭處。 而彼倭欲學邪學, 願作同行於大邱, 故換着朝鮮衣樣, 到梁山, 以至被捉」云。 潛通異類, 做此變怪, 論其罪狀, 合有當律’爲辭矣。 禁斥邪學, 朝飭本自嚴重, 而日昨別下綸敎, 又復惻怛懇摯, 雖木石之頑、豚魚之迷, 誠可孚而可格矣。 今此禹漢, 卽邪類中年久漏網者, 而至於締引隣國之人。 踰越地界之外者, 尤不可但以凶悖論。 所招中徒黨諸漢, 爲先嚴飭於各鎭營, 刻期詗捕, 築底鉤覈, 按法鋤治。 禹秉延, 押送左水營, 令帥臣大會軍民, 梟首警衆。 此事所關非輕, 而不爲登聞, 只以修報者, 殊涉不審, 該府使金善根推考何如?” 竝允之。
번역문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간심(看審)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찍어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봉산(封山)은 원래 중요한 곳이니 수토(搜討)하는 것도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암암리에 나무를 찍어서 남몰래 실어가는 것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서계(書契)로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해지(要害地)로서 어떠한지 방수(防守)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헤아려보고 의견을 갖추어 수계(修啓)하여 아뢰고 복계(覆啓)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선근(金善根)의 보고를 보니, 양산 군수(梁山郡守)의 이문(移文)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행동이 수상한 놈 2명(名)을 잡아다가 신문하였더니 하나는 대구(大邱)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우병연(禹秉延)은 본래 사도(邪徒)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금년 봄에 왜관(倭館)으로 들어가서 이토〔伊東〕라는 왜인(倭人)이 있는 곳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 왜인은 사학(邪學)을 배우고자 대구에 같이 가길 원하였기 때문에 조선옷을 갈아입고 가다가 양산에서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남몰래 외국인들과 내통하여 이처럼 괴상한 짓을 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한다면 해당 형률(刑律)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학을 금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조칙(朝飭)이 원래 엄중하였고 며칠 전에는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다시금 간곡하게 타일렀으니 비록 목석처럼 완고하고 돼지와 물고기처럼 미련하다 하더라도 진실로 믿고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우가(禹哥) 놈은 사류(邪類) 가운데서 오랫동안 도망하여 숨어 있던 사람으로 이웃 나라 사람을 끌고 지정된 지경(地境) 밖으로 넘어 나가기까지 하였던 자이니, 더욱 다만 흉악한 패륜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공초 안에 있는 도당(徒黨)의 여러 놈들은 우선 각 진영(鎭營)에 엄하게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해서 철저히 캐묻고 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우병연은 좌수영(左水營)에 압송(押送)하여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닌데도 등문(登聞)하지 않고 다만 수보(修報)만 하는 것은 매우 세심하지 못한 행동이니 해당 부사 김선근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간심(看審)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찍어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봉산(封山)은 원래 중요한 곳이니 수토(搜討)하는 것도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암암리에 나무를 찍어서 남몰래 실어가는 것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서계(書契)로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해지(要害地)로서 어떠한지 방수(防守)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헤아려보고 의견을 갖추어 수계(修啓)하여 아뢰고 복계(覆啓)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동래 부사(東萊府使) 김선근(金善根)의 보고를 보니, 양산 군수(梁山郡守)의 이문(移文)을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행동이 수상한 놈 2명(名)을 잡아다가 신문하였더니 하나는 대구(大邱)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우병연(禹秉延)은 본래 사도(邪徒)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금년 봄에 왜관(倭館)으로 들어가서 이토〔伊東〕라는 왜인(倭人)이 있는 곳에 묵고 있었습니다. 그 왜인은 사학(邪學)을 배우고자 대구에 같이 가길 원하였기 때문에 조선옷을 갈아입고 가다가 양산에서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남몰래 외국인들과 내통하여 이처럼 괴상한 짓을 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한다면 해당 형률(刑律)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학을 금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조칙(朝飭)이 원래 엄중하였고 며칠 전에는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다시금 간곡하게 타일렀으니 비록 목석처럼 완고하고 돼지와 물고기처럼 미련하다 하더라도 진실로 믿고 감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우가(禹哥) 놈은 사류(邪類) 가운데서 오랫동안 도망하여 숨어 있던 사람으로 이웃 나라 사람을 끌고 지정된 지경(地境) 밖으로 넘어 나가기까지 하였던 자이니, 더욱 다만 흉악한 패륜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공초 안에 있는 도당(徒黨)의 여러 놈들은 우선 각 진영(鎭營)에 엄하게 신칙하여 기한을 정해놓고 체포해서 철저히 캐묻고 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우병연은 좌수영(左水營)에 압송(押送)하여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닌데도 등문(登聞)하지 않고 다만 수보(修報)만 하는 것은 매우 세심하지 못한 행동이니 해당 부사 김선근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