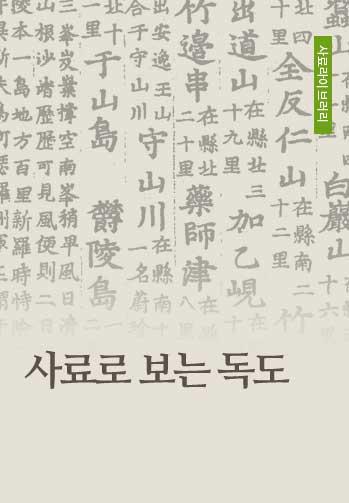홍봉한 등이 춘조의 정지와 선혜청의 군작미에 대한 일 등에 대해 의논하다
사료해설
원도 관찰사 송형중(宋瑩中)이 장계를 통하여 강원도의 춘계 군사훈련을 정지하되 울릉도 수토와 세 진(鎭)에서의 승진시험(勸武都試)은 전례에 의거하여 실행하도록 요청하였다. 영조는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행하도록 명령한다. 이 사료를 통해 영조 때에도 울릉도 수토가 꾸준히 실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命停江原道今春操, 鬱陵島搜討之行, 三鎭勸武都試則依例設行, 因道臣宋瑩中狀請也。 兩都留守, 亦皆狀請停操, 允之, 仍命諸道, 一體停操。 惠廳堂上鄭弘淳請惠廳句管軍作米在三南者, 令諸道轉移山郡所在米於沿海各邑, 以便均輸, 上下詢大臣而允之。 領議政洪鳳漢曰: “三南濟民倉, 湖西嶺南, 皆貯實穀, 獨湖南牟麥居多, 三年一分, 輒致腐傷, 請令道臣, 量宜換作米租。” 又奏: “糶糴不均, 山郡穀多而反爲病民, 沿海穀小而無以利民。 蓋以內而戶曹賑廳, 外而諸道營門, 凡有發賣, 取其高直, 必就海邑致有此弊。 請另飭京外, 若非廟堂所許, 沿海糴穀, 無得散用, 取次轉移, 從便裒益。” 竝允之。 鳳漢又請今番赦典見漏者, 特推均施之典, 上命歷擧以奏, 解謫收敍者, 凡二十二人。
번역문
강원도의 올해 춘조(春操)를 정지하되, 울릉도(鬱陵島)에 수토(搜討)하러 가는 일과 세 진(鎭)의 권무 도시(勸武都試)는 전례에 의거하여 설행(設行)하도록 명하였으니, 도신 송형중(宋瑩中)이 장청(狀請)한 때문이었다. 양도(兩都)의 유수도 또한 춘조를 정지하기를 장청하니 윤허하고, 인하여 제도(諸道)에 일체 춘조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선혜청 당상 정홍순(鄭弘淳)이 선혜청에서 구관(句管)하는 군작미(軍作米)로 삼남(三南)에 있는 것은 제도(諸道)로 하여금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산군(山郡)에 있는 쌀을 전이(轉移)해서 고루 수송하는 데 편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대신(大臣)들에게 하순(下詢)하고 윤허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삼남(三南)의 제민창(濟民倉)에 있어서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에는 모두 실곡(實穀)을 저축하고 있으나, 오로지 호남(湖南)만은 밀과 보리가 대부분인데, 3년 동안 10분의 1은 썩어서 상하고 있으니, 청컨대 도신으로 하여금 쌀과 벼[租]로 헤아려 환작(換作)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조적(糶糴)이 고르지 못하여 산군(山郡)에서는 곡식이 많아서 도리어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고, 연해(沿海)에서는 곡식이 적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개 이는 안으로 호조와 진청에서, 밖으로는 제도(諸道)의 영문(營門)에서 무릇 발매(發賣)할 때에는 비싼 값을 취하여 반드시 해읍(海邑)에서만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청컨대 경외(京外)에 특별히 신칙(申飭)하여 만약 묘당(廟堂)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연해에서는 적곡(糴穀)을 흩어 쓸 수 없게 하고 차례차례 전이(轉移)해서 편한 데 따라 남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보태게 하소서.”
하니, 아울러 윤허하였다. 홍봉한이 또 이번의 사전(赦典)에서 누락된 자들을 특별히 고루 베푸는 은전(恩典)을 미루어 시행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두루 들어서 아뢰도록 명하였는데, 찬적(竄謫)에서 풀어 주어 서용한 자가 무릇 22인이었다.
“삼남(三南)의 제민창(濟民倉)에 있어서 호서(湖西)와 영남(嶺南)에는 모두 실곡(實穀)을 저축하고 있으나, 오로지 호남(湖南)만은 밀과 보리가 대부분인데, 3년 동안 10분의 1은 썩어서 상하고 있으니, 청컨대 도신으로 하여금 쌀과 벼[租]로 헤아려 환작(換作)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조적(糶糴)이 고르지 못하여 산군(山郡)에서는 곡식이 많아서 도리어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고, 연해(沿海)에서는 곡식이 적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개 이는 안으로 호조와 진청에서, 밖으로는 제도(諸道)의 영문(營門)에서 무릇 발매(發賣)할 때에는 비싼 값을 취하여 반드시 해읍(海邑)에서만 이러한 폐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청컨대 경외(京外)에 특별히 신칙(申飭)하여 만약 묘당(廟堂)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연해에서는 적곡(糴穀)을 흩어 쓸 수 없게 하고 차례차례 전이(轉移)해서 편한 데 따라 남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보태게 하소서.”
하니, 아울러 윤허하였다. 홍봉한이 또 이번의 사전(赦典)에서 누락된 자들을 특별히 고루 베푸는 은전(恩典)을 미루어 시행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두루 들어서 아뢰도록 명하였는데, 찬적(竄謫)에서 풀어 주어 서용한 자가 무릇 22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