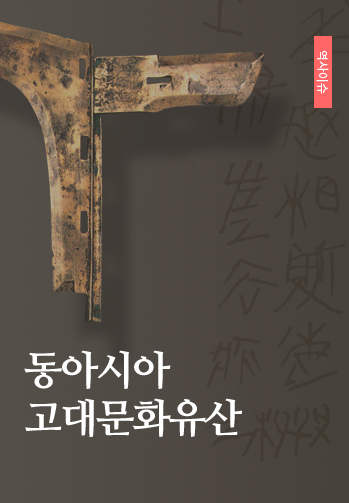소성자촌고성
小城子村古城
규모
둘레: 1,548m
입지
고성에서 서북으로 단림자(團林子) 기차역과는 500m 떨어져 있고, 동북으로 영강향(永康鄕)과는 약 1km 떨어져 있으며, 아울러 휘발하(輝發河)를 넘어 휘발성(輝發城)과 아득하게 마주하고 있다. 고성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심(양)길(림)(沈(陽)吉(林))철로와 300m 떨어진 곳은 독호로산(禿葫蘆山)이다.
유적개관
고성의 평면은 장방형이다. 고성의 성벽은 황토를 판축하여 축조하였으며, 고성의 서북쪽에는 네모난 기단이 있어 각루형태의 시설로 생각된다. 고성의 성벽 사방에는 성문이 있다. 북문의 성벽 가운데에는 안쪽 방향으로 이루어진 옹문구조이다.
유물개관
베무늬기와 잔편
참고문헌
고구려발해고성지연구휘편
해설
소성자고성유지(小城子古城遺址)는 휘남현(輝南縣) 원림향(園林鄕) 조양진(朝陽鎭)에서 동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원림향(園林鄕) 조양진(朝陽鎭)에서 동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소성자촌(小城子村)에 있다. 1999년 성급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고성 서북의 단림참(團林站) 기차역과는 500m, 동북쪽으로 단림진(團林鎭)과는 약 3km 떨어져 있으며, 휘발하(輝發河)를 넘어 휘발고성(輝發古城)과는 약 6.4km 떨어져 있다. 고성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심양~길림 철로와 300m 떨어진 곳에 독호로산(禿葫蘆山)이 있다.
소성자고성유지는 1957년 길림성문관회에서 영강소성자고성을 조사하고 지표면에서 수집한 유물에 근거하여 고구려시기의 성터로 비정하였으며, 1986년 제2차 전국문물조사 당시에 성터를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고성은 북쪽으로 독호로산에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 휘발하와 접해 있다. 고성 평면은 장방형으로 정남북방향이다. 동ㆍ서벽의 길이는 399m, 남ㆍ북벽은 각각 375m로 둘레는 약 1,548m이다. 성안은 오랫동안의 경작으로 인해 성벽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며, 단지 지표면에서 1.5m정도 도드라진 잔벽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벽의 윗부분의 너비는 6m이나 기단부는 분명하지 않다. 성벽은 황색 점토를 다져서 쌓았으며, 그 두께는 10~20cm로 일정하지 않다. 북벽의 서쪽 끝 모서리는 약간 안쪽으로 곡선을 이룬다. 서북쪽 모서리에서 68m 떨어진 곳에 8×8m의 성벽보다 높은 네모난 기단이 있는데, 아마도 각루ㆍ치와 같은 형태의 시설로 생각된다. 네 성벽 중앙에는 각각 1곳씩 문지가 있다. 북문에는 성문 안쪽에 설치된 옹성이 있으며 문길의 현재 너비는 7.5m이다. 동문과 서문은 모두 성문 바깥쪽에 설치된 옹성이며 길이와 너비는 약 20m이다. 주벽의 문길 양쪽에는 가갂 8×8m의 네모난 기단이 있으며 옹성 문길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남문에는 홈만 남아있으며 옹성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성벽 바깥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성을 감싸고도는 해자가 있으며 현재의 너비는 약 5m이다. 해자 서남쪽과 동남쪽 모서리는 작은 개울이 지나간다.
성안 4개의 성문의 연장선상에 현재 4개의 도로가 있어 성터를 4등분한다. 북반부 도로 동쪽에는 3줄의 도드라진 흙기단이 있는데 모두 남북방향이며, 길이는 15m, 너비는 6m이다. 흙기단 주위에는 베무늬가 있는 벽돌, 기와와 도기편이 흩어져 있다. 성 서남쪽 모서리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메워졌다. 성안 남쪽에서 서쪽 벽 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1000평범위에는 도자편과 건축재료가 널려 있어서 건축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 안의 도기편은 모두 물레로 빚은 것으로 소성도가 높으며, 대분은 진흙으로 빚은 회색 도기[泥質灰陶]이다. 또한 약간의 진흙으로 빚은 붉은색 도기[泥質紅陶]도 있다. 그릇의 형태는 항아리[罐]ㆍ시루[甑]ㆍ항아리[瓮]ㆍ동이[盆]ㆍ주발[碗] 등이며 유물 표면에는 선무늬가 있고, 일부 유물에는 복부 아래에 점을 찍은 무늬가 있다. 이밖에 삼채(三彩)와 요나라시기에 제작된 백자도 확인되었다.
성안에서 출토된 도기ㆍ자기, 특히 삼채기는 전형적으로 요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성터의 편년에 근거를 제공한다. 「휘남현문물지」에서는 소성자고성의 건축형식ㆍ성안의 분포ㆍ출토유물의 특징에 근거하고 역사문헌과 지리고증을 통해 요나라시기의 회발성[回拔城]으로 비정하였다. 고성은 고구려시기에 축조되어 이후에 발해 요금시기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7, 「輝南縣文物志」, 66~70쪽.
김진광, 2012, 「북국발해탐험」, 박문사, 679~680쪽.
http://www.jlww.org/article_articleMess?id=140116110309
소성자고성유지는 1957년 길림성문관회에서 영강소성자고성을 조사하고 지표면에서 수집한 유물에 근거하여 고구려시기의 성터로 비정하였으며, 1986년 제2차 전국문물조사 당시에 성터를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고성은 북쪽으로 독호로산에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 휘발하와 접해 있다. 고성 평면은 장방형으로 정남북방향이다. 동ㆍ서벽의 길이는 399m, 남ㆍ북벽은 각각 375m로 둘레는 약 1,548m이다. 성안은 오랫동안의 경작으로 인해 성벽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며, 단지 지표면에서 1.5m정도 도드라진 잔벽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벽의 윗부분의 너비는 6m이나 기단부는 분명하지 않다. 성벽은 황색 점토를 다져서 쌓았으며, 그 두께는 10~20cm로 일정하지 않다. 북벽의 서쪽 끝 모서리는 약간 안쪽으로 곡선을 이룬다. 서북쪽 모서리에서 68m 떨어진 곳에 8×8m의 성벽보다 높은 네모난 기단이 있는데, 아마도 각루ㆍ치와 같은 형태의 시설로 생각된다. 네 성벽 중앙에는 각각 1곳씩 문지가 있다. 북문에는 성문 안쪽에 설치된 옹성이 있으며 문길의 현재 너비는 7.5m이다. 동문과 서문은 모두 성문 바깥쪽에 설치된 옹성이며 길이와 너비는 약 20m이다. 주벽의 문길 양쪽에는 가갂 8×8m의 네모난 기단이 있으며 옹성 문길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남문에는 홈만 남아있으며 옹성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성벽 바깥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성을 감싸고도는 해자가 있으며 현재의 너비는 약 5m이다. 해자 서남쪽과 동남쪽 모서리는 작은 개울이 지나간다.
성안 4개의 성문의 연장선상에 현재 4개의 도로가 있어 성터를 4등분한다. 북반부 도로 동쪽에는 3줄의 도드라진 흙기단이 있는데 모두 남북방향이며, 길이는 15m, 너비는 6m이다. 흙기단 주위에는 베무늬가 있는 벽돌, 기와와 도기편이 흩어져 있다. 성 서남쪽 모서리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메워졌다. 성안 남쪽에서 서쪽 벽 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1000평범위에는 도자편과 건축재료가 널려 있어서 건축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 안의 도기편은 모두 물레로 빚은 것으로 소성도가 높으며, 대분은 진흙으로 빚은 회색 도기[泥質灰陶]이다. 또한 약간의 진흙으로 빚은 붉은색 도기[泥質紅陶]도 있다. 그릇의 형태는 항아리[罐]ㆍ시루[甑]ㆍ항아리[瓮]ㆍ동이[盆]ㆍ주발[碗] 등이며 유물 표면에는 선무늬가 있고, 일부 유물에는 복부 아래에 점을 찍은 무늬가 있다. 이밖에 삼채(三彩)와 요나라시기에 제작된 백자도 확인되었다.
성안에서 출토된 도기ㆍ자기, 특히 삼채기는 전형적으로 요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성터의 편년에 근거를 제공한다. 「휘남현문물지」에서는 소성자고성의 건축형식ㆍ성안의 분포ㆍ출토유물의 특징에 근거하고 역사문헌과 지리고증을 통해 요나라시기의 회발성[回拔城]으로 비정하였다. 고성은 고구려시기에 축조되어 이후에 발해 요금시기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7, 「輝南縣文物志」, 66~70쪽.
김진광, 2012, 「북국발해탐험」, 박문사, 679~680쪽.
http://www.jlww.org/article_articleMess?id=1401161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