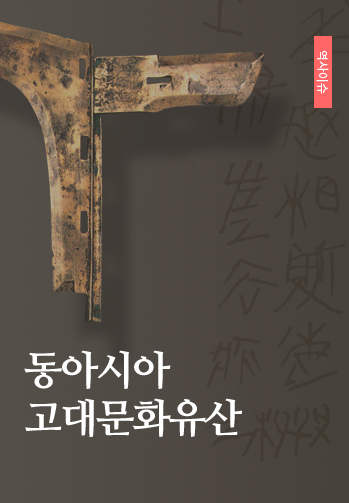대모산성
大母山城
규모
둘레: 1.25km
입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의 낮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미호천과 백곡척이 진천분지의 중앙을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가로질러 흐르고, 산성은 두 하천 사이에 넓게 펼쳐진 충적평야의 중심부에서 낮은 구릉을 끼고 있다.
유적개관
내외성과 자성을 갖춘 특이한 형식의 포곡식산성으로 할미성이라고도 물린다. 삼국사기의 모산성으로도 추정된다. 산성 내부에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성벽은 토축으로, 전체 둘레는 1,250m에 달한다.
출토유물
* 토기
참고문헌
「남한의 고구려유적」, 2006
해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명의 대모산성(大母山城)이 5개소 있다. 경기도 양주시 어둔동 ‘양주대모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의 대모산성과 대모산토성,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순창대모산성/홀어머니산성’, 그리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에 위치한 ‘진천대모산성(鎭川大母山城)/할미산성’ 등이다. 공양왕릉(恭讓王陵)의 경우처럼 위치 비정이 여러 곳에 된 것은 아니고, ‘대모산’이라는 명칭 지역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진천대모산성은 백곡천과 미호천이 만나는 충적평야지대 농경지 가운데 서있는 해발 100m 정도의 얕은 구릉에 쌓은 성이다.
1990년 유적의 일부를 충청북도 기념물 제83호로 지정하였다가 문화재 보호관리상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여 2005년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산성은 계곡을 따라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돌로 쌓은 포곡식(包谷式)으로 축조하였는데, 서쪽 산성과 동쪽 산성을 하나의 성으로 연결하였다. 서쪽의 성을 내성, 동쪽을 외성으로 부르며 지역에서는 할미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의 총길이는 약 1,260m로 파악되고 계곡 남쪽과 외성의 북쪽에 문터가 확인되었다. 성벽의 바깥쪽 면은 경사가 심한 반면 내부 성벽은 흙으로 경사를 줄였다.
성의 내부에서는 어디에서나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이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조사초기에는 대략 4세기 이후 처음 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근래 산성 외부에서 백제 초기의 저장구덩이와 이보다 오래된 시기의 움 무덤, 신라의 석실분 등이 조사되면서 산성의 축조연대가 원삼국시대인 1-2세기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대모산성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모산성(母山城)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기록의 모산성은 삼국시대 내내 신라의 영토로, 188년에는 백제의 공격을 막아냈고 , 484년에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냈으며, 616년에는 백제가 공격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602년 기록에는 아막산성(阿莫山城) 혹은 아막성이 일명 모산성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진천대모산성이, 기록의 모산성인지는 불명확하다. 또 이 지역을 2세기 무렵부터 신라가 점유했다는 점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
, 484년에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냈으며, 616년에는 백제가 공격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602년 기록에는 아막산성(阿莫山城) 혹은 아막성이 일명 모산성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진천대모산성이, 기록의 모산성인지는 불명확하다. 또 이 지역을 2세기 무렵부터 신라가 점유했다는 점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
현재 유적의 파손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의 고고학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역이 백제와 고구려, 신라 삼국이 삼국통일전쟁기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격전지였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진천대모산성의 존재는 한국 고대사회의 행정구역과 산성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진천대모산성은 백곡천과 미호천이 만나는 충적평야지대 농경지 가운데 서있는 해발 100m 정도의 얕은 구릉에 쌓은 성이다.
1990년 유적의 일부를 충청북도 기념물 제83호로 지정하였다가 문화재 보호관리상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여 2005년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산성은 계곡을 따라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돌로 쌓은 포곡식(包谷式)으로 축조하였는데, 서쪽 산성과 동쪽 산성을 하나의 성으로 연결하였다. 서쪽의 성을 내성, 동쪽을 외성으로 부르며 지역에서는 할미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성의 총길이는 약 1,260m로 파악되고 계곡 남쪽과 외성의 북쪽에 문터가 확인되었다. 성벽의 바깥쪽 면은 경사가 심한 반면 내부 성벽은 흙으로 경사를 줄였다.
성의 내부에서는 어디에서나 삼국시대의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이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조사초기에는 대략 4세기 이후 처음 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근래 산성 외부에서 백제 초기의 저장구덩이와 이보다 오래된 시기의 움 무덤, 신라의 석실분 등이 조사되면서 산성의 축조연대가 원삼국시대인 1-2세기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대모산성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모산성(母山城)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기록의 모산성은 삼국시대 내내 신라의 영토로, 188년에는 백제의 공격을 막아냈고
 , 484년에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냈으며, 616년에는 백제가 공격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602년 기록에는 아막산성(阿莫山城) 혹은 아막성이 일명 모산성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진천대모산성이, 기록의 모산성인지는 불명확하다. 또 이 지역을 2세기 무렵부터 신라가 점유했다는 점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
, 484년에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냈으며, 616년에는 백제가 공격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602년 기록에는 아막산성(阿莫山城) 혹은 아막성이 일명 모산성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진천대모산성이, 기록의 모산성인지는 불명확하다. 또 이 지역을 2세기 무렵부터 신라가 점유했다는 점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할 수는 없다.현재 유적의 파손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의 고고학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역이 백제와 고구려, 신라 삼국이 삼국통일전쟁기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격전지였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 진천대모산성의 존재는 한국 고대사회의 행정구역과 산성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