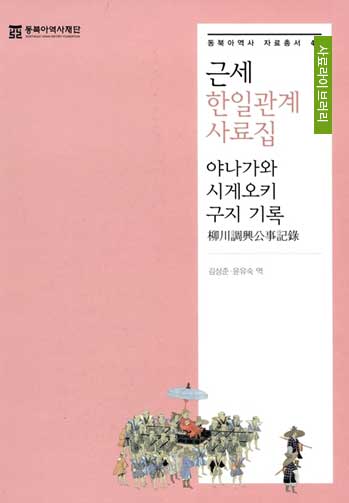삼사(三使)의 예물 목록
[예물] 목록의 겉포장은 그림의 봉투와 같으며, 풀로 붙인 곳에 쓴다.
봉(奉)
조선국 이(李) 근봉(謹封)
일본국 대군 전하
인삼 50근
대순자(大純子)주 001 10필
흑저포 30필
백면주주 003 50필
생저포주 004 30필
채화석주 005
각주 005)

20장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화문석의 수요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급증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에게 애호되었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따르면 한 번의 동지사행(冬至使行) 때 중국에 보낸 화문석이 124장에 달했으며, 조선에 오는 관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양을 선사했다. 화문석의 조달을 담당한 기관은 장흥고(長興庫)로, 이곳에서는 각 지방으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거두어들였다. 화문석은 용수초지석·오채용문석(五彩龍紋席)·용문염석(龍紋簾席)·오조용문석(五爪龍紋席)·만화석(滿花席)·각색세화석(各色細花席)·채화석(彩花席)·잡채화석(雜彩花席)·황화석(黃花席)·화석(花席)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청서피주 006 30장
색지주 007 30권
호피주 008 15장
표피주 009 15장
청밀주 010 10근
황밀주 011 10근
진묵주 012 50홀
각색필주 013
각주 013)

50병여러 가지 빛깔이나 모양의 붓. 붓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인데 가는 대나무나 나무로 된 자루 끝에 짐승의 털을 꽂아서 만든다. 조선통신사의 사행을 통해 일본에 가져간 각색필(各色筆)은 주로 용편(龍鞭), 대모(玳瑁), 홍당죽(紅唐竹)으로 만든 것이다. 용편(龍鞭)은 바닷가에 자생하는 떨기 형태의 식물로, 그 줄기가 보통 풀보다는 딱딱하며 탄력이 있어서 젓가락이나 붓으로 만들어 쓰기도 했다. 대모(玳瑁)는 거북이의 일종으로, 등껍질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공예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등껍질로 자루를 꾸며 붓을 만들기도 했다. 홍당죽(紅唐竹)은 붉은 빛의 대나무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매홍 1근
매주 014
각주 014)

20연맷과에 속하는 중형 조류(鳥類). 매를 세는 단위 명사인 연(連)을 붙여서 ‘鷹連’이라고도 한다. 조정에서 통신사의 공예단품(公禮單品)에 해당되었고, 쓰시마가 조선에 요청한 물품에도 다수 포함되었다. 『증정교린지』에 적힌 공예단의 수량에는 매[鷹子] 46마리[連] 중 관백(關白) 20마리, 구관백(舊關白)·약군(若君) 각 10마리, 집정(執政) 5인·경윤(京尹) 각 1마리로 되어 있다. 보내는 매의 숫자는 전례를 따랐고, 사행 도중에 병들어 죽는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정한 수 외에 몇 마리를 더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매를 기르는 사람인 외응(喂鷹) 한두 명이 사행에 동행했다.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병으로 죽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준마주 015 2필
끝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꽃무늬를 놓은 돗자리. 화문석의 수요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급증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에게 애호되었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 따르면 한 번의 동지사행(冬至使行) 때 중국에 보낸 화문석이 124장에 달했으며, 조선에 오는 관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양을 선사했다. 화문석의 조달을 담당한 기관은 장흥고(長興庫)로, 이곳에서는 각 지방으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거두어들였다. 화문석은 용수초지석·오채용문석(五彩龍紋席)·용문염석(龍紋簾席)·오조용문석(五爪龍紋席)·만화석(滿花席)·각색세화석(各色細花席)·채화석(彩花席)·잡채화석(雜彩花席)·황화석(黃花席)·화석(花席)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여러 가지 빛깔이나 모양의 붓. 붓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인데 가는 대나무나 나무로 된 자루 끝에 짐승의 털을 꽂아서 만든다. 조선통신사의 사행을 통해 일본에 가져간 각색필(各色筆)은 주로 용편(龍鞭), 대모(玳瑁), 홍당죽(紅唐竹)으로 만든 것이다. 용편(龍鞭)은 바닷가에 자생하는 떨기 형태의 식물로, 그 줄기가 보통 풀보다는 딱딱하며 탄력이 있어서 젓가락이나 붓으로 만들어 쓰기도 했다. 대모(玳瑁)는 거북이의 일종으로, 등껍질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공예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등껍질로 자루를 꾸며 붓을 만들기도 했다. 홍당죽(紅唐竹)은 붉은 빛의 대나무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14)
맷과에 속하는 중형 조류(鳥類). 매를 세는 단위 명사인 연(連)을 붙여서 ‘鷹連’이라고도 한다. 조정에서 통신사의 공예단품(公禮單品)에 해당되었고, 쓰시마가 조선에 요청한 물품에도 다수 포함되었다. 『증정교린지』에 적힌 공예단의 수량에는 매[鷹子] 46마리[連] 중 관백(關白) 20마리, 구관백(舊關白)·약군(若君) 각 10마리, 집정(執政) 5인·경윤(京尹) 각 1마리로 되어 있다. 보내는 매의 숫자는 전례를 따랐고, 사행 도중에 병들어 죽는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정한 수 외에 몇 마리를 더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매를 기르는 사람인 외응(喂鷹) 한두 명이 사행에 동행했다.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병으로 죽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