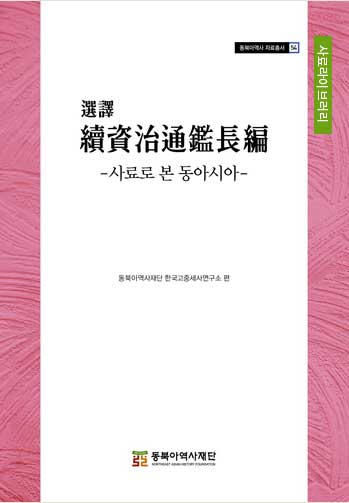관제(官制)의 정비를 주장하는 우사간(右司諫) 왕적(王覿) 등의 상언
우사간(右司諫)주 001 왕적(王覿)주 002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 이득이 많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안 되고, 무릇 법을 바꾸는 까닭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균등하면 도리어 변경하는 수고로움이 있어 지혜롭고 미혹함이 없는 선비를 기다리지 않은 후에 그 부족함을 알게 되니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모두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득이 적고 손해가 많으면 법을 가볍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신이 금년 9월 9일 조지(朝旨)의 절문(節文)을 삼가 보았는데, ‘내외의 말 업무를 모두 태복시(太僕寺)에 예속시켜 직접 상서성에 보고하고 다시 가부(駕部)주 003를 경유하지 말라. 차영(車營)주 004, 치원무(致遠務)주 005, 안비고(鞍轡庫)주 006, 타방(駝坊)주 007, 피박소(皮剝所)주 008, 양상소(養象所)주 009는 모두 가부에 예속시켜라’라고 했습니다. 신이 삼가 말하기를, ‘이는 관제를 파괴할 수 있고 실제적인 이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릇 당나라의 실정에서부터 관제가 문란해진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성조의 조종 이래 처음에 동정서토의 우환이 있었는데 이미 천하[중국]를 통일한 후 한창 모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 힘쓴 까닭에 관제를 정비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종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 역대의 실추된 법제를 조사하여 일대의 성헌을 새롭게 만들고, 모든 관직을 바로잡고, 육련(六聯)을 다시 세우니, 위아래가 서로 연결되고, 각각 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당, 우, 삼대에 관직을 설치한 좋은 뜻을 얻은 것이니 후세에 마땅히 정성껏 지키고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마정이 오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말을 기르는 법을 행하는 것은 진실로 태복, 가부의 직무입니다. 만약 태복을 예전처럼 가부에 예속시켜 함께 그 직무를 맡게 한다면 말 기르는 법에서 폐해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차영, 치원 등의 업무를 태복에 예속시키지 않고 성조(省曹)의 관할을 받게 한다면, 말 기르는 법에서 그 이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말이 순서를 잃어 관제가 다시 훼손되니 신은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장무(場務)가 시, 감에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 감이 성조에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여, 관리가 법도를 돌보지 않는 것이 상정이니, 조정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돌아볼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황제께서 집정대신에게 선유하여 말을 기르는 하나의 일로써 관제를 가볍게 훼손하지 못하게 하고, 9월 9일 조지를 회수하여 별도로 명을 내려 시행케 하십시오.”라고 했다.
첩황(貼黃)주 010에서 말했다. “선조에서 만든 새로운 관제는 고전의 내용에 모두 의거한 것입니다. 만약 확대하여 시행할 때에 미진함이 보인다면, 마땅히 다듬어서 완성하면 되는데 어찌 이유도 없이 폐지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올해 8월 20일 칙서를 보니 그 주요 내용은 ‘고려에서 공물을 바치면 모두 관구소(管勾所)가 검사하여 살피고, 조격(條格)에 의거하여 (관구소를) 관할하는 홍려시(鴻臚寺)에 보고한다. 홍려시는 사정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단지 주객(主客)에 상신(上申)하여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린다. 금후로 고려와 서하가 입공했을 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일은 모두 관구동문관소(管勾同文館所)와 도정서일소(都亭西馹所)주 011로 하여금 소속된 조부(曹部)에 곧바로 보고하여 시행하고 또 홍려시를 경유하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삼가 말하기를 홍려시가 결정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지만, 만약에 성조(省曹)가 아니어서 조금도 권한이 없다면 감히 결정을 하지 못하기에 이를 것이니 곧 홍려시는 직책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죄가 관리에게 있고, 관제의 잘못이 아닌데 어찌 관리의 죄로 인하여 성조(省曹), 시(寺), 감(監)의 상하가 서로 이어지는 서열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번이(蕃夷)의 입공은 마땅히 홍려시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인데, 지금 (그 임무를) 박탈하고 성조(省曹)에 전담하게 하는 것은 성조의 일처리가 시(寺)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병마에 대한 일[馬事]의 조치는 마땅히 성조를 경유하는 것인데, 지금 (그 임무를) 나누어 태복시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은 시(寺)의 일처리가 성조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실제가 동일한데, (일의) 완급과 잘하고 못하는[工拙]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논자들은 공평한 것은 성조(省曹)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시(寺)의 업무를 빼앗아 전담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속된 시(寺)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간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평한 것이 시(寺)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조의 업무를 아울러 전담하면서 한편으로는 비록 해당 시(寺)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간여할 수 없었던 것인데 과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절차가) 거치는 곳을 줄여버린 연후에 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손해가 없다면 홍려시와 태복시만이 아니라 성조(省曹)와 시(寺), 감(監)에서 상하로 유지되던 질서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법도가 이와 같은데, 어찌 원대한 경영의 도리이겠습니까? 황제께서는 소상히 살피십시오.”
병부상서(兵部尙書) 왕존(王存)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가 생각건대 조정에서 말 업무를 오로지 태복에 예속시키고 가부가 관여하지 않게 하면, 이는 목정에서 이익과 손해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성조(省曹)의 기강과 관련되어 이로부터 점차 훼손되고 문란해질까 걱정됩니다. 신 등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헤헤하고 웃을 수 없습니다. 선제께서 역대 관제의 문란함을 걱정하여 관리에게 명해 관청을 설치하여 요, 순, 삼대의 제도를 조사하고, 당전(唐典)을 참고하여 성, 대, 시, 감의 직분을 바로잡고, 관리에 분수가 있고, 일에 통제가 있게 해서, 상하가 서로 연결되고, 법전을 만들어 후세에 전하고 만세토록 지키게 했습니다. 시행 초기에 특별히 명을 내려 시, 감이 일에 따라 상서육조의 통제를 받게 하고, 또한 중외에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각각 분(分)이 있은 연후에 안정되고, 관리는 각각 수(守)가 있은 연후에 다스려진다. 이로써 모든 직분을 크게 바로잡고, 육련을 다시 세웠는데, 만약 선발된 사람이 분수를 따르지 않고 감히 참람하고 문란함이 있으면, 집정관은 어사대에 위임하여 아뢰고, 상서 이하는 장관이 죄를 밝혀 탄핵하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했습니다. 중외의 신료들은 황제의 말씀을 모두 들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들어 행한 지 이미 4년이 지났는데 폐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관청이 참람하고 문란하게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바꾸면, 신은 삼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관청은 스스로 결정·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관청에) 소속되어 통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복이 이미 가부에 예속되지 않는 것을 허락받았고, 다른 때 태상도 예부에 예속되지 않기를 청할 것이며, 그 외 시, 감이 각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보고하면, 다시 분수가 없어지고 상하에서 분란이 생겨 관제의 파괴가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선제께서 정력과 사력을 다해 두 해에 걸쳐 그것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관청이 참람하고 문란하게 신청하여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서경에서 말하기를, ‘법과 규칙이 있어 자손에게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육관의 제도가 주나라에서 완비되어 이에 선왕의 법칙이 만세토록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육관이 파괴되고, 이에 여러 관청을 난잡하게 세워 진실로 업무가 졸속으로 처리된 것은 당말, 오대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태황태후께서 폐하를 도와 조정을 다스리고, 재직하는 모든 관료는 더욱 마땅히 삼가 법을 지켜야 하니, 관청의 일시적인 청을 좇아 선제가 이미 만든 제도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근래 관청에 폐해가 있고, 법령에 사람들을 불편케 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바꾸는 것을 그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성, 대, 시, 감의 나누어진 직무에 대해 말하자면, 모두 선왕의 다스리는 법에 근본을 두고 있고 그 사이에 막혀 통하지 않는 게 있으면, 헤아려 바로잡아 일을 진행하는데 편하게 하여 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문란한 점이 있으면 사태가 애석할 뿐 아니라 뜻과 사업을 이어받는 의리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조금 더 생각하시어 선제께서 집정대신에게 명을 내린 대로 스스로 백성에게 폐해가 없게 하고 쉽고 가볍게 바꾸지 마십시오. 관청이 참람하고 문란하게 신청하면 마땅히 법령에 따라 시행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제가 점차 무너지는 데까지 이르지 않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첩황에서 말했다. “선제께서 임시로 목마를 관할하기 위한 관청을 설치하셨고, 당시에는 지휘가 가부(駕部)에 예속되지 않았으니 대개 별도로 하나의 관청을 만들어 경영한 것으로 시(寺)와 감(監)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풍 7年(1084) 12월 25일의 칙서를 살펴보면, ‘모든 관청의 창고의 사안은 독단적으로 시행하거나 법식에 없는데도 모름지기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니 소속된 시와 감에 품신(稟申)하라.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아울러 모름지기 사안에 따라 상서성 본부(本部)에 품신하라. 본부에서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곧 헤아려서 (상서)성으로 상신(上申)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상하가 직분을 지키면서 내외의 사무를 행하는 것에는 순서가 있으니 서로 (직분을) 뛰어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와 감에게 직접 주달(奏達)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미 조지(朝旨)를 얻어 바야흐로 성부에 하달하여 시행하는데, 그 사이의 사안에 이득과 폐해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협조하지 않으며 본말이 뒤바뀌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만약 마정(馬政)을 복구시켜 가부를 거치게 되어 혹 지체에 이를 것이 염려된다면, 마땅히 본부에서 책임져야 할 업무를 독촉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혹시 시와 감에 긴급한 일이 있으면 직접 주달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외의 일은 모두 함께 성부를 거치게 하십시오. 이와 같다면 법제에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감찰어사 손승(孫升)이 아뢰기를, “선대에 등용되었던 사람으로는 조보(趙普)처럼 창업을 도왔던 자, 왕단(王旦)처럼 수성(守成)하며 이치에 도달한 자, 한기(韓琦)처럼 유지(遺志)를 받아 정책을 결정한 자가 (있는데), 이 3명의 경우 문장과 학문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덕업(德業) 및 기량, 지혜와 공훈 및 치적을 보게 되면 최근의 재상은 이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안석은 제멋대로 세상에 이름이 난 학문을 하며 사람들이 받드는 일대의 문장가가 되었으니 바야흐로 토론, 글을 꾸미는 직임에 있으면서 고금의 다스림과 어지러움의 말을 늘어놓으니 조정이 그를 현자(賢者)로 여겼고, 중외에서 기대하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잠시 천자를 만나더니 중대한 직임에 나아가 임명되었지만, 당연한 말을 실천하지 않고 이전의 학문은 모두 버렸으며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들을 배척하여 사람들의 (의견을) 방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여 가까운 이익을 쫓으면서 원대한 식견이 없었고 (정치를) 베푸는 방침은 하나같이 개인적인 모략에서 나오니 이로써 천하의 총명함을 가렸습니다. 이를 통해 말하자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보좌하는 일은 문장과 학문에 있지 않습니다. 삼가 살펴보니 폐하께서 정사를 보신 이래로 삼공(三公)과 재상을 신중히 선택하시고 원로대신들을 중용하시니, 멀고 가까운 (오랑캐도) 인을 품어 변경은 덕치로 향하게 되니 천하 사방에서 충의를 지니고 정직하며 선량한 사대부와 지혜와 용기가 있는 뛰어난 재목들이 모두 수용(收用)되고 혹 방기된 인물은 없으니 이른바 천년에 한 번 있는 시절입니다. 신은 큰 소망에 한도가 없어서 원컨대 폐하께서는 좌우에 보필하는 인물을 선발하여 임명함에 반드시 덕업 및 기량과 지혜를 앞에 두시고 문학적 명성을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첩황에서 말했다. “소식(蘇軾)의 문장과 학문은 중외에서 탄복하는 바이지만, 덕업 및 기량과 지혜에는 부족함이 있으니 이것이 자중하지 못하고 조정을 비방한 것에 연루되어 선조(先朝)에서 죄를 얻은 이유입니다. 귀양을 간 곳에서부터 지금은 등용되어 아직 해를 넘기지도 않았는데 한림학사로 삼아 고금을 논하고 황제의 업적을 글로 다듬으니 이른바 그 최고의 직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더해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보좌하게 하시려면, 원컨대 폐하께서는 왕안석을 경계로 삼으십시오.”
한림학사(翰林學士) 소식(蘇軾)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공자께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사계절이 운행하고 만물이 생장할 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 하였습니다. 천자의 법으로 천자가 자기 몸을 공손하게 하고 남면(南面)하여 바르게 앉고 법도를 지키고 상벌을 확실히 하면,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삼대(三代)의 왕들도 이와 같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천하 대사의 안위가 달린 바라 하여 마음을 정밀하게 하여도 법령이 모두에 이를 수는 없는데, 천자의 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삼대에 훈(訓)·고(誥)·서(誓)·명(命)이라고 한 것들은 한(漢) 이후로 제(制)·조(詔)라고 하여 모두 천하를 고무하는 것이기에 가벼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매번 일을 행하는데 법을 밖으로 세운다면 필시 왕언(王言)을 따르고자 그것에 마음을 다할 것이니, 이는 조정에서 스스로 그 법을 가볍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지 않아 반드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미 여러 차례 나갔으니 비록 또다시 마음을 다한다 하여도 사람들은 또한 불신할 것입니다. 지금 ‘십과지거(十科之舉)’주 012는 조정의 정령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세운 법들은 ‘혹 선거하는 바와 같지 않으면 거주(舉主)를 그 인재가 아닌 자를 공거(貢擧)한 율에 따라, 올바른 것을 저버리고 사사로이 뇌물을 받으면 거주(舉主)는 3등을 감하여 그를 죄주며, 만약 뇌물을 받아 불법을 행하여 죄명이 무거운 자는 무거운 죄를 따라 처벌하고 집정(執政) 역시도 관직을 낮춰[降官] 벌을 준다.’입니다. 신이 말하건대 세운 법들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만약 충분하지 않다 여겨지면 또 다시 조서를 내리도록 할 것이고 이에 조서가 끊임없이 내려질 것입니다. 신이 청컨대 금년 조정에서 천거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을 간략하게 하여 7가지 사안으로 정하였으면 합니다. 전운(轉運)·제형(提刑)을 뽑는 것이 첫째, 관직(館職)을 뽑는 것이 둘째, 통판(通判)을 뽑는 것이 셋째, 학관(學官)을 뽑는 것이 넷째, 법을 중하게 다스리는 현령(縣令)을 뽑는 것이 다섯째, 경학에 밝고 행실이 바른 자를 뽑는 것이 여섯째, 십과(十科)를 뽑는 것이 일곱째입니다. 7가지는 경중에 큰 차이가 없으니 만약 십과(十科)를 (뽑는 것에 대해) 당장 조서를 내리면 (나머지) 6가지도 (조서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후로는 하나의 일에는 하나의 조서를 내려 왕언(王言)을 함부로 여기는 일이 이보다 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간관의 뜻만을 취하여 (조서를)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면 그 의(義)가 어찌 있겠습니까. 신이 원하건대 집정에게 경계하게 하여 오직 법도를 지키고 상법을 올바로 주고 왕언(王言)을 거듭 중하게 여김으로써 대사(大事)를 기다렸다가 일으킨다면 천하를 바로잡고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내리신 조서는 신이 감히 찬하지 않겠습니다.”
주광정(朱光庭), 왕적(王覿)이 이미 사간(司諫)으로 옮겨서 좌우정언(左右正言)이 오래 비어 있고 (새로) 보임되지 않았다. 시어사(侍御史) 왕암수(王巖叟)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의견을 구하는 데에 널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데에 많은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데에 넓게 하지 않으면 천하의 사정을 모두 말하는 데에 부족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에 많지 않으면 성인의 덕을 크게 이루는 데에 부족합니다. 『시경』에 ‘옛 선인들의 말씀에 나무꾼에게도 일을 물어보라.’라고 하였으니 나무꾼이 천할지라도 오히려 남겨두지 않고 물었으니, 어진사대부에게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무릇 보물이라는 것이 크면 그것을 가진 이가 (그 가치를) 넓히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성인의 마음입니다. 삼대 이후 수 천년 동안 계속 바라면서 그 사이에 성심을 다하고 간언을 좋아한 것은 겨우 몇몇의 임금뿐이었습니다. 진실로 폐하께서 청정하신 초기와 같이 먼저 널리 의견을 구하여 참혹하고 슬픈 현실을 드러내고 연이어 조서를 내려 세상의 폐단을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 아뢰게 하여서 아무 잡생각 없이 진심으로 듣고 굳센 의지를 세워 실행하여 몇 년 되지 않아 조정은 맑고 깨끗해지고 천하가 쉴 수 있게 되어 다시 조종(祖宗)의 번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구구절절하고 어리석은 충정은 여전히 성상의 총명을 넓게 하고 성덕을 펼치게 하고자하여 스스로 그칠 수 없었는데, 폐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국가가 멀고 가까운 시기의 제도를 본떠 간관으로 정원으로 불과 6인을 두었을 뿐이니, 바야흐로 선왕께서 이미 적다고 여겼고 지금 다시 좌우정언이 결원이고 보임하지 않았는데도 신이 아직 아뢰지 않았습니다.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이미 깨끗하다고 말할 것이 없겠습니까? 인재는 (자리와 재주가) 부합하기 어려우기 그 자리에 헛된 경우가 없겠습니까? 두 경우는 모두 신이 오늘에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비록 깨끗하다고 할 지라도 (이 상황을) 굳게 유지하려면 어진 이를 얻는 것이 정답이며, 인재가 부합하기 어렵다고 하나 널리 찾고 골라 뽑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미 잘 다스려진 것을 믿고 허물 듣기를 소홀히 하면 천하의 다스림에 혹여 잃어버리는 것이 생길까 걱정되며, 인재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관원을 임명하는 것을 비워두면 올바른 사람이 홀로될까 걱정됩니다. 지금 많은 선비가 궁정을 채우고 있는데 어찌 고를 만한 이가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자애로운 조서를 내려 간신(諫臣)을 보임하여 그 자리를 오래 비우지 마십시오. 강대하고 안정된 국세를 이어 빛나게 나아간다면 성상의 공덕입니다.”
(왕암수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의 일은 (일의 사안을) 재고 아는 것은 귀로 (상황을) 듣는 것만 못하고,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실상을 보는 것만 못합니다. 지금 사방이 크고 만리 밖으로 멀어 백성들 상황의 이해득실을 두루 말할 수 없고, 풍속의 잘잘못을 대략 열거할 수 없으며, 인재의 어질고 불초함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사방의 일을 살펴보도록 맡기시어 사방의 실정에 달통하였다는 이를 가만히 보면, 세상은 몇 명뿐이라고 말하는데, 모두 한 쪽 지역의 사람을 쓴 것으로, 천하에 성상의 눈과 귀를 넓혀줄 이가 아닙니다. 신은 폐하께서 항상 언로에 사방의 선비를 참여시킬 것을 바라며, 그리하면 천하의 큰 다행일 것입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