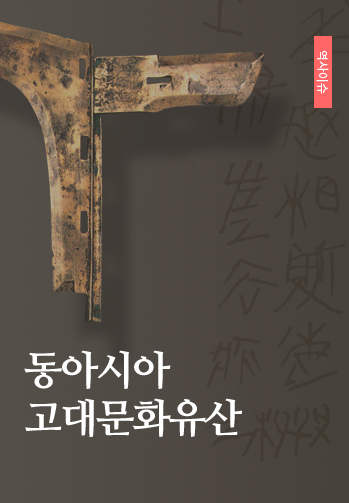두정리고분군
입지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두담마을 북쪽에 위치한다.
유적개관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모두 6기가 각각 1m 간격을 두고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장축방향은 모두 남북방향이며, 평면형태가 다른 1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동편향의 연도시설을 갖추고 있다.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벽체가 2~5단만 잔존하고 있는데, 1~2단은 다듬은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1호를 제외 한 석실분에는 별도의 시상대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불다짐한 흔적이 확인된다. 2호분은 벽체에 회를 발라 마감하였으며, 2호분과 4호분에는 연도 폐쇄석이 확인된다. 모든 고분에서 관정이 확인되며, 2호분과 6호분에서 각각 호 1점이, 4호분에서는 은제 지환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 고구려 토기, 관정, 은제지환
참고문헌
발굴보고서
해설
2007년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건설부지와 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중원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결과 6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6기 모두 석실을 두고 입구에서 석실까지 복도를 만든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이었다. 이와 함께 온돌 유적1기와 작업장 터 등이 조사되었다.
고분들은 충주에서 음성 방향으로 나아가는 산지의 계곡 평지에 일렬로 나란히 분포하고 있다.
6기 모두 석실은 네모난 장방형(長方形)이고, 입구부터 석실에 이르는 연도(羨道, 널길)는 오른쪽에 치우쳐있는 우편제로 조영되었다. 석실 내부의 벽면에는 회(灰)를 도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훼손이 진행되어 명확히 할 수는 없으나,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발견되어 고구려 양식으로 파악된 고분들과 유사한 점은 파악할 수 있다. 1호분부터 4호분까지는 3-4단을 쌓고 모서리를 죽인 모줄임구조[抹角] 천장 형태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많지 않지만 소수의 관 못과, 2호분과 4호분에서 목이 굵고 길게 붙어있는 장동호(長胴壺)와 둥근 몸통에 짧은 목이 달린 단경호(短頸壺) 파편이 출토되었다. 4호분에서는 은제 반지가 출토되었다.
장동호는 고구려 토기 중 가장 많이 출토되는 형식이며, 은제반지는 평양 대성산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모줄임구조 천장 역시 고구려고분의 대표적 형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두정리고분군의 6기 고분은 고구려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주지역은 한강유역에서 후퇴한 서해안의 백제와 영남지역에 위치한 신라를 연결해주는 교통로이자, 고구려가 남하하여 영역화한 삼국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충주지역은 백제의 영토였다가, 5세기 중엽 고구려가 중원일대로 진출하였고, 이후 신라 진흥왕대에 신라의 영토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구려가 충주지역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영역지배와 경영을 뒷받침 해주는 고고학 자료는 중원고구려비(충주고구려비) 외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두정리고분의 발굴은 이를 보완해주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 청원의 남성골 유적에서 고구려의 목책성과 토기, 금제 귀걸이 등이 확인 되었고, 충청남도 연기군에서도 고구려 귀걸이가 수습된 사례가 있어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석실분 6기와 작업장 터 1기를 원형 보존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교육관광자료로 활용 중이다.
고분들은 충주에서 음성 방향으로 나아가는 산지의 계곡 평지에 일렬로 나란히 분포하고 있다.
6기 모두 석실은 네모난 장방형(長方形)이고, 입구부터 석실에 이르는 연도(羨道, 널길)는 오른쪽에 치우쳐있는 우편제로 조영되었다. 석실 내부의 벽면에는 회(灰)를 도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훼손이 진행되어 명확히 할 수는 없으나,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발견되어 고구려 양식으로 파악된 고분들과 유사한 점은 파악할 수 있다. 1호분부터 4호분까지는 3-4단을 쌓고 모서리를 죽인 모줄임구조[抹角] 천장 형태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많지 않지만 소수의 관 못과, 2호분과 4호분에서 목이 굵고 길게 붙어있는 장동호(長胴壺)와 둥근 몸통에 짧은 목이 달린 단경호(短頸壺) 파편이 출토되었다. 4호분에서는 은제 반지가 출토되었다.
장동호는 고구려 토기 중 가장 많이 출토되는 형식이며, 은제반지는 평양 대성산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모줄임구조 천장 역시 고구려고분의 대표적 형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두정리고분군의 6기 고분은 고구려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주지역은 한강유역에서 후퇴한 서해안의 백제와 영남지역에 위치한 신라를 연결해주는 교통로이자, 고구려가 남하하여 영역화한 삼국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충주지역은 백제의 영토였다가, 5세기 중엽 고구려가 중원일대로 진출하였고, 이후 신라 진흥왕대에 신라의 영토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구려가 충주지역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영역지배와 경영을 뒷받침 해주는 고고학 자료는 중원고구려비(충주고구려비) 외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두정리고분의 발굴은 이를 보완해주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 청원의 남성골 유적에서 고구려의 목책성과 토기, 금제 귀걸이 등이 확인 되었고, 충청남도 연기군에서도 고구려 귀걸이가 수습된 사례가 있어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석실분 6기와 작업장 터 1기를 원형 보존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고 교육관광자료로 활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