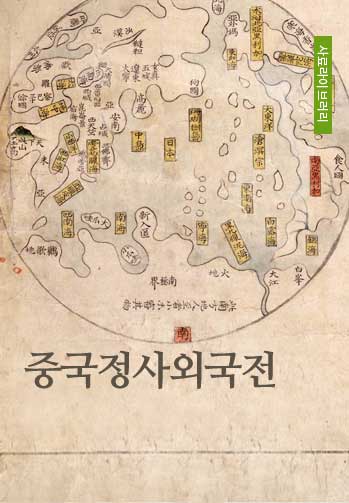도기선우가 호한야선우의 공격에 패한 뒤 자살하였고 이후 질지선우가 윤진선우와 호한야선우를 아울러 격파함
그 이듬해주 001
호한야선우는 자신의 동생 우록리왕 등을 서쪽으로 보내 도기선우의 주둔군을 습격하여 만여 명을 죽이거나 약취하였다. 도기선우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스스로 6만의 기병을 이끌고 호한야선우를 쳤다. 천 리 가량 행군하여 욕고(嗕姑)
주 002에 도달하기 전, 4만 명에 이르는 호한야선우의 군대와 만나 맞붙어 싸웠다. 도기선우의 군대가 패하였고 [도기선우는] 자살했다. 도륭기는 이에 도기의 막내아들인 우록리왕 고무루두와 함께 한으로 망명 귀순하였다. 거리선우는 동쪽으로 가서 호한야선우에게 항복하였다. 호한야선우의 좌대장 오려굴(烏厲屈)과 그의 부친 호칙루(呼遫累) 오려온돈(烏厲溫敦)
주 003
이때 이릉(李陵) 주 005
각주 003)

은 모두 흉노의 난리를 보고 휘하의 무리 수만 인을 이끌고 남하하여 한에 항복하였다. [한 천자는] 오려굴을 신성후(新城侯)로, 오려온돈은 의양후(義陽侯)로 봉하였다.주 004顔師古의 주석에 따르면 “呼遫累”는 흉노의 官號이다. 그런데 『漢書』의 「宣帝紀」에서는 “匈奴의 呼速累單于가 무리를 이끌고 來降하였다”(『漢書』 권8 : 266)고 하고 「功臣表」에서는 “匈奴의 謼連累單于가 무리를 이끌고 항복했다”(『漢書』 권17 : 673)고 하였다. 모두 烏厲溫敦을 單于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제기」와 「공신표」의 두 기사에서 烏厲溫敦의 呼遫累라는 官號와 單于號가 동시에 칭해진 것이 된다. 그 원인에 대하여 烏厲溫敦이 漢에 항복할 때 單于를 자칭하였거나 혹은 漢 측에서 烏厲溫敦을 單于라고 잘못 표기한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漢書補注』 : 1586).

각주 004)

列侯로 책봉된 匈奴의 來降者들은 新城侯 烏厲屈을 제외하고는 모두 『漢書』 「功臣表」에 기록되어 있다. 栗原朋信은 이들의 列侯 책봉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들이) 책봉된 지역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식읍을 사여받고 또한 功臣表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內臣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 둘 점은 이제까지 많은 예가 있었던 것과 같이 外民族으로 王爵에 상당하는 地位를 가진 자가 漢의 內臣이 될 경우에는 일급 격하되어 ‘列侯’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漢帝國의 구조가 中華思想에 기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印綬에 대해서도 그 점을 말할 수 있다. 漢은 종종 外臣의 王에게 金印紫綬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국내에서 金印紫綬를 받는 爵位는 諸侯王보다 한 급이 낮은 列侯였다.”(栗原朋信, 1970 : 465).

이때 이릉(李陵) 주 005
각주 005)

의 아들이 다시 오자도위를 세워 선우로 삼았는데, 호한야선우가 붙잡아 참수하였고 마침내 다시 선우정을 도읍으로 삼았다. 그러나 무리는 겨우 수만 명이었다. 도기선우의 종제(從弟)인 휴순왕(休旬王)은 휘하 기병 5, 6백을 이끌고 좌대저거(左大且渠)주 006를 쳐서 죽인 뒤 그 병사들을 아울렀다. [흉노의] 오른쪽 땅에 이르러 윤진선우(閏振單于)로 자립하고, [흉노의] 서쪽 변경에 머물렀다. 그 뒤 호한야선우의 형인 좌현왕 호도오사(呼屠吾斯) 또한 자립하여 질지골도후선우(郅支骨都侯單于)
주 007李陵(?∼전74) : 前漢의 장군으로 隴西 成紀(현재 甘肅省 靜寧의 西南 지역) 사람이다. 字는 少卿이다. 李廣의 손자로 말 타고 활 쏘는 데 능하였다. 武帝 때 騎都尉가 되었다. 李陵은 자청하여 5천 명의 騎兵과 步兵을 이끌고 匈奴를 토벌하였으나 8만의 匈奴 군사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였다. 匈奴 單于는 그를 右校王으로 삼았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李陵은 이후 20여 년간 匈奴 지역에서 살다가 元平 원년에 病死하였다. 匈奴에 항복한 다음 李陵의 행적에 대해서는 『漢書』 권54 「蘇武列傳」에 관련 기사가 있다.

각주 007)

가 되어 [흉노의] 동쪽 변경에 주둔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윤진선우는 그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질지선우(郅支單于)를 쳤다. 질지선우는 맞붙어 싸워 [윤진선우를] 죽이고 그 군대를 아울렀다. 이어서 나아가 호한야를 쳤다. 호한야는 격파되고 그 군대는 달아났으며주 008
질지가 선우정을 도읍으로 삼았다.郅支單于(?∼전36) : 이름이 呼屠吾斯이다. 虛閭權渠單于의 아들이고 呼韓邪單于의 형이다. 처음 左賢王에 임명되었다. 虛閭權渠單于가 사망한 뒤, 匈奴에는 내란이 발생하여 귀족들이 다투어 자립하자, 宣帝 五鳳 2년(전56)에 자립하여 郅支骨都侯單于가 되었다. 呼韓邪單于를 공격하여 한으로 남하하도록 하였다. 黃龍원년(전49)에는 호한야선우의 공격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元帝 初元년간(전48∼전44)에는 한에서 보낸 사자 谷吉을 살해하고, 서쪽으로 康居 지역까지 이동하여 烏孫을 침략하였다. 建昭 3년(전36) 한의 西域都護 甘延壽는 屯田吏士와 諸國 군대를 동원하여 郅支單于를 공격하였고 이때 피살되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顔師古의 주석에 따르면 “呼遫累”는 흉노의 官號이다. 그런데 『漢書』의 「宣帝紀」에서는 “匈奴의 呼速累單于가 무리를 이끌고 來降하였다”(『漢書』 권8 : 266)고 하고 「功臣表」에서는 “匈奴의 謼連累單于가 무리를 이끌고 항복했다”(『漢書』 권17 : 673)고 하였다. 모두 烏厲溫敦을 單于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제기」와 「공신표」의 두 기사에서 烏厲溫敦의 呼遫累라는 官號와 單于號가 동시에 칭해진 것이 된다. 그 원인에 대하여 烏厲溫敦이 漢에 항복할 때 單于를 자칭하였거나 혹은 漢 측에서 烏厲溫敦을 單于라고 잘못 표기한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漢書補注』 : 1586).
-
각주 004)
列侯로 책봉된 匈奴의 來降者들은 新城侯 烏厲屈을 제외하고는 모두 『漢書』 「功臣表」에 기록되어 있다. 栗原朋信은 이들의 列侯 책봉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들이) 책봉된 지역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식읍을 사여받고 또한 功臣表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內臣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 둘 점은 이제까지 많은 예가 있었던 것과 같이 外民族으로 王爵에 상당하는 地位를 가진 자가 漢의 內臣이 될 경우에는 일급 격하되어 ‘列侯’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漢帝國의 구조가 中華思想에 기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印綬에 대해서도 그 점을 말할 수 있다. 漢은 종종 外臣의 王에게 金印紫綬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국내에서 金印紫綬를 받는 爵位는 諸侯王보다 한 급이 낮은 列侯였다.”(栗原朋信, 1970 : 465).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郅支單于(?∼전36) : 이름이 呼屠吾斯이다. 虛閭權渠單于의 아들이고 呼韓邪單于의 형이다. 처음 左賢王에 임명되었다. 虛閭權渠單于가 사망한 뒤, 匈奴에는 내란이 발생하여 귀족들이 다투어 자립하자, 宣帝 五鳳 2년(전56)에 자립하여 郅支骨都侯單于가 되었다. 呼韓邪單于를 공격하여 한으로 남하하도록 하였다. 黃龍원년(전49)에는 호한야선우의 공격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元帝 初元년간(전48∼전44)에는 한에서 보낸 사자 谷吉을 살해하고, 서쪽으로 康居 지역까지 이동하여 烏孫을 침략하였다. 建昭 3년(전36) 한의 西域都護 甘延壽는 屯田吏士와 諸國 군대를 동원하여 郅支單于를 공격하였고 이때 피살되었다.
- 각주 008)
색인어
- 이름
- 호한야선우, 도기선우, 도기선우, 호한야선우, 호한야선우, 도기선우, 도기선우, 도륭기, 도기, 고무루두, 거리선우, 호한야선우, 호한야선우, 오려굴(烏厲屈), 오려온돈(烏厲溫敦), 오려굴, 신성후(新城侯), 오려온돈, 의양후(義陽侯), 이릉(李陵), 호한야선우, 도기선우, 윤진선우(閏振單于), 호한야선우, 호도오사(呼屠吾斯), 질지골도후선우(郅支骨都侯單于), 윤진선우, 질지선우(郅支單于), 질지선우, 윤진선우, 호한야, 호한야, 질지
- 지명
- 욕고(嗕姑), 한, 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