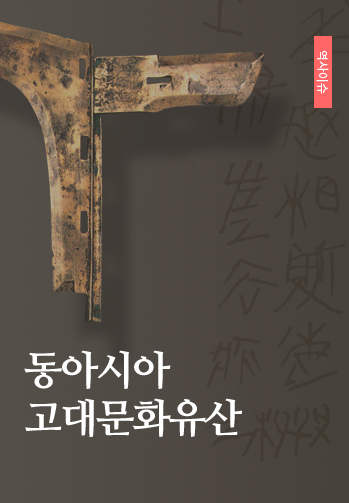대구 만촌동 유적
입지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 조사 시행.
유적개관
대구시 동구 만촌동에서 금호강안의 동촌유원지 주변 주차장 정지작업중에 다량의 청동기가 발견된 유적으로, 금호강변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표하 40~50㎝에서 청동일괄유물이 발견되었음. 공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유물을 캐낸 부분에서 별다른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며, 유적은 1966년 국립중앙 박물관이 발굴 조사하였으나 유구는 파괴가 심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었으나 목관 묘일 가능성이 높음.
출토유물
* 동과, 동검, 검파두식, 중광형동과 등
참고문헌
「한국고고학사전」
「대구만촌동출토(大邱晩村洞出土)의 동검(銅劍)·동과(銅戈)」
「大邱晩村洞遺蹟出土の靑銅器」
「慶尙北道大邱市晩村洞發見の靑銅器について」
「대구만촌동출토(大邱晩村洞出土)의 동검(銅劍)·동과(銅戈)」
「大邱晩村洞遺蹟出土の靑銅器」
「慶尙北道大邱市晩村洞發見の靑銅器について」
해설
대구는 한반도 동남부인 영남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분지는 남북쪽이 높고 동서쪽이 낮다. 북쪽으로는 해발 해발 1,193m의 팔공산맥이 지나면서 도덕산(해발 660m), 함지산(해발 284m)의 산지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해발 1,084m의 비슬산맥이 지나면서 대덕산(해발 584m), 앞산(해발 660m), 산성산(해발 653m), 법이산(해발 334m), 용지봉(해발634m)을 형성하고 있다. 동편과 서편으로도 해발 200~300m 내외의 지산, 두리봉, 모봉, 형제봉, 산성산, 앞산 대덕산 등의 낮은 산지가 외곽 경계를 이룬다. 중앙부는 움푹한 전형적인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다.
만촌동은 대구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5㎞ 떨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달성군, 동쪽으로는 경산시와 연접하고 있다. 만촌동 일대는 대구분지의 청동도끼 구릉지에 바로 인접해 있다. 청동도끼 구릉지는 해발 150~215m의 두리봉, 모봉, 형제봉 등의 낮은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 좁은 곡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이 발견된 지점은 금호강안의 낮은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동쪽에 동남에서 북서로 흐르는 금호강은 고령군과 경계를 이루는 낙동강에 유입된다. 서쪽과 남쪽 또한 해발 100m 내외의 얕은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 주변의 구릉지와 산지의 완만한 말단부에는 가천동유적을 비롯하여 만촌동 유물산포지, 용계동 유물산포지, 효목동유적, 가천동 고분군, 임당동 고분군, 노변동 고분군, 고모동 고분군, 고모동 유물산포지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대구분지는 금호강의 소지류인 신천, 대구천, 팔계천, 동화천, 율하천, 욱수천, 진천천, 성당천 유역의 낮은 구릉지대와 충적지에 점유가 시작된다. 월성동과 팔달동, 송현동 일대에는 구릉지대와 서변동, 상동, 동천동 주변의 충적대지에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취락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또한 동천동유적에서는 경작유구가 확인된바 있다. 유적 분포를 통해 이 일대 청동기 사회는 농경을 기반으로 수렵과 어로생활이 혼합된 생계경제를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상동 동촌유원지 진입로와 주차장 확장공사 중 다량의 청동유물 일괄이 발견되어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구 파괴가 심해 정확한 성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나무널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청동꺽창(銅戈) 1점, 청동칼((銅劍) 3점, 검부속구(附屬具)가 출토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유물인 청동꺽창은 전체 길이 39.7㎝로 봉부(鋒部)의 길이가 과신(戈身)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최대폭이 봉부에 있는 이른바 중광형청동꺽창(中廣形銅戈)에 속한다. 한 쪽면에는 봉부의 중앙에 등날이 세워져 있다. 피홈(血溝)의 하단부에는 삼지무늬(三枝文)가 장식되어 있으며 경부에는 동심반원문양(同心半圓文)이 새겨져 있다. 몸체는 편평하고 날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용품이 아닌 의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촌동에서 출토된 청동유물 중 중광형청동꺽창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형식으로 청동유물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시기 비실용적인 의기는 주로 일본열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광형청동꺽창은 일본 구주지방을 그 조형으로 상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이 같은 형식들이 김해지역과 같은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져 오히려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 만촌동유적 출토품의 학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또한 이들 청동유물들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북한지역으로 유입딘 철기문화가 남부지역으로도 전파되면서 실용적 청동기가 점차 의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만촌동 출토품은 기원전후 한반도 남부지방 청동기 문화의 일면 보여주는 자료이다. 철기의 수용과 함께 다양한 청동기가 매납되며 껴묻거리 양이 급속히 증가되어 가며 청동기가 점차적으로 의기화되어 가는 양상은 당시 대구지역 청동기 사회의 분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며 유력 세력이 등장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만촌동은 대구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5㎞ 떨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달성군, 동쪽으로는 경산시와 연접하고 있다. 만촌동 일대는 대구분지의 청동도끼 구릉지에 바로 인접해 있다. 청동도끼 구릉지는 해발 150~215m의 두리봉, 모봉, 형제봉 등의 낮은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 좁은 곡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이 발견된 지점은 금호강안의 낮은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동쪽에 동남에서 북서로 흐르는 금호강은 고령군과 경계를 이루는 낙동강에 유입된다. 서쪽과 남쪽 또한 해발 100m 내외의 얕은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 주변의 구릉지와 산지의 완만한 말단부에는 가천동유적을 비롯하여 만촌동 유물산포지, 용계동 유물산포지, 효목동유적, 가천동 고분군, 임당동 고분군, 노변동 고분군, 고모동 고분군, 고모동 유물산포지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대구분지는 금호강의 소지류인 신천, 대구천, 팔계천, 동화천, 율하천, 욱수천, 진천천, 성당천 유역의 낮은 구릉지대와 충적지에 점유가 시작된다. 월성동과 팔달동, 송현동 일대에는 구릉지대와 서변동, 상동, 동천동 주변의 충적대지에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취락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또한 동천동유적에서는 경작유구가 확인된바 있다. 유적 분포를 통해 이 일대 청동기 사회는 농경을 기반으로 수렵과 어로생활이 혼합된 생계경제를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상동 동촌유원지 진입로와 주차장 확장공사 중 다량의 청동유물 일괄이 발견되어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구 파괴가 심해 정확한 성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나무널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청동꺽창(銅戈) 1점, 청동칼((銅劍) 3점, 검부속구(附屬具)가 출토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유물인 청동꺽창은 전체 길이 39.7㎝로 봉부(鋒部)의 길이가 과신(戈身)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최대폭이 봉부에 있는 이른바 중광형청동꺽창(中廣形銅戈)에 속한다. 한 쪽면에는 봉부의 중앙에 등날이 세워져 있다. 피홈(血溝)의 하단부에는 삼지무늬(三枝文)가 장식되어 있으며 경부에는 동심반원문양(同心半圓文)이 새겨져 있다. 몸체는 편평하고 날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용품이 아닌 의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촌동에서 출토된 청동유물 중 중광형청동꺽창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형식으로 청동유물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시기 비실용적인 의기는 주로 일본열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광형청동꺽창은 일본 구주지방을 그 조형으로 상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이 같은 형식들이 김해지역과 같은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져 오히려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 만촌동유적 출토품의 학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또한 이들 청동유물들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아 서북한지역으로 유입딘 철기문화가 남부지역으로도 전파되면서 실용적 청동기가 점차 의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만촌동 출토품은 기원전후 한반도 남부지방 청동기 문화의 일면 보여주는 자료이다. 철기의 수용과 함께 다양한 청동기가 매납되며 껴묻거리 양이 급속히 증가되어 가며 청동기가 점차적으로 의기화되어 가는 양상은 당시 대구지역 청동기 사회의 분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며 유력 세력이 등장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