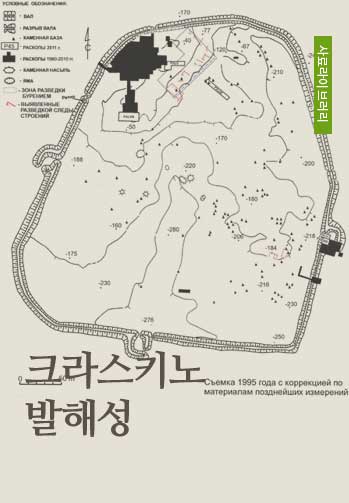1) 평기와
(1) 수키와
수키와는 기본적으로 와당이 부착되지 않은 것과 부착이 된 것2종 류가 있다. 다만 일반 평기와로서의 수키와를 이야기할 때에는 와당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다. 수키와는 암키와와 달리 거의 모두 외면을 물손질하여 타날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와통을 감았던 천 자국이 남아 있다. 와도는 양쪽 모두 안쪽에서 그었다. 대부분의 경우 와도 자국과 기와를 부러뜨린 흔적이 함께 남아 있는데19 80년에 제3구역에서 출토된 와당이 부착된 수키와 1점에는 측면의 와도흔과 부러뜨린 흔적을 모두 지운 것이 있다(도면 1980-52).
와당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수키와는1 980년도에 출토된 것들의 경우 크기가 길이3 2.5~34.5㎝, 좁은 상단부 너비 9.3~9.8㎝, 넓은 하단부 너비 15.5~16.6㎝, 두께는 하단분 쪽이 1.6~2.3㎝, 상단부 쪽이 0.9~1.3㎝이다. 참고로 와당이 부착된 수키와는 와당 포함 전체 길이가 37.5㎝이다.
크라스키노성에서 수키와는 미구기와와 토수기와가 출토되었다. 미구기와는 좁은 쪽 부분에 턱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2줄의 고랑이 있다(도면 625, 1). 때문에 고랑 미구기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994년에 출토된 고랑 미구기와는 길이가 37~39㎝, 넓은 쪽 너비 15㎝, 좁은 쪽 너비 9~10㎝, 두께 1.5~2㎝이다. 고랑이 있는 미구의 길이는 5~6.5㎝이다(도면 1994-128). 고랑 미구가 있는 수키와는 1980년(도면 1980-49), 1981년 제5구역(도면 1981-15, 16), 1998년 제15구역과 제16구역(도면 1998-106, 140, 155), 2003년 제31구역(도면 2003-123), 2010년 제45구역(도면 2010-351) 등에서도 출토된 것이 있다. 모두 미구에 2줄의 고랑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면 625 | 크라스키노성 출토 수키와: 1-제31구역(2003), 2-제3구역(1980), 3, 4-제16구역(1998)
토수기와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는 수키와의 상단부가 대략 기와의 몸2통/3 정도 지점부터 축약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도면 625, 2). 사진으로 보고된 대부분의 토수기와는 이 형식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0년에 제3구역(도면 1980-53~56), 1981년에 제5구역(도면 1981-15, 16)에서 출토된 수키와들 중 그 예가 제시된 것이 있다. 1994년에 출토된 1점은 크기가 길이는 34~36㎝, 넓은 앞쪽 너비는 15~16㎝, 좁은 뒤쪽 너비는 8~12㎝, 두께는 1.2~1.5㎝이다. 이 형식의 수키와에는 꼬리 부분, 즉 토수 부분에 못 구멍이 있는 것도 있다. 글자를 새겨 놓은 것도 있다.
두 번째는 넓은 하단부에서 좁은 상단부까지 완만하게 축약되는 것이다(도면 625, 3). 1998년에 제16구역의 6호 가마에서 출토된 수키와들 중에 그 예가 확인된다(도면 1998-198~203).
그런데 수키와의 꼬리 부분에 고랑이 돌려진 것이 1점 있다(도면 625, 4). 1998년에 출토된 이 편 상태의 유물은 토수기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이 기와가 토수기와라면 크라스키노성에 고랑 토수기와도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암키와
1994년에 출토된 암키와는 길이가 32~36.5㎝(제9구역) 혹은 36.7~44.7㎝(제10구역), 넓은 쪽인 하단부의 너비는 20~21㎝(제9구역) 혹은 29~35㎝(제10구역), 좁은 쪽인 상단부의 너비는 18~19㎝(제9구역) 혹은 24.5~33.5㎝(제10구역), 두께는 1.5~2.5㎝였다. 다시 말해서 전각지에서 출토된 것과 석축담장 문지 일대에서 출토된 암키와들은 크기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 전각지의 암키와가 크기가 작았고, 석축담장 문지 일대의 암키와가 더 컸다. 좁은 상단면은 절단한 후 물손질 마무리하였고, 넓은 하단면에는 문양을 시문하였다.
암키와는 하단면에 문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된다. 크기도 두 종류로 구분된다1.9 80년도 출토 하단 면에 문양이 있는 암키와들은 크기가 대형은 길이 41.5~46㎝, 좁은 상단부 너비 24~28㎝, 넓은 하단부 너비 28~35㎝, 두께 2~2.2㎝이고(도면 1980-58~60), 소형은 길이 36~37㎝, 좁은 상단부 너비 14.6~18㎝, 넓은 하단부 너비 15.2~24㎝, 두께 1.6~1.8㎝이다.
암키와는 성형을 모골와통에서 하였다. 1980년에 제2구역에서 출토된 암키와의 내면 사진에는 기와 성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도면 1980-61)(도면 626). 이 기와에는 모골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천 자국도 잘 남아 있으며, 천을 와통에 씌운 다음에 아래 쪽을 천으로 고정한 띠 고정 흔적도 관찰된다한. 또 돌기형 눈테의 흔적도 가장자리 부분에 남아 있다. 와도는 양쪽 모두 내면에서 그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와가 수평 방향으로 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기와를 성형할 때에 띠 모양의 소지를 수평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쌓아 올렸음을 말한다. 1998년에 우물 뒤채움부(도면 1998-143)와 제16구역(도면 1998-215)에서 출토된 와편들에도 뚜렷한 모골의 흔적과 함께 기와가 수평 방향으로 깨어진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626 | 크라스키노성 제2구역 출토 암키와(1980)
띠 고정 흔적은 1980년에 제3구역에서 출토된 암키와에서도 확인된다(도면 627).

도면 627 | 크라스키노성 제3구역 출토 암키와(1980)
암키와의 내면에는 내면 조정을 하여 모골의 흔적을 지운 것도 발견된다. 1994년에 제9구역에서 출토된 암키와(도면 628)와 1998년에 제16구역에서 출토된 암키와 내면에 내면 조정의 흔적이 관찰된다(도면 1998-173).

도면 628 | 크라스키노성 제9구역 출토 암키와(1994)

도면 629 | 코르사코프카 절터 출토 암키와(1993)
암키와의 외면은 먼저 승문 박자로 타날을 하여 기면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승문의 흔적이 외면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다. 1980년에 제2구역에서 출토된 1점은 외면에 승문 타날의 흔적이 무질서하게 남아 있고, 좁은 상단부 쪽만 회전 물손질 하였다(도면 1980-60)). 외면을 무질서하게 승문 타날한 흔적은 1998년에 우물 뒤채움부에서도 출토된 것들이 있다(도면 1998-144~147). 편 상태이기는 하지만 외면 전체에 정연하게 승문이 잘 남아 있는 것도 있다. 승문의 방향이 다른 것도 있다. 1981년에 제5구역(도면 1981-20), 1998년에 우물 뒤채움부(도면 1998-150, 151), 제16구역(도면 1998-164) 등에 출토된 것들이 그 예이다. 치구를 서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그어 문양을 베풀은 듯한 암키와도 있다(도면 2001-93).
대부분의 경우는 승문 타날을 한 다음에 외면을 회전 물손질 하여 승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 1980년에 제2구역에서 출토된 1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도면 1980-59). 하지만 승문 타날 다음에 승면을 모두 지우지 않고 일부씩 남긴 것들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1980년에 제3구역(도면 1980-58)(도면 627), 1981년에 제5구역(도면 1981-13)에서 출토된 것들이 그 좋은 예이다.
암키와 하단면의 문양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되었다.주 001 첫 번째는 손가락 끝부분을 눌러 문양을 베푼 지두문이다(도면 1994-134~135; 136, 1, 4~11, 13~18). 지두문은 전체적으로 하단면의 가장자리에 파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지적되었다. 지두문은 모두 16개의 변종이 도면으로 제시되었다. 각 변종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지만 도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지두문 변종1은 등 쪽 가장자리에 지두를 약간의 간격을 두고 위에서 아래로 연속적으로 짧게 누른 것이(도다면 1994-136, 1)(도면 630, 1). 변종2는 등 쪽 가장자리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두를 연속적으로 길고 조밀하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4)(도면 630, 2). 변종3은 등 쪽 가장자리에 (왼손) 엄지손가락 지두를 연속적으로 길고 조밀하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5)(도면 630, 3). 변종4는 등 쪽 가장자리에 (왼손) 엄지손가락 지두를 연속적으로 짧고 조밀하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6)(도면 630, 4). 변종5는 등 쪽과 배 쪽의 양쪽 가장자리에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함께 거의 연속으로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7)(도면 630, 5). 변종6은 등 쪽 가장자리에 (오른손) 지두를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짧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8)(도면 630, 6). 변종7은 등쪽 가장자리에 (왼손) 지두를 약간 측면으로 한 상태에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길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9)(도면 630, 7). 변종8은 등 쪽 가장자리에 (왼손) 지두를 기와의 장축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조밀하게 연속적으로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10)(도면 630, 8). 변종9는 등 쪽 가장자리에 (오른손) 지두를 약간 측면으로 한 상태에서 가장자리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게 연속적으로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11)(도면 630, 9). 변종10은 등 쪽 가장자리에 (왼손) 지두를 측면으로 한 상태에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짧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13)(도면 630, 10).

도면 630 | 크라스키노성 출토 암키와 지두문 각종 형식
변종11은 등 쪽 가장자리에 (왼손) 지두를 완전히 측면이 되게 한 상태에서 거의 연속적으로 짧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14)(도면 631, 1). 변종12는 변종1과 매우 흡사하지만 조금 더 얕게 그리고 더 넓은 간격으로 짧게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15)(도면 631, 2). 변종13은 등 쪽 가장자리에 (오른손) 지두를 측면으로 하여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짧게 누른 것인데 지두의 왼쪽 위에 손톱자국이 남아 있다(도면 1994-136, 16)(도면 631, 3). 변종14는 등 쪽 가장자리에 먼저 각진 시문구를 연속적으로 누른 다음에 다시 지두의 가운데 부분으로 얕고 넓게 연속적으로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17)(도면 631, 4). 변종15는 변종1 및 변종 15와 매우 흡사하지만 지두를 더 넓게 연속적으로 누른 것이 차이가 나는 점이다(도면 1994-136, 18)(도면 631, 5). 그 외에 각재 시문구로 문양을 낸 것으로 소개한 한 종류는 사실은 왼손 손가락을 측면으로 바싹 세워 연속적으로 누른 것이라 생각된다. 지두문 변종16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도면 1994-136, 2)(도면 631, 6).

도면 631 | 크라스키노성 출토 암키와 지두문 및 각재문 각종 형식
그 외에도 각재 시문구로 문양을 낸 것이2 종류 있다. 각재문 변종1은 등 쪽 가장자리에 각재 시문구를 오른손으로 연속적으로 누른 것이다(도면 1994-136, 3)(도면 631, 7). 각재문 변종2는 등 쪽 가장자리에 각재 시문구를 왼손으로 연속적으로 누르면서 약간 비튼 것이다(도면 1994-136, 12)(도면 631, 8).
따라서 1994년에만 크라스키노성에서는 16종류의 지두문과 2 종류의 각재문이 그리고 각재문과 지두문이 함께 시문된 것이 1종류 각각 확인되어 이 종류 문양이 매우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절대 다수의 종류가 등 쪽에 문양을 내었지만,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등 쪽과 배 쪽의 양쪽 가장자리에 동시에 문양을 낸 경우도 있고, 또 지두와 각재를 혼용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두문 암키와는 1980년(도면 1980-50), 1981년 제5구역(도면 1981-13, 19, 20), 1997년 제15구역(도면 1997-70, 77), 1998년 제15구역(도면 1998-142, 143, 144), 제16구역(도면 1998-159, 164, 171, 172, 180, 181, 182187, 196)(도면 632, 1, 2), 2003년 제31구역(도면 2003-119, 120, 121)(도면 632, 4), 2009년 제40구역(도면 2009-219)(도면 632, 5), 제42구역(도면 2009-756, 757)(도면 632, 3), 2010년 제45구역(도면 2010-352, 397)(도면 632, 6), 2011년 제45구역(도면 2011-56, 제47구역(도면 2011-569, 658), 제48구역(도면 2011-347, 350, 412, 476)(도면 632, 7), 2012년 제44구역, 제47구역, 제48구역, 2014년 제47구역, 제49구역, 2015년 제47구역, 제50구역, 2017년 제51구역, 제53구역, 2018년 제51구역, 제53구역 등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632 | 크라스키노성 출토 지두문 암키와: 1-제16구역(1998), 2-제16구역(1998), 3- 제42구역(2009), 4-제31구역(2003), 5- 제40구역(2009), 6-제45구역(2010), 7-제48구역(2011)
두 번째의 하단면 문양은 하단면에 2줄의 홈-고랑을 내어 3개의 문양대를 조성한 일종의 삼대문(三帶文)이다. 모두 7개의 변종이 소개되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위와 아래 가장자리 쪽의 문양대에는 모두 좁은 각재로 ‘눈금’을 새기고, 중간 부분의 문양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문양을 새겼다는 사실이다(도면 1994-137, 1~4, 6~8). 이 단사선 각재눈금문은 절대 다수의 경우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정면에서 보았을 때에 어골문의 효과를 낸다. 하지만 동일 방향으로 배치된 경우도 있다. 각각의 변종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도면을 보면 각 변종의 문양은 다음과 같다.
삼대문 변종1은 가운데 문양대에 일정 간격을 두고 끝이 둥그스름한 막대기를 눌러 둥근 구멍무늬를 낸 것이다. 양쪽 가장자리의 각재눈금문은 모두 한쪽 방향으로만 시문되어 있다(도면 1994-137, 1)(도면 633, 1). 변종 2는 가운데 문양대에 일정 간격을 두고 끝이 네모난 막대기를 수직방향으로 눌러 수직 네모 구멍무늬를 낸 것이다. 양쪽 가장자리의 각재눈금문은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어골문의 효과를 내는데 어골의 좁은 쪽이 왼쪽을 향한다(도면 1994-137, 2)(도면 633, 2). 변종3은 가운데 문양대에 둥근 구멍무늬를 낸 것은 변종1과 동일하지만 양쪽 가장자리의 각재눈금문이 대칭적으로 배치된 것이 차이를 보인다. 각재눈금문이 만든 어골형상은 좁은 쪽이 왼쪽을 향한다(도면 1994-137, 3)(도면 633, 3). 변종4는 가운데 문양대에 네모 구멍무늬를 시문하고 또 양쪽 가장자리의 각재눈금문이 왼쪽 방향으로 어골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변종2와 동일하다. 다만 네모 구멍무늬의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 경사진 방향인 경사 네모 구멍무늬인 것이 차이가 난다 (도면 1994-137, 4)(도면 633, 4). 변종 5는 가운데 문양대에 둥근 구멍무늬가 시문된 것이 변종1 및 변종3과 동일하다. 하지만 가장자리의 각재눈금문이 등 쪽은 경사진 방향, 배 쪽은 거의 수직 방향인 것이 서로 차이가 난다(도면 1994-137, 6)(도면 633, 6). 변종6은 가운데 문양대에 끝이 타원형인 막대기를 약간 경사지게 연속적으로 눌러 경사 타원 구멍무늬를 낸 것이다. 양쪽 가장자리의 각재눈금문은 좁은 쪽이 오른쪽을 향한다(도면 1994-137, 7)(도면 633, 7). 변종7은 가운데 문양대에 대롱모양의 막대기를 얕게 눌러 대롱무늬를 낸 것이다. 양쪽 가장자리에 각재눈금문이 듬성듬성하게 배치되었다(도면 1994-137, 8)(도면 633, 8).

도면 633 | 크라스키노성 출토 암키와 삼대문 각종 형식
하단면의 양쪽 가장자리에 각재눈금문이 시문된 암키와는 1980년(도면 50, 58), 1981년 제5구역(도면 1981-13), 1997년 제15구역(도면 1997-71), 1998년 제15구역(도면 1998-108, 109), 제16구역(도면 1998-141, 162, 214~217, 194), 2000년 제25구역(도면 2000-31), 2011년 제48구역(도면 2011-349)(도면 634, 1; 635, 2), 2015년 제50구역(도면 2015-701, 943, 944)(도면 634, 1, 2; 635, 2, 3), 2017년 제51구역(도면 2017-25, 91, 142, 291, 293, 295)(도면 634, 3~6; 635, 4~6), 2018년 제51구역(도면 2018-172, 209, 222)(도면 634, 7, 8; 635, 7~9)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도면 634 | 크라스키노성 출토 삼대문 암키와: 1-제50구역 섹터2 제2인공층 우-2방안(2015), 2-제50구역 섹터2 제4인공층 쉬-5방안(2015), 3-제51구역 제4인공층 웨-9방안(2017), 4-제51구역 제5인공층 제-8방안(2017), 5-제51구역 제6인공층 베-7방안(2017), 6-제51구역 제6인공층 아-7방안(2017), 7-제51구역 제9인공층 베-8방안(2018), 8-제51구역 제9인공층 아-8'방안(2018)
여기에서 제51구역 도로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은 층위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4인공층에서 수직 네모구멍무늬가 있는 것이 1점(도면 2017-91)(도면 634, 3; 635, 4), 제5인공층에서 둥근 구멍무늬가 있는 것이 1점(도면 2017-142)(도면 634, 4), 제6인공층에서 대롱무늬가 있는 것이 1점(도면 2017-292), 위에 소개된 변종들과는 차이가 있는 가운데 문양대를 따라 부정 사다리꼴의 구멍무늬가 있는 것이 1점(도면 2017-293)(도면 634, 5; 635, 6), 하단면에 홈-고랑이 없고 양쪽 가장자리에만 각재눈금문이 시문된 것이 1점(도면 2017-295)(도면 634, 6; 635, 5), 제8인공층에서 대롱무늬가 있는 것이 1점(도면 2018-172)(도면 635, 9), 제9인공층에서 대롱무늬가 있는 것이 1점(도면 2018-209)(도면 634, 7; 635, 7), 둥근 구멍무늬가 있는 것이 1점(도면 2018-222)(도면 634, 8; 635, 8) 각각 출토되었다.

도면 635 | 크라스키노성 출토 삼대문 암키와: 1-제48구역 서쪽섹터 제1인공층(2011), 2-제50구역 섹터2 제2인공층 우-2방안(2015), 3-제50구역 섹터2 제4인공층 쉬-5방안(2015), 4-제51구역 제4인공층 웨-9방안(2017), 5-제51구역 제6인공층 아-7방안(2017), 6-제51구역 제6인공층 베-7방안(2017), 7-제51구역 제9인공층 베-8방안(2018), 8-제51구역 제9인공층 아-8'방안(2018), 9-제51구역 제8인공층 아'-9방안(2018)
제51구역의 도로구간만 놓고 본다면 둥근 구멍무늬는 아래의 제9인공층과 위의 제5인공층에서 함께 보이고, 대롱무늬도 아래의 제9인공층, 제8인공층, 위의 제6인공층에서 모두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은 오랫동안 사용된 문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직 네모 구멍무늬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문양과 부정 사다리꼴 문양 등이 1점씩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삼대문의 정확한 상대편년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의 하단면 문양은 둥그스름하게 마무리를 한 하단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경사지게 선을 그은 것이다(도면 1994-137, 5)(도면 633, 5). 이 문양은 단 한 예만 소개되었고 다른 변종은 없다. 다만 하단면을 둥그스름하게 마무리한 암키와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암키와의 하단면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물론 암키와의 상단면은 둥그스름하게 마무리한 경우는 많지만 문양을 시문한 경우는 거의 없다. 어쨌든 이 암키와의 문양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3) 모서리 기와
모서리 기와는 지붕의 모서리 부분에 사용하기 때문에 평면 모양이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을 가진다. 크라스키노성에서는 보고된 모서리 기와는 모두 삼각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 981년에 제5구역(도면 1981-17)(도면 636, 1), 1996년에 제12구역(도면 1996-57)(도면 636, 2), 2011년에 제48구역(도면 411)(도면 636, 3)에서 출토된 것이 각각 사진으로 보고된 것이 있다. 1981년에 출토된 모서리 기와에는 못 구멍이 하나 뚫려있다. 그 외에도 1994년에 1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도면 1994-143, 2). 크라스키노성에서 출토된 모서리 기와는 모두 편 상태여서 원래의 크기는 알 수 없다. 1994년에 출토된 것은 두께가 1.5~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면 636 | 크라스키노성 출토 모서리 기와: 1-제5구역(1981), 2-제12구역(1996), 3-제48구역(2011)
(4) 박와
1980년에 보고된 것이 있다. 두께가 0.6~0.8㎝로 얇다. 박와의 내면에는 천자국도 입자가 매우 작다. 도면이나 사진은 제시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