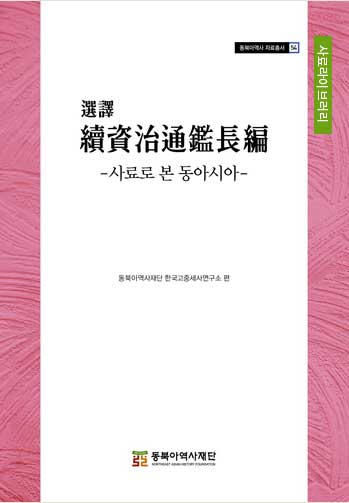거란의 공봉관(供奉官) 이신(李信)의 귀부(歸附)
거란(요)의 공봉관(供奉官)주 001 이신(李信)주 002이 귀부했다. 이신이 그 나라 안의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란(요) 군주의 아비 명기(明記)주 003는 호(號)가 경종(景宗)주 004이고 황후 소씨(蕭氏)주 005는 협력(挾力)주 006 재상의 딸로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장자는 이름이 융서(隆緒)주 007로 즉 거란(요) 군주이고, 둘째는 이름이 찬(贊)주 008
각주 008)

으로 양왕(梁王)주 009에 봉해지고 지금 31세이며, 셋째는 이름이 고칠(高七)주 010이고 오왕(吳王)주 011에 봉해지고 25세이며, 넷째는 이름이 정가(鄭哥)주 012이고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또한 세 딸을 두었습니다. 장녀는 연가(燕哥)주 013라 하고 34세이고 소씨의 동생 북재상(北宰相)주 014 유주가(留住哥)주 015에게 시집갔는데 (유주가는) 부마도위(駙馬都尉)주 016에 임명되었습니다. 둘째는 장수노(長壽奴)주 017라 하고 29세이며 소씨의 조카 동경유수(東京留守)주 018 패야(悖野)주 019贊 : 973∼1016, 거란(요)의 황족. 5대 황제 경종과 승천황태후 사이의 2남으로, 이름은 耶律隆慶이고, 字는 燕隱이다. 8세에 恒王에 봉해졌고, 聖宗 統和 16年(998)에 梁王으로 진봉되고 南京留守가 되었다. 999, 1001년에 송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경종과 성종 시기에 侍中, 燕京管內處置使, 南京留守를 역임했고 政事令을 겸했으며 大元帥에 배수되기도 했다. 성종 開泰 元年(1012)에 秦晋國王에 봉해져 鐵券을 받고 守太師兼政事令이 더해졌다. 사망한 이후에 皇太弟로 추증되었다. 여기에서 이름을 贊이라고 부른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각주 019)

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연수노(延壽奴)주 020라 하고 27세이고 패야의 동모제(同母弟) 긍두(肯頭)주 021悖野 : ?∼1023. 거란(요)의 관인. 이는 거란(요)의 大臣인 蕭排押을 지칭하는 것이다. 字는 韓隱이고, 중국식 이름은 寧이었다. 統和 元年(983)에 左皮室詳穩이 되어 山西 지역의 땅을 탈환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 統和 7年(989)에 경종의 차녀와 혼인하여 駙馬都尉에 배수되었고, 同政事門下平章事의 직함이 더해졌다. 統和 13年(995)에는 北南院宣徽使를 역임했고, 統和 15年(997)에 北府宰相에 임명되었다. 고려를 정벌할 때에는 都統에 임명되어 開京에 침입했고, 이후 蘭陵郡王에 봉해졌다. 開泰 2年(1013)에는 知西南面招討使가 되었고, 開泰 5年(1016)에는 東平郡王으로 進封되었다. 開泰 7年(1018)에 다시 都統이 되어 고려를 침공했으나 패배하면서 免官되었다. 太平 3年(1023)에 西南面招討使가 되고 다시 豳王에 봉해졌다. 蕭排押은 東京留守가 되었던 적이 없었는데, 蕭排押의 동생인 蕭恒德(즉, 蕭遜寧)은 東京留守였다.

각주 021)

에게 시집갔습니다. 연수노는 사냥을 나갔다가 사슴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소씨가 즉시 긍두를 교살하여 순장했습니다. 소씨는 누이가 둘 있습니다. 큰누이가 제왕(齊王)주 022에게 시집갔는데 왕이 죽자 스스로 제비(齊妃)라 칭하고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서쪽 변방의 여구아하(驢駒兒河)주 023에 주둔했습니다. 일찍이 말을 둘러보다가 번노(蕃奴) 달람아발(達覽阿鉢)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움을 보고 장막 안으로 불러들여 시중들게 했습니다. 소씨가 그 소식을 듣고 달람아발을 잡아매고 모래주머니로 400대 매질하여 그녀에게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다음해 제비가 소씨에게 청하여 지아비로 삼기를 원한다고 하자 소씨가 허락하고 서쪽으로 달단(達靼)주 024肯頭 : ?∼996. 거란(요)의 관인. 이는 蕭排押의 동생인 蕭恒德을 지칭하는 것이다. 字가 遜寧이어서 蕭遜寧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統和 元年(983)에 경종의 3녀와 혼인하여 駙馬都尉에 배수되었고, 南面林牙가 되었다가 곧 北面林牙가 되었다. 統和 10年(992)에 東京留守로서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 이듬해(993)에 고려가 화평을 청하자 거란(요) 聖宗의 명을 받들어 딸을 고려국왕에게 시집보냈다. 統和 12年(994)에는 兀惹部를 공격했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功臣號가 삭제되었다. 승천황태후는 3녀 越國公主의 병을 걱정하여 宮人 賢釋을 보냈는데, 蕭恒德은 그녀와 私通했고 越國公主는 분노하여 사망했다. 이에 승천황태후는 蕭恒德을 賜死했다.

각주 024)

을 방어하게 했는데 모두 항복하자 (제비는) 장수와 모의하여 그 무리가 골력찰국(骨歷扎國)주 025으로 달아나 군사를 모아 소씨의 자리를 빼앗고자 했습니다. 소씨가 그 소식을 듣고 마침내 그 병력을 빼앗고 유주(幽州)주 026를 다스리라고 명했습니다. 작은누이는 조왕(趙王)주 027에게 시집갔는데 왕이 죽자 조비(趙妃)는 모임에서 소씨에게 독을 마시게 하려 했는데 노비가 그것을 발설하자 소씨는 그녀를 독살했습니다. 소씨는 현재 50세이고 경종이 죽었을 때부터 나랏일을 주관하고 스스로 태후라 칭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유주를 관할하는 한병(漢兵)은 신무(神武),주 028 공학(控鶴),주 029 우림(羽林),주 030 효무(驍武)주 031 등으로 불리는데 약 18,000여기로 장수에 임명되었고, 거란, 구여해(九女奚),주 032 남북피실(南北皮室)주 033達靼 : 투르크어로 타타르(Tatar)라고 불렸던 민족으로 퀼 테긴 비문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타타르는 여러 한문 사료에서 達怛, 韃靼, 塔坦, 塔塔, 達旦, 達達 등 다양한 표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唐代 중기에 투르크 계통 부족의 泛稱이 室韋에서 達靼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室韋를 達靼으로 칭하거나 室韋 계통이 아닌 부족들까지 達靼으로 칭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에 達靼은 점점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을 가리키는 泛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거란(요)에서는 몽골고원에 사는 達靼을 阻卜이라 칭하기도 했다. 達靼은 거란(요) 제국 내에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거란(요)에 대한 반항투쟁을 일으키면서 거란(요)의 서북 통치를 약화시키기도 했다.

각주 033)

의 당직사리(當直舍利),주 034 8부락사리(部落舍利),주 035 산후(山後) 4진(鎭)주 036 제군은 약 108,000여기로 내부의 5,600은 항시 거란(요) 군주를 호위하고 나머지 93,950은 때에 따라 노략질을 하는 군대입니다. 그 국경은 유주에서 동쪽으로 550리 가면 평주(平州)주 037에 이르고 또 550리 가면 요양성(遼陽城)주 038에 이르는데 즉 동경(東京)주 039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또 동북으로 600리 가면 오야국(烏惹國)주 040에 이르는데 그 나라는 한문법(漢文法)을 사용하고 인장은 팔각이고 안에 원이 있습니다. 또한 동남쪽으로 고려와 접합니다. 또한 북쪽으로 여진(女眞)주 041南北皮室 : 거란(요)의 군대 중 하나로 皮室軍이 있었는데, 이는 左와 右로 나뉘어 있었다. 左皮室軍을 南皮室軍, 右皮室軍을 北皮室軍이라 부르기도 했다. 야율아보기가 여러 부락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御帳親軍을 두었고, 그 군대를 皮室이라 불렀다. 太宗은 전국의 정예병들을 선발하여 皮室 조직을 더욱 확충하여 그 수가 3만에 달했다. 대략 聖宗 이후가 되면, 皮室은 더 이상 行宮의 숙위를 맡지 않고 중앙에서 직할하는 기동부대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거란(요)과 송의 경계에 배치되었다. 南北皮室 이외에 단일한 부락으로 皮室軍을 조직하기도 했는데, 그 예로 黃皮室軍과 敵烈皮室軍 등이 있었다.

각주 041)

에 이르고 동쪽으로 압강(鴨江)주 042을 지나는데 즉 신라(新羅)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신을 공봉관으로 삼고 기폐(器幣)와 관대(冠帶)를 내려주었다.女眞 : 동부 滿洲에 살던 퉁구스 계통의 민족. 女直이라고도 한다. 이 민족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라 춘추전국시대에는 肅愼, 한나라 때는 挹婁, 남북조시대에는 勿吉, 隋唐代에는 靺鞨로 불렸다. 10세기 초 송나라 때 처음으로 女眞이라 하여 명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랐으나, 청나라 때는 滿洲族이라고 불렀다. 말갈족의 부족 가운데 粟末靺鞨과 白山靺鞨은 고구려에 복속하였다가 고구려가 멸망한 뒤 지금의 遼寧省 朝陽에 해당하는 營州로 이주하였고, 大祚榮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한 뒤 피지배층으로 복속되었다. 松花江과 黑龍江 하류 지역에 근거를 두고 발해에 대항하였던 黑水靺鞨은 발해가 멸망한 뒤 거란에 복속되어 여진이라 불렸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贊 : 973∼1016, 거란(요)의 황족. 5대 황제 경종과 승천황태후 사이의 2남으로, 이름은 耶律隆慶이고, 字는 燕隱이다. 8세에 恒王에 봉해졌고, 聖宗 統和 16年(998)에 梁王으로 진봉되고 南京留守가 되었다. 999, 1001년에 송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경종과 성종 시기에 侍中, 燕京管內處置使, 南京留守를 역임했고 政事令을 겸했으며 大元帥에 배수되기도 했다. 성종 開泰 元年(1012)에 秦晋國王에 봉해져 鐵券을 받고 守太師兼政事令이 더해졌다. 사망한 이후에 皇太弟로 추증되었다. 여기에서 이름을 贊이라고 부른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
각주 019)
悖野 : ?∼1023. 거란(요)의 관인. 이는 거란(요)의 大臣인 蕭排押을 지칭하는 것이다. 字는 韓隱이고, 중국식 이름은 寧이었다. 統和 元年(983)에 左皮室詳穩이 되어 山西 지역의 땅을 탈환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 統和 7年(989)에 경종의 차녀와 혼인하여 駙馬都尉에 배수되었고, 同政事門下平章事의 직함이 더해졌다. 統和 13年(995)에는 北南院宣徽使를 역임했고, 統和 15年(997)에 北府宰相에 임명되었다. 고려를 정벌할 때에는 都統에 임명되어 開京에 침입했고, 이후 蘭陵郡王에 봉해졌다. 開泰 2年(1013)에는 知西南面招討使가 되었고, 開泰 5年(1016)에는 東平郡王으로 進封되었다. 開泰 7年(1018)에 다시 都統이 되어 고려를 침공했으나 패배하면서 免官되었다. 太平 3年(1023)에 西南面招討使가 되고 다시 豳王에 봉해졌다. 蕭排押은 東京留守가 되었던 적이 없었는데, 蕭排押의 동생인 蕭恒德(즉, 蕭遜寧)은 東京留守였다.
- 각주 020)
-
각주 021)
肯頭 : ?∼996. 거란(요)의 관인. 이는 蕭排押의 동생인 蕭恒德을 지칭하는 것이다. 字가 遜寧이어서 蕭遜寧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統和 元年(983)에 경종의 3녀와 혼인하여 駙馬都尉에 배수되었고, 南面林牙가 되었다가 곧 北面林牙가 되었다. 統和 10年(992)에 東京留守로서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 이듬해(993)에 고려가 화평을 청하자 거란(요) 聖宗의 명을 받들어 딸을 고려국왕에게 시집보냈다. 統和 12年(994)에는 兀惹部를 공격했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功臣號가 삭제되었다. 승천황태후는 3녀 越國公主의 병을 걱정하여 宮人 賢釋을 보냈는데, 蕭恒德은 그녀와 私通했고 越國公主는 분노하여 사망했다. 이에 승천황태후는 蕭恒德을 賜死했다.
- 각주 022)
- 각주 023)
-
각주 024)
達靼 : 투르크어로 타타르(Tatar)라고 불렸던 민족으로 퀼 테긴 비문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타타르는 여러 한문 사료에서 達怛, 韃靼, 塔坦, 塔塔, 達旦, 達達 등 다양한 표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唐代 중기에 투르크 계통 부족의 泛稱이 室韋에서 達靼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室韋를 達靼으로 칭하거나 室韋 계통이 아닌 부족들까지 達靼으로 칭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에 達靼은 점점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을 가리키는 泛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거란(요)에서는 몽골고원에 사는 達靼을 阻卜이라 칭하기도 했다. 達靼은 거란(요) 제국 내에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거란(요)에 대한 반항투쟁을 일으키면서 거란(요)의 서북 통치를 약화시키기도 했다.
- 각주 025)
- 각주 026)
- 각주 027)
- 각주 028)
- 각주 029)
- 각주 030)
- 각주 031)
- 각주 032)
-
각주 033)
南北皮室 : 거란(요)의 군대 중 하나로 皮室軍이 있었는데, 이는 左와 右로 나뉘어 있었다. 左皮室軍을 南皮室軍, 右皮室軍을 北皮室軍이라 부르기도 했다. 야율아보기가 여러 부락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御帳親軍을 두었고, 그 군대를 皮室이라 불렀다. 太宗은 전국의 정예병들을 선발하여 皮室 조직을 더욱 확충하여 그 수가 3만에 달했다. 대략 聖宗 이후가 되면, 皮室은 더 이상 行宮의 숙위를 맡지 않고 중앙에서 직할하는 기동부대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거란(요)과 송의 경계에 배치되었다. 南北皮室 이외에 단일한 부락으로 皮室軍을 조직하기도 했는데, 그 예로 黃皮室軍과 敵烈皮室軍 등이 있었다.
- 각주 034)
- 각주 035)
- 각주 036)
- 각주 037)
- 각주 038)
- 각주 039)
- 각주 040)
-
각주 041)
女眞 : 동부 滿洲에 살던 퉁구스 계통의 민족. 女直이라고도 한다. 이 민족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라 춘추전국시대에는 肅愼, 한나라 때는 挹婁, 남북조시대에는 勿吉, 隋唐代에는 靺鞨로 불렸다. 10세기 초 송나라 때 처음으로 女眞이라 하여 명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랐으나, 청나라 때는 滿洲族이라고 불렀다. 말갈족의 부족 가운데 粟末靺鞨과 白山靺鞨은 고구려에 복속하였다가 고구려가 멸망한 뒤 지금의 遼寧省 朝陽에 해당하는 營州로 이주하였고, 大祚榮이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한 뒤 피지배층으로 복속되었다. 松花江과 黑龍江 하류 지역에 근거를 두고 발해에 대항하였던 黑水靺鞨은 발해가 멸망한 뒤 거란에 복속되어 여진이라 불렸다.
- 각주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