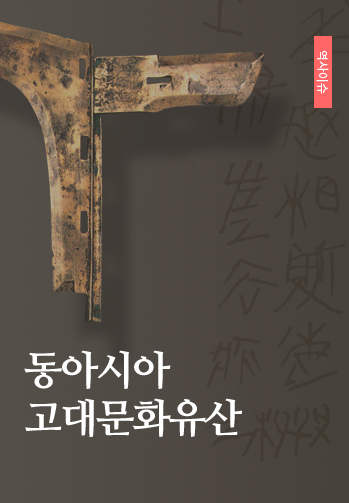광개토왕릉비/광개토왕비
好太王碑
입지
우산남쪽 기슭의 언덕에 위치해 있다.
유적개관
방주형 각력응회암으로, 높이는 6.39m, 네 면의 폭은 1.34~2m이다. 화강암과 석회암으로 구성된 쌍흥의 기초위에 세워져 있고, 비문은 가는 선으로 44행으로 나누고 문자는 왼쪽부터 세로로 씌어져 있으며, 한자 서체는 예해(隷楷) 사이이고, 전각은 세밀하고 깔끔하다. 네 면의 글자는 모두 1,775자이다. 비석은 청나라 광서 3년인 1877년에 발견되었다. 비문은 고구려 건국신화, 호태왕의 업적, 능을 지키는 연호 등의 기술로 나누어져 있다.
참고문헌
「集安高句麗王陵」, 2004
해설
광개토왕비는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시 태왕진에 있으며 2004년 환인 및 집안 고구려유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12년, 고구려 19대 광개토왕이 죽은 지 2년째가 되는 해인 414년 9월 29일에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으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 고구려의 영역확장 과정과 그 사회상 및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비문에 의하면 광개토왕의 정식시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며,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비를 ‘호태왕비(好太王碑)’ 또는 ‘영락태왕비(永樂太王碑)’라고도 부른다. 이 비는 고구려의 왕릉급 무덤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집안시 우산을 뒤로 하고 압록강을 앞에 둔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45도 치우친 동남향에서 서북향 방향으로 서 있다. 1928년부터 1976년까지는 집안현 지사였던 유천성(劉天成)의 주도로 세워진 2층 비각 속에 있었고 1982년에 중국 당국에 의하여 새로 건립된 단층의 대형 비각 속에 있으며, 200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비각 전면을 유리로 에워 쌓다. 현재 비각은 태왕릉과 연결된 능역 내에서 함께 관리되고 있다.
비는 받침돌과 비신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비의 석질은 각력응회암의 석질로 집안인근에서 채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높이×너비가 6.39×1.3~2.0m 가량 되는 거대한 4면비이다. 1면과 2면 연결 중간부분의 손상이 심해 글자 판독이 어려우며 중국에서 비신보호를 위해 접착용 수지를 바른 모습이 보인다. 받침돌은 약 20cm 두께의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다듬은 것인데, 길이 3.35m, 너비 2.7m의 장방형으로 3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깨졌다. 비문의 글자는 비신의 동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서에 따라 4면에 새겨졌다. 제1면 11행, 제2면 10행, 제3면 14행, 제4면 9행으로 전체 44행이며, 각 행마다 글자 수는 기본적으로 41자이나 군데군데에 처음부터 글자를 쓰지 않은 여백이 있고, 비면이 고르지 않아 글자를 써넣을 수 없는 곳도 있으므로 모두 합해 29자의 결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 전체 글자 수는 1,775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 150여자 정도는 현재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글자의 크기도 균등하지가 않다. 대부분은 14~15cm정도이나 큰 것은 16cm, 작은 것은 약 11cm정도 되는 것도 있다. 각 글자는 대체로 1~0.5cm 정도의 깊이로 새겨져 있으며 글자의 배합과 간격은 비교적 균등한 편이다. 고구려에서 만든 독자적인 이체자도 사용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서문격으로 제1면 1행부터 1면 6행에 걸쳐 추모왕의 건국신화를 비롯하여 유류왕과 대주류왕을 거쳐 광개토왕에 이르는 대왕의 세계와 약력이 서술되어 있다. 또 광개토왕의 즉위 및 서거 관련내용을 비롯한 비의 건립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제2부는 비문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제1면 7행부터 3면 8행에 걸쳐서 대왕의 정복활동과 토경순수 기사가 연대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영락5년(395) 시라무렌강 유역에 거주하던 거란족 일파를 정벌하여 포로와 노획물을 획득하였고, 영락6년(396)에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으로 비정되는 58성 700촌을 취했으며, 양락 8년(398)에는 이전부터 고구려에 예속되어 조공을 바쳐오던 숙신 방면에 소규모의 군대를 파견해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또 영락10년(400)에는 신라의 원군 요청을 받아들여 5만 군대를 파견해 신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던 다라와 왜 연합군을 내쫓고 낙동강 유역까지 추격함으로써 백제-가야-왜 연합세력의 기세를 꺾어놓았고, 14년(404)에는 백제의 사주를 받아 황해도 지역가지 쳐들어온 왜를 궤멸시켰다. 그리고 영락20년(410)에는 동부여를 공략하여 속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응징하고, 다시 조공관계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둘째 부분은 광개토왕의 훈적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부분으로 사실상 비문의 본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정복활동 가운데 삼국사기 등의 문헌을 통해 광개토왕의 재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후연과의 싸움과 관련되는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문상에서 마멸이 심하여 전쟁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영락17년조의 기사를 후연과의 전투기사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때 깨트린 성의 이름들로 미루어 보아 이 때의 싸움도 역시 백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제3부는 제3면 8행부터 4면 9행에 걸쳐서 능을 지키는 수묘인연호의 명단과 수묘지침 및 수묘인 관리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광개토왕을 비롯한 그 이전 고구려 역대 왕들의 능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기존의 수묘제를 개혁했다는 내용과 그에 관계된 법령 및 수묘인의 전체 인원과 그들의 출신지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새겨 놓았다. 특히, 광개토왕이 자신의 능 수묘를 위한 수묘인을 신래한예만으로 설정했던 사실과 장수왕이 구민을 추가하여 이들이 함께 수묘역을 담당케 한 사실에 의해 고구려가 백제 및 예계통 복속민들을 종족, 문화적으로 동일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와 발해 붕괴 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고려 말 조선초에는 금나라의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지역은 청이 백두산 일대를 자신들의 발상지로 신성시하여 실시한 봉금제로 인해 통제되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봉금이 해제되고 광서2년(1876)에 회인현이 설치된 후 1880년대 비가 재발견되고 탁본이 중국학계에 소개되었다. 1883년에 비의 쌍구가묵본(또는 묵수곽전본)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 육군 참모본부 주도 아래에 비문연구를 진행한 다음, 1888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비로소 광개토왕비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비문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학계였는데, 그 이유는 비문 가운데 이른바 신묘년조라 불리는 기사가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명분으로 강조되고 있던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 국내에 이 비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07년 무렵이었으나 그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행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 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한일고대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업적은 정인보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신묘년조의 기사에서 ‘도해파(渡海破)’의 주어를 ‘왜(倭)’가 아닌 고구려로 봄으로써 4세기대에 왜가 한반도로 건너와 백제, 가야,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한 일본학계의 통설을 반박하고 남선경열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해방 이후 남한 학계뿐만 아니라 북한 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73년 이진희에 의해 일본 참모본부에 의한 비문훼손 및 석회도부에 의한 비문조작설이 제기되면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비록 1984년 중국학자 왕건군이 석회도부는 일본 참모본부가 아닌 탁공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여 일본의 왜곡설은 수정되었으나, 석회도부에 의한 비문변조만은 확인된 셈이었다. 이후 원석탁본에 대한 조사와 소개가 진행되었고 비문의 구조 및 내용 분석과 연구사 정리 등이 이루어져 일정하게 공헌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학계에서도 이전처럼 신묘년조의 자구해석에만 치중하던 연구단계에서 벗어나 광개토왕비의 발견경위, 각종 탁본이 만들어진 시기, 비문조작 여부, 판독상과 해석상의 문제, 비문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구조분석, 비문의 사회사적인 측면과 건국신화와 왕계에 대한 연구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다.
비는 받침돌과 비신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비의 석질은 각력응회암의 석질로 집안인근에서 채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높이×너비가 6.39×1.3~2.0m 가량 되는 거대한 4면비이다. 1면과 2면 연결 중간부분의 손상이 심해 글자 판독이 어려우며 중국에서 비신보호를 위해 접착용 수지를 바른 모습이 보인다. 받침돌은 약 20cm 두께의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다듬은 것인데, 길이 3.35m, 너비 2.7m의 장방형으로 3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깨졌다. 비문의 글자는 비신의 동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서에 따라 4면에 새겨졌다. 제1면 11행, 제2면 10행, 제3면 14행, 제4면 9행으로 전체 44행이며, 각 행마다 글자 수는 기본적으로 41자이나 군데군데에 처음부터 글자를 쓰지 않은 여백이 있고, 비면이 고르지 않아 글자를 써넣을 수 없는 곳도 있으므로 모두 합해 29자의 결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 전체 글자 수는 1,775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 150여자 정도는 현재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글자의 크기도 균등하지가 않다. 대부분은 14~15cm정도이나 큰 것은 16cm, 작은 것은 약 11cm정도 되는 것도 있다. 각 글자는 대체로 1~0.5cm 정도의 깊이로 새겨져 있으며 글자의 배합과 간격은 비교적 균등한 편이다. 고구려에서 만든 독자적인 이체자도 사용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서문격으로 제1면 1행부터 1면 6행에 걸쳐 추모왕의 건국신화를 비롯하여 유류왕과 대주류왕을 거쳐 광개토왕에 이르는 대왕의 세계와 약력이 서술되어 있다. 또 광개토왕의 즉위 및 서거 관련내용을 비롯한 비의 건립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제2부는 비문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제1면 7행부터 3면 8행에 걸쳐서 대왕의 정복활동과 토경순수 기사가 연대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영락5년(395) 시라무렌강 유역에 거주하던 거란족 일파를 정벌하여 포로와 노획물을 획득하였고, 영락6년(396)에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으로 비정되는 58성 700촌을 취했으며, 양락 8년(398)에는 이전부터 고구려에 예속되어 조공을 바쳐오던 숙신 방면에 소규모의 군대를 파견해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또 영락10년(400)에는 신라의 원군 요청을 받아들여 5만 군대를 파견해 신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던 다라와 왜 연합군을 내쫓고 낙동강 유역까지 추격함으로써 백제-가야-왜 연합세력의 기세를 꺾어놓았고, 14년(404)에는 백제의 사주를 받아 황해도 지역가지 쳐들어온 왜를 궤멸시켰다. 그리고 영락20년(410)에는 동부여를 공략하여 속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응징하고, 다시 조공관계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둘째 부분은 광개토왕의 훈적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부분으로 사실상 비문의 본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정복활동 가운데 삼국사기 등의 문헌을 통해 광개토왕의 재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후연과의 싸움과 관련되는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문상에서 마멸이 심하여 전쟁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영락17년조의 기사를 후연과의 전투기사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때 깨트린 성의 이름들로 미루어 보아 이 때의 싸움도 역시 백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제3부는 제3면 8행부터 4면 9행에 걸쳐서 능을 지키는 수묘인연호의 명단과 수묘지침 및 수묘인 관리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광개토왕을 비롯한 그 이전 고구려 역대 왕들의 능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기존의 수묘제를 개혁했다는 내용과 그에 관계된 법령 및 수묘인의 전체 인원과 그들의 출신지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새겨 놓았다. 특히, 광개토왕이 자신의 능 수묘를 위한 수묘인을 신래한예만으로 설정했던 사실과 장수왕이 구민을 추가하여 이들이 함께 수묘역을 담당케 한 사실에 의해 고구려가 백제 및 예계통 복속민들을 종족, 문화적으로 동일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개토왕비는 고구려와 발해 붕괴 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고려 말 조선초에는 금나라의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지역은 청이 백두산 일대를 자신들의 발상지로 신성시하여 실시한 봉금제로 인해 통제되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봉금이 해제되고 광서2년(1876)에 회인현이 설치된 후 1880년대 비가 재발견되고 탁본이 중국학계에 소개되었다. 1883년에 비의 쌍구가묵본(또는 묵수곽전본)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 육군 참모본부 주도 아래에 비문연구를 진행한 다음, 1888년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비로소 광개토왕비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비문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학계였는데, 그 이유는 비문 가운데 이른바 신묘년조라 불리는 기사가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명분으로 강조되고 있던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 국내에 이 비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07년 무렵이었으나 그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행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 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던 한일고대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연구업적은 정인보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신묘년조의 기사에서 ‘도해파(渡海破)’의 주어를 ‘왜(倭)’가 아닌 고구려로 봄으로써 4세기대에 왜가 한반도로 건너와 백제, 가야,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한 일본학계의 통설을 반박하고 남선경열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해방 이후 남한 학계뿐만 아니라 북한 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73년 이진희에 의해 일본 참모본부에 의한 비문훼손 및 석회도부에 의한 비문조작설이 제기되면서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비록 1984년 중국학자 왕건군이 석회도부는 일본 참모본부가 아닌 탁공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여 일본의 왜곡설은 수정되었으나, 석회도부에 의한 비문변조만은 확인된 셈이었다. 이후 원석탁본에 대한 조사와 소개가 진행되었고 비문의 구조 및 내용 분석과 연구사 정리 등이 이루어져 일정하게 공헌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학계에서도 이전처럼 신묘년조의 자구해석에만 치중하던 연구단계에서 벗어나 광개토왕비의 발견경위, 각종 탁본이 만들어진 시기, 비문조작 여부, 판독상과 해석상의 문제, 비문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구조분석, 비문의 사회사적인 측면과 건국신화와 왕계에 대한 연구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