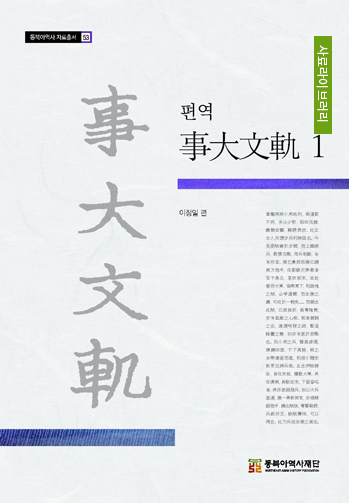남병(南兵)을 조발(調發)하여 잔적(殘賊)을 소탕해 주기를 청하며 행병부(行兵部)에 보내는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56. 本國請撥南兵以終大事
발신: 조선국왕
사유: 속히 남병(南兵)을 조발하고 진격해서 잔적을 쳐부수어 큰 공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선국왕] 지난달 27일, 배신 성균관의 직강 안중길(安重吉)을 따로 차견하여 속히 진병해야 할 연유를 갖추어 자문으로 간청하였습니다. 그 뒤, 곧이어 제도도체찰사 유성룡(柳成龍)이 치계하였습니다.
[유성룡] 경기도관찰사 이정형(李廷馨) 등의 정(呈)을 받았습니다.
[이정형] 경성(京城)의 왜적이 강을 건너 남쪽으로 도주하다가 과천현(果川縣)‧사평원(沙坪院) 등의 곳에 주둔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갈래의 군사는 용산창(龍山倉)에 머무르면서 왕래하고 있는데 그 수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잡혀갔던 인구가 날마다 도망쳐오면서 말하기를, “도성 안의 왜적 10명 중 7~8명은 강을 건넜고 함경도의 왜적이 도성에 들어왔는데 산골짜기로 흩어져 나간 우리나라의 남녀노소가 하루에도 수백 명을 밑돌지 않습니다. 삼각산(三角山)의 여러 동(洞)과 광주(廣州)의 우천(牛川) 가까운 곳에는 흘러들어 온 사람들이 넘쳐서 길을 막고 있는데 굶주려 쓰러져 죽어서 서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본국의 관군(官軍)과 의병(義兵) 들은 천병이 진격하지 않는 까닭에 강 밖으로 물러나 주둔하고 있으니 원근이 모두 실망하여 곳곳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유성룡] 또 운량사(運糧使) 권징(權徵)의 정을 받았습니다.
[권징] 경기도 일대의 여러 고을들이 더욱 혹독한 화를 입어서 백성에게는 곡식이 없고, 들판에는 가는 풀도 없습니다. 제가 강화부(江華府)와 인근 여러 고을의 쌀과 콩을 거두어 운반한 약 3만 석을 어렵사리 넘겨서 천병에게 군량을 이어 댔습니다. 근래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배로 운반해 온 쌀과 콩 2만여 석이 임진강 어귀에 도착하였습니다. 만약 대군이 서둘러 진격한다면 장차 지금 있는 그 수효로써 날수를 헤아려 지급하겠지만 군대의 출동 기일이 늦어지면 점점 소모될 것입니다.
[조선국왕] 또 함경도도순찰사 윤탁연(尹卓然)이 치계하였습니다.
[윤탁연] 영흥진절제도위 이여량(李汝良)의 신(申)을 받았습니다.
[이여량] 생포한 왜적 1명을 보냅니다.
[윤탁연] 이를 받았습니다. 그를 역심(譯審)하여 여여씨(汝汝氏)의 공초를 얻었습니다.
[여여씨] 원래 본도에 주둔하던 왜적의 무리가 지금 곧장 경성에 가서 1개월 동안 병력을 휴식시키고 나서 관백(關白)의 말을 준행하여 대명(大明)의 땅을 나누어 공격하려 합니다.
[윤탁연] 이를 보니, 왜적의 정형이 간사하여 허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긴급한 첩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신속하게 아뢰어 품합니다.
[조선국왕] 갖춘 장계를 받고 당직은 생각하기에, 소방이 천조의 은혜를 입어서 바야흐로 다행히도 되살아날 수 있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배신들의 공급이 형편없어서 대군은 뒤로 물러났고 (왜적의) 잔당은 쉴 틈을 얻었으니 얼마 남지 않은 백성들이 모두 죽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직이 듣기에, 경도(京都) 근처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장차 죽게 되어 목을 늘이고 서쪽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왕사(王師)가 언제나 와서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인가.” 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면 참혹하여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직은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바다 모퉁이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조리 흉악한 병화(兵禍)에 걸려들게 하였으니 마음이 아프고 기력이 끊어져서 무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전쟁통에 죽고 남은 여러 인민을 노약까지 모두 일으켜서 이고 지게 하면서 대군의 후미를 쫓게 한 것은 형장에 죽도록 독촉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과 밤으로 오직 바라는 것은 이 왜적들을 탕멸하여 그 부형과 처자의 원수를 갚고 다시 살리는 기약을 얻고자 할 뿐이니 그 마음이 극히 가련합니다. 만약 시일을 질질 끌게 되면 명령을 쫓는 데에 지쳐서 금년의 농사 또한 밭 갈고 씨 뿌릴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니 재화와 곡식이 바닥나서 공사(公私)가 텅 비어 형세상 흩어지지 않으면 썩어서 문드러지게 될 뿐입니다. 또한 대군이 주둔하든 행군하든 노고와 비용은 같으니 앉아서 군대를 늙어 가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군량이라도 다한다면, 진실로 아홉 길을 쌓은 공로가 도리어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실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주 001
각주 001)

삼가 생각하기를 귀부께서 성천자의 밝은 명령을 공경히 받들어서 경략을 오로지 맡으셨으니 완급과 이해가 있는 바를 살피셔서 가엽게 여기고 속히 도모해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당직이 소방의 지리(地利)를 다시 살펴보니 요동(遼東)이나 계주(薊州)와는 같지 않아서 산이 많고 들은 적은데다 논과 밭이 뒤섞여 있어 철기가 나란히 달려와서 장기(長技)를 펼치기 어려우니,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이른 바의 “보병은 험한 곳에서 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 왜적은 보병 전투를 잘하므로 상국의 남병이야말로 교전하기에 가장 적합하니, 군사를 써서 적을 제압하는 것은 각기 마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번거로이 바라옵건대 귀부께서 이미 조발한 남방의 포수(炮手) 가운데 계주진(薊州鎭)과 천진위(天津衛)에 있는 약간의 병력을 더 뽑아내어 밤을 새워 와서 독부의 대군과 더불어 세력을 합쳐 동쪽으로 내려가게 한다면 얼이 빠진 왜적들은 반드시 앞다투어 도망할 것이니 완전한 승리의 공업을 하루아침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신속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기를 쉽게 놓쳐서 저 흉악하고 교활한 왜적이 간모를 만들어 춘신(春迅)의 바람이 편한 때를 타고 병력을 더하여 잇달아 원조해 오게 된다면, 나중에 혹 귀부의 걱정거리가 됨이 오늘보다 더 심할 것이며 소방의 군신은 장차 어디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사세는 급박하고 정형은 곤궁하여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서둘러 이길 만한 계책으로 이끌어 주시어 이로써 대사를 완수해 주십시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밝게 살펴 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논어(論語)』 자한(子罕) 편의 “비유하면 산을 만듦에 마지막 흙 한 삼태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서 중지함도 내가 중지하는 것이며, 비유하면 평지에 흙 한 삼태기를 처음 쏟아 붓더라도 나아감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譬如爲山 未成一簣 止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吾往也)”라는 문구에서 유래하는 표현이다. 공자가 『서경(書經)』 여오(旅獒)에 “산을 아홉 길 만드는데, 공이 흙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진다.(爲山九仞 功虧一簣)”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九仞之功 反失於一蕢’는 ‘九仞之功 虧於一簣’이라고도 쓰는데 ‘九仞 功虧一簣’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九仞功虧一簣’는 “높이가 구인(九仞)이 되는 산을 쌓는 데에 최후의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仞’은 대략 8척을 의미하며 ‘九仞’은 ‘자못 높다’는 의미로, ‘九仞之功’은 곧 ‘높은 공로’라는 의미도 된다. 오래 쌓은 공로가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실패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이 자문을 행병부에 보냅니다.
만력 21년 3월 5일.
-
각주 001)
『논어(論語)』 자한(子罕) 편의 “비유하면 산을 만듦에 마지막 흙 한 삼태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서 중지함도 내가 중지하는 것이며, 비유하면 평지에 흙 한 삼태기를 처음 쏟아 붓더라도 나아감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譬如爲山 未成一簣 止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吾往也)”라는 문구에서 유래하는 표현이다. 공자가 『서경(書經)』 여오(旅獒)에 “산을 아홉 길 만드는데, 공이 흙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진다.(爲山九仞 功虧一簣)”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九仞之功 反失於一蕢’는 ‘九仞之功 虧於一簣’이라고도 쓰는데 ‘九仞 功虧一簣’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九仞功虧一簣’는 “높이가 구인(九仞)이 되는 산을 쌓는 데에 최후의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仞’은 대략 8척을 의미하며 ‘九仞’은 ‘자못 높다’는 의미로, ‘九仞之功’은 곧 ‘높은 공로’라는 의미도 된다. 오래 쌓은 공로가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실패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