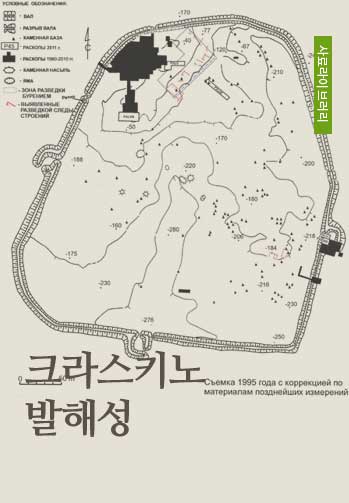16) 명문 토기
크라스키노성에서 한자 명문이 새겨진 혹은 한자를 연상시키는 기호가 새겨진 토기편들이 종종 발견되었다. 드물게는 양각으로 표현된 것도 있다. 일부는 판독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판독되지 못하였다. 발견된 순서대로 명문 토기를 소개한다.
1994년에는 제9구역의 전각지에서 출토된 토기 동체부편 1점에 한자가 새겨진 것이 확인되었으나 판독이 되지 못하였다(도면 966, 1).

도면 966 | 크라스키노성 출토 명문 토기편: 1-제9구역 전각지 데-14방안(1994-도69), 2-제15구역 제2인공층 제`-7방안(1997-도35, 2), 3-제21구역 제2인공층 에르-7방안(1999-도50), 4-제21구역 제4인공층 붸-4방안(1999-도76, 3), 5-제27구역 제5인공층 붸-6방안 (2001-도118), 6~11-제34구역(2007-도212), 12-제40구역 제2인공층 예-7방안(2008-도317,318), 13-제41구역 동쪽구역 8호 주거지(2008-도208, 4), 14-제41구역 8호 주거지 까-3방안(2008-도445)
1997년에는 제15구역에서 명문 토기 동체부편이 1점 출토되었다(도면 966, 2).
1999년에는 제21구역에서는 ‘女’자가 새겨진 토기 동체부편 1점(도면 966, 3)과 판독이 되지 않은 다른 명문 토기 동체부편 1점(도면 966, 4)이 각각 출토되었다.
2001년에는 제27구역에서 ‘木’자가 새겨진 말갈계 심발형 토기 구연부편이 1점 출토되었다(도면 966, 5).
2007년에는 제34구역에서 한자를 연상시키는 부조 기호가 있는 토기 저부편들이 출토되었는데 판독이 힘들다(도면 966, 6~11).
2008년에 제40구역에서 출토된 암회색의 토기 동체부편에 ‘日’자를 연상시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도면 966, 12).
2008년에 제41구역 8호 주거지에서 명문의 일부만 남은 토기 동체부편이 1점 출토되었다. 회갈색의 토기 외면에 짧게 그은 2개의 줄이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명문의 일부로 생각된다(도면 966, 13).
2008년에 제41구역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 아랫부분에 ‘道隆弘知’라는 4글자로 된 한자 명문이 있다(도면 966, 14). 도륭은 조금 크게 왼쪽에 위에서 아래로, 홍지는 조금 작게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각각 썼다. 여기에서 도륭(道隆)은 ‘도가 융성하다’ 혹은 ‘도를 융성하게 한다’라는 뜻이며, 승려의 이름 혹은 사찰의 이름으로 사용된 예들도 보인다고 한다. 일반인의 이름으로 사용된 예도 있지만, 그 경우 성이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승려 이름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홍지(弘知)는 ‘지혜를 넓힌다’ 혹은 ‘넓은 지혜’라는 뜻이며, 승려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륭과 홍지가 『속고승전』 등 불교경전에서 주로 그 예를 찾을 수 있어 불교와 관련된 용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도륭과 홍지가 승려 이름일 경우 현재 이 두 명칭이 일본 인명으로 쓰이고 있어 일본의 승려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해를 거쳐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 승려는 계융(戒融)만 알려져 있어 그들이 반드시 일본의 승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향후 추가 자료가 기대된다.
이 명문이 있는 토기 아랫부분은 기저부와 바닥에 해당한다. 명문은 토기가 완전히 소성되고 난 다음에 쓴 것이다. 이 토기는 원래 입이 좁은 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따라서 이 토기가 아직 깨어지기 전에는 글을 쓰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토기가 깨어진 다음에 글을 썼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 토기 아랫부분은 옹이 아닌 입이 넓은 동이의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직 이 토기가 사용 중일 때에 글을 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토기의 크기는 저경이 13㎝, 잔존 높이가 8.4㎝이다. 표면은 암회색이다.
2009년에는 제40구역에서 명문 혹은 기호가 새겨진 4점의 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1점은 흑색의 기면에 엇갈리게 선들을 그은 것인데 어떤 글자인지 혹은 기호인지 파악이 힘들다(도면 967, 1). 다른 1점은 흑색의 기면에 글자를 새긴 것이다(도면 967, 2). 이 글자는 ‘武’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사실 알 수가 없다. 다른 1점은 암회색의 토기 어깨 부분에 한자를 새긴 것이다. 일부만 남아 있어 어떤 글자인지는 알 수 없다(도면 967, 3). 나머지 1점은 도면이나 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도면 967 | 크라스키노성 출토 명문 토기편: 1-제40구역 제6인공층 붸-19방안(2009-도160,161), 2-제40구역 제8인공층 예-19방안(2009-도228,229), 3-제40구역 제8인공층 베,붸-15,16방안(2009-도238), 4-제48구역 제2인공층 제-36방안(2011-도375), 5-제48구역 제2인공층 제-36방안(2011-도376), 6-제47구역 제13인공층 붸-23방안(2014-도688), 7-제47구역 제13인공층 게-28방안(2014-도689), 8-제47구역 2섹터 제6인공층 붸-20방안 (2015-도316), 9-제47구역 2섹터 붸-12방안(2015-도408), 10-제47구역 2섹터 제12인공층 아-15방안(2015-도518), 11-제51구역 제4인공층 데-7방안(2017-도82), 12-제51구역 제4인공층 데-9방안(2017-도86), 13-제48구역 동쪽섹터 주거지 이-27방안(2018-도48)
2011년에는 제48구역에서 글자를 연상시키는 새김 기호가 있는 2점의 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도면 967, 4). 그중의 1점은 잔존하는 기호 부분이 ‘十’자 모양이다(도면 967, 5).
2014년에는 제47구역에서 2점의 명문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중의 1점은 갈색의 동체부편이다. 토기편의 크기는 6.1×4.3㎝, 두께는 0.9㎝이다. 명문은 토기를 소성하기 전에 새긴 것이다(도면 967, 6). 어떤 글자인지 판독이 되지 않는다. 다른 1점은 회색 병의 목 부분에 새겨 놓은 것이다. 이 경부편은 높이 8.1㎝가 잔존한다. 경경은 6.3㎝이며, 기벽의 두께는 0.7~0.8㎝이다. 토기를 소성한 다음에 ‘木’자를 새겼다(도면 967, 7).
2015년에 제47구역에서 출토된 토기 동체부편 1점에는 토기 소성 전에 새긴 한자 하나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아랫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동체부편의 크기는 12.5×5.6㎝이고, 두께는 1㎝이다. 한자의 일부 구성 요소들은 확인되나 전체 글자는 파악되지 않는다(도면 967, 8).
2015년에 제47구역에서 출토된 다른 작은 암회색 토기 동체부편에는 ‘十’자 모양의 기호가 새겨져 있다. 소성 후에 새긴 것이다(도면 967, 9).
2015년에 제47구역에서 출토된 다른 작은 토기 동체부편에는 ‘日’자를 연상시키는 글자가 있다(도면 967, 10).
2017년에 제51구역에서 출토된 토기 저부편의 바깥 바닥에는 글자를 새긴 것 같은 기호가 있는데 판독이 되지 않는다(도면 967, 11).
2017년에 제51구역에서 출토된 토기 저부편에는 바깥 바닥에 ‘日’자를 닮은 글을 새겨 놓았다. 이 토기 저부편는 저경이 5.5㎝, 바닥 두께가 0.5~0.6㎝이다. 속심은 명회색, 표면은 암회색이다(도면 967, 12).
2018년에 제48구역 2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적갈색 토기 동체부편에는 토기를 소성하기 전에 새긴 한자 명문의 일부가 남아 있다. 토기편의 크기는 4.9×4.6×0.5㎝이다(도면 96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