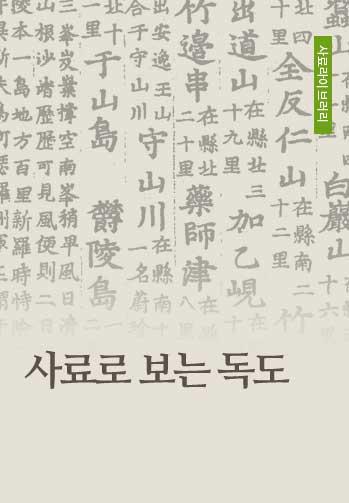새 땅의 소재를 찾아보도록 함길도 관찰사·도절제사에게 전지하다
사료해설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외에 요도(蓼島)라는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세종은 함경도 감사에게 요도에 관해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명한다. 세종은 요도의 존재할 것으로 보고, “이 새 땅은 우리 강역(疆域) 안에 있는 것이니 더욱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상을 걸고라도 요도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정부의 영토의식 및 동해에 관한 관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원문
○戊申/傳旨咸吉道觀察使、都節制使:
道內有新地事, 喧傳已有年矣, 親說者亦非一二計也。 豈無自而然哉! 想必有其實也。 然差人尋訪, 又非一再, 而猶未得焉。 載籍前史, 漢武帝拜張騫爲中郞將, 齎金帛直數千巨萬, 至烏孫。 久之, 未得其要, 因遣副使於大宛、康居、大月氏、大夏、安息、身毒、于闐及諸傍國。 烏孫送騫還, 使數十人、馬數十匹隨騫報謝。 是歲, 騫還到後, 所遣通大夏之屬者, 皆頗與其人俱來。 於是, 西域始通於漢矣。 唐太宗廣求王右軍蘭亭眞跡, 聞僧辨才寶藏, 召至長安, 密爲畫策, 求索未得, 辨才托疾還山。 御史蕭翼承密旨, 携二王書法, 微服至湘潭, 隨客船至越之永欣寺, 過辨才院, 辨才迎入相話。 因此踰月相從, 情甚相得, 談論翰墨, 仍示二王書法, 辨才熟視曰: “是則是矣, 非得意書也。” 取出梁山匣內蘭亭書法示之。 後翼伺辨才之出, 潛往撤關取蘭亭, 驛馳以進。 太宗大悅, 擢翼爲員外郞。 前日於江原道武陵島搜訪之時, 皆曰: “未知在處。” 後曹敏等尋得蒙賞。 乃於蓼島看望時, 聞曹敏之事, 而亦或有自望求覓者矣。 以此觀之, 凡其土地書籍, 尋訪亦甚難矣。 必誠心求之, 然後乃得之, 天下古今之常事也。 得之與否, 在於求之誠不誠如何耳。 今新地之事, 亦類此也。 若無其實, 則傳之者何若是之久, 而說之者何若是之多歟? 況此新地, 在吾域中, 尤不可不知, 求之以誠, 必有得之之理也。 卿其知悉, 境內古老人及事知各人等處, 或懸賞以問之, 或開說以訊之, 多方計畫, 廣行咨訪以聞。
道內有新地事, 喧傳已有年矣, 親說者亦非一二計也。 豈無自而然哉! 想必有其實也。 然差人尋訪, 又非一再, 而猶未得焉。 載籍前史, 漢武帝拜張騫爲中郞將, 齎金帛直數千巨萬, 至烏孫。 久之, 未得其要, 因遣副使於大宛、康居、大月氏、大夏、安息、身毒、于闐及諸傍國。 烏孫送騫還, 使數十人、馬數十匹隨騫報謝。 是歲, 騫還到後, 所遣通大夏之屬者, 皆頗與其人俱來。 於是, 西域始通於漢矣。 唐太宗廣求王右軍蘭亭眞跡, 聞僧辨才寶藏, 召至長安, 密爲畫策, 求索未得, 辨才托疾還山。 御史蕭翼承密旨, 携二王書法, 微服至湘潭, 隨客船至越之永欣寺, 過辨才院, 辨才迎入相話。 因此踰月相從, 情甚相得, 談論翰墨, 仍示二王書法, 辨才熟視曰: “是則是矣, 非得意書也。” 取出梁山匣內蘭亭書法示之。 後翼伺辨才之出, 潛往撤關取蘭亭, 驛馳以進。 太宗大悅, 擢翼爲員外郞。 前日於江原道武陵島搜訪之時, 皆曰: “未知在處。” 後曹敏等尋得蒙賞。 乃於蓼島看望時, 聞曹敏之事, 而亦或有自望求覓者矣。 以此觀之, 凡其土地書籍, 尋訪亦甚難矣。 必誠心求之, 然後乃得之, 天下古今之常事也。 得之與否, 在於求之誠不誠如何耳。 今新地之事, 亦類此也。 若無其實, 則傳之者何若是之久, 而說之者何若是之多歟? 況此新地, 在吾域中, 尤不可不知, 求之以誠, 必有得之之理也。 卿其知悉, 境內古老人及事知各人等處, 或懸賞以問之, 或開說以訊之, 多方計畫, 廣行咨訪以聞。
번역문
함길도 관찰사·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道內)에 새 땅이 있다는 일은 떠들썩하게 전하여진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고, 친히 말하는 자도 역시 한둘로 계산할 수 없었으니, 어찌 그 까닭이 없이 그러했겠는가. 생각하건대, 그 실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였다.
예전 역사 기록에는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장건(張騫)을 중랑장(中郞將)으로 제수하여 삼고 금과 비단 수천 만어치를 싸 가지고 오손(烏孫)에 도착하였으나, 오래 되도록 요령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서 부사(副使)를 대완(大宛)·강거(康居)·대월씨(大月氏)·대하(大夏)·안식(安息)·신독(身毒)·우전(于闐)과 여러 이웃나라에 보냈었다. 오손에서 건(騫)을 보내어 돌아가게 하는데 사자(使者) 수십 인과 말 수십 필이 건을 따라 보답하는 사례를 하였다. 이 해 건이 돌아와 도착한 뒤에 대하(大夏) 등지에 보냈던 자들이 모두 꽤 많은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왔다. 그래서 서역(西域)이 처음으로 한(漢)나라에 통하게 되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왕우군(王右軍)의 난정(蘭亭) 진적(眞跡)을 널리 구(求)하였는데, 중[僧] 변재(辨才)가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장안(長安)에 불러다가 비밀히 계책을 짜 가지고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변재는 병(病)을 칭탁하고 산으로 돌아갔다. 어사(御史) 소익(蕭翼)이 밀지(密旨)를 받고 이왕(二王)의 서법(書法)을 가지고 미복(微服)으로 상담(湘潭)에 이르러 객선(客船)을 타고서 월(越)의 영흔사(永欣寺)에 도착하여 변재가 있는 원(院)을 심방(尋訪)하니, 변재가 맞아들여 서로 담화(談話)하였다. 이로 인하여 달[月]이 지나도록 상종(相從)하면서 우정이 매우 깊게 되었다. 글과 글씨[翰墨]를 담론(談論)하다가 이왕(二王)의 글씨[書法]를 내어 보이니, 변재가 자세히 보고서 말하기를, ‘옳기는 옳지마는 득의(得意)의 글씨는 아니다.’ 하고, 대들보 위에 있는 갑(匣)속에서 난정(蘭亭) 글씨를 꺼내어 보이었다. 뒤에 익(翼)이 변재가 나간 틈을 타서 가만히 가서 잠근 것을 뜯고 난정 글씨를 꺼내어 가지고 역마(驛馬)로 달려서 이를 바치니, 태종이 매우 기뻐하여 익을 발탁하여 원외랑(員外郞)을 삼았다.
지난날 강원도의 무릉도(武陵島)를 찾으려고 할 때에 모두 말하기를,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고 하였는데, 뒤에 조민(曹敏) 등이 이를 찾아내어 상(賞)을 탔다. 요도(蓼島)에서 바라볼 때에 조민의 일을 듣고서, 역시 제 스스로 찾겠다고 희망하는 자가 간혹 있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무릇 토지(土地)나 서적(書籍)을 찾아낸다는 것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반드시 성심(誠心)으로 구(求)한 연후에야 얻게 되는 것이 천하 고금(天下古今)의 상사(常事)이니, 그것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데에 있어 정성 여하(如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새 땅의 일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니, 만약 그 실지가 없는 것이라면 전(傳)하는 것이 어찌 이 같이 오랠 것이며, 말하는 자가 어찌 이같이 많겠는가. 하물며 이 새 땅은 우리 강역(疆域) 안에 있는 것이니 더욱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구하기를 성심으로 하면 반드시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은 이를 알아서 경내(境內)의 고로인(古老人)과 일을 아는 각 사람 등에게 현상(懸賞)하여 묻기도 하고, 혹은 설명하여 묻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로 계획하여 널리 탐방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도내(道內)에 새 땅이 있다는 일은 떠들썩하게 전하여진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고, 친히 말하는 자도 역시 한둘로 계산할 수 없었으니, 어찌 그 까닭이 없이 그러했겠는가. 생각하건대, 그 실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였다.
예전 역사 기록에는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장건(張騫)을 중랑장(中郞將)으로 제수하여 삼고 금과 비단 수천 만어치를 싸 가지고 오손(烏孫)에 도착하였으나, 오래 되도록 요령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서 부사(副使)를 대완(大宛)·강거(康居)·대월씨(大月氏)·대하(大夏)·안식(安息)·신독(身毒)·우전(于闐)과 여러 이웃나라에 보냈었다. 오손에서 건(騫)을 보내어 돌아가게 하는데 사자(使者) 수십 인과 말 수십 필이 건을 따라 보답하는 사례를 하였다. 이 해 건이 돌아와 도착한 뒤에 대하(大夏) 등지에 보냈던 자들이 모두 꽤 많은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왔다. 그래서 서역(西域)이 처음으로 한(漢)나라에 통하게 되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왕우군(王右軍)의 난정(蘭亭) 진적(眞跡)을 널리 구(求)하였는데, 중[僧] 변재(辨才)가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장안(長安)에 불러다가 비밀히 계책을 짜 가지고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변재는 병(病)을 칭탁하고 산으로 돌아갔다. 어사(御史) 소익(蕭翼)이 밀지(密旨)를 받고 이왕(二王)의 서법(書法)을 가지고 미복(微服)으로 상담(湘潭)에 이르러 객선(客船)을 타고서 월(越)의 영흔사(永欣寺)에 도착하여 변재가 있는 원(院)을 심방(尋訪)하니, 변재가 맞아들여 서로 담화(談話)하였다. 이로 인하여 달[月]이 지나도록 상종(相從)하면서 우정이 매우 깊게 되었다. 글과 글씨[翰墨]를 담론(談論)하다가 이왕(二王)의 글씨[書法]를 내어 보이니, 변재가 자세히 보고서 말하기를, ‘옳기는 옳지마는 득의(得意)의 글씨는 아니다.’ 하고, 대들보 위에 있는 갑(匣)속에서 난정(蘭亭) 글씨를 꺼내어 보이었다. 뒤에 익(翼)이 변재가 나간 틈을 타서 가만히 가서 잠근 것을 뜯고 난정 글씨를 꺼내어 가지고 역마(驛馬)로 달려서 이를 바치니, 태종이 매우 기뻐하여 익을 발탁하여 원외랑(員外郞)을 삼았다.
지난날 강원도의 무릉도(武陵島)를 찾으려고 할 때에 모두 말하기를,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 ’고 하였는데, 뒤에 조민(曹敏) 등이 이를 찾아내어 상(賞)을 탔다. 요도(蓼島)에서 바라볼 때에 조민의 일을 듣고서, 역시 제 스스로 찾겠다고 희망하는 자가 간혹 있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무릇 토지(土地)나 서적(書籍)을 찾아낸다는 것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반드시 성심(誠心)으로 구(求)한 연후에야 얻게 되는 것이 천하 고금(天下古今)의 상사(常事)이니, 그것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데에 있어 정성 여하(如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새 땅의 일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니, 만약 그 실지가 없는 것이라면 전(傳)하는 것이 어찌 이 같이 오랠 것이며, 말하는 자가 어찌 이같이 많겠는가. 하물며 이 새 땅은 우리 강역(疆域) 안에 있는 것이니 더욱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구하기를 성심으로 하면 반드시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은 이를 알아서 경내(境內)의 고로인(古老人)과 일을 아는 각 사람 등에게 현상(懸賞)하여 묻기도 하고, 혹은 설명하여 묻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로 계획하여 널리 탐방하여서 아뢰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