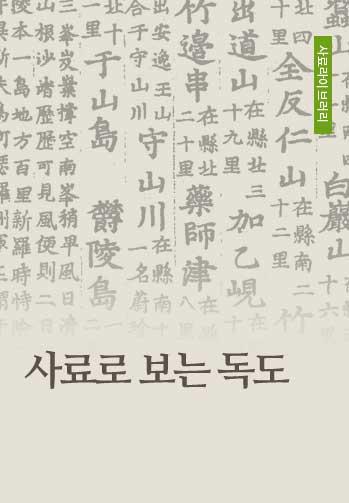유수강이 영동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조목을 갖추어 상언하다
사료해설
조정에서 우산도(牛山島; 독도)와 무릉도(茂陵島; 울릉도)의 두 섬에 현읍(縣邑)을 설치할 것을 논의한 내용이다. 조정의 논의는 두 섬은 물산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이 거주할 수 있으니 현읍(縣邑)을 설치할 것과 두 섬이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다 가운데의 고도(孤島)에 읍(邑)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어렵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국 두 섬에 병선(兵船)이 쉽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하되, 섬에 몰래 들어간 사람은 쇄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조선정부가 쇄환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울릉도 일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한 사실을 보여준다.
원문
○初, 前中樞院副使柳守剛上書言:
臣嘗任江陵府, 於嶺東防禦之事, 耳聞目擊, 謹條陳。 一, 本道都節制使營及三陟、杆城鎭, 但口傳軍士二三人赴防, 巨鎭踈虞。 且三陟、蔚珍, 相距遙隔, 故於中間沃原驛築城, 以驛丞兼差千戶之任, 然不置守城軍卒, 有名無實。 請自今諸邑軍士, 依咸吉道安邊以北軍士例, 勿屬侍衛牌及加定軍, 以閑良通政未滿六十以下及下番甲士、別侍衛、銃筒衛、防牌六十歲, 自募學生人等試才, 分屬都節制使營及三陟、杆城、沃原等諸鎭, 其中自募赴防, 滿三十朔者, 除散官職, 以實防禦, 其上京侍衛牌未充者, 以京畿、忠淸兩道加定軍充數。 一, 江陵連谷浦海口, 水淺石露, 其餘諸浦海口, 亦皆塡沙成岸, 脫有事變, 兵船出海及期應敵爲難。 江陵安仁浦內淵闊, 可以多泊兵船, 且距十餘里地, 人民密居, 防禦似緊, 而無兵船。 連谷浦在四十餘里, 三陟浦在一百四十里, 相距不遠, 請革此兩浦, 合安仁浦, 以江陵船軍屬之, 使防禦便易, 無裹糧之弊。 又罷塡沙諸浦兵船, 依平安道口子例, 木柵石堡漸次造築, 其沿邊草人亦使撤去, 使其萬戶陸地防禦。 一, 本道之兵, 非但本道防禦, 儻有北門之變, 先爲赴援, 而不別置都節制使, 以觀察使兼之。 設使觀察使在嶺西, 而嶺東有變, 則及期救援無由。 且都節使營在江陵, 窄狹頹毁, 軍器衣甲與火藥雜置, 不特火災可畏, 造作年久, 日漸蠧損, 將爲無用, 請分授諸鎭軍士, 令漸次修補, 又別設都節制使, 巡行諸邑, 整點兵器, 以固防禦。 一, 江陵人言, ‘牛山、茂陵兩島可以設邑, 其物産之富、財用之饒, 如楮木、苧桑、大竹、海竹、魚膠木、冬栢木、栢子木、梨木、柿木、鴉鶻、黑色山鳩、海衣、鰒魚、文魚、海獺等物, 無不有之, 土地膏腴, 禾穀十倍他地。 東西南北相距各五十餘里, 可以居民, 四面險阻, 壁立千仞, 而亦有泊船處。 水路則自三陟距島, 西風直吹, 則丑時發船, 亥時到泊, 風微用櫓, 則一晝一夜可到, 無風用櫓亦二日一夜可到。’ 伏望設縣邑, 擇人守之。”
命兵曹議之, 兵曹啓: “第一條, 江原道都節制使本營, 三陟、杆城、沃原諸鎭防禦事及侍衛牌移定等事, 則咸吉道軍士本不番上, 乃於本道赴防, 故雖當番休之時, 亦令輪次赴防, 江原道別侍衛甲士, 則皆京中番上, 不可依咸吉道例, 番休時又令赴防。 且本道防禦, 視他道不緊, 其赴防自募人散官職除授, 至爲猥濫, 而移定本道侍衛牌於京畿、忠淸道, 亦爲不可。 第二條, 塡沙諸浦兵船革罷, 木柵、石堡造築, 草人(撒)〔撤〕去等事內, 草人則非却敵之器, 撤去爲便。 其諸浦, 則當時雖無邊警, 事變之來, 亦所難測, 未可只以浦口塡沙, 遽罷兵船。 第三條, 軍器分授軍士修補, 都節制使巡行修整等事, 以軍器散授軍士, 不合事體, 觀察使之兼任節制使, 行之已久, 別無巨弊, 不須別設。 第四條, 牛山、茂陵兩島縣邑設置事, 兩島水路險遠, 往來甚難, 海中孤島設邑, 持守亦難。 其上項條件, 幷勿擧行。 但本道人民, 不無流寓兩島之弊, 請待風和時, 遣朝官刷還, 其塡沙諸浦內兵船, 專未出入處, 令其道觀察使審度移泊處, 以啓。” 從之。 但兩島流寓者, 勿令刷還。
臣嘗任江陵府, 於嶺東防禦之事, 耳聞目擊, 謹條陳。 一, 本道都節制使營及三陟、杆城鎭, 但口傳軍士二三人赴防, 巨鎭踈虞。 且三陟、蔚珍, 相距遙隔, 故於中間沃原驛築城, 以驛丞兼差千戶之任, 然不置守城軍卒, 有名無實。 請自今諸邑軍士, 依咸吉道安邊以北軍士例, 勿屬侍衛牌及加定軍, 以閑良通政未滿六十以下及下番甲士、別侍衛、銃筒衛、防牌六十歲, 自募學生人等試才, 分屬都節制使營及三陟、杆城、沃原等諸鎭, 其中自募赴防, 滿三十朔者, 除散官職, 以實防禦, 其上京侍衛牌未充者, 以京畿、忠淸兩道加定軍充數。 一, 江陵連谷浦海口, 水淺石露, 其餘諸浦海口, 亦皆塡沙成岸, 脫有事變, 兵船出海及期應敵爲難。 江陵安仁浦內淵闊, 可以多泊兵船, 且距十餘里地, 人民密居, 防禦似緊, 而無兵船。 連谷浦在四十餘里, 三陟浦在一百四十里, 相距不遠, 請革此兩浦, 合安仁浦, 以江陵船軍屬之, 使防禦便易, 無裹糧之弊。 又罷塡沙諸浦兵船, 依平安道口子例, 木柵石堡漸次造築, 其沿邊草人亦使撤去, 使其萬戶陸地防禦。 一, 本道之兵, 非但本道防禦, 儻有北門之變, 先爲赴援, 而不別置都節制使, 以觀察使兼之。 設使觀察使在嶺西, 而嶺東有變, 則及期救援無由。 且都節使營在江陵, 窄狹頹毁, 軍器衣甲與火藥雜置, 不特火災可畏, 造作年久, 日漸蠧損, 將爲無用, 請分授諸鎭軍士, 令漸次修補, 又別設都節制使, 巡行諸邑, 整點兵器, 以固防禦。 一, 江陵人言, ‘牛山、茂陵兩島可以設邑, 其物産之富、財用之饒, 如楮木、苧桑、大竹、海竹、魚膠木、冬栢木、栢子木、梨木、柿木、鴉鶻、黑色山鳩、海衣、鰒魚、文魚、海獺等物, 無不有之, 土地膏腴, 禾穀十倍他地。 東西南北相距各五十餘里, 可以居民, 四面險阻, 壁立千仞, 而亦有泊船處。 水路則自三陟距島, 西風直吹, 則丑時發船, 亥時到泊, 風微用櫓, 則一晝一夜可到, 無風用櫓亦二日一夜可到。’ 伏望設縣邑, 擇人守之。”
命兵曹議之, 兵曹啓: “第一條, 江原道都節制使本營, 三陟、杆城、沃原諸鎭防禦事及侍衛牌移定等事, 則咸吉道軍士本不番上, 乃於本道赴防, 故雖當番休之時, 亦令輪次赴防, 江原道別侍衛甲士, 則皆京中番上, 不可依咸吉道例, 番休時又令赴防。 且本道防禦, 視他道不緊, 其赴防自募人散官職除授, 至爲猥濫, 而移定本道侍衛牌於京畿、忠淸道, 亦爲不可。 第二條, 塡沙諸浦兵船革罷, 木柵、石堡造築, 草人(撒)〔撤〕去等事內, 草人則非却敵之器, 撤去爲便。 其諸浦, 則當時雖無邊警, 事變之來, 亦所難測, 未可只以浦口塡沙, 遽罷兵船。 第三條, 軍器分授軍士修補, 都節制使巡行修整等事, 以軍器散授軍士, 不合事體, 觀察使之兼任節制使, 行之已久, 別無巨弊, 不須別設。 第四條, 牛山、茂陵兩島縣邑設置事, 兩島水路險遠, 往來甚難, 海中孤島設邑, 持守亦難。 其上項條件, 幷勿擧行。 但本道人民, 不無流寓兩島之弊, 請待風和時, 遣朝官刷還, 其塡沙諸浦內兵船, 專未出入處, 令其道觀察使審度移泊處, 以啓。” 從之。 但兩島流寓者, 勿令刷還。
번역문
처음에 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유수강(柳守剛)이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신(臣)은 일찍이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재임(在任)했으므로 영동(嶺東)의 방어(防禦)하는 일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삼가 조목별로 진술하겠습니다.
1. 본도(本道)의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 및 삼척(三陟)과 간성진(杆城鎭)은 다만 구전(口傳) 2, 3인만이 부방(赴防)했을 뿐이므로, 거진(巨鎭)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또 삼척(三陟)과 울진(蔚珍)은 서로 떨어지기가 멀리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중간의 옥원역(沃原驛)에 성(城)을 쌓고는 역승(驛丞)을 가지고 천호(千戶)의 임무를 겸임(兼任)시켰지마는, 그러나 성을 지키는 군졸을 두지 않으니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여러 고을의 군사를 함길도(咸吉道) 안변(安邊) 이북 지방 군사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위패(侍衛牌) 및 가정군(加定軍)에 소속시키지 말고, 한량(閑良)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 이하와 하번(下番)한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의 60세와 자모(自募)한 학생인(學生人) 등으로써 재주를 시험하되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 및 삼척(三陟)·간성(杆城)·옥원(沃原) 등의 여러 진(鎭)에 분속(分屬)시키게 하고, 그 중에 자모(自募)하여 부방(赴防)한 자로 30개월이 된 사람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여 방어(防禦)에 채우게 하고, 그 서울에 올라온 시위패(侍衛牌)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 두 도(道)의 가정군(加定軍)으로 수효를 채우게 하소서.
1. 강릉(江陵) 연곡포(連谷浦)의 해구(海口)는 물이 얕아서 돌이 노출(露出)되고, 그 나머지 여러 포(浦)의 해구(海口)도 또한 모두 모래가 메어져 언덕을 이루었으니, 혹시 사변(事變)이 있으면 병선(兵船)이 바다에 나와서 시기에 미치어 적(敵)에게 응전(應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는 안이 깊고 넓어서 병선을 많이 정박(停泊)시킬 수가 있으며, 또 거리가 10여 리(里) 땅에 있고, 인민(人民)이 조밀(租密)하게 거주하므로 방어가 긴요한 듯한데도 병선이 없습니다. 연곡포(連谷浦)는 40여 리(里)에 있고, 삼척포(三陟浦)는 1백 40리(里)에 있으므로 거리가 서로 멀지 않으니, 청컨대 두 포(浦)를 혁파(革罷)하여 안인포(安仁浦)에 합치고, 강릉(江陵)의 선군(船軍)을 가지고 이에 속하게 해서 방어(防禦)가 편이(便易)하도록 하여 양식을 싸 가지고 오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을 파(罷)하고, 평안도구자(平安道口子)의 예(例)에 의거하여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점차로 축조(築造)하도록 하고, 그 연변(沿邊)의 초인(草人)도 또한 철거(撤去)하도록 하고, 그 만호(萬戶)로 하여금 육지에서 방어하게 하소서.
1. 본도(本道)의 군사는 다만 본도의 방어(防禦)뿐만 아니라, 혹시 북문(北門)의 사변(事變)이 있으면 먼저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인데도 별도로 도절제사(都節制使)를 두지 않고 관찰사(觀察使)를 가지고 이를 겸무(兼務)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사 관찰사가 영서(嶺西)에 있어도 영동(嶺東)에 사변이 있으면 시기에 미치어 구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이 강릉(江陵)에 있는데 협착하고 무너졌으며, 군기(軍器)와 갑옷과 화약(火藥)을 뒤섞어 두었으니, 다만 화재가 두려울 뿐 아니라, 만들어 둔 해가 오래 되어 날로 점차 좀이 먹고 상하여서 장차는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니, 청컨대 여러 진(鎭)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점차로 보수(補修)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설치하여 여러 고을을 순행(巡行)하면서 병기(兵器)를 점검(點檢)하고 정비(整備)하도록 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소서.
1. 강릉(江陵) 사람의 말에, ‘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는 읍(邑)을 설치할 만하니, 그 물산(物産)의 풍부함과 재용(財用)의 넉넉함은, 저목(楮木)·저상(苧桑)·대죽(大竹)·해죽(海竹)·어교목(魚膠木)·동백목(冬栢木)·백자목(栢子木)·이목(梨木)·시목(柹木)과, 아골(鴉鶻)·흑색 산구(黑色山鳩)·해의(海衣)·복어(鰒魚)·문어(文魚)·해달(海獺) 등의 물건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화곡(禾穀)의 생산이 다른 지방보다 10배나 된다. 동·서·남·북이 상거(相距)가 각각 50여 리(里)나 되니 백성이 거주할 수가 있으며, 사면(四面)이 험조(險阻)하여 절벽(絶壁)이 천 길이나 서 있는데도 또한 배를 정박(停泊)할 곳이 있다. 수로(水路)는 삼척(三陟)에서 섬에 이르는 데 서풍(西風)이 곧바로 불어온다면 축시(丑時)에 배가 출발하여 해시(亥時)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살살 불어도 노(櫓)를 사용한다면 하루 낮 하루 밤에 도착할 수가 있으며, 바람이 없어도 노를 사용한다면 또한 두 낮 하루 밤이면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현읍(縣邑)을 설치하여 사람을 골라서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제1조. 강원도 도절제사(江原道都節制使)의 본영(本營)과 삼척(三陟)·간성(杆城)·옥원(沃原) 등 여러 진(鎭)의 방어(防禦)하는 일과 시위패(侍衛牌)를 이정(移定)하는 등의 일은, 함길도(咸吉道)의 군사는 본디부터 번상(番上)하지 않으며, 곧 본도(本道)에서 부방(赴防)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번(番)을 쉴 때를 당하더라도 또한 윤차(輪次)로 부방하도록 하며, 강원도(江原道)의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는 모두 경중(京中)에 번상(番上)하게 되니, 함길도(咸吉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번(番)을 쉴 때에도 또한 부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본도(本道)의 방어(防禦)는 다른 도(道)에 비해서 긴요하지 않으니, 그 부방(赴防)을 자모(自募)하는 사람에게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된 일이며, 본도(本道)의 시위패(侍衛牌)를 경기(京畿)와 충청도(忠淸道)에 이정(移定)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제2조.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兵船)을 혁파(革罷)하고,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축조(築造)하고, 초인(草人)을 철거(撤去)하는 등의 일 속에서 초인(草人)은 적군(敵軍)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니 철거(撤去)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 여러 포(浦)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사변(事變)이 닥쳐 오는 것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兵船)을 혁파(革罷)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3조. 군기(軍器)를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수(補修)하고,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순행(巡行)하면서 병기(兵器)를 수리하고 정비한다는 등의 일로 말하면, 군기(軍器)를 가지고 군사들에게 흩어 주는 것은 사체(事體)에 적합하지 않으며, 관찰사(觀察使)가 절제사(節制使)를 겸임(兼任)하는 것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별다른 큰 폐해가 없으니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 현읍(縣邑)을 설치하는 일은 두 섬이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다 가운데의 고도(孤島)에 읍(邑)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위의 조건(條件)을 아울러 거행(擧行)하지 마소서. 다만 본도(本道)의 인민(人民)이 두 섬에 방랑하여 우거(寓居)할 폐단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바람이 순할 때를 기다려 조관(朝官)을 보내어 쇄환(刷還)하도록 하고, 그 모래가 메인 여러 포구(浦口)안의 병선(兵船)은 오로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곳에는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옮겨 정박(停泊)할 곳을 살펴보아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하지 말게 하였다.
“신(臣)은 일찍이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재임(在任)했으므로 영동(嶺東)의 방어(防禦)하는 일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삼가 조목별로 진술하겠습니다.
1. 본도(本道)의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 및 삼척(三陟)과 간성진(杆城鎭)은 다만 구전(口傳) 2, 3인만이 부방(赴防)했을 뿐이므로, 거진(巨鎭)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또 삼척(三陟)과 울진(蔚珍)은 서로 떨어지기가 멀리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중간의 옥원역(沃原驛)에 성(城)을 쌓고는 역승(驛丞)을 가지고 천호(千戶)의 임무를 겸임(兼任)시켰지마는, 그러나 성을 지키는 군졸을 두지 않으니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여러 고을의 군사를 함길도(咸吉道) 안변(安邊) 이북 지방 군사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위패(侍衛牌) 및 가정군(加定軍)에 소속시키지 말고, 한량(閑良)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 이하와 하번(下番)한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의 60세와 자모(自募)한 학생인(學生人) 등으로써 재주를 시험하되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 및 삼척(三陟)·간성(杆城)·옥원(沃原) 등의 여러 진(鎭)에 분속(分屬)시키게 하고, 그 중에 자모(自募)하여 부방(赴防)한 자로 30개월이 된 사람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여 방어(防禦)에 채우게 하고, 그 서울에 올라온 시위패(侍衛牌)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 두 도(道)의 가정군(加定軍)으로 수효를 채우게 하소서.
1. 강릉(江陵) 연곡포(連谷浦)의 해구(海口)는 물이 얕아서 돌이 노출(露出)되고, 그 나머지 여러 포(浦)의 해구(海口)도 또한 모두 모래가 메어져 언덕을 이루었으니, 혹시 사변(事變)이 있으면 병선(兵船)이 바다에 나와서 시기에 미치어 적(敵)에게 응전(應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는 안이 깊고 넓어서 병선을 많이 정박(停泊)시킬 수가 있으며, 또 거리가 10여 리(里) 땅에 있고, 인민(人民)이 조밀(租密)하게 거주하므로 방어가 긴요한 듯한데도 병선이 없습니다. 연곡포(連谷浦)는 40여 리(里)에 있고, 삼척포(三陟浦)는 1백 40리(里)에 있으므로 거리가 서로 멀지 않으니, 청컨대 두 포(浦)를 혁파(革罷)하여 안인포(安仁浦)에 합치고, 강릉(江陵)의 선군(船軍)을 가지고 이에 속하게 해서 방어(防禦)가 편이(便易)하도록 하여 양식을 싸 가지고 오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을 파(罷)하고, 평안도구자(平安道口子)의 예(例)에 의거하여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점차로 축조(築造)하도록 하고, 그 연변(沿邊)의 초인(草人)도 또한 철거(撤去)하도록 하고, 그 만호(萬戶)로 하여금 육지에서 방어하게 하소서.
1. 본도(本道)의 군사는 다만 본도의 방어(防禦)뿐만 아니라, 혹시 북문(北門)의 사변(事變)이 있으면 먼저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인데도 별도로 도절제사(都節制使)를 두지 않고 관찰사(觀察使)를 가지고 이를 겸무(兼務)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사 관찰사가 영서(嶺西)에 있어도 영동(嶺東)에 사변이 있으면 시기에 미치어 구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이 강릉(江陵)에 있는데 협착하고 무너졌으며, 군기(軍器)와 갑옷과 화약(火藥)을 뒤섞어 두었으니, 다만 화재가 두려울 뿐 아니라, 만들어 둔 해가 오래 되어 날로 점차 좀이 먹고 상하여서 장차는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니, 청컨대 여러 진(鎭)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점차로 보수(補修)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설치하여 여러 고을을 순행(巡行)하면서 병기(兵器)를 점검(點檢)하고 정비(整備)하도록 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소서.
1. 강릉(江陵) 사람의 말에, ‘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는 읍(邑)을 설치할 만하니, 그 물산(物産)의 풍부함과 재용(財用)의 넉넉함은, 저목(楮木)·저상(苧桑)·대죽(大竹)·해죽(海竹)·어교목(魚膠木)·동백목(冬栢木)·백자목(栢子木)·이목(梨木)·시목(柹木)과, 아골(鴉鶻)·흑색 산구(黑色山鳩)·해의(海衣)·복어(鰒魚)·문어(文魚)·해달(海獺) 등의 물건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화곡(禾穀)의 생산이 다른 지방보다 10배나 된다. 동·서·남·북이 상거(相距)가 각각 50여 리(里)나 되니 백성이 거주할 수가 있으며, 사면(四面)이 험조(險阻)하여 절벽(絶壁)이 천 길이나 서 있는데도 또한 배를 정박(停泊)할 곳이 있다. 수로(水路)는 삼척(三陟)에서 섬에 이르는 데 서풍(西風)이 곧바로 불어온다면 축시(丑時)에 배가 출발하여 해시(亥時)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살살 불어도 노(櫓)를 사용한다면 하루 낮 하루 밤에 도착할 수가 있으며, 바람이 없어도 노를 사용한다면 또한 두 낮 하루 밤이면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현읍(縣邑)을 설치하여 사람을 골라서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제1조. 강원도 도절제사(江原道都節制使)의 본영(本營)과 삼척(三陟)·간성(杆城)·옥원(沃原) 등 여러 진(鎭)의 방어(防禦)하는 일과 시위패(侍衛牌)를 이정(移定)하는 등의 일은, 함길도(咸吉道)의 군사는 본디부터 번상(番上)하지 않으며, 곧 본도(本道)에서 부방(赴防)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번(番)을 쉴 때를 당하더라도 또한 윤차(輪次)로 부방하도록 하며, 강원도(江原道)의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는 모두 경중(京中)에 번상(番上)하게 되니, 함길도(咸吉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번(番)을 쉴 때에도 또한 부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본도(本道)의 방어(防禦)는 다른 도(道)에 비해서 긴요하지 않으니, 그 부방(赴防)을 자모(自募)하는 사람에게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된 일이며, 본도(本道)의 시위패(侍衛牌)를 경기(京畿)와 충청도(忠淸道)에 이정(移定)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제2조.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兵船)을 혁파(革罷)하고,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축조(築造)하고, 초인(草人)을 철거(撤去)하는 등의 일 속에서 초인(草人)은 적군(敵軍)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니 철거(撤去)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 여러 포(浦)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사변(事變)이 닥쳐 오는 것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兵船)을 혁파(革罷)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3조. 군기(軍器)를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수(補修)하고,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순행(巡行)하면서 병기(兵器)를 수리하고 정비한다는 등의 일로 말하면, 군기(軍器)를 가지고 군사들에게 흩어 주는 것은 사체(事體)에 적합하지 않으며, 관찰사(觀察使)가 절제사(節制使)를 겸임(兼任)하는 것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별다른 큰 폐해가 없으니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 현읍(縣邑)을 설치하는 일은 두 섬이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다 가운데의 고도(孤島)에 읍(邑)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위의 조건(條件)을 아울러 거행(擧行)하지 마소서. 다만 본도(本道)의 인민(人民)이 두 섬에 방랑하여 우거(寓居)할 폐단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바람이 순할 때를 기다려 조관(朝官)을 보내어 쇄환(刷還)하도록 하고, 그 모래가 메인 여러 포구(浦口)안의 병선(兵船)은 오로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곳에는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옮겨 정박(停泊)할 곳을 살펴보아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하지 말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