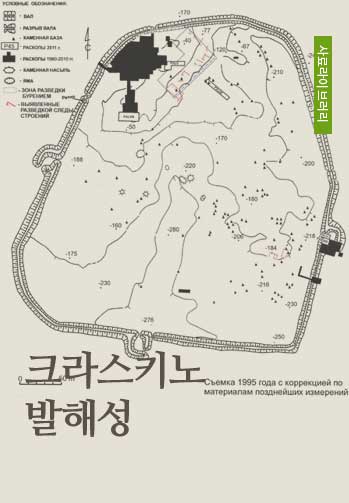1) 옹류 토기
이 종류에 속하는 토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크기가 크다. 옹은 크라스키노성에서 비교적 많은 수량으로 출토된 토기이다. 하지만 대부분 구연부를 포함하는 옹의 윗부분만 보고되었다. 그 외에 옹의 저부도 확인된다. 온전한 형태 혹은 전체 기형이 복원된 옹은 보고된 것이 7점에 불과하다.
전체 기형이 확인되는 옹은 어깨가 넓은 광견옹이 5점, 동체가 장란형으로 길쭉한 장동옹이 2점 각각 보고되었다. 모두 구순의 단면이 원형이다. 광견옹은 구경이 44.5㎝부터 53.7㎝까지, 높이가 74.2㎝부터 81㎝까지이다. 장동옹 2점은 크기가 각각 구경 21.2㎝에 높이 68㎝, 구경 14.1㎝에 높이 50㎝이다.
그런데 광견옹과 장동옹은 구연부와 동체 윗부분만이 남아 있는 경우 호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사실 옹과 호는 비슷한 기형을 가진 경우가 많아 크기를 통해 서로 구분을 한다. 고구려 토기의 경우에는 높이 40㎝ 이상은 옹류로, 그 미만은 호류로 판단을 한다.주 001 발해 토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크라스키노성에서 출토된 옹류와 호류 토기는 절대다수가 구연-동체 윗부분이고, 소수만이 전체 기형이 확인된다. 때문에 높이가 아니라 구연부의 직경, 즉 구경을 통해 옹과 호를 구분해야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광견옹과 장동옹은 온전한 형태로 보고된 것은 구연이 모두 단면이 도톰하고 둥그스름한 소위 ‘대롱구순’ 혹은 ‘원형구순’이다. 모두 목이 짧게 형성되어 있고 구연부도 짧게 외반하였다. 광견옹은 저경이 구경보다 작고, 장동옹은 반대로 저경이 구경보다 크거나 혹은 비슷하다. 광견옹은 어깨 부분이 목 아래에서 처음에는 약간 완만하게 경사지다가 안쪽으로 크게 호선을 이루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장동옹은 어깨가 비교적 급하게 경사지다가 안쪽으로 완만하게 호선을 이루면서 내려간다.
먼저 광견옹과 장동옹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짧게 외반하는 대롱구순과 짧은 목이 있는 구연-동체 윗부분들의 구경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구경이 8.8㎝부터 56㎝까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도면 752).주 002 전체 기형이 남아 있는 광견옹의 구경이 44.5~53.7㎝임을 감안한다면 구경이 56㎝까지는 옹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몇㎝부터를 광견옹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광견옹 5점의 구경과 높이 비율을 통해 옹과 호의 경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높이 4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상 구경은 22~29㎝인 것이 확인되었다(표 1).

도면 752 | 크라스키노 성 ‘대롱구순’ 옹-호류 토기 구경 분포도
표 1. ‘대롱구순’ 광견옹의 높이와 구경 비율
| 대롱구순 광견옹 | 높이 : 구경(㎝) | 높이 40㎝: 예상 구경 | 도면 |
| 1 | 75 : 54.5 | 40 : 29 | 753, 1 |
| 2 | 74.2 : 45.6 | 40 : 24.5 | 754, 3 |
| 3 | 81 : 44.5 | 40 : 22 | 754, 1 |
| 4 | 78.3 : 53.7 | 40 : 27.4 | 753, 2 |
| 5 | 75.8 : 46.9 | 40 : 24.7 | 754, 2 |
광견옹이 분명한 것들은 구경 분포가 36~47.4㎝와 51~56㎝의 두 구간으로 크게 구분된다. 하지만 구경이 44.5㎝인 것이 높이는 81㎝이고, 또 반대로 구경은 54.5㎝인 것이 높이는 75㎝로서 구경과 높이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광견 대옹은 구경 42~56㎝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광견 중옹은 구경 36~41.1㎝까지 볼 수 있다. 광견옹일 수도 있고 또 호일 수도 있는 구경 그룹은 26~34.4㎝인데 잠정적으로 광견 소옹-대호로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이 장동옹 2점은 구경이 각각 14.1㎝와 21.2㎝이다. 이 2점과 동일한 형태의 것이 높이 40㎝가 될 경우 예상되는 구경은 11.3~12.5㎝ 사이이다(표 2).
표 2. ‘대롱구순’ 장동호의 높이와 구경 비율
| 대롱구순 장동호 | 높이 : 구경(㎝) | 높이 40㎝: 예상 구경 | 도면 |
| 1 | 68 : 21.2 | 40 : 12.5 | 759, 1 |
| 2 | 50 : 14.1 | 40 : 11.3 | 762 |
그런데 이 구간 및 부근의 동일 특징 토기 구경은 12.6~16㎝, 17~18.2㎝, 19.9~25㎝로 서로 구분된다. 때문에 동체가 장동이면서 대롱구순인 토기는 구경 12.6~16㎝ 장동 소옹, 구경 17~18.2㎝ 장동 중옹, 구경 19.9~25㎝ 장동 대옹으로 각각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구경이 그 보다 더 작은 8.8~12.2㎝는 다시 구경 8.8~10.6㎝와 11.4~12.2㎝로 구분된다. 구경 11.4~12.4㎝는 장동옹이 될 수도 있고 또 호가 될 수도 있다. 구경 8.8~10.6㎝는 경경이 더 좁아 이미 병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옹에는 이러한 특징적인 형태의 광견옹과 장동옹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순이 원형 혹은 대롱구순이 아닌 것 중에도 옹류 토기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원형구순 옹류 토기와 동체가 심발을 연상시키는 옹류 토기 그리고 잔존하는 동체가 원통형인 옹류 토기를 소개하였다. 다만 이것들은 전체 기형이 복원된 것이 없어 전체 기형을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 그 외에도 크라스키노성에서는 직구 옹류 토기도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직구류 토기에서 소개하였다.
(1) 원형구순 광견옹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5점이 보고되었다. 모두 대형이다. 구연은 모두 짧게 외반하였고, 도톰하고 둥그스름한 소위 대롱구순이다. 목은 매우 짧게 형성되어 있으며 잘록하다. 목과 어깨 사이에 돌대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전체적으로 어깨가 발달하여 둥그스름한 역사다리꼴을 연상시킨다. 모두 평저이다. 목의 최소 직경, 즉 최소 경경이 내저 직경보다 크다. 옹은 기본적으로 회색 계통의 윤제 토기이다. 대부분 동체 기저부분에 일정한 두께로 깎기 조정을 한 것이 확인된다.
① 광견 대옹
2002년에 제30구역에서 출토된 광견 대옹은 토층도에 위치가 잘 반영되어 있는데 표토-부식토 바로 아래의 첫 번째 문화층에 구덩이를 파고 넣은 것이다. 이 구덩이는 제30구역 평면도에 17호 구덩이로 표시되어 있다. 이 대옹은 어깨가 크게 발달하여 동체 최대경이 동체의 윗부분에 위치한다. 목은 짧게 형성되어 있다. 구연은 대롱형식이며, 짧게 외반한다. 경부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물레에서 밀어내어 만든 돌대가 있다. 크기는 구경 54.5㎝, 동체 최대경 75㎝, 높이 75㎝, 저경 31㎝이다. 기벽의 두께는 0.9~1㎝이다(도면 753, 1).

도면 753 | 크라스키노 성 제30구역 줴-제-7방안(1)과 줴-제-8방안(2) 출토 광견대옹(2002)
2002년에 제30구역에서 출토된 다른 광견 대옹 1점은 상기한 대옹과 남북으로 나란히 17호 구덩이 안에 위치하였다. 이 대옹이 남쪽에 위치한다. 상기한 대옹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동체 최대경이 동체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목은 짧게 형성되어 있다. 구연은 짧게 외반하는 대롱형식이다. 다만 상기한 대옹과는 달리 경부와 동체 연결부위에 돌대가 없다. 크기는 구경 53.7㎝, 동체 최대경 73.8㎝, 높이 78.3㎝, 저경 33.5㎝이다. 기벽의 두께는 0.9~1㎝이다(도면 753, 2).
2002년에 제30구역에서 출토된 다른 대옹은 어깨에 돌대가 있고, 다른 특징들은 상기한 대옹들과 거의 동일하다. 구경은 46.8㎝, 동체 최대경은 69㎝, 높이는 75.8㎝, 저경은 32.1㎝이다. 기벽의 두께는 0.9~1㎝이다(도면 754-2).

도면 754 | 크라스키노성 제31구역 와실유구 데-9방안(2004)(1), 제30구역 베-붸-6방안(2002)(2), 제34구역(2005) 출토 광견대옹
2004년에 제31구역의 와실유구에서 출토된 대옹은 크기가 구경 44.5㎝, 경경 42.6㎝, 동최대경 76.2㎝, 저경 33.8㎝, 높이 81㎝이다. 속심은 방색, 내면은 갈색, 외면은 회색이다(도면 754, 1).
2005년에 제34구역에서 출토된 대옹은 용량이 90리터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크기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다. 도면에 제시된 축척을 통해 볼 때 이 옹은 높이 74.2㎝, 구경 45.6㎝, 동최대경 65.8㎝, 저경 31.7㎝이다(도면 754, 3).
대형 광견옹은 대부분 구연부와 어깨 부분으로 된 옹의 윗부분만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편 상태의 대형 옹들은 어깨 부분의 호선 상태 혹은 경사도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온전한 형태가 보고된 대형 광견옹과 마찬가지로 어깨 부분이 완만하게 경사지다가 그 아래로 크게 호선을 그리는 것들이다. 구연-동체 윗부분만 남아 있는 이 광견 대옹들은 구경이 42㎝(도면 755, 1)부터 56㎝(도면 755, 2) 사이이다.

도면 755 | 크라스키노성 출토 광견대옹 구연-동체 윗부분: 1-제25구역 제2인공층 줴-1방안(2001-도46), 2-제15구역(1998-도259, 2), 3-제47구역 5섹터 제3인공층 제-5`방안(2012-도470, 1), 4-제53구역 남동쪽섹터 제3인공층 2호 수혈 붸-10,11방안(2018-도625, 1), 5-제53구역 2섹터 제4인공층 엠-2방안(2017-도604, 1), 6-제42구역 제6인공층 붸-1방안(2009-도806), 7-제44구역 동쪽섹터 제7인공층 까-21방안(2013-도65, 1), 8-제53구역 남서쪽 섹터 제9인공층 에르-2방안(2018-도856, 2), 9-제53구역 서북쪽섹터 제3인공층 제-1-6`방안(2018-도540, 1), 10-제47구역 2섹터 제11인공층 게-14방안(2015-도506, 1), 11-제44구역 제8인공층 엠-22방안(2014-도126, 1), 12-제21구역 제2-3인공층(1999-도143, 1), 13-제49구역 2,4섹터 제2인공층 뻬-35방안(2014-도883, 2), 14-제44구역 제2인공층 엠-29방안(2010-도112), 15-제47구역 2섹터 제7인공층 붸-20방안(2015-도355, 1), 16-제49구역 2,4섹터 제2인공층 뻬-41방안(2014-도883, 3)
이 광견 대옹들 중에는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에 돌대가 1줄 돌려져 있는 것도 있다(도면 755, 3). 목과 어깨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도면 755, 4~6; 756, 1, 2).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에 돌대 혹은 턱이 없는 것들도 다수 확인된다(도면 755, 7~9; 756, 3, 4) (도면 2013-121; 1996-58, 2).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에 돌대 혹은 턱이 없으면서 구연의 대롱모양 단면이 분명하게 관찰되는 것들도 있다(도면 755, 10; 756, 5) (도면 2001-46; 1998-259, 2; 1997-112-1).
두 번째는 어깨 부분이 사선을 이루면서 밖으로 경사진 것인데 얼핏 보면 장동옹의 윗부분을 연상시키지만, 구경과 대비하여 어깨 부분의 너비를 관찰할 때에 역사다리꼴의 동체를 가진 광견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 전체가 복원되는 개체가 발견되면 그 형태가 분명하게 파악될 것이다. 8점이 확인된다.
두 번째 형식의 11점 대형 광견옹 중에는 어깨 부분에 턱이 형성된 것도 있다(도면 755, 11, 12, 13; 756, 6, 7). 어깨 부분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 중의 1점에는 목에 일정 간격으로 수직의 띠 모양 광택무늬가, 동체 부분에 수평의 띠 모양 광택무늬가 각각 시문되어 있다(도면 755, 11; 756, 6). 나머지 4점에는 어깨 부분에 돌대나 턱이 없다(도면 755, 14, 15).
그 외에도 편이 매우 작은 2점도 구연의 형태적 특징과 구경의 크기로 보아 광견 대옹일 것으로 생각된다. 1점은 구연이 2중으로 되어 있고, 구경은 46㎝이다(도면 755, 16; 756, 8). 다른 1점은 추정 구경이 45㎝이다(도면 1996-58, 3).

도면 756 | 크라스키노성 출토 광견대옹: 1-제53구역 2섹터 제4인공층 엠-2방안 출토 광견대옹 구연-동체 윗부분(2017-도591), 2-제42구역 제6인공층 붸-1방안(2009-도795), 3-제44구역 동쪽섹터 제7인공층 까-21방안(2013-도120), 4-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9인공층 에르-2방안 출토 광견대옹 구연-동체 윗부분(2018-도844), 5-제47구역 2섹터 제11인공층 게-14방안(2015-도491), 6-제44구역 제8인공층 엠-22방안(2014-도107, 2), 7-제49구역 2,4섹터 제2인공층 뻬-35방안(2014-도879), 8-제49구역 2,4섹터 제2인공층 뻬-41방안(2014-도878)
② 광견 중옹
중형의 광견옹은 온전한 형태가 보고된 것이 없다. 때문에 정확한 형태적 특징이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 광견옹을 참고할 때에 몇몇 구연-동체 윗부분 편들은 중형의 광견옹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순이 도톰하고 둥그스름한 단면 대롱모양이다. 구경은 36~41.1㎝ 사이이다. 어깨 부분은 대형 광견옹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가 확인된다. 다만 어깨 아랫부분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 형태를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10점 중에서 7점은 어깨선이 완만하게 경사졌고, 3점은 급하게 경사졌다.
첫 번째 어깨 부분이 완만하게 경사진 것들은 목과 어깨 사이에 대부분이 돌대가 1줄 형성되어 있다(도면 757, 1~5). 그중에서 1점에는 돌대 바깥에 침선이 1줄 형성되어 있다(도면 757, 2). 다른 1점에는 목에 수직의 띠 모양 광택무늬가 일정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도면 757, 3; 758, 3). 이 토기는 외면이 수평 띠 마연되었고, 속심은 회색, 표면은 흑색이다. 1점은 목과 어깨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1997-112, 2). 나머지 1점도 목과 어깨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명하지는 못하다(도면 757, 6). 이 토기는 외면을 둔하게 수평 띠 마연하였고, 속심과 내면은 주황-갈색이고, 내면은 갈색이다.

도면 757 | 크라스키노성 출토 광견중옹 구연-동체 윗부분: 1-제41구역 8호 주거지 이-2방안(2008-도442, 3), 2-제40구역(2008-도456, 1), 3-제50구역 1섹터 제4인공층 2호 수혈 치-1`방안(2015-도719, 3), 4-제50구역 1섹터 제3인공층 치-1`방안(2015-도724, 1), 5-제47구역 5섹터 제3인공층 제-5`방안(2012-도470, 1), 6-제44구역 제11인공층 베`-20방안(2014-도252, 1), 7-제41구역 제4인공층 8호 주거지 엔-2방안(2008-도439, 1), 8-제41구역 8호 주거지 까-4방안(2008-도442, 1), 9-제51구역 동쪽섹터 제10인공층 줴-5방안(2018-도270, 1)

도면 758 | 크라스키노성 출토 광견중옹 구연-동체 윗부분: 1-제50구역 1섹터 제4인공층 2호 수혈 치-1`방안(2015-도717), 2-제41구역 제4인공층 8호 주거지 엔-2방안(2008-도186, 1), 3-제51구역 동쪽섹터 제10인공층 줴-5방안(2018-도263)
두 번째 어깨 부분이 거의 사선 방향은 것은 3점 모두 목과 어깨 사이에 돌대가 1줄씩 돌려져 있다(도면 757, 7~9; 758, 2, 3). 그중의 1점은 속심과 표면이 모두 회색이다(도면 757, 9; 758, 3).
(2) 원형구순 장동옹
동체가 장란형으로 길쭉하다. 형태가 온전하게 보고된 것은 2점에 불과하며, 구경이 각각 14.1㎝와 21.2㎝이다. 14.1~21.2㎝ 구간 및 부근의 동일특징 토기 구경은 12.6~16㎝, 17~18.2㎝, 19.9~25㎝로 서로 구분된다. 그런데 동일특징의 목과 구연을 가진 토기 중에는 기형이 확인되는 호선 기벽의 대형 심발도 있다(도면 804, 5). 이 심발은 구경이 21.4㎝이고 높이가 27.5㎝이다. 때문에 장동옹 구경 구간의 구연-동체 윗부분의 편들은 원칙상 호나 호선 기벽의 심발에 속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런데 해당되는 구연-동체 윗부분의 편들 중 절대다수는 어깨 부분까지만 남아 있다. 어깨 부분 아래까지도 기벽의 호선이 확인되는 것 중에는 온전한 형태의 옹과 호를 통해 옹인지 혹은 호인지 추정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 장동옹이 분명한 것은 장동옹으로, 호가 분명한 것은 호로, 옹인지 호인지 분명하지 못한 것은 옹-호로 각각 판단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호로 표기한 것들은 원칙상 호선 기벽 심발에 속할 수도 있으나 기벽의 호선이 전체적으로 호에 더 가깝다.
① 장동 대옹
전체 기형이 남아 있는 대형 장동옹은 1점이 보고되었다. 구경이 21.2㎝, 높이가 68㎝이다. 동체가 길쭉하며, 동최대경이 어깨 아랫부분에 위치한다. 구연은 도톰하고 둥그스름한데 구순의 끝부분이 거의 위로 향한다. 목이 짧게 형성되어 있고, 목과 어깨와의 사이에 가볍게 턱이 형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수평의 띠 마연이 되어 있다(도면 759, 1; 760, 1).

도면 759 | 크라스키노성 출토 장동대옹: 1-제41구역 8호 주거지 이-2,3방안(2008-도447), 2-제53구역 남동쪽섹터 제3인공층 2호 수혈 붸,게-10,11방안(2018-도627, 2), 3-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6인공층 떼–1방안(2018-도787, 1), 4-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6인공층 오-4방안(2018-도787, 5), 5-제42구역 제3인공층분(2009-도693, 2), 6-제40구역 10호 주거지 베-16방안(2009-도157, 1)

도면 760 | 크라스키노성 출토 장동대옹: 1-제41구역 8호 주거지 이-2,3방안(2008-도197), 2-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6인공층 떼–1방안(2018-도775), 3-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6인공층 오-4방안(2018-도774), 4-제42구역 제3인공층(2009-도682)
그 외에 5점은 편 상태인데 어깨 아래로 동체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다. 완만하게 내만 호선을 이루고 있는 기벽의 상태로 볼 때 장동옹이 분명하다. 그중 2점에는 목과 어깨의 경계 부분에 돌대가 1줄씩 돌려져 있다. 2점 모두 동체 외면을 수평 띠 마연하였고, 속심은 오렌지-갈색, 표면은 회색이다(도면 759, 2, 3; 760, 2). 다른 1점은 목과 어깨의 경계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 외면에는 수평 띠 마연을 하였고, 속심과 표면은 회색이다(도면 759, 4; 760, 3). 나머지 2점은 목과 어깨에 턱이나 돌대가 없다(도면 759, 5, 6; 760, 4). 그중의 1점에는 구연의 중간 아랫부분에 얕게 홈이 돌려져 있다(도면 759, 6).
② 장동 중옹
전체 형태가 남아 있는 중형 장동옹은 보고된 것이 없다. 구경이 17㎝부터 18.2㎝ 사이이다. 짧은 목과 짧게 외반하는 도톰하고 둥그스름한 구연, 그리고 어깨와 동체 상부 기벽의 완만한 호선이 장동옹에 특징적이다. 4점이 확인된다. 그중에서 2점은 어깨 부분에 1줄씩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1점은 구경이 18㎝이고, 외면에 수평 띠 모양 광택무늬가 시문되어 있으며, 속심은 명회색, 표면은 암회색이다(도면 761, 1; 760, 5). 다른 1점은 속심은 회색이고, 표면은 흑색이다(도면 761, 2; 760, 6).

도면 761 | 크라스키노성 출토 장동중옹 구연-동체 윗부분: 1, 5-제53구역 서북쪽섹터 제2인공층 줴-10`방안(2018-도481, 5), 2, 6-제53구역 2섹터 제4인공층 엠-2방안(2017도604, 3), 3-제47구역 6섹터 제3인공층 붸-33방안(2013-도225, 2), 4-제44구역 제2인공층 엔-29방안(2010-도113)
다른 2점은 어깨에 돌대나 턱이 없다. 그중에서 1점은 구경이 18.2㎝이고, 속심은 회색, 표면은 흑색이다(도면 761, 3). 다른 1점은 구경이 17㎝이고, 속심과 표면이 회색이다(도면 761, 4).
③ 장동 소옹
기형이 남아 있는 소형의 장동옹 1점은 구경이 14.1㎝, 높이가 50㎝, 저경이 20.3㎝이다. 동최대경이 37.5㎝로 경경 12.5㎝에 비해 넓은 편이다. 동최대경이 동체의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한다. 구연은 도톰하면서 둥그스름한 ‘대롱’ 모양이며, 구연이 약 45도 방향으로 짧게 외반한다. 2008년에 제41구역의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도면 762).

도면 762 | 크라스키노성 제41구역 8호 주거지 제,이-3방안 출토 장동소옹(2008-도446)
(3)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
구연-동체 윗부분만 남아 있어 옹인지 호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토기들이다.
① 옹-호류 토기1
짧게 외반하는 대롱구순의 구연-동체부 윗부분 편들 중에서 구경 26~34.4㎝ 구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14점이 확인된다. 모두 편 상태이다. 어깨 부분은 완만하게 경사진 것, 급하게 경사진 것, 그리고 거의 수평인 것이 있다.
어깨선이 완만하게 경사진 것은 광견의 옹일 가능성이 높다. 1점은 어깨에 돌대가 1줄 돌려져 있다(도면 763, 1). 이 토기는 목 부분은 수직의 띠 광택무늬로, 어깨 부분은 외면이 수평의 띠 광택무늬로 각각 장식되었다. 다른 2점은 어깨와 목의 경계 부분에 턱이 져있다(도면 763, 2, 3). 다른 1점은 어깨 부분에 침선이 1줄 돌려져 있다. 목은 수직의 띠 광택무늬로 장식되었다. 속심은 암갈색, 표면은 암회색이다(도면 763, 4; 764, 1). 1점은 어깨 아래로 동체가 일부 남아 있다(도면 763, 5; 764, 2). 나머지 1점은 구연의 아랫부분에 얕게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63, 6; 764, 3).

도면 763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1: 1-31구역 와실유구 (2004-도182, 5), 2-제15구역 제4인공층(1997-도111, 3), 3-제48구역 동쪽섹터 제6인공층 줴,제-29,30방안(2016-도63, 1), 4-제44구역 제8인공층 줴-23방안(2014-도127, 2), 5-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7인공층 떼-1방안(2018-도810, 1), 6-제47구역 3섹터 제7인공층 게-30방안(2011-도703), 7-제34구역 제3인공층 데-11방안(2006-도202, 3), 8-제34구역 제7인공층 게-15방안(2007-도220, 2), 9-제40구역 1호 수혈 제7인공층 베,붸-15,16방안(2009-도88, 1), 10-제42구역 제3인공층(2009-도693, 1), 11-제15구역 제4인공층(1997-도111, 2), 12-제47구역 5섹터 제3인공층 엠-3방안(2012-도468, 1), 13-제37구역(2008-도435, 2), 14-제45구역 서쪽섹터 제8인공층 까-5방안(2011-도256, 2)

도면 764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1: 1-제44구역 제8인공층 줴-23방안(2014-도110, 2), 2-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7인공층 떼-1방안(2018-도803), 3-제47구역 3섹터 제7인공층 게-30방안(2011-도694), 4-제42구역 제3인공층(2009-도686), 5-제45구역 서쪽섹터 제8인공층 까-5방안(2011-도256, 1)
어깨선이 급하게 경사진 것은 광견옹일 가능성도 있고 또 원칙상 장동옹이나 장동호일 가능성도 있다. 5점은 어깨와 목의 경계 부분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63, 7~11; 764, 4). 다만 그중의 1점에는 목과 어깨 사이에 돌대가 1줄 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분명하지는 않다. 1점에는 어깨에 2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도면 763, 12).
어깨선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것은 1점이 있다. 수평에 가까운 어깨가 끝나는 부분에서 동체 기벽이 급격하게 아래로 꺾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도면 763, 13).
다른 1점은 어깨 부분이 완만하게 경사진 것인데 어깨에 ‘코 손잡이’가 있다(도면 763, 14; 764, 5). 구경이 33.8㎝이고, 견부의 잔존 직경이 53.8㎝인데 어깨 부분의 기벽 호선으로 보아 광견옹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② 옹-호류 토기2
대롱구순의 구연-동체부 윗부분 편들 중에서 옹 혹은 호가 분명한 것을 제외하고 구경 19.9~25㎝ 구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어깨선이 완만하게 경사진 것, 급하게 경사진 것, 어깨 부분의 잔존부분이 너무 적어 어깨선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것들로 구분된다.
어깨선이 완만하게 경사진 것은 6점이 확인된다. 그중 2점은 목과 어깨 부분에 턱이 형성되어 있고, 속심과 표면이 회색이다(도면 765, 1, 2; 766, 1, 2). 다른 1점에도 목과 어깨 부분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65, 3). 1점은 목과 어깨 사이에 1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고, 목에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띠 광택무늬가 시문되어 있다(도면 765, 4; 766, 3). 이 토기는 속심은 주황-갈색이고, 표면은 회색이다. 다른 2점은 어깨에 턱이나 돌대가 없다(도면 765, 5, 6; 766, 4). 그중의 1점은 속심은 회색, 표면은 암회색이다(도면 2014-540, 2).

도면 765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2: 1-제50구역(2015-도794, 5), 2-제45구역 제3인공층 쉬-6방안(2010-도383), 3-제15구역 제5인공층(1997-도114, 1), 4-제44구역 제9인공층 엘–25방안(2014-도177, 5), 5-제47구역 3섹터 제6인공층 베-29방안(2014-도540, 1), 6-제11, 12구역(1995-도46, 1), 7-제53구역 남동쪽섹터 제3인공층 붸-10방안(2018-도625, 6), 8-제40구역 제3~4인공층 게-15방안(2008-도452, 2), 9-제41구역 제2~3인공층 이,까-4방안(2008-도436, 2), 10-제47구역 3섹터 제5인공층 게-23방안(2011-도701), 11-제49구역 2~4섹터 제2인공층 이-38방안(2014-도885, 4), 12-제50구역 1섹터 제3인공층 3호 수혈(2015-도756, 2), 13-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4인공층 뻬,에르-3방안(2018-도707, 2), 14-제12구역(1996-도64, 3), 15-제21구역 제2~3인공층(1999-도145, 12), 16-제23구역 제3인공층(1999-도161, 36)

도면 766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2: 제50구역(2015-도771), 2-제45구역 제3인공층 쉬-6방안(2010-도382), 3-제44구역 제9인공층 엘–25방안(2014-도139, 1), 4-제47구역 3섹터 제6인공층 베-29방안(2014-도532)
어깨선이 급하게 경사진 것은 4점이 확인된다(도면 765, 7~10). 기벽의 호선 상태로 보아 장동옹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중의 2점에는 목과 어깨 경계 부분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65, 7, 8).
어깨선의 상태를 판단하기 힘든 것도 7점이 있다(도면 2014-540) (도면 765, 5, 11~16). 그중의 1점은 속심은 갈색, 표면은 회색이다(도면 765, 5; 766, 4). 3점은 속심은 모두 회색, 표면은 회색(도면 765, 11, 12) 혹은 암회색(도면 765, 13)이다.
③ 옹-호류 토기3
대롱구순의 구연-동체부 윗부분 편들 중에서 옹 혹은 호가 분명한 것을 제외하고 구경 17~18.2㎝ 구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2점이 확인된다. 1점은 동체 윗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기벽의 호선 상태로만 보아서는 옹인지 호인지 구분이 힘들다(도면 767, 1). 다른 1점은 편이 매우 작다. 속심은 회색, 표면은 암회색이다(도면 767, 2, 3).

도면 767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3: 1-제31구역 제6인공층 제-6방안(2003-도132), 2, 3-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6인공층 뻬-4방안(2018-도 787, 4; 776)
④ 옹-호류 토기4
대롱구순의 구연-동체부 윗부분 편들 중에서 옹 혹은 호가 분명한 것을 제외하고 구경 12.6~16㎝ 구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어깨선이 완만하게 경사진 것과 급하게 경사진 것이 있다. 그 외에 편이 매우 작아 어깨선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것도 있다.
어깨선이 완만하게 경사진 것은 어깨가 넓은 광견인데 호일 가능성도 있고 또 옹일 가능성도 있다. 6점이 확인된다. 그중의 2점은 어깨와 목의 경계 부분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68, 1, 2; 769, 1). 다른 1점은 목 부분에는 수평과 수직 방향, 어깨 부분의 외면에는 수평 방향으로 띠 광택무늬가 시문되었다(도면 768, 3). 나머지 3점은 다른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다(도면 768, 4, 5, 6).

도면 768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4: 1-제15구역 제4인공층(1997-도111, 4), 2-제40구역 1호 수혈 베-붸-15방안(2009-도90, 2), 3-제40구역 제4~5인공층 붸-17방안(2008-도457, 3), 4-제44구역 동쪽섹터 제6인공층 줴-25방안(2013-도90, 3), 5-제40구역 제2,3인공층 베-16방안(2008-도451, 3), 6-제40구역 제4인공층 베-16방안(2008-도453, 1), 7-제41구역 8호 주거지 제,이-3방안(2008-도443, 4), 8-제40구역 제2~4인공층 베,붸-16방안(2008-도450, 2), 9-제42구역 제3인공층 베-3방안(2009-도695, 2), 10-제40구역 제4인공층 붸-16방안(2008-도453, 2), 11-제53구역 남동쪽섹터 제3인공층 게-10,11방안(2018-도628, 3), 12-제47구역 7섹터 제2인공층 베-48방안(2013-도273, 4), 13-제21구역 제2~3인공층(1999-도145, 11), 14-제47구역 3섹터 제3,4인공층 아-25방안(2014-도492, 1), 15-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7인공층 떼-2방안(2018-도810, 3), 16-제47구역 2섹터 제12인공층 베-14방안(2015-도531, 4), 17-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7인공층 뻬-3`-1`방안(2018-도810, 4), 18-제40구역 복토 제거중(2009-도87, 2), 19-제40구역 복토 제거 중(2009-도87, 3)

도면 769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4: 1-제40구역 1호 수혈 베-붸-15방안(2009-도202), 2-제47구역 7섹터 제2인공층 베-48방안(2013-도 278), 3-제47구역 3섹터 제3,4인공층 아-25방안(2014-도483, 5), 4-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7인공층 떼-2방안(2018-도801), 5-제47구역 2섹터 제12인공층 베-14방안(2015-도520), 6-제53구역 남서쪽섹터 제7인공층 뻬-3`-1`방안(2018-도802)
어깨선이 급하게 경사진 것은 4점이 있다. 동체는 장동형일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 짧게 외반하는 구연이 있다. 그중의 1점에는 목 아래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68, 7). 1점은 동체 외면이 수평의 띠 광택무늬로 장식되었다(도면 768, 8). 다른 1점은 수직의 띠 광택무늬로 장식되었다(도면 768, 9). 4점은 다른 특징이 관찰되지 않는다(도면 768, 10~13; 769, 2).
편이 매우 작은 것들 중에는 목과 어깨 경계 부분에 턱이 진 것이 1점 있는데 속심은 주황-갈색, 표면은 흑색이다(도면 768, 14; 769, 3). 다른 1점은 목에 수직 때 광택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이 토기는 속심은 명회색, 표면은 암회색이다(도면 768, 15; 769, 4). 2점은 구연의 아랫부분에 얕은 홈이 1줄 돌려져 있다(도면 768, 16, 17; 769, 5, 6). 2점은 속심과 표면이 회색 혹은 암회색이다. 나머지 2점은 다른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도면 768, 18, 19).
⑤ 옹-호류 토기5
대롱구순의 구연-동체부 윗부분 편들 중에서 옹 혹은 호가 분명한 것을 제외하고 구경 11.6~12.2㎝ 구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6점이 확인된다. 4점 모두 어깨선이 45도의 경사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1점은 어깨에 1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고, 목은 수직의 띠 광택무늬로 장식되었다(도면 770, 1). 다른 1점은 목에 턱이 형성되어 있고, 또 구연의 중간 부분에 얕은 홈이 1줄 돌려져 있다(도면 770, 2). 1점은 목과 어깨 사이에 약간의 꺾임이 있어 목이 잘 구분된다(도면 770, 3). 1점은 두터운 구연의 외측이 약간 편평하다. 이 토기는 외면이 수평 띠 마연되었고, 속심과 표면은 암회색이다(도면 770, 4). 나머지 2점은 구연부가 짧게 외반한다(도면 770, 5, 6).

도면 770 | 크라스키노성 출토 원형구순 옹-호류 토기5: 1-제21구역 제4인공층 5호 수혈(1999-도144, 1), 2-제29구역 7호 수혈 베-붸-5-6방안(2001-도89), 3-제31구역 제6인공층 제-8방안(2003-도141, 1), 4-제47구역 6섹터 제1인공층(2013-도177, 1), 5-제34구역 서쪽섹터 제11인공층 게-15방안(2007-도239, 1), 6-제40구역 제6인공층 베-16방안(2009-도180, 5)
이 토기들은 경경이 9.2㎝, 9.9㎝ 등이어서 옹이었을 수도 있고, 호였을 수도 있고, 혹은 병의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전체 기형이 남아 있는 토기가 출토된다면 그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다.
(4) 심발 옹류 토기
전형적인 형태의 원형구순 광견옹이나 장동옹과는 구분되는 옹류 토기이다. 구연부가 모두 원형구순 옹류 토기에 비해 얇고 긴 편이다. 전체 기형이 확인되는 것이 없어 형태적인 특징을 모두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동체의 기벽이 상대적으로 강한 혹은 약한 호선을 이룬다. 배가 나온 심발류 토기와 기형이 비슷한데 구경이 30.8㎝ 이상인 것들이다. 10점이 있다. 구연부의 형태적 특징이 대부분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경이 큰 것부터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점은 구경이 44.9㎝이다. 구연부의 안쪽이 넓게 약간 볼록하다. 목은 어깨와 구연부가 꺾인 부분이며, 어깨선은 장동형에 특징적인 호선을 보인다(도면 771, 1).

도면 771 | 크라스키노성 출토 심발 옹류 토기 구연-동체 윗부분: 1-제40구역 1호 수혈 베,붸-15,16방안(2009-도100, 1), 2-제34구역 제4인공층 게-1방안(2006-도203, 3), 3-제34구역 제3~4인공층 데-7방안(2006-도209, 1), 4-제44구역 동쪽섹터 제6인공층 이,까-17,18방안(2013-도90, 1), 5-제40구역 제8인공층 줴-20방안(2009-도254, 5), 6-제37구역(2008-도435, 3), 7-제42구역 제4인공층 데-4방안(2009-도752, 5), 8-제40구역 제7인공층 붸-16방안(2009-도254, 1), 9-제40구역 1호 수혈 제7인공층 붸-16방안(2009-도99, 1), 10-제47구역 2섹터 제5인공층 게-12방안(2015-도299, 2)
1점은 구경이 43.7㎝이다. C자 모양으로 외반하는 구연부에서 구순의 하변이 아래로 볼록하여 단면이 세장한 삼각형을 이룬다(도면 771, 2).
1점은 구연부의 두께가 대체로 일정하며, 어깨 부분에 얕은 돌대가 1줄 돌려져 있다. 구경은 41㎝이다(도면 771, 3).
1점은 동최대경과 구경이 비율이 호에 가깝다. 구경은 38㎝이다. 속심은 오렌지-갈색, 표면은 흑색이다(도면 771, 4; 772, 1).

도면 772 | 크라스키노성 출토 심발 옹류 토기 구연-동체 윗부분: 1-제44구역 동쪽섹터 제6인공층 이,까-17,18방안(2013, 도96), 2-제40구역 1호 수혈 제7인공층 붸-16방안(2009-도198), 3-제47구역 2섹터 제5인공층 게-12방안(2015-도285)
1점은 구경이 37.7㎝이다. 구연부가 C자 모양으로 외반하는데 구순의 아래가 약간 아래로 넓어졌다(도면 771, 5).
1점은 구경이 34.5㎝이다. C자 모양으로 외반하는 구연부의 끝부분이 3중으로 되어 있는3겹 입술이다. 경경은 29.3㎝이다(도면 771, 6).
1점은 구경이 34.9㎝인데 구순이 동글-삼각형이다. 목과 어깨 사이에 턱이 져있다(도면 771, 7).
1점은 구경이 33.2㎝이다. 목이 약간 곧추선 듯 내만하며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였다. 구순의 단면이 동글-삼각형에 가깝다. 목과 어깨의 경계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71, 8).
1점은 구경이 33.1㎝이다. 동체의 기벽이 상당부분 확인된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였고, 구순의 아랫부분이 아래로 뾰족하다. 목과 어깨의 경계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도면 771, 9; 772, 2).
마지막 1점은 구경이 30.8㎝이다. 어깨에 1줄의 수평 침선이 돌려져 있다. 속심과 표면이 모두 회색이다. 외면이 수평 띠 마연되었다(도면 771, 10; 772, 3).
(5) 직벽 옹류 토기
동체의 기벽이 비교적 곧은 옹류 토기로서, 동체의 모양이 원통형에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체 기형이 확인되는 것이 없어 기종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릴 수가 없다. 전형적인 형태의 광견옹 및 장동옹과는 구분되며, 또한 그 외에도 동체의 기벽이 호선을 이루는 옹류 토기와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구경이 28.4㎝부터 45.9㎝ 사이인데, 대형, 중형, 소형이 구분된다.
대형은 구경이 40.4㎝부터 45.9㎝까지 5점이 있고, 중형은 34㎝부터 37.6㎝까지 9점이 확인되며, 소형은 구경이 28.6㎝ 2점이 있다. 개체 수가 적어 따로 형식을 구분하지 않았다.
① 대형 직벽 옹
5점이 확인된다. 구경이 45.9㎝로 가장 큰 1점은 구연이 삼중이다. 구연부는 크게 호선을 이루며 외만하고, 어깨-동체 윗부분이 거의 수직 방형이며, 둘 사이의 경계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도면 773, 1). 1점은 어깨에 턱이 약간씩 형성되어 있고, 어깨-동체 윗부분이 가볍게 바깥쪽으로 향하면서 내려간다. 구경은 42.6㎝이다(도면 773, 2). 다른 1점은 구경이 41.6㎝이다. 속심은 암회색, 표면은 갈색이다(도면 773, 3). 1점은 구경이 42.4㎝이다(도면 773, 4). 나머지 1점은 구경이 40.4㎝이며, 어깨-동체 윗부분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아래로 내려간다(도면 773, 5).

도면 773 | 크라스키노성 출토 대형 직벽 옹류 토기 구연-동체 윗부분: 1-제40구역 제11인공층 11호 주거지 아`-19방안(2009-도384, 3), 2-제34구역 제12~13인공층 붸,게-14,15방안(2007-도249, 3), 3-제34구역 제11인공층 데-11방안(2007-도239, 3), 4-제34구역 6호 주거지 붸-4방안(2007-도250, 1), 5-제34구역 6호 주거지 게-4방안(2007-도251, 2)
② 중형 직벽 옹
9점 모두 외반된 구연부를 가졌지만, 구연부 자체는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1점은 목-구연부의 단면이 약한 C자 모양이지만 외측에 약간 꺾임이 있다. 구연은 아래쪽이 도톰하고, 구순은 뾰족한 편이다. 어깨 부분에 2줄, 동체 윗부분에 2줄 각각 수평 침선이 돌려져 있다. 구경은 36.4㎝이다. 동체의 기벽은 미약하게 호선을 이루지만 거의 곧은 상태로 아래로 내려간다(도면 774, 1). 다른 1점은 구연부가 거의 사선 방향으로 곧게 외반하였다. 어깨 부분에 2줄의 수평 침선이 돌려져 있다. 구경은 35.7㎝이다(도면 774, 2). 1점은 약하게 호선을 이루며 외반한 구연부의 구연이 삼중으로 되어있다. 어깨-동체 윗부분의 기벽은 미약하게 바깥을 향하며 내려간다. 구경은 37.6㎝이다(도면 774, 3; 775, 1).

도면 774 | 크라스키노성 출토 중형 직벽 옹류 토기 구연-동체 윗부분: 1-제33a구역 제2인공층 엠-11방안(2006-도36), 2-제40구역 제13인공층 11호 주거지 붸-20방안(2009-도387, 1), 3-제40구역 제13인공층 11호 주거지 아`-19방안(2009-도387, 2), 4-제45구역 제2인공층 이-5방안(2010-도347), 5-제45구역 제1인공층 하-6방안(2010-도306), 6-제34구역 제10인공층 데-1,2방안(2007-도228, 1), 7-제34구역 제1인공층 예-2방안(2006-도199, 7), 8-제34구역 제5인공층 이-13방안(2006-도204, 4), 9-제45구역 제4인공층 까-5방안(2010-도432), 10-제40구역 제9인공층 게-21방안(2009-도154, 3), 11-제40구역 제12인공층 11호 주거지와 주변 아`-20방안(2009-도386, 1)
1점은 구연부가 완만하게 호선을 이루며 크게 외반하는데 목-구연부의 단면이 넓은 C자 모양이다. 목 부분에는 수직 띠 광택무늬가 시문되었다. 어깨 부분에는 3줄의 수평 침선이 돌려져 있다. 구경은 36㎝, 경경은 30.8㎝이며, 속심은 갈색, 표면은 흑색이다(도면 774, 4). 1점은 외반하는 구연부의 끝부분이 위로 약간 돌출하였다. 어깨-동체 윗부분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고, 기벽이 거의 수직 상태로 아래로 향한다. 구경은 35.6㎝, 경경은 31.6㎝이며, 속심과 표면은 회색이다(도면 774, 5). 나머지 1점은 구경이 34㎝이다(도면 774, 6).
1점은 목은 수평 방향으로, 외면은 수직 방향으로 각각 띠 마연되었다. 구경은 39.8㎝이다(도면 774, 7). 다른 2점은 구경이 각각 36.7㎝와 40㎝이다(도면 774, 8, 9).
③ 소형 직벽 옹
2점이 있다. 2점 모두 2중 구순이다. 1점은 구연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외반하였다. 목이 약간 구분된다. 구경은 28.6㎝이다(도면 774, 10). 다른 1점은 목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어깨 부분에는 2줄의 수평 침선이 돌려져 있다. 구경은 28.4㎝이다(도면 774, 11; 775, 2).

도면 775 | 크라스키노성 출토 중형 직벽 옹류 토기 구연-동체 윗부분: 1-제40구역 제13인공층 11호 주거지 아`-19방안(2009-도373), 2-제40구역 제12인공층 11호 주거지와 주변 아`-20방안(2009-도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