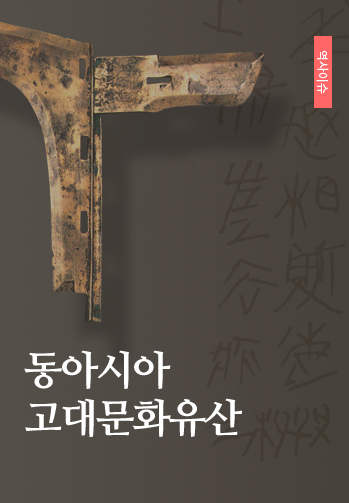이곡리유적
규모
남북: 1,530km
입지
지표조사에서 한강 하류와 서해안에서 주로 출토되는 형식의 빗살무늬토기편 수 점이 확인되었고, 1978년에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유적개관
가평천의 서편으로 형성된 충적대지에 있으며, 비슷한 시기의 마장리 유적보다 조금 상류변에 위치한다. 유물은 2·3·4층에서만 출토되었는데, 2층 주거지층을 제Ⅱ문화층, 3·4층 이하를 제Ⅰ문화층으로 구분하였다. 2층에서 발견된 움집터의 면적은 15.70m²로 넓고, 형태는 거의 원형으로서 완전히 연소된 기둥이 14개 박혀 있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아 20~100cm의 차이를 나타냈다. 움집터 안에 유물은 많지 않았고, 상당수의 강자갈이 흩어져 있었다. 장축 64cm, 너비 50cm의 화덕자리 하나가 움집터의 남동쪽에 직사각형으로 돌출되어 있었는데, 화덕자리 안에는 점토가 약 7~10cm 두께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상당량의 숯이 남아 있었다. Ⅰ문화층은 청동기시대 말기에 속하며, Ⅱ문화층은 철기시대로 접어드는 시기로 마장리 주거지와 비슷한 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움집터는 상부층위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출토유물
* 간돌도끼, 반달돌칼조각, 간돌화살촉, 돌끌, 그물추, 숫돌, 빗살무늬토기, 민무늬토기아가리파편, 민무늬토기바닥, 토기뚜껑, 회청색시루, 쇠뿔잡이, 철화살촉, 쇠칼파편, 민무늬납작단지, 구멍문토기파편, 민무늬토기파편, 반달돌칼
참고문헌
「가평군 이곡리 철기시대 주거지 발굴보고서」,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9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학교박물관·가평군, 1999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학교박물관·가평군, 1999
해설
가평군은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은 강원도의 화천, 춘천, 홍천군과 서남은 경기도의 포천, 양주, 양평군과 접하고 있다. 북쪽에는 광주산맥이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있다. 해발 1,468m의 화악산을 비롯하여 응봉(1,436m), 촛대봉(1,125m), 가덕산(858m), 북배산(867m) 등이 화천군, 춘천시와의 경계가 되며, 명지산(1,250m), 국망봉(1,168m), 강씨봉(830m), 청계봉(842m), 운악산(936m)은 포천과의 면하고 있다. 이들 산지의 사면을 따라 흐르는 가평천과 조종천은 많은 산간 분지를 형성하면서 북에서 남으로 흘러 동서로 관류하는 북한강으로 유입된다. 두 하천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는 긴 통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평은 이들 하천이 형성해 놓은 대표적인 충적대지이다.
가평군의 남쪽으로는 북한강이 동서로 흐르며 북한강과 그 지류인 가평천, 조종천변에는 작고 긴 분지형 평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곡리유적은 북한강 북안에 있는 가평읍에서 북쪽으로부터 흘러오는 가평천을 따라 북행하여 약 8㎞ 정도 되는 지점의 논에 위치하는데 마장리 유적과는 약 1㎞ 지점 떨어진 곳에 인접해있다. 주변은 비교적 낮은 구릉선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의 달전천과 동북쪽의 가평천이 각각 동류, 남류하며 북한강으로 흘러들면서 동쪽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가평천 주변의 구릉과 충적평야에는 석장리 고인돌, 삼회리 유물산포지, 마장리유적, 항사리유적, 대곡리유적, 조옥동절터, 가평향교 등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1976년 이곡 2리에 거주하는 복용섭씨에 의해 토기편이 수습・신고되어 단국대 사학과 최무장교수에 의해 1977년~1978년 걸쳐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에 1978년 유물의 성격과 유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층위의 최상층인 1층은 두께 30㎝의 경작토, 2층은 두께 50㎝의 검은 모래층으로 집자리가 발견된 문화층이다. 3층은 두께 30㎝의 노란색 모래층, 4층은 두께 30㎝의 진흙이 섞인 붉은 모래층, 5층은 두께 35㎝의 노란색 굵은 모래층, 6층은 자갈층으로 되어 있다.
집자리는 평면 원형으로 직경 500㎝, 깊이 70㎝, 면적 15.70㎡ 정도로 추정된다. 바닥은 진흙을 10㎝ 두께로 다져서 생활면으로 사용하였다. 집자리 내부에는 완전히 연소된 기둥이 14개 정도 박혀 있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아 20~100㎝ 정도 거리를 두고 시설되어 있다. 64×50㎝ 규모의 화덕자리 하나가 집자리의 남동쪽에 직사각형으로 돌출되었는데 화덕자리 안에는 진흙을 약 7~10㎝ 두께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상당수의 숯이 산적해있다. 남쪽에서도 소형의 화덕자리가 1개 더 시설되어 있다. 집자리 내부에서는 유물이 많지 않은데 경질민무늬토기, 석기, 가락바퀴, 숫돌이 출토되었고 상당수의 강자갈이 흩어져 있었다.
유적은 2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층은 두께 80~144㎝의 노랗고 붉은 모래층으로 민무늬토기, 공렬무늬토기, 석기, 가락바퀴가 출토되었다. Ⅱ층은 두께 30~80㎝의 검은 모래층으로 민무늬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시루, 가락바퀴, 간돌도끼, 돌화살촉, 반달돌칼, 숫돌, 철화살촉, 옥제 장식품이 출토되었다. 이에 따라 Ⅰ문화층은 청동기시대 말기, Ⅱ문화층은 철기시대로 접어드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빗살무늬토기와 덧띠새김무늬토기, 토제 송풍관, 철화살촉 등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곡리유적에서 조사된 집자리는 철기시대에 해당하며 출토유물 중 상당수는 이른바 중도식 무문토기(中島式 無文土器)로 외반입술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뚜껑, 완 등의 기종으로 나뉜다.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기술 전통에 새로운 고화도 소성의 기술이 가미되면서 출현한 토기로 생각되나 명사리식 토기,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기 요동지역 토기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또 동일 기형의 토기들이 출토되연해주 및 동북지역 초기철기시대의 단결-크로노프카문화 유적을 기원지로 보는 연구 시각도 존재한다. 이곡리유적은 북한강유역의 유물유구 양상을 비롯한 문화상을 논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평군의 남쪽으로는 북한강이 동서로 흐르며 북한강과 그 지류인 가평천, 조종천변에는 작고 긴 분지형 평지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곡리유적은 북한강 북안에 있는 가평읍에서 북쪽으로부터 흘러오는 가평천을 따라 북행하여 약 8㎞ 정도 되는 지점의 논에 위치하는데 마장리 유적과는 약 1㎞ 지점 떨어진 곳에 인접해있다. 주변은 비교적 낮은 구릉선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의 달전천과 동북쪽의 가평천이 각각 동류, 남류하며 북한강으로 흘러들면서 동쪽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가평천 주변의 구릉과 충적평야에는 석장리 고인돌, 삼회리 유물산포지, 마장리유적, 항사리유적, 대곡리유적, 조옥동절터, 가평향교 등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1976년 이곡 2리에 거주하는 복용섭씨에 의해 토기편이 수습・신고되어 단국대 사학과 최무장교수에 의해 1977년~1978년 걸쳐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에 1978년 유물의 성격과 유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층위의 최상층인 1층은 두께 30㎝의 경작토, 2층은 두께 50㎝의 검은 모래층으로 집자리가 발견된 문화층이다. 3층은 두께 30㎝의 노란색 모래층, 4층은 두께 30㎝의 진흙이 섞인 붉은 모래층, 5층은 두께 35㎝의 노란색 굵은 모래층, 6층은 자갈층으로 되어 있다.
집자리는 평면 원형으로 직경 500㎝, 깊이 70㎝, 면적 15.70㎡ 정도로 추정된다. 바닥은 진흙을 10㎝ 두께로 다져서 생활면으로 사용하였다. 집자리 내부에는 완전히 연소된 기둥이 14개 정도 박혀 있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지 않아 20~100㎝ 정도 거리를 두고 시설되어 있다. 64×50㎝ 규모의 화덕자리 하나가 집자리의 남동쪽에 직사각형으로 돌출되었는데 화덕자리 안에는 진흙을 약 7~10㎝ 두께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상당수의 숯이 산적해있다. 남쪽에서도 소형의 화덕자리가 1개 더 시설되어 있다. 집자리 내부에서는 유물이 많지 않은데 경질민무늬토기, 석기, 가락바퀴, 숫돌이 출토되었고 상당수의 강자갈이 흩어져 있었다.
유적은 2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층은 두께 80~144㎝의 노랗고 붉은 모래층으로 민무늬토기, 공렬무늬토기, 석기, 가락바퀴가 출토되었다. Ⅱ층은 두께 30~80㎝의 검은 모래층으로 민무늬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시루, 가락바퀴, 간돌도끼, 돌화살촉, 반달돌칼, 숫돌, 철화살촉, 옥제 장식품이 출토되었다. 이에 따라 Ⅰ문화층은 청동기시대 말기, Ⅱ문화층은 철기시대로 접어드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빗살무늬토기와 덧띠새김무늬토기, 토제 송풍관, 철화살촉 등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곡리유적에서 조사된 집자리는 철기시대에 해당하며 출토유물 중 상당수는 이른바 중도식 무문토기(中島式 無文土器)로 외반입술항아리, 깊은바리토기, 뚜껑, 완 등의 기종으로 나뉜다.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기술 전통에 새로운 고화도 소성의 기술이 가미되면서 출현한 토기로 생각되나 명사리식 토기,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기 요동지역 토기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또 동일 기형의 토기들이 출토되연해주 및 동북지역 초기철기시대의 단결-크로노프카문화 유적을 기원지로 보는 연구 시각도 존재한다. 이곡리유적은 북한강유역의 유물유구 양상을 비롯한 문화상을 논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