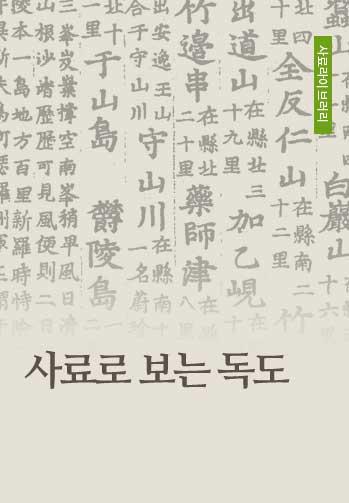제신을 인견하여 대마도에 하사하는 공작미에 관해 논의하다
사료해설
이 사료는 영의정 유상운이 ‘울릉도쟁계’ 타결 후 울릉도(鬱陵島) 수토를 제안하자 국왕 숙종이 2년 간격으로 울릉도 수토를 명한 내용으로, 조선후기 울릉도수토제의 초기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1697년(숙종 23) 2월 대마도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오자 조정 내에서는 울릉도 수토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은 울릉도 문제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일본이 일본인의 울릉도에서 어로행위를 금한다고 하였고,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보낸 서계에서도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수토할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으므로 비록 바다 멀리 떨어져 있고, 무인도이므로 매년은 어렵지만 간간히 사람을 보내 순찰해야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국왕 숙종은 3년마다 울릉도에 관원을 파견하여 수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울릉도수토제의 초기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1697년(숙종 23) 2월 대마도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오자 조정 내에서는 울릉도 수토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은 울릉도 문제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일본이 일본인의 울릉도에서 어로행위를 금한다고 하였고,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보낸 서계에서도 때때로 사람을 보내어 수토할 뜻을 이미 밝힌 바가 있으므로 비록 바다 멀리 떨어져 있고, 무인도이므로 매년은 어렵지만 간간히 사람을 보내 순찰해야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국왕 숙종은 3년마다 울릉도에 관원을 파견하여 수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울릉도수토제의 초기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壬戌/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曰: “東萊公作米, 卽公貿綿布之換給於對馬島者。 柳淰爲府使時, 權許換米, 遂成謬例, 一年所給一萬六千餘石。 當初酌定, 或限十年, 或限五年, 今乃云不知年限, 情狀巧惡。 諸大臣以爲自今防塞給米, 還復給布之規, 爲宜云矣。” 上問諸臣。 左參贊李世華曰: “換米後, 民弊滋甚, 故相臣李尙眞, 常以爲柳淰創此無限弊端云矣。 今若欲還復給布之規, 則島倭必以死爭, 其勢終難不許。 姑以年限爭之可矣。” 禮曹判書申琓曰: “此非當初約條, 今以復舊例之意爭之, 則操縱在我。 乞哀之後, 觀勢許之可矣。” 左尹李濡、韓城君 李基夏、副提學徐宗泰、江華留守李頣命之言, 亦略同。 上曰: “第使邊臣力爭, 而彼若哀乞, 則更許無妨。” 琓言: “幼學充水軍者, 旣許赴擧, 則生ㆍ進、朝士之充軍者, 勿揀赦前, 反重於幼學之罰, 似爲不均。” 尙運請除去勿揀赦前之律, 上從之。 頣命以賑民請得二千石穀, 尙運請給三之一, 上命給七百石。 尙運曰: “鬱陵島事, 今已明白歸一, 不可不間間送人巡檢。” 上命間二年入送。
번역문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동래(東萊)의 공작미(公作米)는 공무(公貿)하는 면포(綿布)의 대가(代價)로 대마도(對馬島)에다 바꾸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심(柳淰)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임시로 쌀과 바꾸도록 허락한 것이 마침내 잘못된 전례가 되어 1년에 지급하는 것이 1만 6천여 석(石)입니다. 당초에 작정(酌定)하기는 간혹 10년을 기한하기도 하고, 간혹 5년을 기한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 기한을 모른다고 하니, 정상(情狀)이 교활하고 간악합니다. 여러 대신들은 지금부터 쌀로 지급하는 것을 막고 도로 면포로 지급하는 규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쌀로 바꾼 뒤에 백성들의 폐단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고(故)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은 유심(柳淰)이 한없는 폐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 도로 면포로 지급하는 규정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도왜(島倭)가 틀림없이 죽기로 다툴 것이니, 그 형세도 끝내 허락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연한(年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신완(申琓)은 말하기를,
“이것은 당초에 약조(約條)한 것이 아니니, 이제 옛날의 규례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다툰다면 조종(操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애처롭게 빌도록 한 뒤에 형세를 관찰하면서 허락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좌윤(左尹) 이유(李濡),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부제학(副提學) 서종태(徐宗泰),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이명(李頤命)의 말도 대략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변방을 맡은 신하로 하여금 힘껏 다투게 하여 그들이 만약 애처로이 빈다면 다시 허락하는 것도 해로울 것은 없다.”
하였다. 신완(申琓)이 말하기를,
“유학(幼學)으로 수군(水軍)에 충정(充定)된 자에게 이미 부거(赴擧)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생원(生員)·진사(進士)·조사(朝士)로서 충군(充軍)된 자는 물간 사전(勿揀赦前)케 하심은 도리어 유학에게 적용하는 처벌보다 중하여 균일(均一)하지 못한듯 합니다.”
하고, 유상운(柳尙運)은 물간 사전의 율(律)을 없애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이명이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데 사용하려고 2천 석(石)의 곡식을 청하였는데, 유상운이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7백 석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
“울릉도(鬱陵島)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으니,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2년 간격으로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
“동래(東萊)의 공작미(公作米)는 공무(公貿)하는 면포(綿布)의 대가(代價)로 대마도(對馬島)에다 바꾸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심(柳淰)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에 임시로 쌀과 바꾸도록 허락한 것이 마침내 잘못된 전례가 되어 1년에 지급하는 것이 1만 6천여 석(石)입니다. 당초에 작정(酌定)하기는 간혹 10년을 기한하기도 하고, 간혹 5년을 기한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 기한을 모른다고 하니, 정상(情狀)이 교활하고 간악합니다. 여러 대신들은 지금부터 쌀로 지급하는 것을 막고 도로 면포로 지급하는 규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쌀로 바꾼 뒤에 백성들의 폐단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고(故) 상신(相臣) 이상진(李尙眞)은 유심(柳淰)이 한없는 폐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 도로 면포로 지급하는 규정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도왜(島倭)가 틀림없이 죽기로 다툴 것이니, 그 형세도 끝내 허락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연한(年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신완(申琓)은 말하기를,
“이것은 당초에 약조(約條)한 것이 아니니, 이제 옛날의 규례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다툰다면 조종(操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애처롭게 빌도록 한 뒤에 형세를 관찰하면서 허락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좌윤(左尹) 이유(李濡),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 부제학(副提學) 서종태(徐宗泰),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이명(李頤命)의 말도 대략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변방을 맡은 신하로 하여금 힘껏 다투게 하여 그들이 만약 애처로이 빈다면 다시 허락하는 것도 해로울 것은 없다.”
하였다. 신완(申琓)이 말하기를,
“유학(幼學)으로 수군(水軍)에 충정(充定)된 자에게 이미 부거(赴擧)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생원(生員)·진사(進士)·조사(朝士)로서 충군(充軍)된 자는 물간 사전(勿揀赦前)케 하심은 도리어 유학에게 적용하는 처벌보다 중하여 균일(均一)하지 못한듯 합니다.”
하고, 유상운(柳尙運)은 물간 사전의 율(律)을 없애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이명이 백성을 진구(賑救)하는 데 사용하려고 2천 석(石)의 곡식을 청하였는데, 유상운이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청하자, 임금이 7백 석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유상운이 말하기를,
“울릉도(鬱陵島)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으니,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2년 간격으로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