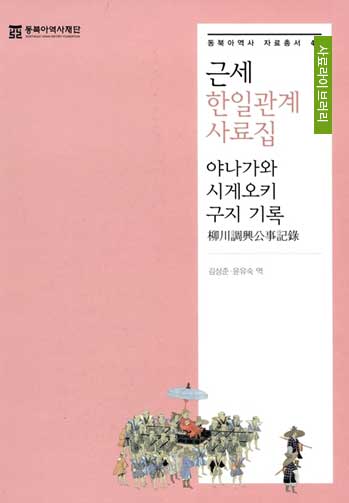삼사(三使)가 에도성(江戸城)에서의 의례(儀禮) 절차와 배석한 인물
절차
一. 서한 상자는 고케(高家)주 001가 상상관에게서 받는다. 다치(太刀)를 찬 고케가 중단(中段之間)의 서쪽 다다미 끝으로 나아가 [서한을] 드러내 보인 다음 삼사가
스스로 예를 취한다. 삼사가 [오히로마에] 들어오면 고케(高家)는 삼사를 동반하여 하단(下段之間)으로 나온다.주 002 쓰시마노카미도 곁에서 예를 표할 자리를 안내하고 하단으로부터 5번째 다타미에서 삼사 일동이 예를 표한다. 쓰시마노카미는 5번째 다타미의 동쪽에 자리한다. 예를 마치고 삼사는 마쓰노마(松之間)로 물러난다. 쓰시마노카미도 이곳에서 툇마루로 물러난다.
一. 쇼군(御前)께서 우콘노쇼겐(右近將監)·우쿄노다이부(右京大夫)를 부르시어 삼사가 이번에 내방하는 일로 수고했다고 하시며 술을 내리라고 분부하셨다.
쇼군님에게서 두 사람이 물러났다. 곁방 장지의 북쪽에 동쪽을 향해 늘어앉았다. 이때 쓰시마노카미는 툇마루(板緣)주 003로 물러났다. 우콘노쇼겐·우쿄노다이부는 쓰시마노카미에게 인사를 했다. 쓰시마노카미가 위의 두 사람 곁으로 나아가자 삼사에게 전하는 쇼군님의 뜻을, 우콘노쇼겐이 쓰시마노카미에게 두 사람이 전달했다. 쓰시마노카미는 툇마루로 나가 상상관을 불러 쇼군님의 뜻을 전달했다. 상상관이 그것을 숙지하고 삼사 곁으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했다. 상상관은 잠시 물러나 쓰시마노카미에게 전했다. 쓰시마노카미·우콘노쇼겐이 어전으로 나가 삼사의 답변을 전해 올렸다. [그것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삼사가 다시 전원 [마쓰노마에서] 나와 하단(下段)의 동쪽 위로부터 5번째 다타미에 앉았다.
삼어배(三御杯). 간토기(磨土器),주 004 목재(木地),주 005 산보(三方)주 006에 얹음. 고케(高家)[가 음식을 내 옴]
히키와타시(引渡)주 007. 각진 삼나무 상에 다시마, 후키치라시(吹ちらし),주 008 노시(熨斗).주 009 고케 삼사에게 히키와타시를 냈다. 식사 시중은 나카오쿠(中奧)주 010의 고쇼(小姓)주 011
술병(銚子). 금종이 꽃 장식. 고케
술 따르는 도구(加)는 위와 같음. 고케
어전으로 불러들여 술을 채운다. 잔은 술병에 얹는다. 중단(中段) 아래부터 3번째 다타미에서 술을 따르기 위해 가까이 오게 하자, 쓰시마노카미가
하단의 툇마루(緣頰)까지 나와 안내했고 정사(正使)가 중단으로 나갔다. 이때 술잔은 토기를 집어 정사에게 건넸다.주 012 받으면 잔을 채우고 [정사는] 토기 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온다. 또 다른 토기로 마시고, 잔을 채우면 부사가 나와 그것을 받으며 절차는 앞과 같다. 종사관의 절차도 동일하다. 전부 마치고 쓰시마노카미는 하단의 동쪽, 삼사는 곁방에서 대기한다. 술병, 히키와타시 등을 들이고, 쓰시마노카미는 삼사를 안내하여 삼사가 하단 중앙으로 나와 일동 배례(拜禮)했다. 전부 마치고 삼사는 마쓰노마(松之間)로 물러났다.
一. 상상관 세 사람 모두 자리로 나와 하단의 문턱 안에서
배례하고 물러났다. 다음으로 상판사·제술관·군관 등이 세 번에 걸쳐 툇마루로 나가 배례했다. 다음으로 차관·소동이 낮은 툇마루로 두 번에 걸쳐 나가 배례했다.
단 상상관 한 사람이 먼저 나가 지시했다. 오메쓰케·메쓰케(目付)주 013가 안내했다.
중관 여러 명이 무대 앞 뜰로 두 번에 걸쳐 나가 배례했다.
가치(徒士)주 014와 메쓰케가 인도했다.
이 과정이 끝나고 쇼군님께 우콘노쇼겐·우쿄노다이부가 불려가 삼사에게 향응을
베풀라는 명을 받고 물러났다. 마쓰노마로 건너가 술잔을 내렸다. 예정된 시간대로 삼사에게 전달했다. 응하였고, 이때의 향응 배석과 [요리] 차림판은 말미에 기록했다.
[에도성 향응이 행해진 공간과 배석한 인원들]
오히로마(大廣間)주 015
각주 015)

에도성 안에서 가장 큰 서원(書院). 쇼군 임명 의식,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 발포, 새해 정월의 배하(拜賀) 등 공적인 행사를 행하던, 가장 격식이 높은 고텐(御殿)이다. 가장 높은 자리인 조단노마(上段之間)에 쇼군이 북쪽을 등지고 추단노마(中段之間), 게단노마(下段之間)를 향해 앉는다. 각각 단차가 있어서 가장 높은 죠단노마는 게단노마보다 42㎝ 높았다. 귄위를 연출하는 공간인 오히로마에서는 다이묘가 앉는 장소가 격식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고, 추단노마, 게단노마, 二之間, 三之間, 四之間, 五之間, 納戶가 中庭을 둘러싸는 형태로 총 500조(畳)로 구성되어 있었다. (https://wako226.exblog.jp/16483689/ 참조)

삼사
고산케(御三家)가 접대역으로 배석주 016
이때는 기이 주나곤(紀伊中納言) 님
마쓰노마(松之間)
상상관
도라노마(虎之間)
학사(學士)
양의(良醫)
상판사(上判事)
같은 곳 병풍 칸막이
군관(軍官)
압물판사(押物判事)주 017
각주 017)

조선시대 중국이나 일본과의 사행(使行) 때 세폐(歲幣)를 비롯한 각종 방물(方物)과 예물 등을 기록, 운송, 관리, 수납하는 일과 함께 통역을 담당했던 관리. 압물통사(押物通詞), 압물관(押物官), 압물통관(押物通官), 압물판사(押物判事)라고도 했는데, 압물관과 압물통관은 연행(燕行)에서 자주 사용하였고, 압물판사는 일본에서 사용했다. 약칭으로 압물(押物)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모두 사역원(司譯院)의 역관들로 임명되었다. 통신사행의 압물통사는 초기에는 왜학역관(倭學譯官) 2인, 한학역관(漢學譯官) 1인으로 구성되었으나 1682년부터 왜학역관 1인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공식예물을 호송하는 외에 소량의 사물(私物)을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대외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무역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1763년 통신사 때에는 현계근(玄啓根)이 일방(一房) 소속 압물통사로 사행에 참여하여 왜어(倭語)로 된 물명(物名)을 담당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은 적이 있다. (대일관계 용어사전)

서기(書記)
사자관(寫字官)
화사(畵士)
야나기노마(柳之間)
군관(軍官)
모미지노마(紅葉之間)
차관(次官)
소동(小童)
이는 3즙 11채(三汁十一菜) 요리이며 차림판은 말미에 기록함.
중관(中官)
오테몬(大手門) 대기소
하관 팥밥
一. 향응을 마치고 삼사에게 쓰시마노카미가 인사했다. 마쓰노마(松之間)로 이동하게 유도하여 삼사는 이전처럼 미닫이 장지 부근에서 동쪽으로 5번째 다타미에 서향으로 늘어앉았다. 이때 쓰시마노카미도 같은 자리에서 남쪽으로 나갔다. 상상관은 이전과 같이 툇마루로 나갔다. 이때 도시요리(年寄)들은 마쓰노마에 나와 미닫이 장지의 북쪽 위편에 동향으로 늘어앉았다. 이때 삼사는
상상관을 불러 향응에 대한 감사의 말을 표했다. 상상관은 조금 물러나 쓰시마노카미에게 이를 전했고, 쓰시마노카미는 도시요리(年寄)들에게 전했다. 또한 이번에 삼사와 동행하면서 만사가 시종일관 훌륭하게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뜻을, 쓰시마노카미에게 도시요리들이 인사했다. 마치고 삼사가 물러났다. 이때 지샤부교(寺社奉行)·오메쓰케(大目付)·접대인들이 삼사와 함께 가고 상상관이 뒤따랐다. 도시요리들은 쇼인(書院)주 020 경비소(番所) 앞까지 배웅했다. 이곳에서 삼사들에게 두 번 읍했다. 쓰시마노카미·지샤부교·오메쓰케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한편, 오히로마(大廣間)에서 조선인이 예를 마치고,
[쇼군이] 안으로 들어간 후에 발을 내린다. 하단 서쪽 문의 발을 내리고, 자리를 정돈한 후 기이(紀伊) 님이 서쪽 부엌으로부터 나와 하단 위에서 3번째 다타미 서쪽에 앉는다. 이때 쓰시마노카미가 안내하여 삼사가 마쓰노마(松之間)로부터 나온다. 기이 님과 삼사가 서로 두 번 읍한다. 삼사는 동쪽의 미닫이 장지 부근에 앉는다.
요리를 낸다.
급사들은 겹옷에 관을 쓴 모습이다.
다치(太刀)는 휴대하지 않는다.
한편, 향응 중에는 서쪽 툇마루에 도시요리들이 늘어앉는다. 같은 곳 부엌 쪽에는 마쓰다이라 셋쓰노카미(松平攝津守)가 자리하고, 쓰시마노카미는 동쪽 툇마루에 자리하며 때때로 삼사 쪽으로 온다.
위 과정이 끝나고 기이 님이 삼사를 향해 두 번 읍한 후, 부엌으로 물러난다. 삼사는 마쓰노마의 향응이 끝날 때까지 본래의 자리에 착석한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에도성 안에서 가장 큰 서원(書院). 쇼군 임명 의식,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 발포, 새해 정월의 배하(拜賀) 등 공적인 행사를 행하던, 가장 격식이 높은 고텐(御殿)이다. 가장 높은 자리인 조단노마(上段之間)에 쇼군이 북쪽을 등지고 추단노마(中段之間), 게단노마(下段之間)를 향해 앉는다. 각각 단차가 있어서 가장 높은 죠단노마는 게단노마보다 42㎝ 높았다. 귄위를 연출하는 공간인 오히로마에서는 다이묘가 앉는 장소가 격식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고, 추단노마, 게단노마, 二之間, 三之間, 四之間, 五之間, 納戶가 中庭을 둘러싸는 형태로 총 500조(畳)로 구성되어 있었다. (https://wako226.exblog.jp/16483689/ 참조)
- 각주 016)
-
각주 017)
조선시대 중국이나 일본과의 사행(使行) 때 세폐(歲幣)를 비롯한 각종 방물(方物)과 예물 등을 기록, 운송, 관리, 수납하는 일과 함께 통역을 담당했던 관리. 압물통사(押物通詞), 압물관(押物官), 압물통관(押物通官), 압물판사(押物判事)라고도 했는데, 압물관과 압물통관은 연행(燕行)에서 자주 사용하였고, 압물판사는 일본에서 사용했다. 약칭으로 압물(押物)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모두 사역원(司譯院)의 역관들로 임명되었다. 통신사행의 압물통사는 초기에는 왜학역관(倭學譯官) 2인, 한학역관(漢學譯官) 1인으로 구성되었으나 1682년부터 왜학역관 1인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공식예물을 호송하는 외에 소량의 사물(私物)을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대외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무역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1763년 통신사 때에는 현계근(玄啓根)이 일방(一房) 소속 압물통사로 사행에 참여하여 왜어(倭語)로 된 물명(物名)을 담당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은 적이 있다. (대일관계 용어사전)
- 각주 018)
- 각주 019)
- 각주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