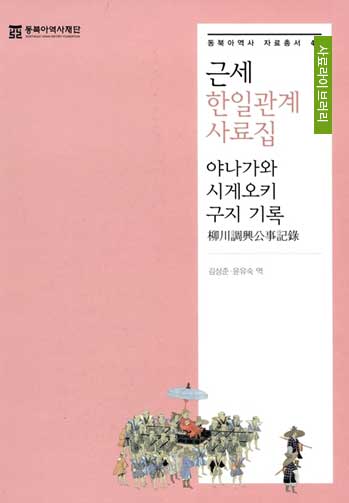통신사 등성(登城) 행렬 및 참가자, 복장, 기물(器物) 등
一. 2월 27일 [통신사] 등성 행렬주 001
마(麻) 상하의, 보행(步行) 말 진상 마 상하의, 보행 사(士) 2인
사무라이(侍) 1인 말 사무라이 1인 아시가루(足輕) 2인
마부 2인
신발함
모리 노토노카미(毛利能登守) 가신 가토 도토미노카미(加藤遠江守) 가신
기마(騎馬) 기마 좌우 기마는 마(麻) 상하의에
하인 하인 하인 하인
同 20기(騎) 同 20기 길에 종자[供人]들 늘어섬
통사(通詞) 마(麻) 상하의 통사 마 상하의
소통사(小通事)주 003
각주 003)

조선인 소통사 조선인중앙에서 파견한 왜학역관(倭學譯官)인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를 보좌하는 하급 통사(通事). 소통사는 조선전기의 왜학 생도와 비슷한 존재이며, 삼포 왜관 시대에도 부산포 왜관에 왜학생도가 있었다. 소통사의 정원은 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처음에는 16인을 두었고, 1703년에 35인으로 증가했다가 1739년에 30인으로 정해졌다. 중앙에서 파견된 훈도·별차와 동래 현지인으로서 이들을 보좌하는 소통사는 통역관의 위계나 역할에서 구분되었다. 소통사는 사절의 연향을 준비하고, 양국인의 왕래를 규제하며, 왜관의 물품 관리나 통역 등은 물론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참여했다. 『증정교린지』에는 통신사행에 10인, 문위행에 4인의 소통사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통사의 경우 맡은 일에 따라 다양하게 일컬었는데, 문위행 때 쓰시마에 도해하는 소통사를 도해통사(渡海通事), 통신사행을 수행하는 소통사를 신행통사(信行通事), 임소의 문부(文簿)를 관장하는 소통사를 서기통사(書記通事), 잔심부름을 하는 소통사를 통인통사(通引通事)라고 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통신사 행렬이 들고 있는 깃발 묘사]
바탕 청색, 글자 홍색
청도(淸道)주 004
각주 004)

좌우열(左右列) 하관(下官)주 005 보행청도기(淸道旗). 사행 때 앞서 가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깃발. 원래는 행군할 때 사용하는 군기(軍旗)의 일종이다. 남빛 바탕에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이며, ‘淸道’라고 쓰여 있다. 청도기를 들고 가는 사람을 청도기수(淸道旗手)라고 하고, 일본에서 구분한 통신사의 등급 가운데 중관(中官)에 속한다. 1694년 쓰시마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사망하자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승습하고, 은퇴했던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섭정하게 되자 조선은 이 일로 문위행(問慰行)을 파견했는데 이때부터 청도기를 사용했다. 임금의 명을 전하는 국서전명의식 때 의장대를 설치하여 북을 치고 나팔을 분다. 통신사행 때 청도기가 행렬의 맨 앞에 서고 독기(纛旗), 형명기(形名旗),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가 그 뒤를 잇는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언월도(偃月刀)주 007 좌우열 하관 보행
대형명기(大形名旗)주 008
각주 008)

운룡화(雲龍畵). 바탕 엷은 남색, 가장자리는 붉은색. 길이 9척 폭 5척 정도. 하관(下官) 마상(馬上)형명기(形名旗)는 조선 왕권의 상징인 용(龍)이 그려져 있는 깃발. 형명기독(形名旗纛)이라고도 한다. 형명(形名)의 형(形)은 깃발을, 명(名)은 징이나 북을 뜻한다. 사행 때에 북을 울리면서 기폭(旗幅)을 이용하여 사행단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하며 신호를 보냈다. 형명기를 받들고 가는 사람을 형명기수(形名旗手)라고 하며, 일본에서 통신사절단을 구분하는 등급 가운데 중관(中官)에 속한다. 통신사행 때 대개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각각 1명씩 거느렸다. 형명기는 청도기(淸道旗), 독기(纛旗), 순시기(巡視旗) 등과 함께 통신사행 때의 경외노수(京外路需)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각 도(道)에 복정(卜定)하여 거두어들였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밧줄잡이(綱引) 일본인 3,4인 청통(淸筒)
마부 ▲ 마부 마부 ▲ 마부
사무라이 도훈도(都訓道)주 010
각주 010)

사무라이 사무라이 도훈도 사무라이조선의 역관 훈도(訓導)의 우두머리. 훈도는 조선시대 한양의 4학(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敎官)으로 산학(算學), 율학(律學), 역학(譯學), 지리학, 의학 등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담당했다. 통신사행렬 때에는 주로 청도기(淸道旗), 독기(纛旗), 형명기(形名旗) 다음과 영기(令旗) 다음, 그리고 마상재(馬上才), 전악(典樂) 주변에 위치하여 나졸들과 하부 원역(員役)들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다. 통신사행 때 삼사신이 각각 1,2명씩 총 3~6명을 거느렸다. 일본에서 사절단을 구분하는 등급 가운데 문위행(問慰行) 때에는 상관(上官)에, 통신사행 때에는 중관(中官)에 속했다. (대일관계 용어사전)

마(麻) 상하의 마 상하의
마상(馬上) 1인 마상 1인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긴 창(長柄) 긴 창
同 同
同 同
좌우열(左右列) 하관(下官) 보행
바탕은 옅은 황색, 글자는 붉은색, 가장자리는 붉은색
순시(巡視) 좌우열 하관 보행
삼지창(三枝槍) 좌우열 하관 보행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 색
포대에 넣음(布袋入) 포대에 넣음
마부 ▲ 마부 마부 ▲ 마부
활·화살·다치 휴대 활·화살·다치 휴대
사무라이 도훈도(都訓道) 사무라이 사무라이 도훈도 사무라이
마상(馬上) 1인 마상 1인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긴 창(長柄) 긴 창
[통신사 행렬이 들고 있는 도구, 악기 묘사]
도척(刀尺)주 013
목재
포대에 넣음. 좌우열(左右列) 중관(中官)주 014
각주 014)

보행통신사에 대한 일본 측 등급 중의 하나. 복선장(卜船將), 배소동(陪小童), 노자(奴子), 소통사(小通事), 도훈도(都訓導), 예단직(禮單直), 청직(廳直), 반전직(盤纏直), 사령(使令), 취수(吹手), 절월봉지(節鉞奉持), 포수(砲手), 도척(刀尺), 사공(沙工), 형명수(形名手), 둑수(纛手), 월도수(月刀手), 순시기수(巡視旗手), 영기수(令旗手), 청도기수(淸道旗手), 삼지창수(三枝槍手), 장창수(長槍手), 마상고수(馬上鼓手), 동고수(銅鼓手), 대고수(大鼓手), 삼혈총수(三穴銃手), 세악수(細樂手), 쟁수(錚手)을 일본 측이 구분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이 관인(官人)이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어 “오니리”라고 말한다.
나팔수(喇叭手)주 015
놋쇠
4척 가량이 됨. 좌우대열로 분다. 중관 보행
그물에 넣음.
좌우대열로 분다. 중관(中官) 보행
세악(細樂)주 017
세 군데에 늘어선다. 중관 보행
태평소(太平簫)주 018
각주 018)

목관악기의 일종. 대평소(大平簫), 쇄납, 호적(胡笛, 號笛), 철적(鐵笛), 난난이, 날라리, 사납이라고도 한다. 대평소는 악기 명칭인 동시에 군영에서 태평소를 연주하는 군사를 지칭하기도 한다. 생김새는 원뿔형 관의 넓은 쪽 끝에 나팔 모양의 동팔랑(銅八郞)이 있으며, 반대쪽에는 동구(銅口)가 있다. 공무로 행차할 때에는 출입과 동작에서 태평소를 부는 것을 절차로 삼았다. 통신사 행렬과 통신사의 국서 전달의식 때에도 태평소와 나팔을 불어 길을 인도했고, 일본 측 관리가 쓰시마 번주의 말을 전하러 오면 이를 공무라하여 태평소를 불어서 맞이하고 배웅했다. (대일외교용어사전)

좌우열(左右列). 중관(中官) 보행
대세악(大細樂)
이것은 이 열로 목에 걸고 친다. 중관 보행
마부 마부 마부 마부
마상재 마상재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시가루 마상(馬上)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긴 창(長柄) 긴 창
同 同
同 同
좌우
중관(中官) 보행
피리
좌우열(左右列). 중관 보행
좌우열(左右列). 중관(中官) 보행
징
좌우열. 중관 보행
전악(典樂)주 023
각주 023)

당관(唐冠)주 024
사절단의 행렬, 의식, 연회 등의 음악을 담당한 관원.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되어 있고, 정6품 잡직(雜職)의 하나로 체아직(遞兒職)이다. 전악은 원래 진연(進宴) 시 모라복두(冒羅幞頭)를 쓰고 남색주(藍色紬) 안감을 댄 녹초삼(綠綃衫)을 입으며 야대(也帶)를 매고 흑화(黑靴)를 신었다. 고수(鼓手)는 큰북, 동고수(銅鼓手)는 꽹과리, 세악수(細樂手)는 장구, 큰북, 피리, 해금 등을 연주하되, 각 악기의 연주자는 전악의 지휘하에 연주했다. 이들은 모두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통신사의 악대에 선발되었다. 통신사행 때 정사와 부사 및 종사관에 각각 배속되는 경우도 있고, 정사와 부사 혹은 정사와 종사관에만 배속되는 경우도 있어, 사행 때마다 그 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2,3명 정도가 참여했다. 차관(次官)에 속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1인 마상(馬上) 마(麻) 상하의를 입은 사(士) 2인
▲ ▲ 아시가루(足輕) 2인, 긴 창, 신발함,
[조선의 국서를 운반하는 가마에 관한 묘사]
서한 가마(書翰轎)
국서
[가마의 크기] 높이 4척 9촌, 가로 3척 5촌, 틀 1척 1촌
일본인이 든다.
사방의 기둥에는 조각. 안은 금으로 채색.
마(麻) 상하의를 착용한 사(士) 여러 명, 아시가루 여러 명
통사(通詞) 마(麻) 상하의 통사 마 상하의
마부 마부 마부 마부
사자관주 026 당관(唐冠) 사자관 당관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시가루 마상 1인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 1인 아시가루
검게 칠한 2척 정도의 상자 두 개
말
마부 마부 마부 마부
소동(小童) 소동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馬上) 2인 마상 2인
긴 창(長柄) 긴 창
마부 △ 마부 마부 △ 마부
군관(軍官) 군관 활·화살(弓箭)·태도(太刀) 휴대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同 同
同 同
절월(節鉞)주 028
좌 우
비단 양산(羅絹傘) [위 부분은] 하늘색 견 자주빛 가죽. 일렬 하관(下官) 보행
[정사가 타는] 가마
▲ ▲
흡창(吸唱)주 029 흡창
사무라이 마(麻) 상하의 관인 관인 사무라이 마(麻) 상하의
하관(下官) 여러 명이 든다.
사무라이 사무라이
도롱이상자 긴 창
마부 ▲ 마부 마부 ▲ 마부
사무라이 군관 1인 사무라이 사무라이 군관 1인 사무라이
아시가루(足輕) 마상(馬上)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마부 唐冠 마부
사무라이 제술관(製述官)주 030
각주 030)

1명 사무라이통신사행 때 전례문(典禮文) 등을 지어 바치는 임시 벼슬. 문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선발하였고, 정사가 타고 가는 제일선(第一船)에 배속되었다. 제술관이라는 명칭은 1682년 통신사행 때부터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학관(學官), 이문학관(吏文學官), 독축관(讀祝官) 등의 명칭으로 사행에 참여했다. 학관에서 독축관으로의 명칭 변화는 통신사행의 일광산치제(日光山致祭) 참여로 인하여 축문을 읽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광산치제 폐지 이후에는 필담창화(筆談唱和)와 같은 문화교류의 전담자로서 제술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마부 마부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마상 마상 마상
각 마부·사무라이·아시가루에 긴 창이 따름
통사(通詞) 마(麻) 상하의 통사 마 상하의
청도기(淸道旗) 2열
독기(纛旗) 1열 마상(馬上)
대형명기(大形名旗) 1열
언월도(偃月刀) 언월도
마부 마부 마부 마부
사무라이 도훈도(都訓道) 사무라이 사무라이 도훈도 사무라이
활·화살·태도 휴대 활·화살·태도 휴대
아시가루 마상(馬上)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同 同
同 同
긴 창 긴 창 하관(下官)
순시기(巡視旗) 순시기 하관
삼지창(三枝槍) 삼지창 하관
영기(令旗) 영기 하관
철포(鐵炮) 2열
마부 마부 마부 마부
활·화살·태도 휴대 활·화살·태도 휴대
사무라이 도훈도 사무라이 사무라이 도훈도 사무라이
아시가루(足輕) 1인 마상(馬上) 아시가루 아시가루 1인 마상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도척(刀尺) 도척
나팔수 나팔수 중관(中官)
나각수(螺角手) 나각수 (中官)
태평소 태평소 중관
세악 세악 중관
대세악 대세악 중관
마부 마부 마부 마부
마상재(馬上才) 마상재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마상(馬上) 3인 마상 3인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적(笛) 해금 중관(中官)
피리 피리 同
자바라(錚子) 자바라 중관(中官)
징 징 중관
휴상(休床)
사령(使令)주 033 사령
마부 마부 마부 마부
소동(小童) 소동
마상(馬上) 마상
아시가루 2인 아시가루 아시가루 2원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마부 마부 마부 마부
군관(軍官) 군관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3인 3인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절월(節鉞) 절월 하관(下官)
비단 양산[羅絹傘]
흡창 부사(副使) 가마 흡창
사무라이 마(麻) 상하의 사무라이 마 상하의
사무라이 同 사무라이 同
정사(正使)와 같음
도롱이상자 단, 표범가죽 도롱이상자
통사(通詞) 마(麻) 상하의 통사 마 상하의
하관(下官)
청도기(淸道旗) 청도기
독기(纛旗) 하관
마상(馬上)
대형명기(大形名旗) 하관
마상
언월도(偃月刀) 언월도
마부 마부 마부 마부
도훈도(都訓道) 도훈도 활·화살·태도 휴대
아시가루 마상(馬上)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긴 창 긴 창
同 同
同 同
긴 창 긴 창 하관(下官)
순시기(巡視旗) 순시기 同
삼지창(三枝槍) 삼지창 同
영기(令旗) 영기 同
포(鉋) 포
마부 마부 마부 마부
도훈도 도훈도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1인 마상 1인 마상
긴 창(長柄) 긴 창
도척(刀尺) 도척
나팔수(喇叭手) 나팔수 중관(中官)
나각수(螺角手) 나각수 同
태평소(太平嘯) 태평소 同
세악(細樂) 세악 同
대세악(大細樂) 대세악 중관(中官)
마부 마부 마부 마부
마상재(馬上才) 마상재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상(馬上) 3인 마상 3인
긴 창(長柄) 긴 창
횡적(橫笛) 해금 중관
피리 피리 중관(中官)
자바라(錚子) 자바라
징 징 同
휴상(休床)
사령(使令) 사령
마부 마부 마부 마부
소동(小童) 소동
마상(馬上) 마상
아시가루 2인 아시가루 아시가루 2인 아시가루
긴 창(長柄) 긴 창
마부 마부 마부 마부
군관(軍官) 군관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마상 아시가루 마상 아시가루
긴 창(長柄) 긴 창
同 同
同 同
통사(通詞) 마(麻) 상하의 통사 마 상하의
비단 양산
흡창(吸唱) 흡창
사무라이 마 상하의 종사관(從事官) 가마 사무라이 마 상하의
同 同
도롱이 상자 부사(副使)와 같음 긴 창
통사(通詞) 통사
마부 마부
소동(小童)
아시가루 아시가루
긴 창
사령(使令) 사령
당관(唐冠)
사무라이 상하의 당상관 가마 사무라이 마 상하의
사령(使令) 사령
同
사령 사령
同
사무라이 양의(良醫) 가마 사무라이
마부 마부 마부 마부
군관(軍官) 군관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마부 마부 마부 마부
마상재(馬上才) 마상재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아시가루
하관(下官) 여러 명
단, 장로(長老) 2인, 상상관 1인이 삼사보다 먼저 도착하다.
사무라이 사무라이 사무라이
창 긴 창
하사미바코(挾箱)주 037 가마 하사미바코
말
기마(騎馬)
오사에 일행 오사에
조선인은 말을 탄 사람들에게 신발함을 드는 사람 1명씩 붙음. 이곳에 2개 행렬
가마[旅輿]
삼사 모두 [가마에] 탄다.
[가마는] 전체를 아지로(網代) 기법으로 엮은 형태이고,주 040 장지[障子]주 041는 밤색. 교대용 가마 2정(挺)씩을 오사카에서 접대용으로 제공했다.
등(燈)
그림과 같이 연둣빛 주머니를 건다.
그림과 같이 접는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중앙에서 파견한 왜학역관(倭學譯官)인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를 보좌하는 하급 통사(通事). 소통사는 조선전기의 왜학 생도와 비슷한 존재이며, 삼포 왜관 시대에도 부산포 왜관에 왜학생도가 있었다. 소통사의 정원은 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처음에는 16인을 두었고, 1703년에 35인으로 증가했다가 1739년에 30인으로 정해졌다. 중앙에서 파견된 훈도·별차와 동래 현지인으로서 이들을 보좌하는 소통사는 통역관의 위계나 역할에서 구분되었다. 소통사는 사절의 연향을 준비하고, 양국인의 왕래를 규제하며, 왜관의 물품 관리나 통역 등은 물론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참여했다. 『증정교린지』에는 통신사행에 10인, 문위행에 4인의 소통사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통사의 경우 맡은 일에 따라 다양하게 일컬었는데, 문위행 때 쓰시마에 도해하는 소통사를 도해통사(渡海通事), 통신사행을 수행하는 소통사를 신행통사(信行通事), 임소의 문부(文簿)를 관장하는 소통사를 서기통사(書記通事), 잔심부름을 하는 소통사를 통인통사(通引通事)라고 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4)
청도기(淸道旗). 사행 때 앞서 가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깃발. 원래는 행군할 때 사용하는 군기(軍旗)의 일종이다. 남빛 바탕에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이며, ‘淸道’라고 쓰여 있다. 청도기를 들고 가는 사람을 청도기수(淸道旗手)라고 하고, 일본에서 구분한 통신사의 등급 가운데 중관(中官)에 속한다. 1694년 쓰시마 번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사망하자 소 요시미치(宗義方)가 11살의 어린 나이로 승습하고, 은퇴했던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섭정하게 되자 조선은 이 일로 문위행(問慰行)을 파견했는데 이때부터 청도기를 사용했다. 임금의 명을 전하는 국서전명의식 때 의장대를 설치하여 북을 치고 나팔을 분다. 통신사행 때 청도기가 행렬의 맨 앞에 서고 독기(纛旗), 형명기(形名旗),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가 그 뒤를 잇는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형명기(形名旗)는 조선 왕권의 상징인 용(龍)이 그려져 있는 깃발. 형명기독(形名旗纛)이라고도 한다. 형명(形名)의 형(形)은 깃발을, 명(名)은 징이나 북을 뜻한다. 사행 때에 북을 울리면서 기폭(旗幅)을 이용하여 사행단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하며 신호를 보냈다. 형명기를 받들고 가는 사람을 형명기수(形名旗手)라고 하며, 일본에서 통신사절단을 구분하는 등급 가운데 중관(中官)에 속한다. 통신사행 때 대개 정사(正使)와 부사(副使)가 각각 1명씩 거느렸다. 형명기는 청도기(淸道旗), 독기(纛旗), 순시기(巡視旗) 등과 함께 통신사행 때의 경외노수(京外路需)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각 도(道)에 복정(卜定)하여 거두어들였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9)
-
각주 010)
조선의 역관 훈도(訓導)의 우두머리. 훈도는 조선시대 한양의 4학(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敎官)으로 산학(算學), 율학(律學), 역학(譯學), 지리학, 의학 등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담당했다. 통신사행렬 때에는 주로 청도기(淸道旗), 독기(纛旗), 형명기(形名旗) 다음과 영기(令旗) 다음, 그리고 마상재(馬上才), 전악(典樂) 주변에 위치하여 나졸들과 하부 원역(員役)들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다. 통신사행 때 삼사신이 각각 1,2명씩 총 3~6명을 거느렸다. 일본에서 사절단을 구분하는 등급 가운데 문위행(問慰行) 때에는 상관(上官)에, 통신사행 때에는 중관(中官)에 속했다. (대일관계 용어사전)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통신사에 대한 일본 측 등급 중의 하나. 복선장(卜船將), 배소동(陪小童), 노자(奴子), 소통사(小通事), 도훈도(都訓導), 예단직(禮單直), 청직(廳直), 반전직(盤纏直), 사령(使令), 취수(吹手), 절월봉지(節鉞奉持), 포수(砲手), 도척(刀尺), 사공(沙工), 형명수(形名手), 둑수(纛手), 월도수(月刀手), 순시기수(巡視旗手), 영기수(令旗手), 청도기수(淸道旗手), 삼지창수(三枝槍手), 장창수(長槍手), 마상고수(馬上鼓手), 동고수(銅鼓手), 대고수(大鼓手), 삼혈총수(三穴銃手), 세악수(細樂手), 쟁수(錚手)을 일본 측이 구분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목관악기의 일종. 대평소(大平簫), 쇄납, 호적(胡笛, 號笛), 철적(鐵笛), 난난이, 날라리, 사납이라고도 한다. 대평소는 악기 명칭인 동시에 군영에서 태평소를 연주하는 군사를 지칭하기도 한다. 생김새는 원뿔형 관의 넓은 쪽 끝에 나팔 모양의 동팔랑(銅八郞)이 있으며, 반대쪽에는 동구(銅口)가 있다. 공무로 행차할 때에는 출입과 동작에서 태평소를 부는 것을 절차로 삼았다. 통신사 행렬과 통신사의 국서 전달의식 때에도 태평소와 나팔을 불어 길을 인도했고, 일본 측 관리가 쓰시마 번주의 말을 전하러 오면 이를 공무라하여 태평소를 불어서 맞이하고 배웅했다. (대일외교용어사전)
- 각주 019)
- 각주 020)
- 각주 021)
- 각주 022)
-
각주 023)
사절단의 행렬, 의식, 연회 등의 음악을 담당한 관원.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되어 있고, 정6품 잡직(雜職)의 하나로 체아직(遞兒職)이다. 전악은 원래 진연(進宴) 시 모라복두(冒羅幞頭)를 쓰고 남색주(藍色紬) 안감을 댄 녹초삼(綠綃衫)을 입으며 야대(也帶)를 매고 흑화(黑靴)를 신었다. 고수(鼓手)는 큰북, 동고수(銅鼓手)는 꽹과리, 세악수(細樂手)는 장구, 큰북, 피리, 해금 등을 연주하되, 각 악기의 연주자는 전악의 지휘하에 연주했다. 이들은 모두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통신사의 악대에 선발되었다. 통신사행 때 정사와 부사 및 종사관에 각각 배속되는 경우도 있고, 정사와 부사 혹은 정사와 종사관에만 배속되는 경우도 있어, 사행 때마다 그 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2,3명 정도가 참여했다. 차관(次官)에 속한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24)
- 각주 025)
- 각주 026)
- 각주 027)
- 각주 028)
- 각주 029)
-
각주 030)
통신사행 때 전례문(典禮文) 등을 지어 바치는 임시 벼슬. 문장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선발하였고, 정사가 타고 가는 제일선(第一船)에 배속되었다. 제술관이라는 명칭은 1682년 통신사행 때부터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학관(學官), 이문학관(吏文學官), 독축관(讀祝官) 등의 명칭으로 사행에 참여했다. 학관에서 독축관으로의 명칭 변화는 통신사행의 일광산치제(日光山致祭) 참여로 인하여 축문을 읽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광산치제 폐지 이후에는 필담창화(筆談唱和)와 같은 문화교류의 전담자로서 제술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31)
- 각주 032)
- 각주 033)
- 각주 034)
- 각주 035)
- 각주 036)
- 각주 037)
- 각주 038)
- 각주 039)
- 각주 040)
- 각주 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