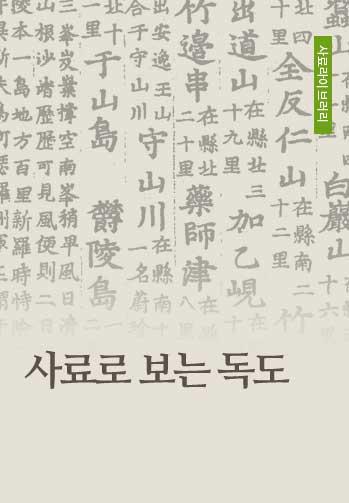대사간 이수언이 응지하여 인재의 등용·과세의 지나침·해안 경비 등을 상소하다
사료해설
대사간 이수언(李秀彦)이 해안 방비를 주문하며 올린 상소 내용이다. 고려 말년에는 왜구의 침략이 영동지방까지 이르렀고, 근년에는 영동과 영남지방의 어민들이 예사롭게 울릉도를 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본인들의 침탈에 대비하여 해안방비를 엄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숙종대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조정은 물론 일반백성을 망라한 일반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울릉도의 방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문
○庚午/大司憲李秀彦應旨上疏曰:
數十年來, 陰陽之消長相仍, 朝著之變革無常, 刑戮之慘, 先及於崇高之地, 竄逐之禍, 偏加於通顯之家, 故士民之視卿相, 如視鬼朴, 胥徒之遇官吏, 有同逆旅, 上下乖離, 莫相維攝。 古人所謂紀綱體統, 非所暇論, 願殿下, 自今開示誠信, 內外洞然, 使在下之人, 展布四體, 則朝廷自尊, 風俗可變, 豈不休哉? 今之朝議, 率以寬容爲主, 沐浴請討之論, 只爲兩司謄傳之啓, 而無一人爲殿下別白言之者, 此可謂得是非之正乎? 彼或以一言半辭, 草草塞責於坤聖出宮之時者, 有何可紀之功? 而除拜相續, 至其戕賢之罪, 則全不致罰, 此果可謂得稱停之中乎? 遂令丁思愼之徒, 爲半日庭請之相臣, 顯爲贊楊之辭, 事之可駭, 孰大於此? 至於李后定之疏, 則志操特異, 誠有可尙, 如此之人, 正合追奬, 而其他憲臣陳疏, 指陳頗僻之失, 或以士子發憤自廢於曩時者, 亦不無其人, 不可不褒奬收錄, 以礪流俗也。 向者崇用嶺南人, 乘軺鳴玉之外, 居嶺邑嶺閫者, 幾至三十餘之多, 厥後罷去者過半, 而仍蹲者, 亦以其家近之故, 肆行不法之事, 就其中尤無良者, 稍加澄汰然後, 民生可蘇也。 咸鏡一道, 自故相閔鼎重爲監司, 始爲詳定。【倣大同法而爲之者。】民皆便之。 近有科外徵布之規, 大爲民弊, 至於六鎭牧民之官, 皆是武弁, 徵斂無藝, 宜遣文官之有才望者, 處其間, 以爲彈壓之地。 關西內奴身貢, 比他役甚苦, 侵徵隣族, 一邑之中, 免其役者幾希, 誠可愍然。 逃故之代, 雖不可盡充, 若使本道考案, 準年六十以上, 竝除其貢, 則亦可以慰悅邊民, 且峽邑火田, 收稅過濫, 宜使道臣, 時時糾察, 以爲上聞論罪之地也。 臣曾按嶺南, 巡到左道海邊, 丑山浦ㆍ包伊浦ㆍ栗浦舊鎭, 在於寧海ㆍ盈德ㆍ興海等地, 詢諸故老, 則昔者日本之侵軼, 或及於此, 故設鎭以防。 其後水宗變易, 故漸移各鎭於東萊以下, 而舊址猶在云。 其言雖不可徵信, 而以《麗史》觀之, 麗末倭患, 及於嶺東ㆍ近年嶺東ㆍ嶺南, 漁採之民, 尋常往來於鬱陵島, 則水宗變易之說, 或不至於孟浪耶? 天下之患, 多生所忽, 乞更以海道爲念, 嚴加防禁焉。”
上奬納之。 凡可議者, 下于該曹。
數十年來, 陰陽之消長相仍, 朝著之變革無常, 刑戮之慘, 先及於崇高之地, 竄逐之禍, 偏加於通顯之家, 故士民之視卿相, 如視鬼朴, 胥徒之遇官吏, 有同逆旅, 上下乖離, 莫相維攝。 古人所謂紀綱體統, 非所暇論, 願殿下, 自今開示誠信, 內外洞然, 使在下之人, 展布四體, 則朝廷自尊, 風俗可變, 豈不休哉? 今之朝議, 率以寬容爲主, 沐浴請討之論, 只爲兩司謄傳之啓, 而無一人爲殿下別白言之者, 此可謂得是非之正乎? 彼或以一言半辭, 草草塞責於坤聖出宮之時者, 有何可紀之功? 而除拜相續, 至其戕賢之罪, 則全不致罰, 此果可謂得稱停之中乎? 遂令丁思愼之徒, 爲半日庭請之相臣, 顯爲贊楊之辭, 事之可駭, 孰大於此? 至於李后定之疏, 則志操特異, 誠有可尙, 如此之人, 正合追奬, 而其他憲臣陳疏, 指陳頗僻之失, 或以士子發憤自廢於曩時者, 亦不無其人, 不可不褒奬收錄, 以礪流俗也。 向者崇用嶺南人, 乘軺鳴玉之外, 居嶺邑嶺閫者, 幾至三十餘之多, 厥後罷去者過半, 而仍蹲者, 亦以其家近之故, 肆行不法之事, 就其中尤無良者, 稍加澄汰然後, 民生可蘇也。 咸鏡一道, 自故相閔鼎重爲監司, 始爲詳定。【倣大同法而爲之者。】民皆便之。 近有科外徵布之規, 大爲民弊, 至於六鎭牧民之官, 皆是武弁, 徵斂無藝, 宜遣文官之有才望者, 處其間, 以爲彈壓之地。 關西內奴身貢, 比他役甚苦, 侵徵隣族, 一邑之中, 免其役者幾希, 誠可愍然。 逃故之代, 雖不可盡充, 若使本道考案, 準年六十以上, 竝除其貢, 則亦可以慰悅邊民, 且峽邑火田, 收稅過濫, 宜使道臣, 時時糾察, 以爲上聞論罪之地也。 臣曾按嶺南, 巡到左道海邊, 丑山浦ㆍ包伊浦ㆍ栗浦舊鎭, 在於寧海ㆍ盈德ㆍ興海等地, 詢諸故老, 則昔者日本之侵軼, 或及於此, 故設鎭以防。 其後水宗變易, 故漸移各鎭於東萊以下, 而舊址猶在云。 其言雖不可徵信, 而以《麗史》觀之, 麗末倭患, 及於嶺東ㆍ近年嶺東ㆍ嶺南, 漁採之民, 尋常往來於鬱陵島, 則水宗變易之說, 或不至於孟浪耶? 天下之患, 多生所忽, 乞更以海道爲念, 嚴加防禁焉。”
上奬納之。 凡可議者, 下于該曹。
번역문
대사간 이수언(李秀彦)이 응지(應旨)하여 상소하기를,
“몇 십년 이래로 음양(陰陽)의 소장(消長)이 서로 잇달고 조정의 변혁(變革)이 무상하여, 참혹하게 죽이는 형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미치고, 내쫓아 귀양 보내는 화가 명망이 있는 가문에 치우치게 가해졌기 때문에 사민(士民)들이 경상(卿相)을 귀박(鬼朴)처럼 보고 서리(胥吏)들이 관원을 나그네처럼 대하여, 상하가 괴리되고 서로 유대(紐帶) 관계가 없으니, 옛사람이 말한 ‘기강(紀綱)이나 체통(體統)은 논할 겨를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제부터 성신(誠信)을 보이시고 안팎을 툭 트이게 하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체(四體)를 쭉 펼 수 있게 하신다면, 조정이 저절로 높아지고 풍속이 고쳐질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조정 의논이 대개 모두 관대하게 용납하기를 주장하여, 목욕(沐浴)하고 토죄(討罪)하기를 청하는 논계(論啓)는 단지 양사(兩司)만이 등서(謄書)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누구 하나 전하를 위해 명백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시비의 정당함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더러 초초(草草)한 한 마디 말이나 반 구절의 말로 곤성(坤聖)께서 궁궐을 나가실 때의 일을 색책(塞責)한 것이 무슨 기록할 만한 공이 있는 것이라고 제배(除拜)가 잇따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진 사람들을 장살(戕殺)한 죄에 있어서는 전연 벌을 주기 않으니, 이것이 과연 알맞게 조정(調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드이어 정사신(丁思愼)의 무리로 하여금 반나절 정청(庭請)을 했던 상신(相臣)을 위해 드러나게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니, 해괴스러운 일로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후정(李后定)의 상소에 있어서는 지조가 특이한 것이어서 진실로 가상한 점이 있으니, 이러한 사람은 바로 뒤좇아 포장(褒奬)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외에 사헌부 신하들이 진달한 상소는 한편에 치우치는 짓을 한 잘못을 지적하여 진달했고, 더러 선비로서 발분(發憤)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스스로 폐치(廢置)된 사람도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니, 포장해 주고 수록(收錄)하여 잘못되어 가는 세속을 격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영남(嶺南) 사람들을 숭상하고 등용하여 승초 명옥(乘軺鳴玉)하게 된 이외에 영남의 고을 원이 되거나 영남의 곤수(閫帥)가 된 사람이 거의 30여 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뒤에 파직된 사람이 절반이 넘기는 하지만, 그대로 눌러 있는 사람들은 또한 집이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멋대로 불법(不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더욱 양심(良心)이 없는 짓을 한 자를 차차 도태(陶汰)한 다음에야 민생이 소생(蘇生)할 것입니다. 함경도(咸鏡道) 한 도는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감사(監司)일 적에야 비로서 상정(詳定)을【대동법(大同法)을 본받아 시행한 것이다.】 하여 민간에서 모두 편리하게 여겨 왔는데, 요사이는 예외의 징수(徵收)하는 규정이 생겨 큰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육진(六鎭)의 목민지관(牧民之官)들은 모두가 무관(武官)이므로 징수를 법도 없이 하고 있으니, 마땅히 문관(文官) 중에 재질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처하며 억제해 가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관서(關西)의 내노비(內奴婢)의 신공(身貢)은 딴 신역(身役)에 비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인데,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므로 온 고을 안에서 이 신역을 면하게 되는 자가 거의 드무니, 진실로 딱한 일입니다. 도고(兆故)의 대신을 비록 모두 채울 수 없겠지만, 만일 본도(本道)로 하여금 문안(文案)을 고찰하여, 나이 예순 이상이 된 사람은 모두 이 신공을 면제해준다면, 또한 변방 백성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중 고을들의 화전(火田)에 대하여 거두는 세가 지나치니, 마땅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수시로 규찰(糾察)하고 상문(上聞)하게 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영남(嶺南)을 안찰(按察)하였을 적에 좌도(左道)의 바닷가를 순찰해 보았는데, 축산포(丑山浦)·포이포(包伊浦)·율포(栗浦)의 구진(舊鎭)들이 영해(寧海)·영덕(盈德)·흥해(興海) 등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고로(古老)들에게 물어보니, ‘그전에 일본(日本)의 침범이 더러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진을 설치하여 방비했었는데, 그 뒤에는 수종(水宗)이 달라졌기 때문에 점차 각진을 동래(東萊) 이하로 옮기고 옛적의 터만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고려사(高麗史)》를 보건대 고려 말년에 왜인(倭人)들의 환란이 영동(嶺東)까지 미쳤고, 근년에는 영동과 영남의 어업(漁業)하는 민중들이 심상하게 울릉도를 갔다왔다 하고 있으니, 수종이 달라졌다는 말은 혹은 맹랑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환란은 허다히 소홀히 여기는 데에서 발생하니, 다시 해도(海道)에 유의하여 엄중하게 방금(防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칭찬하며 받아들이고, 무릇 의논해야 할 것들은 해조(該曹)에 계하(啓下)했다.
“몇 십년 이래로 음양(陰陽)의 소장(消長)이 서로 잇달고 조정의 변혁(變革)이 무상하여, 참혹하게 죽이는 형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미치고, 내쫓아 귀양 보내는 화가 명망이 있는 가문에 치우치게 가해졌기 때문에 사민(士民)들이 경상(卿相)을 귀박(鬼朴)처럼 보고 서리(胥吏)들이 관원을 나그네처럼 대하여, 상하가 괴리되고 서로 유대(紐帶) 관계가 없으니, 옛사람이 말한 ‘기강(紀綱)이나 체통(體統)은 논할 겨를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제부터 성신(誠信)을 보이시고 안팎을 툭 트이게 하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체(四體)를 쭉 펼 수 있게 하신다면, 조정이 저절로 높아지고 풍속이 고쳐질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조정 의논이 대개 모두 관대하게 용납하기를 주장하여, 목욕(沐浴)하고 토죄(討罪)하기를 청하는 논계(論啓)는 단지 양사(兩司)만이 등서(謄書)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누구 하나 전하를 위해 명백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시비의 정당함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더러 초초(草草)한 한 마디 말이나 반 구절의 말로 곤성(坤聖)께서 궁궐을 나가실 때의 일을 색책(塞責)한 것이 무슨 기록할 만한 공이 있는 것이라고 제배(除拜)가 잇따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진 사람들을 장살(戕殺)한 죄에 있어서는 전연 벌을 주기 않으니, 이것이 과연 알맞게 조정(調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드이어 정사신(丁思愼)의 무리로 하여금 반나절 정청(庭請)을 했던 상신(相臣)을 위해 드러나게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니, 해괴스러운 일로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후정(李后定)의 상소에 있어서는 지조가 특이한 것이어서 진실로 가상한 점이 있으니, 이러한 사람은 바로 뒤좇아 포장(褒奬)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외에 사헌부 신하들이 진달한 상소는 한편에 치우치는 짓을 한 잘못을 지적하여 진달했고, 더러 선비로서 발분(發憤)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스스로 폐치(廢置)된 사람도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니, 포장해 주고 수록(收錄)하여 잘못되어 가는 세속을 격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영남(嶺南) 사람들을 숭상하고 등용하여 승초 명옥(乘軺鳴玉)하게 된 이외에 영남의 고을 원이 되거나 영남의 곤수(閫帥)가 된 사람이 거의 30여 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뒤에 파직된 사람이 절반이 넘기는 하지만, 그대로 눌러 있는 사람들은 또한 집이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멋대로 불법(不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더욱 양심(良心)이 없는 짓을 한 자를 차차 도태(陶汰)한 다음에야 민생이 소생(蘇生)할 것입니다. 함경도(咸鏡道) 한 도는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감사(監司)일 적에야 비로서 상정(詳定)을【대동법(大同法)을 본받아 시행한 것이다.】 하여 민간에서 모두 편리하게 여겨 왔는데, 요사이는 예외의 징수(徵收)하는 규정이 생겨 큰 민폐가 되고 있습니다. 육진(六鎭)의 목민지관(牧民之官)들은 모두가 무관(武官)이므로 징수를 법도 없이 하고 있으니, 마땅히 문관(文官) 중에 재질과 명망이 있는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처하며 억제해 가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관서(關西)의 내노비(內奴婢)의 신공(身貢)은 딴 신역(身役)에 비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인데,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므로 온 고을 안에서 이 신역을 면하게 되는 자가 거의 드무니, 진실로 딱한 일입니다. 도고(兆故)의 대신을 비록 모두 채울 수 없겠지만, 만일 본도(本道)로 하여금 문안(文案)을 고찰하여, 나이 예순 이상이 된 사람은 모두 이 신공을 면제해준다면, 또한 변방 백성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중 고을들의 화전(火田)에 대하여 거두는 세가 지나치니, 마땅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수시로 규찰(糾察)하고 상문(上聞)하게 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영남(嶺南)을 안찰(按察)하였을 적에 좌도(左道)의 바닷가를 순찰해 보았는데, 축산포(丑山浦)·포이포(包伊浦)·율포(栗浦)의 구진(舊鎭)들이 영해(寧海)·영덕(盈德)·흥해(興海) 등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고로(古老)들에게 물어보니, ‘그전에 일본(日本)의 침범이 더러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진을 설치하여 방비했었는데, 그 뒤에는 수종(水宗)이 달라졌기 때문에 점차 각진을 동래(東萊) 이하로 옮기고 옛적의 터만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고려사(高麗史)》를 보건대 고려 말년에 왜인(倭人)들의 환란이 영동(嶺東)까지 미쳤고, 근년에는 영동과 영남의 어업(漁業)하는 민중들이 심상하게 울릉도를 갔다왔다 하고 있으니, 수종이 달라졌다는 말은 혹은 맹랑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환란은 허다히 소홀히 여기는 데에서 발생하니, 다시 해도(海道)에 유의하여 엄중하게 방금(防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칭찬하며 받아들이고, 무릇 의논해야 할 것들은 해조(該曹)에 계하(啓下)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