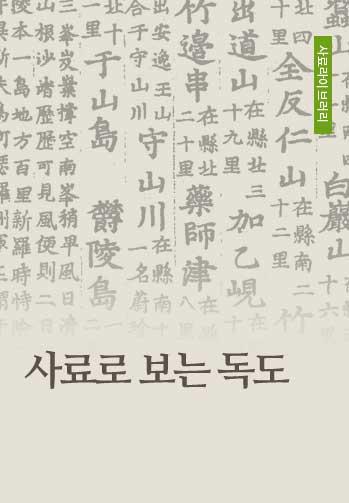제신을 인견하여 주문 짓는 일·기강 확립 등에 관해 논의하다
사료해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안용복(安龍福)의 감형을 주장한 내용이다. 그는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 등도 안용복의 참형을 반대하고, 대마도주가 이제까지 조선과 대마도 간에 있었던 ‘울릉도쟁계’의 책임이 전 도주에게 있으며,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하겠다고 한 문서를 보내온 상황에서 안용복의 공(功)으로 ‘울릉도쟁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안용복을 먼저 처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왕 숙종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용복을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정부가 대마도가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영토화를 주도하였음을 인지하고, 나아가 ‘울릉도 쟁계’ 이후 조일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右議政崔錫鼎, 稟奏文撰出事, 請以世子誕生後, 卽通彼國, 且告宗廟, 定以嫡長子, 中宮鞠養, 無異已出, 臣民屬望已久。 皇明祖訓五百里內宗藩, 慮有嫡庶爭立之患, 有此定制, 而非可用於外藩之意, 爲言, 上從之。 錫鼎言: “臣方帶文衡, 固當撰奏文, 而亦當會衆說而折衷。 請令承文提調, 竝皆製述。” 尙運言: “雖非承文提調, 如吳道一、崔奎瑞、李彦綱, 俱有文望, 宜使撰出。” 錫鼎曰: “京畿監司李畬, 亦可使撰。 上竝從之, 畬則以外官故, 只令相議。 尙運曰: “安龍福在法當誅, 而南九萬、尹趾完, 皆以爲不可輕殺, 且島倭送書, 歸罪前島主, 而鬱島則禁倭往來, 無他端, 而猝然自服, 似不無所由, 龍福不可徑先處斷。 其意蓋以倭人折服, 爲龍福之功也。” 上意亦以爲然, 命減死定配。 憲府屢啓爭之, 不從。 尙運仍以錫鼎吏判時箚, 覆奏: “其一, 量田事, 徐觀年事更稟; 其二, 免稅事, 亦待後日稟處; 其三, 身役事, 除見存外, 切勿加定; 其四, 海西大同事, 待監司狀聞後稟定; 其五, 減兵額事, 倉卒難可變通, 熟講而處之; 其六, 貢物量減事, 就元額中不緊者, 更爲稟處; 其七, 年分實結分定事, 遙度爲難, 不可輕易爲之; 其八、其九, 飢民設粥、發賣事, 旣已施行, 今無更議事; 其十, 崇節儉事。” 上命諸臣各陳所懷, 諸臣皆陳抑奢從儉之道。 執義李廷謙, 乃歸咎於紀綱之頹弛, 左議政尹趾善曰: “法官不聽干請, 則紀綱當自立矣。” 廷謙曰: “卽今宰相子弟, 方營大家, 宏侈過制。 如是而尙可望有崇儉之效耶?” 尙運折之曰: “今日則惟當勉戒君上而已, 何必多言?” 趾善弟趾慶, 方爲郵官, 貪黷無厭, 廣營家舍, 人皆駭歎, 而以相臣故, 莫敢言。 趾善法官干請之說, 觸激廷謙之怒, 乘憤發說, 而猶不擧名, 尙運知其有所指, 逆沮之。
번역문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 우의정(右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주문(奏文)을 지어낼 일을 아뢰고, 계청(啓請)하기를,
“세자(世子)가 탄생한 뒤에 즉시 피국(彼國)에 통보하였고, 또 종묘(宗廟)에 고(告)하여 적장자(嫡長子)로 정하고, 중궁(中宮)이 기르시기를 자신이 낳은 것과 다름이 없어 신민(臣民)들이 바라고 기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이므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가 옹립되기를 다투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런 제도를 정하여 두었으나, 외번(外藩)에는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뜻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최석정이 말하기를,
“신이 바야흐로 문형(文衡)을 맡고 있으니, 주문(奏文)을 짓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말을 모아 절충(折衷)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청컨대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로 하여금 아울러 모두 짓도록 하소서.”
하니,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비록 승문원 제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도일(吳道一)·최규서(崔奎瑞)·이언강(李彦綱) 같은 이는 모두 문망(文望)이 있으니, 지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자,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여(李畬)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이여는 지방관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상의(相議)하도록 하였다.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鬱陵島)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여러 번 아뢰면서 다투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유상운(柳尙運)이 인해서 최석정(崔錫鼎)이 이조 판서(吏曹判書)였을 때의 차자(箚子)를 복주(覆奏)하기를,
“첫째 양전(量田)에 관한 일은 천천히 농사를 관찰하여 다시 품지(稟旨)하겠으며, 둘째 세금을 면제하는 일 또한 후일(後日)을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으며, 세째 신역(身役)에 관한 일은 현재 살아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절실하게 보태어 정하지 말도록 하겠으며, 네째 해서(海西)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일은 감사(監司)의 장문(狀聞)을 기다린 뒤에 품정(稟定)하겠으며, 다섯째 병액(兵額)을 줄이는 일은 갑자기 변통(變通)하기 어려우니 곰곰이 강구해서 처리하겠으며, 여섯째 공물(貢物)을 헤아려서 감해야 한다는 일은, 원액(元額) 가운데 긴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품처하겠으며, 일곱째 연분(年分)의 결실(結實)을 나누어 정하는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여덟째와 아홉째 굶주린 백성에게 설죽(設粥)하는 것과 〈창고의 곡식을〉 발매(發賣)하는 일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일이 없으며, 열째 절약하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는 일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각기 마음에 품은 바를 진달하도록 명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사치를 억제하고 검소함을 따르는 도리를 진달하였다. 집의(執義) 이정겸(李廷謙)이 인해서 잘못을 기강(紀綱)이 무너지고 해이한 데로 돌리자,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
“법관(法官)이 간청(干請)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강이 응당 저절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니, 이정겸(李廷謙)이 말하기를,
“지금 재상(宰相)의 자제(子弟)들이 큰 집을 짓고 있는데, 넓고 사치하기가 제도에 지나칩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오히려 검소함을 숭상하는 성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유상운(柳尙運)이 힐난하기를,
“오늘은 오직 군상(君上)을 경계하여 힘쓰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뿐인데,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한가?”
하였다. 윤지선(尹趾善)의 아우 윤지경(尹趾慶)이 지금 우관(郵官)인데, 탐욕스러움이 끝이 없어 집을 크게 지으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탄식하였지만, 〈그 형이〉 상신(相臣)이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었다. 윤지선은 법관이 간청을 들어준다는 말로 이정겸(李廷謙)의 화를 건드리고 격동시켜 분노한 김에 말을 뱉기는 하였어도 오히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유상운이 그가 지목하는 바가 있음을 알고 미리 저지시킨 것이다.
“세자(世子)가 탄생한 뒤에 즉시 피국(彼國)에 통보하였고, 또 종묘(宗廟)에 고(告)하여 적장자(嫡長子)로 정하고, 중궁(中宮)이 기르시기를 자신이 낳은 것과 다름이 없어 신민(臣民)들이 바라고 기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황명 조훈(皇明祖訓) 5백 리(里) 안은 종번(宗藩)이므로 적자(嫡子)와 서자(庶子)가 옹립되기를 다투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런 제도를 정하여 두었으나, 외번(外藩)에는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뜻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최석정이 말하기를,
“신이 바야흐로 문형(文衡)을 맡고 있으니, 주문(奏文)을 짓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말을 모아 절충(折衷)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청컨대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로 하여금 아울러 모두 짓도록 하소서.”
하니,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비록 승문원 제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도일(吳道一)·최규서(崔奎瑞)·이언강(李彦綱) 같은 이는 모두 문망(文望)이 있으니, 지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자,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여(李畬)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이여는 지방관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상의(相議)하도록 하였다.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鬱陵島)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여러 번 아뢰면서 다투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유상운(柳尙運)이 인해서 최석정(崔錫鼎)이 이조 판서(吏曹判書)였을 때의 차자(箚子)를 복주(覆奏)하기를,
“첫째 양전(量田)에 관한 일은 천천히 농사를 관찰하여 다시 품지(稟旨)하겠으며, 둘째 세금을 면제하는 일 또한 후일(後日)을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으며, 세째 신역(身役)에 관한 일은 현재 살아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절실하게 보태어 정하지 말도록 하겠으며, 네째 해서(海西)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일은 감사(監司)의 장문(狀聞)을 기다린 뒤에 품정(稟定)하겠으며, 다섯째 병액(兵額)을 줄이는 일은 갑자기 변통(變通)하기 어려우니 곰곰이 강구해서 처리하겠으며, 여섯째 공물(貢物)을 헤아려서 감해야 한다는 일은, 원액(元額) 가운데 긴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품처하겠으며, 일곱째 연분(年分)의 결실(結實)을 나누어 정하는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여덟째와 아홉째 굶주린 백성에게 설죽(設粥)하는 것과 〈창고의 곡식을〉 발매(發賣)하는 일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일이 없으며, 열째 절약하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는 일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각기 마음에 품은 바를 진달하도록 명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사치를 억제하고 검소함을 따르는 도리를 진달하였다. 집의(執義) 이정겸(李廷謙)이 인해서 잘못을 기강(紀綱)이 무너지고 해이한 데로 돌리자,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
“법관(法官)이 간청(干請)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강이 응당 저절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니, 이정겸(李廷謙)이 말하기를,
“지금 재상(宰相)의 자제(子弟)들이 큰 집을 짓고 있는데, 넓고 사치하기가 제도에 지나칩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오히려 검소함을 숭상하는 성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유상운(柳尙運)이 힐난하기를,
“오늘은 오직 군상(君上)을 경계하여 힘쓰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뿐인데, 무슨 많은 말이 필요한가?”
하였다. 윤지선(尹趾善)의 아우 윤지경(尹趾慶)이 지금 우관(郵官)인데, 탐욕스러움이 끝이 없어 집을 크게 지으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탄식하였지만, 〈그 형이〉 상신(相臣)이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었다. 윤지선은 법관이 간청을 들어준다는 말로 이정겸(李廷謙)의 화를 건드리고 격동시켜 분노한 김에 말을 뱉기는 하였어도 오히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는데, 유상운이 그가 지목하는 바가 있음을 알고 미리 저지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