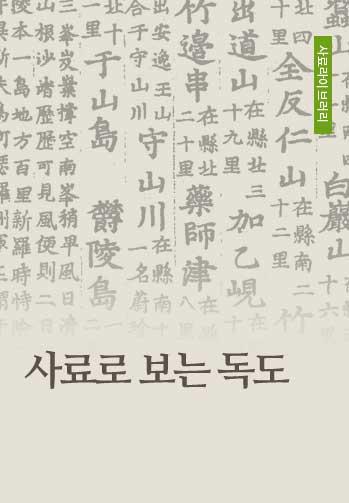차왜 귤진중이 제2서의 회답을 요구하니 남구만이 거절하다
사료해설
대마도는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재판차왜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多田與左衛門)이 지참한 예조참판 앞 서계의 조선의 회답서에 ‘우리의 경계 울릉도(敝境之鬱陵島)’라는 구절을 삭제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사자로 다치바나를 다시 파견하였다. 본 사료는 이후 대마도와 조선측 사이에 논의되었던 울릉도 영유권에 관한 논쟁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훨씬 이전부터 울릉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이다.
1695년 윤 5월 13일에 다치바나는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대마도주의 서계(제2서계)와 이전의 조선측 회답서계를 가지고 왜관에 건너왔다.
회답서계를 받은 조선정부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넣은 회답서계를 건넸다. 일본이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의 이칭으로 일본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안용복 등 조선어민들이 우리 땅인 울릉도에 갔는데, 도리어 조선영토에 일본인들이 침범하여 붙잡아간 것은 잘못된 처사이니, 앞으로는 일본인이 울릉도를 오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즉 예조참판 명의의 서계에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울릉도 해역에 관한 조선의 영유권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차왜 다치바나는 왜관에 체류하며 자신이 가지고 온 제2서계의 회답서계를 요구하였지만, 조선측에서는 두 문서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회답서계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대마도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선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확인한 다치바나는 동년 6월 대마도로부터 소환명령을 받고 귀국하기에 앞서 섭정도주 소 요시자네(宗義眞)의 의중을 반영하여 죽도와 울릉도의 관계에 대해서 4개 조항의 질문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에서는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를 수색하게 했다는데 일본의 어민들은 그곳에서 조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둘째, 이미 78년, 59년, 30년전에 표류한 일본인들이 어로잡이를 위해 죽도(울릉도)에 왔다고 했는데, 그 때는 왜 문제 삼지 않았는가? 셋째, 하나의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조선의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고, 대마도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첫 회답서계에서는 ‘귀국의 죽도’, ‘우리나라의 울릉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82년 전에 죽도(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를 삼았지만, 78년 전에 일본인들이 죽도(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했을 대는 국경침월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측은 1614년 당시 대마도에서 두왜 1명과 격왜 13명이 礒竹島(울릉도)를 조사하는 일로 서계를 가져왔으나 조정에서는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고, 동래부사의 명의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답을 내렸다. 그리고 표류민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하러 왔다가 표류하였다고 했을 때 문제 삼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표류인이 빠른 송환을 원했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지승람』에 신라 때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여러번 울릉도에 파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대마도의 대관(代官)이 역관 박재흥에게 『여지승람』을 보면 울릉도는 조선 땅라고 한 적도 있고, 처음 회답서계에서 귀국의 죽도와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조 관원이 옛일에 밝지 못하여 발생한 실언이었다고 하면서 죽도(竹島)는 조선의 울릉도이이며 조선 땅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1695년 윤 5월 13일에 다치바나는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하는 대마도주의 서계(제2서계)와 이전의 조선측 회답서계를 가지고 왜관에 건너왔다.
회답서계를 받은 조선정부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넣은 회답서계를 건넸다. 일본이 말하는 죽도가 울릉도의 이칭으로 일본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안용복 등 조선어민들이 우리 땅인 울릉도에 갔는데, 도리어 조선영토에 일본인들이 침범하여 붙잡아간 것은 잘못된 처사이니, 앞으로는 일본인이 울릉도를 오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즉 예조참판 명의의 서계에 일본에서 말하는 죽도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울릉도 해역에 관한 조선의 영유권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차왜 다치바나는 왜관에 체류하며 자신이 가지고 온 제2서계의 회답서계를 요구하였지만, 조선측에서는 두 문서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회답서계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대마도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선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확인한 다치바나는 동년 6월 대마도로부터 소환명령을 받고 귀국하기에 앞서 섭정도주 소 요시자네(宗義眞)의 의중을 반영하여 죽도와 울릉도의 관계에 대해서 4개 조항의 질문서를 보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에서는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를 수색하게 했다는데 일본의 어민들은 그곳에서 조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둘째, 이미 78년, 59년, 30년전에 표류한 일본인들이 어로잡이를 위해 죽도(울릉도)에 왔다고 했는데, 그 때는 왜 문제 삼지 않았는가? 셋째, 하나의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조선의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고, 대마도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첫 회답서계에서는 ‘귀국의 죽도’, ‘우리나라의 울릉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82년 전에 죽도(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를 삼았지만, 78년 전에 일본인들이 죽도(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했을 대는 국경침월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측은 1614년 당시 대마도에서 두왜 1명과 격왜 13명이 礒竹島(울릉도)를 조사하는 일로 서계를 가져왔으나 조정에서는 접대를 허락하지 않았고, 동래부사의 명의로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답을 내렸다. 그리고 표류민이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하러 왔다가 표류하였다고 했을 때 문제 삼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표류인이 빠른 송환을 원했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지승람』에 신라 때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여러번 울릉도에 파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대마도의 대관(代官)이 역관 박재흥에게 『여지승람』을 보면 울릉도는 조선 땅라고 한 적도 있고, 처음 회답서계에서 귀국의 죽도와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조 관원이 옛일에 밝지 못하여 발생한 실언이었다고 하면서 죽도(竹島)는 조선의 울릉도이이며 조선 땅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원문
○前年接慰官兪集一還朝, 而差倭橘眞重, 猶索第二書之回答, 南九萬以爲: “狡倭情狀絶痛。 豈可又答其第二書乎? 況兩書之意, 自是一事, 一答書足矣。” 終不許。 眞重久留不歸, 期於得請, 會倭國召眞重歸。 眞重遂以六月十五日, 爲發行之期, 貽書萊府, 詰問四條, 以請轉達朝廷而開示之。 其一曰:
答書中時遣公差, 往來搜撿云。 謹按因幡、伯耆二州邊民, 年年往竹島漁採, 二州年年獻彼島鰒魚於東都, 彼島風濤危險, 非海上安穩之時, 則不得往來。 貴國若實有遣公差之事, 則亦當海上安穩之時。 自大神君至今八十一年, 我民未曾奏與貴國公差相遇于彼島之事, 而今回答書中, 言時遣公差往來搜撿者, 未知何意也?
其二曰:
回答書中, 不意貴國人自爲犯越云, 貴國人侵涉我境云。 謹按兩國通好之後, 往來竹島之漁民, 漂到于貴國地, 禮曹參議以送返漂民, 與書於弊州總三度矣。 本邦邊民往漁于彼島之狀, 貴國所曾知也, 以上上年我民往漁于彼島, 爲犯越侵涉, 則曾前三度書中, 何不言犯越侵涉之意乎?
其三曰:
回答書中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 亦皆知之云。 貴國曾考一島二名之狀, 載于書籍之中, 而又謂一島二名之狀, 弊州之人, 亦皆知之, 則初度答書, 何言貴界竹島弊境鬱陵島乎? 若初不知竹島卽鬱陵島, 而爲二島二名, 則今之答書, 何言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亦皆知之乎?
其四曰:
謹按八十二年前, 弊州寄書於東萊府, 以告看審礒竹島之事, 府使答書云: “本島卽我國所謂鬱陵島者, 今雖荒廢, 豈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釁耶?” 其再答書亦然。 七十八年前, 本邦邊民往漁于彼島, 漂到于貴國地之時, 禮曹參議與弊州書云: “倭人馬多三伊等七名, 被獲於邊吏, 問其來由, 則乃往漁于鬱陵島, 遇風漂到者也。 玆付倭船, 送回貴島。” 蓋八十二年前, 言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釁耶, 則無七十八年前, 聞他人往漁而容許之理矣。 今回答書中, 言一島二名之狀, 貴州之人, 亦皆知之者, 以八十二年前東萊府答書, 有礒竹島者, 實我國之鬱陵島也之句乎? 八十二年前書, 七十八年前書, 辭意不相合, 今不可不請問之。
朝廷答曰:
八十二年前甲寅, 貴州頭倭一名、格倭十三名, 以礒竹島大小形止探見事, 持書契出來, 朝廷以爲猥越而不許接待, 只令本府府使朴慶業答書。 其略曰: “所謂礒竹島, 實我國之鬱陵島, 介於慶尙、江原兩道海洋, 而載在輿圖, 烏可誣也? 今雖廢棄, 豈可容他人冒居, 以啓鬧釁耶? 貴島我國往來通行, 唯有一路, 此外則無論漂船眞假, 皆以賊船論斷。 弊鎭及沿海將官, 唯嚴守約束而已, 唯願貴島, 審區土之有分, 知界限之難侵, 各守信義, 免致謬戾。” 云。 今此書辭, 亦載於來書。 疑問第四條, 詳略雖異, 大旨則同, 若欲知此事源委, 此一書足矣。 其後三度漂倭, 或稱往漁于鬱陵島, 或稱漁採于竹島, 而竝付歸船, 送回貴島, 而不以犯越、侵涉爲責, 前後意義各有所在。 頭倭之來, 責以信義者, 以有侵越之情也。 漂船之泊, 只令順付者, 沈溺餘生, 乞得速還, 則資送是急, 不暇問他, 與國之禮, 有當然者。 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 時遣公差, 往來搜檢事, 我國《輿地勝覽》, 詳記新羅、高麗及本朝太宗、世宗、成宗三朝, 屢遣官人於島中之事。 且前日接慰官洪重夏下去時, 貴州摠兵衛稱號人, 言於譯官朴再興曰: “以《輿地勝覽》觀之, 鬱陵島果是貴國地。” 云。 此書乃貴州人所嘗見, 而丁寧言說於我人者也。 近間公差之不常往來, 漁氓之禁其遠入, 蓋爲海路之多險故也。 今者舍自前記載之書而不信, 乃反以彼我人之不相逢値於島中爲疑, 不亦異乎? 一島二名云者, 朴慶業書中, 旣有礒竹島實我國鬱陵島之語。 且洪重夏與正官倭相見時, 正官乃發我國《芝峰類說》之說。 《類說》曰: “礒竹卽鬱陵島也。” 然則一島二名之說, 雖本載於我國書, 發其言端, 實自貴州正官之口。 答書中所謂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者, 乃指此而言也。 此豈可疑而請問者乎? 癸酉年初度答書, 有若以竹島與鬱陵島, 爲二島者然, 此乃其時南宮之官不詳故事之致, 朝廷方咎其失言矣。 此際貴州出送其書而請改, 故朝廷因其請而改之, 以正初書之失, 到今惟當一以改送之書, 考信而已。 初書旣以錯誤而改之, 則何足爲今日憑問之端乎?
此書未及達, 而眞重又自以己意, 作爲文字, 請於回答書啓, 依此改之, 萊府峻責却之。 眞重遂進定行期於六月初十日, 又貽書萊府曰:
去年所受回答書中, 有可疑之辭意。 然再度書契, 不爲回答, 則貴國之意, 未可窮知, 故只請再度答書, 旣受之答書, 不爲疑問, 而裁判平成常入和館, 傳刑部君, 令某歸州之命。 某仍以爲答書中可疑之辭意, 不可不請問, 五月十五日呈疑問書於府使, 以請轉達于京都, 以六月十五日爲乘船之期。 欲貴國閱疑問書, 而察此事之情狀, 某未乘船之前, 再改回答書契之微意也, 故五月卄三日, 以某之意見, 增損答書文字, 錄爲一本, 呈府使大人, 以請轉達于京都。 其後訓導來, 述府使之意, 其所言如不知是非者。 某悟此事不成, 因減所期之日數, 以六月十日爲乘船之期。 自呈疑問書, 至于今二十五日, 而貴國未賜開示者, 卽是無可開示之辭也。 旣無可開示之辭, 則答書不可不改作。 不爲改作而欲令帶去者, 豈止輕侮弊州? 實是侵陵本邦也。 貴國輕侮弊州, 侵陵本邦, 則某之處此事, 不可不直赴東萊府, 面接府使大人, 以見不辱君命之節義。 然刑部君召某之意, 有不可量知者, 故含羞抱憤, 以歸弊州, 府使大人可以憐察某之情也。 某之歸州, 不帶回答書契, 使訓導、別差封之, 以授之館守。 是乃欲刑部君遣使之日, 館守授之使者, 使者繼述某之志事, 以決此事之成否者也。 因惟兩國之和好, 在留答書於和館之間。 答書一越海, 則兩國恐失百年之和好云云。
眞重雖發船, 到絶影島下, 東萊府追送朝廷所答開示書, 眞重乃復貽書萊府, 大肆罵辱。 其書曰:
今日裁判送達開示書於船上, 某謹讀之, 開示不明。 是所謂過而順之, 又從而爲之辭者也。 開示不明之旨趣, 論之如左。 一八十二年前書, 卽述新羅、高麗、國初, 彼島屬于貴國之辭而已, 彼島屬于本邦者, 八十年來之事, 則何以八十二年前書, 爲盡今番一件之源委乎? 開示書, 漂船之泊, 只令順付者, 沈溺餘生, 乞得速還, 則資送是急, 不暇問他, 與國之禮, 有當然者。 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云? 是乃遁辭之窮也。 所謂禮者, 何禮乎? 非禮之禮, 大人不爲。 某竊歎貴國無開示之辭也。 摠兵衛所言, 以《輿地勝覽》觀之之意也, 《輿地勝覽》, 卽二百年前之書籍, 而彼島屬于本邦者, 八十年來之事也。 以《輿地勝覽》, 爲今番一件之證驗, 何其不察古今之變易乎? 八十年來我國邊民, 年年往漁于竹島, 未曾與貴國公差相逢于彼島, 而今開示書, 以《輿地勝覽》爲證驗, 則今之答書, 言時遣公差, 往來搜檢者, 豈不爲虛僞之說乎? 不能開示某之所問, 而却著書中辭意之虛僞者, 某竊爲貴國恥之。 某與朴再興相見時, 發《芝峰類說》之說者, 欲使貴國, 知弊州有《芝峰類說》書也。 今開示書, 以《類說》爲一島二名之證驗, 則某亦可以《類說》, 爲鬱陵島屬于本邦之證驗。 某曾考之《類說》自序, 卽八十二年前所識也。 《類說》亦有近聞倭人, 占據礒竹島之語。 知他人占據而容許之, 知他人往漁而容許之, 則是八十年來, 貴國自棄彼島, 以令爲他人之有也。 往事如是, 而今番以我民往彼島, 爲犯越侵涉者, 不思之甚也。 今之答書, 與初度答書, 辭意不相合, 而貴國今歸罪於南宮之官, 以隱前後答書辭意不相合之失。 今番一件, 固兩國之大事, 則無南宮所作答書朝廷不閱之理矣。 某今讀開示書, 而深爲貴國恥之。
初, 眞重兩年留館, 必期得請。 自以使事不成, 朝家循例供給之物, 一不取用, 穿弊乞食, 辛苦萬狀, 而終不變易焉。 及至渡海之時, 乃取朝家前後所給白米一千八百六十石, 貽書萊府而還送之。 時, 以眞重事, 中外洶洶, 皆以爲: “壬辰之變, 不日將作。” 人心波蕩, 靡有止泊, 久而後乃定。
【史臣曰: “狡倭情狀, 雖甚絶痛, 旣答其一書, 則又以嚴斥之義, 答其第二書, 顧何傷哉? 南九萬執迷不回, 終使堂堂國家, 受無限罵辱於一差倭, 可勝痛哉?”】
答書中時遣公差, 往來搜撿云。 謹按因幡、伯耆二州邊民, 年年往竹島漁採, 二州年年獻彼島鰒魚於東都, 彼島風濤危險, 非海上安穩之時, 則不得往來。 貴國若實有遣公差之事, 則亦當海上安穩之時。 自大神君至今八十一年, 我民未曾奏與貴國公差相遇于彼島之事, 而今回答書中, 言時遣公差往來搜撿者, 未知何意也?
其二曰:
回答書中, 不意貴國人自爲犯越云, 貴國人侵涉我境云。 謹按兩國通好之後, 往來竹島之漁民, 漂到于貴國地, 禮曹參議以送返漂民, 與書於弊州總三度矣。 本邦邊民往漁于彼島之狀, 貴國所曾知也, 以上上年我民往漁于彼島, 爲犯越侵涉, 則曾前三度書中, 何不言犯越侵涉之意乎?
其三曰:
回答書中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 亦皆知之云。 貴國曾考一島二名之狀, 載于書籍之中, 而又謂一島二名之狀, 弊州之人, 亦皆知之, 則初度答書, 何言貴界竹島弊境鬱陵島乎? 若初不知竹島卽鬱陵島, 而爲二島二名, 則今之答書, 何言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亦皆知之乎?
其四曰:
謹按八十二年前, 弊州寄書於東萊府, 以告看審礒竹島之事, 府使答書云: “本島卽我國所謂鬱陵島者, 今雖荒廢, 豈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釁耶?” 其再答書亦然。 七十八年前, 本邦邊民往漁于彼島, 漂到于貴國地之時, 禮曹參議與弊州書云: “倭人馬多三伊等七名, 被獲於邊吏, 問其來由, 則乃往漁于鬱陵島, 遇風漂到者也。 玆付倭船, 送回貴島。” 蓋八十二年前, 言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釁耶, 則無七十八年前, 聞他人往漁而容許之理矣。 今回答書中, 言一島二名之狀, 貴州之人, 亦皆知之者, 以八十二年前東萊府答書, 有礒竹島者, 實我國之鬱陵島也之句乎? 八十二年前書, 七十八年前書, 辭意不相合, 今不可不請問之。
朝廷答曰:
八十二年前甲寅, 貴州頭倭一名、格倭十三名, 以礒竹島大小形止探見事, 持書契出來, 朝廷以爲猥越而不許接待, 只令本府府使朴慶業答書。 其略曰: “所謂礒竹島, 實我國之鬱陵島, 介於慶尙、江原兩道海洋, 而載在輿圖, 烏可誣也? 今雖廢棄, 豈可容他人冒居, 以啓鬧釁耶? 貴島我國往來通行, 唯有一路, 此外則無論漂船眞假, 皆以賊船論斷。 弊鎭及沿海將官, 唯嚴守約束而已, 唯願貴島, 審區土之有分, 知界限之難侵, 各守信義, 免致謬戾。” 云。 今此書辭, 亦載於來書。 疑問第四條, 詳略雖異, 大旨則同, 若欲知此事源委, 此一書足矣。 其後三度漂倭, 或稱往漁于鬱陵島, 或稱漁採于竹島, 而竝付歸船, 送回貴島, 而不以犯越、侵涉爲責, 前後意義各有所在。 頭倭之來, 責以信義者, 以有侵越之情也。 漂船之泊, 只令順付者, 沈溺餘生, 乞得速還, 則資送是急, 不暇問他, 與國之禮, 有當然者。 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 時遣公差, 往來搜檢事, 我國《輿地勝覽》, 詳記新羅、高麗及本朝太宗、世宗、成宗三朝, 屢遣官人於島中之事。 且前日接慰官洪重夏下去時, 貴州摠兵衛稱號人, 言於譯官朴再興曰: “以《輿地勝覽》觀之, 鬱陵島果是貴國地。” 云。 此書乃貴州人所嘗見, 而丁寧言說於我人者也。 近間公差之不常往來, 漁氓之禁其遠入, 蓋爲海路之多險故也。 今者舍自前記載之書而不信, 乃反以彼我人之不相逢値於島中爲疑, 不亦異乎? 一島二名云者, 朴慶業書中, 旣有礒竹島實我國鬱陵島之語。 且洪重夏與正官倭相見時, 正官乃發我國《芝峰類說》之說。 《類說》曰: “礒竹卽鬱陵島也。” 然則一島二名之說, 雖本載於我國書, 發其言端, 實自貴州正官之口。 答書中所謂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者, 乃指此而言也。 此豈可疑而請問者乎? 癸酉年初度答書, 有若以竹島與鬱陵島, 爲二島者然, 此乃其時南宮之官不詳故事之致, 朝廷方咎其失言矣。 此際貴州出送其書而請改, 故朝廷因其請而改之, 以正初書之失, 到今惟當一以改送之書, 考信而已。 初書旣以錯誤而改之, 則何足爲今日憑問之端乎?
此書未及達, 而眞重又自以己意, 作爲文字, 請於回答書啓, 依此改之, 萊府峻責却之。 眞重遂進定行期於六月初十日, 又貽書萊府曰:
去年所受回答書中, 有可疑之辭意。 然再度書契, 不爲回答, 則貴國之意, 未可窮知, 故只請再度答書, 旣受之答書, 不爲疑問, 而裁判平成常入和館, 傳刑部君, 令某歸州之命。 某仍以爲答書中可疑之辭意, 不可不請問, 五月十五日呈疑問書於府使, 以請轉達于京都, 以六月十五日爲乘船之期。 欲貴國閱疑問書, 而察此事之情狀, 某未乘船之前, 再改回答書契之微意也, 故五月卄三日, 以某之意見, 增損答書文字, 錄爲一本, 呈府使大人, 以請轉達于京都。 其後訓導來, 述府使之意, 其所言如不知是非者。 某悟此事不成, 因減所期之日數, 以六月十日爲乘船之期。 自呈疑問書, 至于今二十五日, 而貴國未賜開示者, 卽是無可開示之辭也。 旣無可開示之辭, 則答書不可不改作。 不爲改作而欲令帶去者, 豈止輕侮弊州? 實是侵陵本邦也。 貴國輕侮弊州, 侵陵本邦, 則某之處此事, 不可不直赴東萊府, 面接府使大人, 以見不辱君命之節義。 然刑部君召某之意, 有不可量知者, 故含羞抱憤, 以歸弊州, 府使大人可以憐察某之情也。 某之歸州, 不帶回答書契, 使訓導、別差封之, 以授之館守。 是乃欲刑部君遣使之日, 館守授之使者, 使者繼述某之志事, 以決此事之成否者也。 因惟兩國之和好, 在留答書於和館之間。 答書一越海, 則兩國恐失百年之和好云云。
眞重雖發船, 到絶影島下, 東萊府追送朝廷所答開示書, 眞重乃復貽書萊府, 大肆罵辱。 其書曰:
今日裁判送達開示書於船上, 某謹讀之, 開示不明。 是所謂過而順之, 又從而爲之辭者也。 開示不明之旨趣, 論之如左。 一八十二年前書, 卽述新羅、高麗、國初, 彼島屬于貴國之辭而已, 彼島屬于本邦者, 八十年來之事, 則何以八十二年前書, 爲盡今番一件之源委乎? 開示書, 漂船之泊, 只令順付者, 沈溺餘生, 乞得速還, 則資送是急, 不暇問他, 與國之禮, 有當然者。 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云? 是乃遁辭之窮也。 所謂禮者, 何禮乎? 非禮之禮, 大人不爲。 某竊歎貴國無開示之辭也。 摠兵衛所言, 以《輿地勝覽》觀之之意也, 《輿地勝覽》, 卽二百年前之書籍, 而彼島屬于本邦者, 八十年來之事也。 以《輿地勝覽》, 爲今番一件之證驗, 何其不察古今之變易乎? 八十年來我國邊民, 年年往漁于竹島, 未曾與貴國公差相逢于彼島, 而今開示書, 以《輿地勝覽》爲證驗, 則今之答書, 言時遣公差, 往來搜檢者, 豈不爲虛僞之說乎? 不能開示某之所問, 而却著書中辭意之虛僞者, 某竊爲貴國恥之。 某與朴再興相見時, 發《芝峰類說》之說者, 欲使貴國, 知弊州有《芝峰類說》書也。 今開示書, 以《類說》爲一島二名之證驗, 則某亦可以《類說》, 爲鬱陵島屬于本邦之證驗。 某曾考之《類說》自序, 卽八十二年前所識也。 《類說》亦有近聞倭人, 占據礒竹島之語。 知他人占據而容許之, 知他人往漁而容許之, 則是八十年來, 貴國自棄彼島, 以令爲他人之有也。 往事如是, 而今番以我民往彼島, 爲犯越侵涉者, 不思之甚也。 今之答書, 與初度答書, 辭意不相合, 而貴國今歸罪於南宮之官, 以隱前後答書辭意不相合之失。 今番一件, 固兩國之大事, 則無南宮所作答書朝廷不閱之理矣。 某今讀開示書, 而深爲貴國恥之。
初, 眞重兩年留館, 必期得請。 自以使事不成, 朝家循例供給之物, 一不取用, 穿弊乞食, 辛苦萬狀, 而終不變易焉。 及至渡海之時, 乃取朝家前後所給白米一千八百六十石, 貽書萊府而還送之。 時, 以眞重事, 中外洶洶, 皆以爲: “壬辰之變, 不日將作。” 人心波蕩, 靡有止泊, 久而後乃定。
【史臣曰: “狡倭情狀, 雖甚絶痛, 旣答其一書, 則又以嚴斥之義, 答其第二書, 顧何傷哉? 南九萬執迷不回, 終使堂堂國家, 受無限罵辱於一差倭, 可勝痛哉?”】
번역문
지난해에 접위관(接慰官) 유집일(兪集一)이 조정에 돌아왔는데, 차왜(差倭) 귤진중(橘眞重)이 오히려 제2서(第二書)의 회답(回答)을 요구하자, 남구만이 말하기를,
“교활한 왜(倭)의 정상이 절통(絶痛)하다. 어찌 또 그 제2서에 답서를 보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두 서신(書信)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니, 한 번 답장을 했으면 충분하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귤진중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는 기어코 자신이 청한 것을 성사시키려 하였는데, 마침 왜국(倭國)에서 귤진중을 소환하여 귀국(歸國)하라고 하니, 귤진중이 드디어 6월 15일을 길을 떠나는 시기로 잡고 동래부에 편지를 보내 네 가지 조항을 힐문(詰問)하며 이를 조정에 전달해서 개시(開示)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 첫째 조항에 이르기를,
“답서(答書) 가운데,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인번(因幡)·백기(伯耆) 두 주(州)의 변민(邊民)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여, 2주(州)가 해마다 그 섬의 복어(鰒魚)를 동도(東都)에 바치는데, 그 섬은 바람과 물결이 위험하므로, 해상(海上)이 안온(安穩)할 때가 아니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귀국(貴國)에서 만일 실지로 공차(公差)를 파견한 일이 있다면 역시 분명히 바다가 안온할 때였을 것입니다. 대신군(大神君)으로부터 지금까지 81년 동안 우리 나라 백성들이 일찍이 귀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자(使者)들과 그 섬에서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상주(上奏)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는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고, 둘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뜻밖에 귀국의 사람이 스스로 범월(犯越)하였다.’ 하고, ‘귀국의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양국(兩國)이 통호(通好)한 이후에 죽도(竹島)를 왕래하던 어민(漁民)들이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면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표류민(漂流民)을 되돌려 보내는 일로 폐주(弊州)에 서신을 보낸 것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실상은 귀국이 일찍이 알고 있던 바인데,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것을 범월(犯越)이나 침섭(侵涉)한 것으로 여겼다면, 일찍이 종전 세 차례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어찌하여 범월과 침섭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였고, 세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귀국이 일찍이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상고하고, 또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폐주(弊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생각하였다면, 첫번째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귀계(貴界)의 죽도(竹島)는 폐경(弊境)의 울릉도(鬱陵島)이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만일 애당초 죽도가 바로 울릉도인 줄 알지 못하고 두 섬이 두 이름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지금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실상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하였습니까?”
하였고, 네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82년 전 폐주(弊州)에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의죽도(礒竹島)를 자세히 조사하는 일을 알리니, 동래 부사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본도(本島)는 바로 우리 나라의 이른바 울릉도(鬱陵島)라는 곳으로서 지금은 비록 황폐해져 있으나,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하여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하였고, 그 두번째 답서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78년 전에 본방(本邦)의 변민(邊民)이 그 섬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렀을 때 예조 참의가 폐주(弊州)에 보낸 서신에, ‘왜인(倭人) 마다삼이(馬多三伊) 등 7명이 변방의 관리에게 체포되었기에 그들이 온 연유를 물어보니,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온 자였다. 이에 왜선(倭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82년 전에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라고 말하였다면, 78년 전에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한다는 것을 듣고 허용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한 것은 82년 전 동래부의 답서에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까? 82년 전의 서신과 78년 전의 서신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지금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조정(朝廷)에서 답하기를,
“82년 전 갑인년[1614 광해군 6년.] 에 귀주(貴州)에서 두왜(頭倭) 한 명과 격외(格倭) 13명이 의죽도(礒竹島)의 크고 작은 형편을 탐사(探査)하는 일로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를 함부로 경계를 넘었다 하여 접대(接待)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본부(本府)의 부사(府使)인 박경업(朴慶業)으로 하여금 답장을 하도록 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른바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로서, 경상(慶尙)·강원(江原) 양도(兩道)의 해양(海洋)에 끼여 있는데, 여도(輿圖)에 기재되어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비록 폐기(廢棄)되어 있지만,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귀국(貴國)과 우리 나라가 왕래하고 통행하는 것은 다만 이 한 길이 있을 뿐이며, 이 밖에는 표선(漂船)의 진가(眞假)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적선(賊船)으로 논단(論斷)할 것이다. 폐진(弊鎭)과 연해(沿海)의 장관(將官)들은 다만 약속을 엄중히 지킬 뿐이니, 바라건대 귀도(貴島)는 구토(區土)의 분간이 있음을 살피고, 계한(界限)의 침략하기 어려움을 알아 각각 신의(信義)를 지켜서 사리(事理)에 어그러지는 일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하였고, 지금 이 서신의 내용은 보내온 서신에도 기재되어 있다. 의문을 제기한 네 가지 조항은 상세하고 간략한 것은 비록 다르지만 대지(大旨)는 동일한데, 만일 이 일의 전말(顚末)을 알고자 한다면 이 한장의 서신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표류해 온 왜인이 있어 혹은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고, 혹은 죽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였는데, 아울러 귀선(歸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내고 범월(犯越)·침섭(侵涉)으로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전후의 일이 나름대로 각각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왜(頭倭)가 왔을 때 신의(信義)로써 꾸짖었던 것은 침월(侵越)의 정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딸려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시켜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였겠는가?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여 수색하고 검사한 일은, 우리 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신라(新羅)·고려(高麗)와 본조(本朝)의 태종(太宗)·세종(世宗)·성종(成宗) 삼조(三朝)에서 여러 번 관인(官人)을 섬에 파견한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전일에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내려갔을 때 귀주(貴州)의 총병위(摠兵衛)라 일컫는 사람이 역관(譯官) 박재흥(朴再興)에게 말하기를, ‘《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貴國)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귀주(貴州)의 사람이 일찍이 본 바이고, 틀림없이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요사이 공차(公差)가 항상 왕래하지 않고 어민(漁民)들에게 멀리 들어가는것을 금지시켰던 것은 대개 해로(海路)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제 예전에 기재한 서적은 버리고 믿지 않는 채 도리어 왜인과 우리 나라 사람이 섬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지 않은 것을 의심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은 박경업(朴慶業)의 서신 가운데 이미 ‘의죽도(礒竹島)는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그리고 또 홍중하(洪重夏)가 정관(正官)인 왜인(倭人)과 서로 만났을 때 그 정관이 곧 우리 나라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내용을 발설하였는데, 《지봉유설》에는 이르기를, ‘의죽도는 바로 울릉도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설은 비록 본래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된 것이지만, 그 말이 발달된 것은 사실 귀주(貴州)의 정관(正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답서(答書) 가운데 이른바,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의문을 제기하여 청문(請問)할 만한 것이겠는가? 계유년[1693 숙종 19년.] 의 첫번째 회답한 서신에 죽도와 울릉도를 마치 두 섬으로 여긴 것 같은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 남궁(南宮)의 관원이 고사(故事)에 밝지 못했던 소치로서, 조정이 바야흐로 그 실언(失言)을 나무랐었다. 그때에 귀주(貴州)에서 그 서신을 돌려보내어 고쳐 주기를 청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 청에 따라 첫 서신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바로잡았으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직 마땅히 한결같이 고쳐서 보낸 서신을 상고해 믿어야 할 것이다. 첫 서신은 이미 착오로 인해서 개정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족히 오늘의 빙고(憑考)해 질문할 단서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서신이 미처 전달되기 전에 귤진중이 또 스스로 자기의 의사로 문장을 만들어 회답하는 서계(書啓)를 여기에 따라 고쳐 줄 것을 청하니, 동래부(東萊府)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물리쳤다. 귤진중이 드디어 귀국하는 시기를 6월 10일로 앞당겨 정하고, 또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난해에 받은 회답서(回答書) 가운데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서계(書契)에 대하여 회답을 않으니, 귀국(貴國)의 의사를 끝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두번째의 답서(答書)만을 요구하고, 이미 받은 답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裁判) 평성상(平成常)이 화관(和館)에 들어와서 형부군(刑部君)이 저에게 귀국하라고 하였다는 본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내 답서 가운데 의문스러운 내용을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5월 15일에 의문서(疑問書)를 부사(府使)에게 올려서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청하고, 6월 15일을 귀국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귀국(貴國)에서 의문서를 열람하여 이 일의 정상을 살펴서 제가 귀국하는 배를 타기 전에 회답하는 서계(書契)의 내용을 다시 고쳐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5월 23일에 저의 의견(意見)으로 답서 문자(答書文字)를 더하고 줄여 한 벌을 써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에게 올려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그 뒤에 훈도(訓導)가 와서 부사(府使)의 의사를 설명하였는데, 그의 말은 시비(是非)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약했던 날짜를 단축하여 6월 10일을 승선(秉船)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의문서(疑問書)를 올린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5일이 지났는데도, 귀국에서 거기에 대해 개시(開示)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면 답서(答書)는 고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쳐 쓰지 않고서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 어찌 폐주(弊州)를 경멸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사실은 본방(本邦)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귀국(貴國)에서 폐주를 경멸하고 본방을 업신여겼으니, 저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곧바로 동래부(東萊府)로 달려가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을 면접(面接)하고,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절의(節義)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부군(刑部君)이 저를 소환할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와 분노를 품고 폐주로 돌아가는 것이니, 부사 대인께서는 저의 심정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폐주로 돌아감에 있어 회답하는 서계(書契)를 가져가지 않고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로 하여금 그것을 봉(封)해서 관수(館守)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부군(刑部君)이 사신을 보낼 때 관수가 그것을 사자(使者)에게 주어 그 사자가 저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하도록 해서 이 일의 성사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것입니다. 인하여 생각해 보니, 양국(兩國)의 화호(和好)는 답서(答書)를 화관(和館)에 남겨 두는 데 있었습니다. 답서가 한 번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두 나라는 아마 백년(百年)의 우호(友好)를 상실할 듯합니다.”
하였다. 귤진중(橘眞重)이 이미 배를 띄워 절영도(絶影島) 근처에 이르렀으나, 동래부에서 뒤쫓아가서 조정에서 개시(開示)하는 답서를 전달하니, 귤진중이 이에 다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오늘 재판(裁判)이 개시(開示)하는 서신을 선상(船上)에 보내왔기에 제가 삼가 읽어 보았더니, 개시(開示)한 바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과오를 그대로 계속하고 또 뒤따라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시가 분명하지 않은 취지를 논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82년 전의 서신은 바로 신라(新羅)·고려(高麗)·국초(國初)에 저 섬이 귀국(貴國)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이요,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이니, 어찌 82년 전의 서신으로 이번 이 1건(件)의 전말(顚末)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시한 서신에,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태워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해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國土)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이겠는가?’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궁색한 둔사(遁辭)입니다. 이른바 예(禮)라는 것이 무슨 예입니까? 예가 아닌 예는 대인(大人)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삼가 귀국(貴國)의 개시(開示)한 내용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바입니다. 총병위(摠兵衛)가 말한 바, ‘《여지승람(輿地勝覽)》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다.’는 내용에 있어선 《여지승람》은 바로 2백 년 전의 서적이고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지승람》으로 이번 이 건(件)의 증거로 삼으니, 어찌 그다지도 고금(古今)의 변역(變易)을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까? 80년 이래로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일찍이 귀국의 공차(公差)와 그 섬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개시(開示)하는 서신에는 《여지승람》을 증거로 삼았으니, 지금 답서(答書)에서 말한, ‘수시로 공차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는 것이 어찌 허위(虛僞)의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바에 대해서는 개시(開示)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신에다 허위를 드러내었으니, 저는 삼가 귀국을 위하여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가 박재흥(朴再興)과 서로 만났을 때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설(說)을 발설했다는 것은 귀국(貴國)으로 하여금 폐주(弊州)에 《지봉유설》이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시한 서신에 《지봉유설》로 동일한 섬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증거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지봉유설》로 울릉도가 본방(本邦)에 소속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지봉유설》의 자서(自序)를 상고해 보니, 바로 82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지봉유설》에도 또한, ‘요사이 들으니 왜인(倭人)이 의죽도(礒竹島)를 점거했다고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거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80년 이래로 귀국이 스스로 그 섬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일이 이와 같은데도 이번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간 것을 가지고 범월(犯越)과 침섭(侵涉)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번의 답서(答書)와 첫번째의 답서가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데도, 귀국(貴國)에서는 지금 남궁(南宮)의 관원에게 잘못을 돌리고, 전후(前後)의 답서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실수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사건은 진실로 양국(兩國)의 대사(大事)이니, 예조에서 지은 답서를 조정에서 살펴보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시한 서신을 읽고 매우 귀국을 위해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귤진중이 2년을 왜관(倭館)에 머무르며 반드시 요구를 달성하려고 기약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사신의 임무를 성취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에서 준례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을 일체 취용(取用)하지 않았고, 해진 옷을 입고 밥을 구걸해 먹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마침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 귀국할 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전후에 걸쳐 공급한 백미(白米) 1천 8백 60섬을 가져다 동래부로 서신과 함께 환송(還送)하였다. 이때 귤진중의 일로 인하여 중외(中外)가 흉흉(洶洶)하여 모두 말하기를, ‘임진년[1592 선조 25년.]과 같은 변란이 멀지 않아 장차 일어날 것이다.’고 하였다. 인심(人心)이 물결처럼 흔들려 불안에 차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안정되었다.
사신(史臣)은 말한다.“교활한 왜인(倭人)의 정상은 비록 매우 절통(絶痛)한 일이나 이미 첫번째 서신에 답하였으니, 또 엄중하게 물리치는 뜻으로 그 두번째 서신에 답하는 것이 생각건대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남구만이 잘못된 견해를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아 끝내 당당(堂堂)한 국가로 하여금 한낱 차왜(差倭)에게 무한한 매도(罵倒)와 치욕을 당하게 하였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교활한 왜(倭)의 정상이 절통(絶痛)하다. 어찌 또 그 제2서에 답서를 보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두 서신(書信)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니, 한 번 답장을 했으면 충분하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귤진중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는 기어코 자신이 청한 것을 성사시키려 하였는데, 마침 왜국(倭國)에서 귤진중을 소환하여 귀국(歸國)하라고 하니, 귤진중이 드디어 6월 15일을 길을 떠나는 시기로 잡고 동래부에 편지를 보내 네 가지 조항을 힐문(詰問)하며 이를 조정에 전달해서 개시(開示)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 첫째 조항에 이르기를,
“답서(答書) 가운데,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인번(因幡)·백기(伯耆) 두 주(州)의 변민(邊民)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여, 2주(州)가 해마다 그 섬의 복어(鰒魚)를 동도(東都)에 바치는데, 그 섬은 바람과 물결이 위험하므로, 해상(海上)이 안온(安穩)할 때가 아니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귀국(貴國)에서 만일 실지로 공차(公差)를 파견한 일이 있다면 역시 분명히 바다가 안온할 때였을 것입니다. 대신군(大神君)으로부터 지금까지 81년 동안 우리 나라 백성들이 일찍이 귀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자(使者)들과 그 섬에서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상주(上奏)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는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고, 둘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뜻밖에 귀국의 사람이 스스로 범월(犯越)하였다.’ 하고, ‘귀국의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양국(兩國)이 통호(通好)한 이후에 죽도(竹島)를 왕래하던 어민(漁民)들이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면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표류민(漂流民)을 되돌려 보내는 일로 폐주(弊州)에 서신을 보낸 것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실상은 귀국이 일찍이 알고 있던 바인데,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것을 범월(犯越)이나 침섭(侵涉)한 것으로 여겼다면, 일찍이 종전 세 차례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어찌하여 범월과 침섭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였고, 세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귀국이 일찍이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상고하고, 또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폐주(弊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생각하였다면, 첫번째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귀계(貴界)의 죽도(竹島)는 폐경(弊境)의 울릉도(鬱陵島)이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만일 애당초 죽도가 바로 울릉도인 줄 알지 못하고 두 섬이 두 이름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지금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실상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하였습니까?”
하였고, 네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82년 전 폐주(弊州)에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의죽도(礒竹島)를 자세히 조사하는 일을 알리니, 동래 부사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본도(本島)는 바로 우리 나라의 이른바 울릉도(鬱陵島)라는 곳으로서 지금은 비록 황폐해져 있으나,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하여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하였고, 그 두번째 답서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78년 전에 본방(本邦)의 변민(邊民)이 그 섬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렀을 때 예조 참의가 폐주(弊州)에 보낸 서신에, ‘왜인(倭人) 마다삼이(馬多三伊) 등 7명이 변방의 관리에게 체포되었기에 그들이 온 연유를 물어보니,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온 자였다. 이에 왜선(倭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82년 전에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라고 말하였다면, 78년 전에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한다는 것을 듣고 허용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한 것은 82년 전 동래부의 답서에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까? 82년 전의 서신과 78년 전의 서신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지금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므로, 조정(朝廷)에서 답하기를,
“82년 전 갑인년[1614 광해군 6년.] 에 귀주(貴州)에서 두왜(頭倭) 한 명과 격외(格倭) 13명이 의죽도(礒竹島)의 크고 작은 형편을 탐사(探査)하는 일로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를 함부로 경계를 넘었다 하여 접대(接待)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본부(本府)의 부사(府使)인 박경업(朴慶業)으로 하여금 답장을 하도록 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른바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로서, 경상(慶尙)·강원(江原) 양도(兩道)의 해양(海洋)에 끼여 있는데, 여도(輿圖)에 기재되어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비록 폐기(廢棄)되어 있지만,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귀국(貴國)과 우리 나라가 왕래하고 통행하는 것은 다만 이 한 길이 있을 뿐이며, 이 밖에는 표선(漂船)의 진가(眞假)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적선(賊船)으로 논단(論斷)할 것이다. 폐진(弊鎭)과 연해(沿海)의 장관(將官)들은 다만 약속을 엄중히 지킬 뿐이니, 바라건대 귀도(貴島)는 구토(區土)의 분간이 있음을 살피고, 계한(界限)의 침략하기 어려움을 알아 각각 신의(信義)를 지켜서 사리(事理)에 어그러지는 일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하였고, 지금 이 서신의 내용은 보내온 서신에도 기재되어 있다. 의문을 제기한 네 가지 조항은 상세하고 간략한 것은 비록 다르지만 대지(大旨)는 동일한데, 만일 이 일의 전말(顚末)을 알고자 한다면 이 한장의 서신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표류해 온 왜인이 있어 혹은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고, 혹은 죽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였는데, 아울러 귀선(歸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내고 범월(犯越)·침섭(侵涉)으로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전후의 일이 나름대로 각각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왜(頭倭)가 왔을 때 신의(信義)로써 꾸짖었던 것은 침월(侵越)의 정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딸려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시켜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였겠는가?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여 수색하고 검사한 일은, 우리 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신라(新羅)·고려(高麗)와 본조(本朝)의 태종(太宗)·세종(世宗)·성종(成宗) 삼조(三朝)에서 여러 번 관인(官人)을 섬에 파견한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전일에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내려갔을 때 귀주(貴州)의 총병위(摠兵衛)라 일컫는 사람이 역관(譯官) 박재흥(朴再興)에게 말하기를, ‘《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貴國)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귀주(貴州)의 사람이 일찍이 본 바이고, 틀림없이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요사이 공차(公差)가 항상 왕래하지 않고 어민(漁民)들에게 멀리 들어가는것을 금지시켰던 것은 대개 해로(海路)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제 예전에 기재한 서적은 버리고 믿지 않는 채 도리어 왜인과 우리 나라 사람이 섬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지 않은 것을 의심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은 박경업(朴慶業)의 서신 가운데 이미 ‘의죽도(礒竹島)는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그리고 또 홍중하(洪重夏)가 정관(正官)인 왜인(倭人)과 서로 만났을 때 그 정관이 곧 우리 나라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내용을 발설하였는데, 《지봉유설》에는 이르기를, ‘의죽도는 바로 울릉도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설은 비록 본래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된 것이지만, 그 말이 발달된 것은 사실 귀주(貴州)의 정관(正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답서(答書) 가운데 이른바,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의문을 제기하여 청문(請問)할 만한 것이겠는가? 계유년[1693 숙종 19년.] 의 첫번째 회답한 서신에 죽도와 울릉도를 마치 두 섬으로 여긴 것 같은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 남궁(南宮)의 관원이 고사(故事)에 밝지 못했던 소치로서, 조정이 바야흐로 그 실언(失言)을 나무랐었다. 그때에 귀주(貴州)에서 그 서신을 돌려보내어 고쳐 주기를 청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 청에 따라 첫 서신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바로잡았으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직 마땅히 한결같이 고쳐서 보낸 서신을 상고해 믿어야 할 것이다. 첫 서신은 이미 착오로 인해서 개정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족히 오늘의 빙고(憑考)해 질문할 단서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서신이 미처 전달되기 전에 귤진중이 또 스스로 자기의 의사로 문장을 만들어 회답하는 서계(書啓)를 여기에 따라 고쳐 줄 것을 청하니, 동래부(東萊府)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물리쳤다. 귤진중이 드디어 귀국하는 시기를 6월 10일로 앞당겨 정하고, 또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난해에 받은 회답서(回答書) 가운데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서계(書契)에 대하여 회답을 않으니, 귀국(貴國)의 의사를 끝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두번째의 답서(答書)만을 요구하고, 이미 받은 답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裁判) 평성상(平成常)이 화관(和館)에 들어와서 형부군(刑部君)이 저에게 귀국하라고 하였다는 본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내 답서 가운데 의문스러운 내용을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5월 15일에 의문서(疑問書)를 부사(府使)에게 올려서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청하고, 6월 15일을 귀국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귀국(貴國)에서 의문서를 열람하여 이 일의 정상을 살펴서 제가 귀국하는 배를 타기 전에 회답하는 서계(書契)의 내용을 다시 고쳐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5월 23일에 저의 의견(意見)으로 답서 문자(答書文字)를 더하고 줄여 한 벌을 써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에게 올려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그 뒤에 훈도(訓導)가 와서 부사(府使)의 의사를 설명하였는데, 그의 말은 시비(是非)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약했던 날짜를 단축하여 6월 10일을 승선(秉船)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의문서(疑問書)를 올린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5일이 지났는데도, 귀국에서 거기에 대해 개시(開示)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면 답서(答書)는 고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쳐 쓰지 않고서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 어찌 폐주(弊州)를 경멸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사실은 본방(本邦)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귀국(貴國)에서 폐주를 경멸하고 본방을 업신여겼으니, 저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곧바로 동래부(東萊府)로 달려가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을 면접(面接)하고,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절의(節義)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부군(刑部君)이 저를 소환할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와 분노를 품고 폐주로 돌아가는 것이니, 부사 대인께서는 저의 심정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폐주로 돌아감에 있어 회답하는 서계(書契)를 가져가지 않고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로 하여금 그것을 봉(封)해서 관수(館守)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부군(刑部君)이 사신을 보낼 때 관수가 그것을 사자(使者)에게 주어 그 사자가 저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하도록 해서 이 일의 성사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것입니다. 인하여 생각해 보니, 양국(兩國)의 화호(和好)는 답서(答書)를 화관(和館)에 남겨 두는 데 있었습니다. 답서가 한 번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두 나라는 아마 백년(百年)의 우호(友好)를 상실할 듯합니다.”
하였다. 귤진중(橘眞重)이 이미 배를 띄워 절영도(絶影島) 근처에 이르렀으나, 동래부에서 뒤쫓아가서 조정에서 개시(開示)하는 답서를 전달하니, 귤진중이 이에 다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오늘 재판(裁判)이 개시(開示)하는 서신을 선상(船上)에 보내왔기에 제가 삼가 읽어 보았더니, 개시(開示)한 바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과오를 그대로 계속하고 또 뒤따라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시가 분명하지 않은 취지를 논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82년 전의 서신은 바로 신라(新羅)·고려(高麗)·국초(國初)에 저 섬이 귀국(貴國)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이요,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이니, 어찌 82년 전의 서신으로 이번 이 1건(件)의 전말(顚末)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시한 서신에,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태워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해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國土)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이겠는가?’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궁색한 둔사(遁辭)입니다. 이른바 예(禮)라는 것이 무슨 예입니까? 예가 아닌 예는 대인(大人)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삼가 귀국(貴國)의 개시(開示)한 내용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바입니다. 총병위(摠兵衛)가 말한 바, ‘《여지승람(輿地勝覽)》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다.’는 내용에 있어선 《여지승람》은 바로 2백 년 전의 서적이고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지승람》으로 이번 이 건(件)의 증거로 삼으니, 어찌 그다지도 고금(古今)의 변역(變易)을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까? 80년 이래로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일찍이 귀국의 공차(公差)와 그 섬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개시(開示)하는 서신에는 《여지승람》을 증거로 삼았으니, 지금 답서(答書)에서 말한, ‘수시로 공차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는 것이 어찌 허위(虛僞)의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바에 대해서는 개시(開示)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신에다 허위를 드러내었으니, 저는 삼가 귀국을 위하여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가 박재흥(朴再興)과 서로 만났을 때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설(說)을 발설했다는 것은 귀국(貴國)으로 하여금 폐주(弊州)에 《지봉유설》이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시한 서신에 《지봉유설》로 동일한 섬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증거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지봉유설》로 울릉도가 본방(本邦)에 소속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지봉유설》의 자서(自序)를 상고해 보니, 바로 82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지봉유설》에도 또한, ‘요사이 들으니 왜인(倭人)이 의죽도(礒竹島)를 점거했다고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거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80년 이래로 귀국이 스스로 그 섬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일이 이와 같은데도 이번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간 것을 가지고 범월(犯越)과 침섭(侵涉)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번의 답서(答書)와 첫번째의 답서가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데도, 귀국(貴國)에서는 지금 남궁(南宮)의 관원에게 잘못을 돌리고, 전후(前後)의 답서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실수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사건은 진실로 양국(兩國)의 대사(大事)이니, 예조에서 지은 답서를 조정에서 살펴보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시한 서신을 읽고 매우 귀국을 위해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귤진중이 2년을 왜관(倭館)에 머무르며 반드시 요구를 달성하려고 기약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사신의 임무를 성취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에서 준례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을 일체 취용(取用)하지 않았고, 해진 옷을 입고 밥을 구걸해 먹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마침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 귀국할 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전후에 걸쳐 공급한 백미(白米) 1천 8백 60섬을 가져다 동래부로 서신과 함께 환송(還送)하였다. 이때 귤진중의 일로 인하여 중외(中外)가 흉흉(洶洶)하여 모두 말하기를, ‘임진년[1592 선조 25년.]과 같은 변란이 멀지 않아 장차 일어날 것이다.’고 하였다. 인심(人心)이 물결처럼 흔들려 불안에 차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안정되었다.
사신(史臣)은 말한다.“교활한 왜인(倭人)의 정상은 비록 매우 절통(絶痛)한 일이나 이미 첫번째 서신에 답하였으니, 또 엄중하게 물리치는 뜻으로 그 두번째 서신에 답하는 것이 생각건대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남구만이 잘못된 견해를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아 끝내 당당(堂堂)한 국가로 하여금 한낱 차왜(差倭)에게 무한한 매도(罵倒)와 치욕을 당하게 하였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