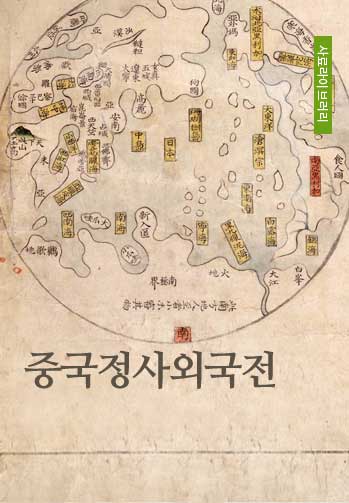왕웅이 진나라(秦) 이래 한과 흉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흉노를 복속하기 힘든 예를 설명함
[중국은] 진시황(秦始皇)
주 001
각주 001)

의 굳셈과 몽염(蒙恬)
주 002의 위세, 그리고 갑옷 입은 병사 40여 만을 가지고도,주 003秦始皇(전259∼전210) : 이름은 嬴政이다. 秦 莊襄王의 아들로 태어나, 13세에 秦王으로 즉위하였고, 39세에 稱帝하였으며 37년간 在位하였다. 최초의 統一王朝 황제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황제로 즉위한 후, 蒙恬을 보내 匈奴를 공격하고 河南地를 수복하고 匈奴를 陰山산맥 以北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서쪽의 臨洮(현재 감숙성 岷縣)에서 동쪽의 遼東에 이르기까지 만리장성을 연결하였다. 또한 남으로는 百越을 점령하고 桂林, 象郡, 南海郡 등을 세웠다. 처음 秦朝가 天下를 통일하였을 때는 36개 郡이었으나, 始皇帝의 재위 말기에는 40여 개로 늘어났다. 그럼으로써 ‘中國’뿐 아니라 匈奴와 越人 등 ‘四夷’ 지역에도 郡縣을 설치하는 세계[天下]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각주 003)

서하(西河)
주 004기원전 215년 진시황은 蒙恬을 보내 匈奴를 정벌했다. 『史記』 권6(「秦始皇本紀」 : 252)에 따르면, 이때 군사 30만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흉노 정벌의 원인에 대하여 後漢의 유학자 鄭玄은 “秦을 멸망시킬 자는 胡이다(亡秦者胡也)”라는 『錄圖書』의 기록이 二世皇帝 胡亥를 겨냥하는 것인 줄 모르고 북방의 胡(즉 匈奴)를 공격하였다고 한다(『史記』 권6 : 253). 하지만 이는 秦朝가 흉노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의 문제로 멸망했음을 강조하는 漢代 儒家들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쓰루마 가즈유키, 2004 : 163∼164).

각주 004)

를 감히 엿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성(長城)을 쌓아주 005西河 : 현재의 山西省과 陝西省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黃河를 지칭한다. 이곳은 夏와 商 이래 山東 지역 국가들의 都城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西河’라고 불렸다. 『史記』 권111(「衞靑列傳」 : 2924)에 “車騎將軍 衞靑이 西河를 지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西河”에 대하여 『史記正義』는 “雲中郡의 西河”라고 풀이하였다. 한편 일역본(內田吟風, 1971 : 121)에서는 황하의 서쪽 지대인 오르도스 지역을 지칭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武帝 元朔 4년(전125)에 西河郡이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현재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平定縣이었다.

각주 005)

[한과 흉노 사이의] 경계를 삼았습니다. 한이 처음 발흥하였을 때, 고조(高祖)
주 006의 위엄과 신령, 30만의 [군(軍)]중(衆)을 가지고도주 007
평성(平城)
주 008에서 곤궁에 처하였습니다.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7일간이나 먹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꾀 많은 책사와 견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신하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간에서 언급을 꺼릴 만한 [추악한] 것이었습니다.주 009長城 : ‘만리’장성은 당시의 척도로 약 5천km에 달한다. 長城 축조의 기사는 『史記』 권6 「秦始皇本紀」에서 진시황 33년, 즉 秦始皇 사망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 짧은 시기에 秦始皇이 長城을 완성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대신 戰國秦이 축조한 오르도스 장성과 陰山長城, 그리고 戰國시기 趙, 燕이 축조한 장성을 연결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秦始皇시대 長城의 축조가 寧夏 回族自治區 지역에 賀蘭山 長城을 새로 축조한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쓰루마 가즈유키, 2004 : 174).

각주 009)

또한 고황후(高皇后)
주 010는 일찍이 흉노에게 분개하여, 신료들을 조정에 모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주 011[이 자리에서] 번쾌(樊噲)
주 012는 10만의 무리를 가지고 흉노 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만, 계포(季布)
주 013顔師古는 平城 탈출의 계책이 醜惡해서 世間에서 언급을 피했다고 풀이하였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기원전 200년 劉邦은 漢軍 32만을 동원하여 匈奴를 공격하였다. 冒頓單于가 지휘하는 匈奴의 騎兵 40만은 平城 부근의 白登에서 7일간 漢軍을 포위하였다. 劉邦은 陳平의 계책에 따라, 匈奴 측에 뇌물과 閼氏를 바치는 조건으로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원전 198년 겨울 漢은 劉敬의 건의에 따라 匈奴와 정식으로 和親의 約을 맺었다. 이 約은 漢이 匈奴에게 公主의 出嫁, 歲幣의 공급을 약속하고 쌍방이 兄弟의 盟約을 맺으며, 匈奴는 한의 변경을 침공하지 말 것 등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내용은 漢측의 열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언급을 회피할 만큼 ‘醜惡’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漢文帝 시기 저명한 文學之士 賈誼는 이 점을 비판하여 “天下의 형세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天下之勢方倒縣)”고 하였다(『漢書』 권48 「賈誼傳」 : 2240). 한편 이러한 約을 통해 형성된 ‘和親’ 관계는 武帝 이전 시기 국제관계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南越, 朝鮮 등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漢 측에서는 이들에게 不可侵을 요구하고, 非漢 측에서는 반대급부로 歲幣를 요구하였다(김한규, 1982 : 197∼201).

각주 013)

는 “번쾌는 참수(斬首)할 만합니다. 망령되게 [황후의] 뜻에 아첨하여 따르려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신들은 임시방편으로 [흉노의 비위에 맞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흉노와 얽힌 일도 풀렸고, 중국의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효문제
주 014때에는 흉노가 북변을 침략하여 해치고, [흉노의] 척후 기병(候騎)이 옹(雍)
주 015의 감천(甘泉)[산]
주 016에까지 이르러 경사(京師)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한은] 세 명의 장군을 일으켜 세류(細柳)
주 017季布 : 彭城 사람이다. 어려서 俠客으로 자임하면서 法度를 지키지 않았다. 項羽가 西楚覇王으로 自立한 뒤, 彭城에 이르렀을 때, 季布를 장수로 임명하였다. 季布는 楚漢 전쟁 동안 여러 차례 劉邦을 곤경에 빠뜨렸다. 漢朝 건립 이후, 劉邦은 특별히 季布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季布는 大俠 朱家의 도움을 받아 사면을 받고 나아가 郞中으로 임명되었다. 惠帝 때에 中郞將이 되었는데, 樊噲의 匈奴 정벌 기도를 막았다. 文帝代에는 河東郡守를 역임했다. 御史大夫로 발령받았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민간에서는 “黃金 1千斤을 얻는 것이 季布로부터 한 차례 인정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 이름이 높았다.

각주 017)

, 극문(棘門)주 018, 패상(覇上)주 019에서 대비하게 하였습니다만주 020몇 개월 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주 021
효무제(孝武帝)는 즉위한 뒤 마읍(馬邑)
주 022의 계략을 세워 흉노를 유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안국(韓安國)
주 023으로 하여금 30만의 무리를 이끌고 유리한 지역주 024에 숨어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흉노는 그 음모를 깨닫고 도주하여 헛되이 재물을 낭비하고 군사를 고생시켰습니다. 한 명의 오랑캐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선우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주 025細柳 : 옛 지명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① 현재의 陝西省 咸陽市의 서남쪽으로 渭水의 북쪽 지대를 말한다. ② 현재의 陝西省 長安縣의 서남쪽을 말한다. 『漢書』에서는 “柳市”라고 지칭하는 곳으로 渭水보다 남쪽에 있다. 『漢書』 권4(「文帝紀」 : 131)에 細柳에 대한 주석이 있다. 如淳은 “長安의 細柳倉이 渭水 북쪽에 있다. 石徼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는 ①의 細柳이다. 반면 張揖은 “昆明池 남쪽에 있다. 지금의 柳市를 말한다”고 했고 顔師古는 “細柳는 渭水 북쪽에 있지 않다. 張揖의 설이 맞다”고 했다. 이는 ②의 細柳, 즉 柳市를 말한다. 『史記索隱』에서도 細柳가 渭水 북쪽에 있다는 설을 비판하고 있다(『史記』 권10 「孝文本紀」 : 432). 하지만 원문에서 周亞夫가 주둔한 곳은 ①의 細柳, 즉 渭河의 북단을 말한다는 지적도 있다.

각주 025)

그 뒤 [무제께서는] 사직(社稷)을 위한 계책을 신중히 생각하시고 크게 만년을 이어갈 대책을 꾀하셨습니다. 이에 수십만의 군사를 크게 일으키고 위청(衞靑)
주 026馬邑 사건의 줄거리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漢武帝는 즉위한 이후에도 祖母 竇太后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나, 建元 6년(전135) 竇太后가 사망하자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하였고 그 최초의 일이 匈奴 문제였다. 이해 무제는 匈奴 정벌 문제를 朝議에 붙였으나 御史大夫 韓安國 등의 반대에 부딪혀 開戰論은 부결되었다. 그 이듬해 元光 1년(전134) 馬邑 사람 聶壹이 開戰의 계책을 올렸고 그 다음 해 元光 2년(전133) 武帝는 다시 朝議를 소집하여 30만 대군의 출병 계획을 확정지었다. 흉노의 軍臣單于는 聶壹의 말에 속아 10여만 기를 이끌고 馬邑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漢의 계획을 눈치채고 철수하였다. 이 일로 聶壹의 계책을 중앙에 보고했던 主戰論者 王恢는 문책을 받고 獄死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漢初 이래 유지되었던 한과 匈奴 사이의 화친관계는 결정적으로 파탄났고 그 뒤 쌍방은 본격적인 전쟁관계로 접어들었다(西嶋定生, 2002 : 153∼154). 이처럼 漢․匈奴 관계의 악화에는 漢武帝 개인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匈奴 單于의 정치적 지도력은 중국의 皇帝만큼 공고하지 못했고, 따라서 화친관계는 匈奴의 귀족 구성원들의 자의적 약탈에 의하여 늘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점(디코스모, 2005 : 297∼298)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각주 026)

과 곽거병(霍去病)
주 027衞靑(?∼전105) : 漢武帝 시기 對匈奴의 전쟁을 지휘한 名將이다. 字는 仲卿이며 河東 平陽 사람이다. 그의 부친이 縣吏로 平陽公主의 집안에 給事하다가 婢女와 私通하여 衞靑을 낳았다. 衞靑은 同母 異父姊인 衞子夫가 武帝에게 得幸하자 그 역시 武帝의 부름을 받아 建章監, 侍中, 太中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元光 6년(전129) 車騎將軍으로 임명된 뒤, 7차에 걸쳐 匈奴 원정에 나섰다. 그 결과 河南地를 수복하여 朔方郡을 설치하였고, 秦代의 邊塞를 수선하여 長安 防備를 충실히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長平侯에 임명되고 食邑 3천 8백호를 받았다. 元狩 4년(전119)에는 定襄塞 밖 천여 리까지 원정하여 匈奴 伊穉斜單于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후 한동안 한과 匈奴 사이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다. 武帝는 衞靑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히 大司馬를 신설하여 그를 大司馬 大將軍으로 임명하였다. 衞靑은 비록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朝政에 간여하지 않고, 겸손한 처신으로 인심을 얻었다. 元封 6년(전105)에 사망했다.

각주 027)

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여 10년 전후의 시간이주 028[지났습니다.] 이에 [한군은] 서하(西河)를 넘어 대사막(大沙漠)주 029을 종단하였으며, 치안(寘顔)[산]
주 030을 공파하고, [선우의] 왕정(王庭)을 습격하고,주 031[흉노] 땅 구석구석까지 도망자들을 쫓아 북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낭거서산(狼居胥山)
주 032에서 봉(封)[의 의식을 거행]하고 고연(姑衍)[산]
주 033에서는 선(禪)[의 의식을 거행]하였으며주 034[나아가] 한해(翰海)
주 035霍去病(?∼전117) : 漢武帝 시기 對匈奴 전쟁을 이끈 名將이다. 大將軍 衞靑의 생질로 그와 명성을 나란히 했다. 모친은 衞子夫의 손위 누이였다. 18세에 霍去病은 皇后의 인척으로 侍中이 되었다. 元朔 6년(전123) 大將軍 衞靑을 따라 匈奴 전쟁에 참가했다. 元狩 2년(전121) 驃騎將軍이 되었다. 그 뒤 전후 6차에 걸쳐 匈奴를 공격하였다. 특히 元狩 2년(121)의 匈奴 공격 결과 匈奴의 渾邪王이 4만을 이끌고 來降하였다. 이때 5개의 屬國을 세워 그 무리를 안치하였다. 그리고 河西 지역에 武威, 張掖, 酒泉, 敦煌 등 4郡을 세웠다. 元狩 4년(전119)의 전투 때에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바이칼호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돌아와서 大司馬 驃騎將軍으로 추대되었다. 武帝代 발생한 戾太子 사건으로 衞氏는 몰락하지만, 霍去病의 동생 霍光은 武帝 사후 정권을 장악한다. 霍氏 일족의 권력 장악은 宣帝代까지 지속되었다.

각주 035)

에 다다랐습니다. [귀환할 때 흉노의] 명왕(名王)과 귀인(貴人) 수백 명을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흉노는 [한을] 두려워하고 더욱 화친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翰海 : ‘瀚海’라고도 하는데 지칭하는 대상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唐代 이전 사람들이 『史記』, 『漢書』를 주석할 때는 이것을 큰 海의 이름으로 보았다. 현재 몽골 고원 북쪽의 呼倫(Hulun)湖나 바이칼호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唐代에는 그 뜻이 몽골고원 大沙漠의 이북과 서쪽 준가르 분지 일대를 가리키는 범칭이었다. 西夏 시기에는 靈州 일대의 소택지를 瀚海라 불렀다. 元代에는 현재 新疆 위구르自治區의 古爾班通古特 사막을 瀚海라고 하였다. 혹은 현재의 알타이산을 瀚海라고 하기도 했다. 明代 이후 ‘翰海’는 고비사막을 지칭하였다. 현대 학자 岑仲勉은 漢代 霍去病이 이곳에 ‘登臨’하였다고 한 이상, 翰海는 海가 아니라 山이며 현재 몽골 항가이산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
각주 001)
秦始皇(전259∼전210) : 이름은 嬴政이다. 秦 莊襄王의 아들로 태어나, 13세에 秦王으로 즉위하였고, 39세에 稱帝하였으며 37년간 在位하였다. 최초의 統一王朝 황제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황제로 즉위한 후, 蒙恬을 보내 匈奴를 공격하고 河南地를 수복하고 匈奴를 陰山산맥 以北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서쪽의 臨洮(현재 감숙성 岷縣)에서 동쪽의 遼東에 이르기까지 만리장성을 연결하였다. 또한 남으로는 百越을 점령하고 桂林, 象郡, 南海郡 등을 세웠다. 처음 秦朝가 天下를 통일하였을 때는 36개 郡이었으나, 始皇帝의 재위 말기에는 40여 개로 늘어났다. 그럼으로써 ‘中國’뿐 아니라 匈奴와 越人 등 ‘四夷’ 지역에도 郡縣을 설치하는 세계[天下]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 각주 002)
-
각주 003)
기원전 215년 진시황은 蒙恬을 보내 匈奴를 정벌했다. 『史記』 권6(「秦始皇本紀」 : 252)에 따르면, 이때 군사 30만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흉노 정벌의 원인에 대하여 後漢의 유학자 鄭玄은 “秦을 멸망시킬 자는 胡이다(亡秦者胡也)”라는 『錄圖書』의 기록이 二世皇帝 胡亥를 겨냥하는 것인 줄 모르고 북방의 胡(즉 匈奴)를 공격하였다고 한다(『史記』 권6 : 253). 하지만 이는 秦朝가 흉노와 같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의 문제로 멸망했음을 강조하는 漢代 儒家들의 의식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쓰루마 가즈유키, 2004 : 163∼164).
-
각주 004)
西河 : 현재의 山西省과 陝西省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黃河를 지칭한다. 이곳은 夏와 商 이래 山東 지역 국가들의 都城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西河’라고 불렸다. 『史記』 권111(「衞靑列傳」 : 2924)에 “車騎將軍 衞靑이 西河를 지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西河”에 대하여 『史記正義』는 “雲中郡의 西河”라고 풀이하였다. 한편 일역본(內田吟風, 1971 : 121)에서는 황하의 서쪽 지대인 오르도스 지역을 지칭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武帝 元朔 4년(전125)에 西河郡이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현재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平定縣이었다.
-
각주 005)
長城 : ‘만리’장성은 당시의 척도로 약 5천km에 달한다. 長城 축조의 기사는 『史記』 권6 「秦始皇本紀」에서 진시황 33년, 즉 秦始皇 사망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 짧은 시기에 秦始皇이 長城을 완성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대신 戰國秦이 축조한 오르도스 장성과 陰山長城, 그리고 戰國시기 趙, 燕이 축조한 장성을 연결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秦始皇시대 長城의 축조가 寧夏 回族自治區 지역에 賀蘭山 長城을 새로 축조한 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쓰루마 가즈유키, 2004 : 174).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顔師古는 平城 탈출의 계책이 醜惡해서 世間에서 언급을 피했다고 풀이하였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기원전 200년 劉邦은 漢軍 32만을 동원하여 匈奴를 공격하였다. 冒頓單于가 지휘하는 匈奴의 騎兵 40만은 平城 부근의 白登에서 7일간 漢軍을 포위하였다. 劉邦은 陳平의 계책에 따라, 匈奴 측에 뇌물과 閼氏를 바치는 조건으로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원전 198년 겨울 漢은 劉敬의 건의에 따라 匈奴와 정식으로 和親의 約을 맺었다. 이 約은 漢이 匈奴에게 公主의 出嫁, 歲幣의 공급을 약속하고 쌍방이 兄弟의 盟約을 맺으며, 匈奴는 한의 변경을 침공하지 말 것 등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내용은 漢측의 열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간에서 언급을 회피할 만큼 ‘醜惡’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漢文帝 시기 저명한 文學之士 賈誼는 이 점을 비판하여 “天下의 형세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天下之勢方倒縣)”고 하였다(『漢書』 권48 「賈誼傳」 : 2240). 한편 이러한 約을 통해 형성된 ‘和親’ 관계는 武帝 이전 시기 국제관계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南越, 朝鮮 등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漢 측에서는 이들에게 不可侵을 요구하고, 非漢 측에서는 반대급부로 歲幣를 요구하였다(김한규, 1982 : 197∼201).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季布 : 彭城 사람이다. 어려서 俠客으로 자임하면서 法度를 지키지 않았다. 項羽가 西楚覇王으로 自立한 뒤, 彭城에 이르렀을 때, 季布를 장수로 임명하였다. 季布는 楚漢 전쟁 동안 여러 차례 劉邦을 곤경에 빠뜨렸다. 漢朝 건립 이후, 劉邦은 특별히 季布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季布는 大俠 朱家의 도움을 받아 사면을 받고 나아가 郞中으로 임명되었다. 惠帝 때에 中郞將이 되었는데, 樊噲의 匈奴 정벌 기도를 막았다. 文帝代에는 河東郡守를 역임했다. 御史大夫로 발령받았으나 병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민간에서는 “黃金 1千斤을 얻는 것이 季布로부터 한 차례 인정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 이름이 높았다.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細柳 : 옛 지명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① 현재의 陝西省 咸陽市의 서남쪽으로 渭水의 북쪽 지대를 말한다. ② 현재의 陝西省 長安縣의 서남쪽을 말한다. 『漢書』에서는 “柳市”라고 지칭하는 곳으로 渭水보다 남쪽에 있다. 『漢書』 권4(「文帝紀」 : 131)에 細柳에 대한 주석이 있다. 如淳은 “長安의 細柳倉이 渭水 북쪽에 있다. 石徼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는 ①의 細柳이다. 반면 張揖은 “昆明池 남쪽에 있다. 지금의 柳市를 말한다”고 했고 顔師古는 “細柳는 渭水 북쪽에 있지 않다. 張揖의 설이 맞다”고 했다. 이는 ②의 細柳, 즉 柳市를 말한다. 『史記索隱』에서도 細柳가 渭水 북쪽에 있다는 설을 비판하고 있다(『史記』 권10 「孝文本紀」 : 432). 하지만 원문에서 周亞夫가 주둔한 곳은 ①의 細柳, 즉 渭河의 북단을 말한다는 지적도 있다.
- 각주 018)
- 각주 019)
- 각주 020)
- 각주 021)
- 각주 022)
- 각주 023)
- 각주 024)
-
각주 025)
馬邑 사건의 줄거리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漢武帝는 즉위한 이후에도 祖母 竇太后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나, 建元 6년(전135) 竇太后가 사망하자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하였고 그 최초의 일이 匈奴 문제였다. 이해 무제는 匈奴 정벌 문제를 朝議에 붙였으나 御史大夫 韓安國 등의 반대에 부딪혀 開戰論은 부결되었다. 그 이듬해 元光 1년(전134) 馬邑 사람 聶壹이 開戰의 계책을 올렸고 그 다음 해 元光 2년(전133) 武帝는 다시 朝議를 소집하여 30만 대군의 출병 계획을 확정지었다. 흉노의 軍臣單于는 聶壹의 말에 속아 10여만 기를 이끌고 馬邑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漢의 계획을 눈치채고 철수하였다. 이 일로 聶壹의 계책을 중앙에 보고했던 主戰論者 王恢는 문책을 받고 獄死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漢初 이래 유지되었던 한과 匈奴 사이의 화친관계는 결정적으로 파탄났고 그 뒤 쌍방은 본격적인 전쟁관계로 접어들었다(西嶋定生, 2002 : 153∼154). 이처럼 漢․匈奴 관계의 악화에는 漢武帝 개인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匈奴 單于의 정치적 지도력은 중국의 皇帝만큼 공고하지 못했고, 따라서 화친관계는 匈奴의 귀족 구성원들의 자의적 약탈에 의하여 늘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점(디코스모, 2005 : 297∼298)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각주 026)
衞靑(?∼전105) : 漢武帝 시기 對匈奴의 전쟁을 지휘한 名將이다. 字는 仲卿이며 河東 平陽 사람이다. 그의 부친이 縣吏로 平陽公主의 집안에 給事하다가 婢女와 私通하여 衞靑을 낳았다. 衞靑은 同母 異父姊인 衞子夫가 武帝에게 得幸하자 그 역시 武帝의 부름을 받아 建章監, 侍中, 太中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元光 6년(전129) 車騎將軍으로 임명된 뒤, 7차에 걸쳐 匈奴 원정에 나섰다. 그 결과 河南地를 수복하여 朔方郡을 설치하였고, 秦代의 邊塞를 수선하여 長安 防備를 충실히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長平侯에 임명되고 食邑 3천 8백호를 받았다. 元狩 4년(전119)에는 定襄塞 밖 천여 리까지 원정하여 匈奴 伊穉斜單于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후 한동안 한과 匈奴 사이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다. 武帝는 衞靑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히 大司馬를 신설하여 그를 大司馬 大將軍으로 임명하였다. 衞靑은 비록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朝政에 간여하지 않고, 겸손한 처신으로 인심을 얻었다. 元封 6년(전105)에 사망했다.
-
각주 027)
霍去病(?∼전117) : 漢武帝 시기 對匈奴 전쟁을 이끈 名將이다. 大將軍 衞靑의 생질로 그와 명성을 나란히 했다. 모친은 衞子夫의 손위 누이였다. 18세에 霍去病은 皇后의 인척으로 侍中이 되었다. 元朔 6년(전123) 大將軍 衞靑을 따라 匈奴 전쟁에 참가했다. 元狩 2년(전121) 驃騎將軍이 되었다. 그 뒤 전후 6차에 걸쳐 匈奴를 공격하였다. 특히 元狩 2년(121)의 匈奴 공격 결과 匈奴의 渾邪王이 4만을 이끌고 來降하였다. 이때 5개의 屬國을 세워 그 무리를 안치하였다. 그리고 河西 지역에 武威, 張掖, 酒泉, 敦煌 등 4郡을 세웠다. 元狩 4년(전119)의 전투 때에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바이칼호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돌아와서 大司馬 驃騎將軍으로 추대되었다. 武帝代 발생한 戾太子 사건으로 衞氏는 몰락하지만, 霍去病의 동생 霍光은 武帝 사후 정권을 장악한다. 霍氏 일족의 권력 장악은 宣帝代까지 지속되었다.
- 각주 028)
- 각주 029)
- 각주 030)
- 각주 031)
- 각주 032)
- 각주 033)
- 각주 034)
-
각주 035)
翰海 : ‘瀚海’라고도 하는데 지칭하는 대상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唐代 이전 사람들이 『史記』, 『漢書』를 주석할 때는 이것을 큰 海의 이름으로 보았다. 현재 몽골 고원 북쪽의 呼倫(Hulun)湖나 바이칼호를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唐代에는 그 뜻이 몽골고원 大沙漠의 이북과 서쪽 준가르 분지 일대를 가리키는 범칭이었다. 西夏 시기에는 靈州 일대의 소택지를 瀚海라 불렀다. 元代에는 현재 新疆 위구르自治區의 古爾班通古特 사막을 瀚海라고 하였다. 혹은 현재의 알타이산을 瀚海라고 하기도 했다. 明代 이후 ‘翰海’는 고비사막을 지칭하였다. 현대 학자 岑仲勉은 漢代 霍去病이 이곳에 ‘登臨’하였다고 한 이상, 翰海는 海가 아니라 山이며 현재 몽골 항가이산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색인어
- 이름
- 진시황(秦始皇), 몽염(蒙恬), 고조(高祖), 고황후(高皇后), 번쾌(樊噲), 계포(季布), 번쾌, 효문제, 효무제(孝武帝), 한안국(韓安國), 무제, 위청(衞靑), 곽거병(霍去病)
- 지명
- 서하(西河), 한, 한, 평성(平城), 옹(雍), 감천(甘泉)[산], 한, 세류(細柳), 마읍(馬邑), 서하(西河), 치안(寘顔)[산], 낭거서산(狼居胥山), 고연(姑衍)[산], 한해(翰海),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