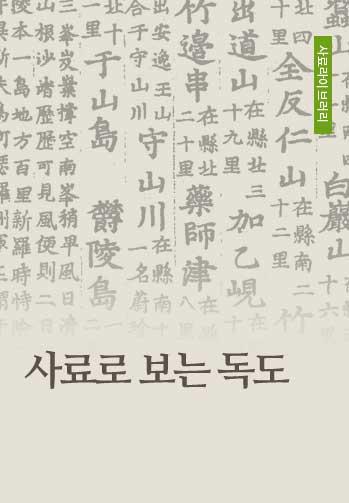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다
사료해설
1696년 3월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명확하기 위해 일본의 호키슈에 건너갔던 안용복은 그해 8월 양양현으로 돌아왔다. 강원 감사(江原監司) 심평(沈枰)에게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본 사료는 비변사의 추문(推問)에서 안용복이 일본에 도일하게 된 이유와 일본에서의 행적, 그리고 귀국과정을 진술한 내용이다.
내용에 따르면 안용복은 그해 3월 승려 뇌헌(雷憲)등 10명과 함께 울릉도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일본인들이 송도(松島; 독도)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귀국하는 일본인들의 뒤를 쫓다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오키도(玉岐島; 隱岐島)에 표류하게 되었다. 안용복은 오키도주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자산도(울릉도) 도해 문제를 따졌으나 그 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안용복은 울릉·자산양도감세장(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관복을 갖춰 입고 돗토리번주에게 1693년 당시 울릉도·자산도 두섬이 조선령임을 밝힌 ‘관백의 서계’를 받았는데, 대마도주가 ‘관백의 서계’를 빼앗고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내어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대마도주의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고 하고, 일행인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이에 막부(幕府)의 문책을 염려한 대마도의 섭정도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돗토리번주를 통하여 소장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돗토리번주는 안용복에게 당시 울릉도·자산도를 침범한 일본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울릉도·자산도 두 섬은 이미 조선에 속하였으므로, 뒷날 일본인으로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대마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안용복이 사양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진술은 안용복과 동행했던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술과도 같다고 기술되었다.
위 내용은 안용복이 체포된 이후 진술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측 사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안용복이 말한 백기주(伯耆州)는 돗토리번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안용복이 받았다는 ‘관백의 서계’는 『오야가문서(大谷家文書)』에서 1696년 안용복이 지참한 물건 가운데 문서가 있어 베껴놓았다는 일본측 사료로 미루어, 1693년 안용복이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돗토리번주나 아라오 슈리[荒尾修理]와 같은 돗토리번의 가로로부터 받은 모종의 문서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에서 조선인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문서로 판단된다.
안용복이 진술한 자산도는 우산도의 이칭으로 일본에서 부르던 마쓰시마[松島], 즉 독도를 가리키며, 안용복은 1696년 돗토리번에 직접 도항을 해서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출입을 금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돗토리번에서 안용복에게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와 부속 섬인 마쓰시마(松島,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주었다는 사실은 돗토리번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인한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안용복은 그해 3월 승려 뇌헌(雷憲)등 10명과 함께 울릉도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일본인들이 송도(松島; 독도)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귀국하는 일본인들의 뒤를 쫓다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오키도(玉岐島; 隱岐島)에 표류하게 되었다. 안용복은 오키도주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자산도(울릉도) 도해 문제를 따졌으나 그 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안용복은 울릉·자산양도감세장(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관복을 갖춰 입고 돗토리번주에게 1693년 당시 울릉도·자산도 두섬이 조선령임을 밝힌 ‘관백의 서계’를 받았는데, 대마도주가 ‘관백의 서계’를 빼앗고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내어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대마도주의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고 하고, 일행인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이에 막부(幕府)의 문책을 염려한 대마도의 섭정도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돗토리번주를 통하여 소장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돗토리번주는 안용복에게 당시 울릉도·자산도를 침범한 일본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울릉도·자산도 두 섬은 이미 조선에 속하였으므로, 뒷날 일본인으로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대마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안용복이 사양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진술은 안용복과 동행했던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술과도 같다고 기술되었다.
위 내용은 안용복이 체포된 이후 진술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측 사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안용복이 말한 백기주(伯耆州)는 돗토리번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안용복이 받았다는 ‘관백의 서계’는 『오야가문서(大谷家文書)』에서 1696년 안용복이 지참한 물건 가운데 문서가 있어 베껴놓았다는 일본측 사료로 미루어, 1693년 안용복이 돗토리번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돗토리번주나 아라오 슈리[荒尾修理]와 같은 돗토리번의 가로로부터 받은 모종의 문서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에서 조선인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문서로 판단된다.
안용복이 진술한 자산도는 우산도의 이칭으로 일본에서 부르던 마쓰시마[松島], 즉 독도를 가리키며, 안용복은 1696년 돗토리번에 직접 도항을 해서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출입을 금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돗토리번에서 안용복에게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와 부속 섬인 마쓰시마(松島,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주었다는 사실은 돗토리번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인한 것이다.
원문
○備邊司推問安龍福等。 龍福以爲: “渠本居東萊, 爲省母至蔚山, 適逢僧雷憲等, 備說頃年往來鬱陵島事, 且言本島海物之豐富, 雷憲等心利之。 遂同乘船, 與寧海篙工劉日夫等, 俱發到本島, 主山三峰, 高於三角, 自南至北, 爲二日程, 自東至西亦然。 山多雜木、鷹、烏猫, 倭船亦多來泊, 船人皆恐。 渠倡言: ‘鬱島本我境, 倭人何敢越境侵犯? 汝等可共縳之。’ 仍進船頭大喝, 倭言: ‘吾等本住松島, 偶因漁採出來。 今當還往本所。’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遂以翌曉, 拕舟入子山島, 倭等方列釜鬻煮魚膏。 渠以杖撞破, 大言叱之, 倭等收聚載船, 擧帆回去, 渠仍乘船追趁, 猝遇狂飆, 漂到玉岐島。 島主問入來之故, 渠言: ‘頃年吾入來此處, 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 至有關白書契, 而本國不有定式, 今又侵犯我境, 是何道理?’ 云爾, 則謂當轉報伯耆州, 而久不聞消息。 渠不勝憤惋, 乘船直向伯耆州,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 將使人通告本島, 送人馬迎之。 渠服靑帖裏, 着黑布笠, 穿皮鞋乘轎, 諸人竝乘馬, 進往本州。 渠與島主, 對坐廳上, 諸人竝下坐中階, 島主問: ‘何以入來?’ 答曰: ‘前日以兩島事, 受出書契, 不啻明白, 而對馬島主奪取書契, 中間僞造, 數遣差倭, 非法橫侵, 吾將上疏關白, 歷陳罪狀。’ 島主許之。 遂使李仁成, 構疏呈納, 島主之父來懇伯耆州曰: ‘若登此疏, 吾子必重得罪死, 請勿捧入。’ 故不得稟定於關伯, 而前日犯境倭十五人, 摘發行罰。 仍謂渠曰: ‘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 仍給糧, 定差倭護送, 渠以帶去有弊, 辭之。” 云。 雷憲等諸人供辭略同。 備邊司啓請: “姑待後日登對稟處。” 允之。
번역문
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安龍福)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동래(東萊)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蔚山)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寧海)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 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철릭[帖裏]를 입고 검은 포립(布笠)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轎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낵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비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하였고,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선 뒷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저는 본디 동래(東萊)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蔚山)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寧海)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 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철릭[帖裏]를 입고 검은 포립(布笠)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轎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낵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비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하였고,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선 뒷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