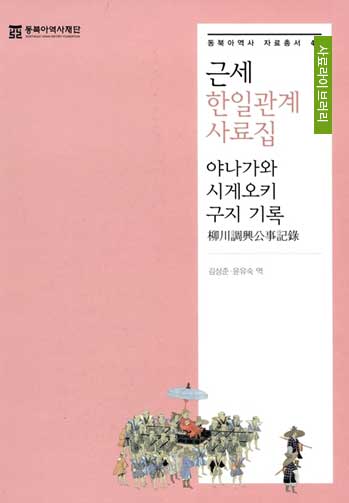등성(登城)할 때 삼사(三使)의 복식(服飾)
[주요 인물들의 옷차림 묘사]
삼사가 등성할 때 금색 관, 조복(朝服),주 001
각주 001)

옥패(玉佩). 옷은 삼사 모두 홍색.전명의례(傳命儀禮)나 하례의식(賀禮儀式)을 행할 때 삼사신(三使臣)이 입었던 복장. 원래는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의식을 거행할 때에 입는 예복을 이르던 말이다. 조근(朝覲)의 의복이라 하여 왕이나 신하가 천자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1426년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관(冠)·의(衣)·상(裳)·폐슬(蔽膝)·중단(中單)·대대(大帶)·혁대(革帶) ·수(綏)·패옥(佩玉)·옥규(玉圭)·말(襪)·석(潟)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붉은 빛의 비단으로 만들며 소매가 넓고 깃이 곧은 것이 특징이다. 왕과 태자가 착용한 조복과 달리 백관이 착용한 조복을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조복을 입을 때 금관도 함께 썼기 때문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홀(笏)주 002
각주 002)

은 상아(象牙)조선시대에 관원이 조복(朝服), 제복(祭服), 공복(公服) 차림을 하였을 때에 손에 쥐는 작은 판(板). 원래는 임금 앞에서 교명(敎命)이 있거나 아뢸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써서 잊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인데 후세에는 다만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왕은 규(圭)를 잡고 대부(大夫)나 사(士)는 홀을 들었다. 길이 약 60cm, 너비 약 6cm에 얄팍하고 약간 굽고 길쭉한 모양.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의하면 l-4품관은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 5-9품관은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을 사용했고 향리(鄕吏)는 공복에만 목홀을 갖추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금모조(金毛彫)
비단 복건(紗幅)주 004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에게 초청되었을 때는 그림과 같은 관 [차림].
옷은 복숭아색 또는 황색. 대대(大帶)주 005·홀 등은 착용하지 않음.
5일 부사가 쓴 비단 복건에 늘어뜨린 부분은 없음.
삼사
여정 중의 복장. 옷은 옅은 황색 또는 백색
상상관이 등성할 때의 복장. 색은 불확실함. 연두·옅은 황색의 무명이다.
제술관, 상판사, 학사, 사자관. 각기 등성할 때 당관(唐冠)을 착용. 고산케를 방문하여 곡마(曲馬) 공연을 할 때도 동일하다.
쓰시마노카미가 초청했을 때 상상관 1인이 이것을 착용. 2인은 비단 두건.
상상관, 제술관, 상판사, 학사, 사자관 등은 항상 그림과 같은 관을 착용.
각각 금색 실의 직물이다.
5일 쓰시마노카미가 초청했을 때 제술관 1인이 착용했다.
모두 안에 입은 옷은 그림과 같다. 전부 흰색.
망건주 006 치촬주 007 상투를 넣고 막대를 찌른다.
군관이 등성할 때 입은 옷은 옅은 황색인지 백화색인지 명확하지 않다. 소재는 비단인 듯하다.
채찍. 채찍 위에 자석이 있는 것도 있다.
각자 채찍을 들었다.
갓의 겉은 라사(羅紗)주 008인 듯하다. 속은 비단 종류를 썼다. 갓의 앞에 새김 장식이 있는 것도 있다.
도훈도, 마상재. 형태는 이와 같다. 단 활과 화살은 차지 않았고 큰 칼을 찬다.
[군관은 활과 화살을] 적자색(赤紫色)주 009 또는 라사 주머니에 넣어 그림과 같이 지닌다.
군관. 평소 복장
이와 같이 홍색 털 등을 부착한 것도 있음. 갓 끈에 오색의 옥을 단 것도 있다.
안감은 홍색 혹은 황색
도훈도, 마상재. 항상 그림과 같다.
이 신은 [높이가] 정강이까지 온다. 조이는 끈도 없고, 정강이를 비단으로 휘감아 정강이에 붙인다.
도훈도, 마상재
등성할 때도 그림과 같다. 옷의 색도 다름이 없다.
평상복은 군관의 평소복과 같은 형태이다.
큰 칼을 [등에] 진다. 채찍[을 손에 든다]
소동의 예복 [차림]
신은 비단. 옅은 황색 문양이 있다.
소동의 평상복
취수의 예복. 악공
각각 붉은 삼베 [착용]. 중관
평상복은 도훈도의 평상복과 같은 듯하다.
사령(使令)·흡창(吸唱)·예사(禮事)직·소통사(小通事) 모두 같다.
도척(刀尺). 그림과 같이 어깨에 멘다.
상의는 감색. 각기 새끼줄을 건다.
백포 백색, 옅은 황색
방울이 달려 있다.
하관의 의복. 옅은 쥐색 혹은 백색
중관 이하. 하의는 그림과 같다.
-
각주 001)
전명의례(傳命儀禮)나 하례의식(賀禮儀式)을 행할 때 삼사신(三使臣)이 입었던 복장. 원래는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의식을 거행할 때에 입는 예복을 이르던 말이다. 조근(朝覲)의 의복이라 하여 왕이나 신하가 천자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1426년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관(冠)·의(衣)·상(裳)·폐슬(蔽膝)·중단(中單)·대대(大帶)·혁대(革帶) ·수(綏)·패옥(佩玉)·옥규(玉圭)·말(襪)·석(潟)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붉은 빛의 비단으로 만들며 소매가 넓고 깃이 곧은 것이 특징이다. 왕과 태자가 착용한 조복과 달리 백관이 착용한 조복을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조복을 입을 때 금관도 함께 썼기 때문이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2)
조선시대에 관원이 조복(朝服), 제복(祭服), 공복(公服) 차림을 하였을 때에 손에 쥐는 작은 판(板). 원래는 임금 앞에서 교명(敎命)이 있거나 아뢸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써서 잊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인데 후세에는 다만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왕은 규(圭)를 잡고 대부(大夫)나 사(士)는 홀을 들었다. 길이 약 60cm, 너비 약 6cm에 얄팍하고 약간 굽고 길쭉한 모양.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儀章)에 의하면 l-4품관은 상아로 만든 상아홀(象牙笏), 5-9품관은 나무로 만든 목홀(木笏)을 사용했고 향리(鄕吏)는 공복에만 목홀을 갖추었다. (대일외교 용어사전)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