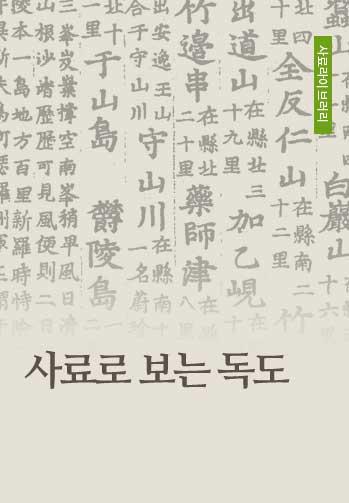경연에서 열무의 열기, 왜인의 진상, 삼봉도 회복 문제 등을 의논하다
사료해설
경연에서 삼봉도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이 올린 계본(啓本)을 보고 삼봉도(三峯島)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믿은 성종은 사람을 파견하여 삼봉도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삼봉도라는 명칭이 사서와 문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성 가운데 바다를 왕래하며 섬에 세 봉우리가 있는 것을 보고 명칭을 붙였을 것이라고 하고, 삼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수색하도록 한다면 병기(兵器)를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정부가 동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토관리에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원문
○丁卯/御經筵。 講訖, 執義尹慜啓曰: “戎政, 國之重事, 不可不講。 然於十月閱武, 則必於八九月徵兵, 臣恐禾稼未收, 必有踏損之弊, 退定何如。” 上曰: “凡秋務, 有至于十月, 而未畢者。 況今年十月有閏, 則雖退定, 似爲未晩, 更以十月望後擇定。” 同知事李承召啓曰: “今倭人所獻, 雖以木蘭皮, 冒稱爲桂皮, 然臣意以謂 ‘彼人, 自以爲慕義獻琛, 則不可不受。’ 受之而不答賜何如?” 上曰: “不受則已, 受之, 則不可不答賜。” 承召曰: “若不受, 則彼必缺望, 不如姑受之。” 上曰: “此則已却之矣, 今後如卿言。” 上又曰: “頃者朴宗元, 求三峯島不得, 今觀永安道敬差官啓本, 其爲有島無疑。 敬差官上來後, 將欲遣人求之。” 領事金國光啓曰: “求之史籍, 雖未有所謂三峯島者, 然其民, 必往來海上, 見島之有三峯者, 因以爲號耳。 但居此島者, 已有叛心者也, 若遣人求之, 則不可不齎兵器以往。” 上曰: “然。” 右副承旨蔡壽啓: “柳陽春上言, 幷啓當初坐罪時招辭。” 上曰: “觀此則其罪不如是之甚也。” 左副承旨金季昌啓曰: “陽春外祖母, 以田民請之, 而不聽, 玄得利, 亦以田民請之曰: ‘爾則年富才優, 可不失高科, 我則不可必矣。 余與汝猶父子, 幸毋發告。’ 陽春又不聽焉, 非徒訟庭, 與得利交口爭詰, 他官則可, 臺省政曹, 不可除也。” 上曰: “敍用。”
번역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윤민(尹慜)이 아뢰기를,
“군정(軍政)은 국가의 중대사(重大事)이니 강(講)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열무(閱武)하려면, 반드시 8,9월에 징병(徵兵)하여야 하니, 신(臣)은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여 반드시 답손(踏損)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물려서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가을일은 10월에 이르러서 끝마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더구나 금년 10월은 윤달이 있으므로, 비록 물려서 정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 다시 10월 보름 뒤[望後]로 택정(擇定)하게 하라.”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이제 왜인(倭人)이 바친 바가 비록 목란피(木蘭皮)를 가지고 계피(桂皮)라고 모칭(冒稱)하였으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스스로 의(義)를 사모하여 구슬[琛]을 바쳤다면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받고서 답사(答賜)만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받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 받았으면 답사(答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승소가 말하기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결망(缺望)할 것이니, 우선 받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미 물리쳤으니, 금후로는 경(卿)의 말과 같이 하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근자에 박종원(朴宗元)이 삼봉도(三峯島)를 구하여 찾다가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그 섬[島]이 있음이 의심없게 되었으니, 경차관(敬差官)이 올라온 뒤에 장차 사람을 보내어 찾도록 하겠다.”
하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사적(史籍)을 찾아 보건대, 비록 삼봉도(三峯島)라 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백성이 반드시 해상(海上)을 왕래하며, 섬에 세 봉우리[三峯]가 있는 것을 본 자가 따라서 이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섬에 거주하는 자는 반심(叛心)을 둔 자이니,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한다면 병기(兵器)를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유양춘(柳陽春)이 상언(上言)하면서 당초 좌죄(坐罪)하였을 때의 초사(招辭)를 아울러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본다면 그 죄(罪)가 이와 같이 심한 것은 아니다.”
하니,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유양춘의 외조모(外祖母)가 전민(田民)을 청하였어도 듣지 않았고, 현득리(玄得利)도 전민(田民)을 청하며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나니, 고과(高科)를 잃지 않을 만하나, 나는 기필할 수가 없다. 내 너와 더불어 부자(父子)와 같으니, 고발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양춘은 또 듣지 않고, 한갓 송정(訟庭)뿐만 아니라 현득리와 더불어 말을 주고 받으며 다투고 힐난하였으니, 타관(他官)은 가(可)하거니와 대성(臺省)과 정조(政曹)는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서용(敍用)하라.”
하였다.
“군정(軍政)은 국가의 중대사(重大事)이니 강(講)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열무(閱武)하려면, 반드시 8,9월에 징병(徵兵)하여야 하니, 신(臣)은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여 반드시 답손(踏損)하는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물려서 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가을일은 10월에 이르러서 끝마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더구나 금년 10월은 윤달이 있으므로, 비록 물려서 정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 다시 10월 보름 뒤[望後]로 택정(擇定)하게 하라.”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이제 왜인(倭人)이 바친 바가 비록 목란피(木蘭皮)를 가지고 계피(桂皮)라고 모칭(冒稱)하였으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스스로 의(義)를 사모하여 구슬[琛]을 바쳤다면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받고서 답사(答賜)만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받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 받았으면 답사(答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승소가 말하기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결망(缺望)할 것이니, 우선 받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미 물리쳤으니, 금후로는 경(卿)의 말과 같이 하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근자에 박종원(朴宗元)이 삼봉도(三峯島)를 구하여 찾다가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그 섬[島]이 있음이 의심없게 되었으니, 경차관(敬差官)이 올라온 뒤에 장차 사람을 보내어 찾도록 하겠다.”
하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사적(史籍)을 찾아 보건대, 비록 삼봉도(三峯島)라 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백성이 반드시 해상(海上)을 왕래하며, 섬에 세 봉우리[三峯]가 있는 것을 본 자가 따라서 이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섬에 거주하는 자는 반심(叛心)을 둔 자이니,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한다면 병기(兵器)를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유양춘(柳陽春)이 상언(上言)하면서 당초 좌죄(坐罪)하였을 때의 초사(招辭)를 아울러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본다면 그 죄(罪)가 이와 같이 심한 것은 아니다.”
하니,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유양춘의 외조모(外祖母)가 전민(田民)을 청하였어도 듣지 않았고, 현득리(玄得利)도 전민(田民)을 청하며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젊고 재주가 뛰어나니, 고과(高科)를 잃지 않을 만하나, 나는 기필할 수가 없다. 내 너와 더불어 부자(父子)와 같으니, 고발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양춘은 또 듣지 않고, 한갓 송정(訟庭)뿐만 아니라 현득리와 더불어 말을 주고 받으며 다투고 힐난하였으니, 타관(他官)은 가(可)하거니와 대성(臺省)과 정조(政曹)는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서용(敍用)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