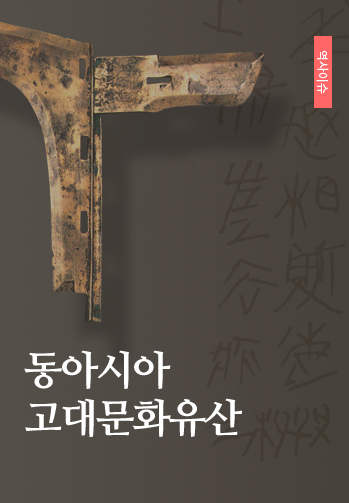대구 팔달동 유적
입지
1992~1993년 경상북도대학교박물관에서 1차 발굴조사를 시행하였고, 1996~1997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시행함.
유적개관
1차 조사에서는 토광묘 17기, 석곽묘 3기,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9기, 원삼국시대 목관묘·토광묘 102기, 목곽묘 1기, 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과묘 22기, 석곽(실)묘 32기, 조선시대 분묘 146기 등이 조사되었음. 팔달동 유적의 중심연대는 목곽묘에서 출토된 다양한 기종의 토기를 기준으로 하여 기원전 2세기~기원후 2세기초로 보고 있음.
출토유물
* 무문토기류(점토대옹, 고배, 흑도장경호, 개, 대부발 등), 와질토기류(주머니호, 조합식 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완, 편구호, 양이부호 등), 삼각형점토대토기, 철부, 철겸, 철모, 철검, 철촉, 철착, 따비, 세형동검, 검파두식, 동모, 동과, 환형동기, 싸쌍두관상동기, 칼집부속구, 유리제구슬, 천하석제 구슬, 골제구슬, 토제장신구, 방추차, 어망추 등
참고문헌
「大邱 八達洞 遺蹟」
「大邱 八達洞 遺蹟Ⅰ」
「大邱 八達洞 遺蹟Ⅰ」
해설
대구는 지형적으로 북쪽과 남쪽에 해발 1,000m가 넘는 팔공산맥과 비슬산맥이 형성되어 있고 중앙은 저지로 대구분지의 분지상에 해당하며 낙동강의 대지류인 금호강과 신천이 이루는 충적평야와 침식저지가 발달해 있다. 팔달동은 대구분지의 중앙부로 금호강과 팔계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함지산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이어져 내려와 금호강에 이르게 되는 능선의 최말단부에 해당하며 주변으로 구릉이 이어져 있다.
팔달동유적은 해발 35~55m의 낮은 구릉지대로 유구는 정상에서 사면부에 조성되어 있다. 팔달동유적 주변의 구릉지대와 충적대지에는 평리동유적,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칠곡3택지 생활유적, 서변동 고분군, 연암산유적, 침산유적 등이 위치한다.
1980년 예비군 훈련 중 참호를 파다가 토기가 발견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이후 여러 차례 조사보고가 이루어지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92~1993년에 걸쳐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널무덤, 돌방무덤, 돌덧널무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후 경북대 박물관 조사구간의 서쪽 능선에 해당하는 145번지 일대가 아파트건설 부지에 해당하여 1996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집자리와 나무널무덤, 돌덧널무덤 등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 기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청동기시대 집자리 19기와 구덩유구 4기를 비롯하여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널무덤 103기, 독무덤 139기, 삼국시대 덧널무덤 22기와 돌덧널무덤 31기, 통일신라시대 돌방무덤 1기와 골호 1기, 조선시대 움무덤 146기가 확인되었다.
집자리는 해발 35~50m 구릉 정상 평탄부와 구릉 동사면에 분포하는데 대개 능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평면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생활면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바닥면 중앙에는 원형으로 얇게 굴착하여 조성한 화덕자리가 1~2기가 열을 지어 조성되어 있다. 13호와 14호는 깬돌을 돌려놓아 조성한 방형의 위석식 화덕자리가 확인된다. 바닥면 중앙과 벽가, 벽가 내측에는 기둥구멍이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다. 모서리 벽면에는 평면 원형의 저장공이 확인된다. 벽면에는 단면 U자형의 벽도랑과 외부돌출구가 시설되었다. 벽도랑 내부에는 벽체를 세우기 위한 기둥구멍이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다. 모서리 벽면에는 평면 원형의 저장공이 확인된다. 자연 폐기된 것과 화재 폐기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 중 몇몇 집자리에서는 집석행위가 확인된다. 가장 규모가 큰 집자리는 1호로 길이 1,638㎝, 너비 390㎝, 면적은 82㎡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지점에서 널무덤과 독무덤은 각각 103기, 139기가 조사되었다. 능선의 정상부와 서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주축방향은 대개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지만 몇몇은 나란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무덤은 통나무널 덧널무덤, 통나무널 돌널무덤, 판재식 널무덤, 판재식 돌널무덤, 움무덤, 덧널무덤으로 구분된다. 26호와 50호의 매장주체부 둘레에는 눈썹모양의 주구가 확인된다. 부장유물은 나무널 내, 충전토 상면, 충전토 내부, 나무널 내부, 나무널 하부, 묘광 바닥, 요갱 및 부장갱, 나무뚜껑 위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독무덤은 구릉 능선부와 사면부에 분포한다. 조합 형태에 따라 단옹식과 이음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음식은 2개의 토기를 합구한 2옹식과 3개의 토기를 연결한 3옹식으로 세분된다.
집자리에서는 민무늬토기, 그물추, 구멍무늬토기, 점토대토기, 기대, 항아리형토기, 골아가리토기, 손잡이, 겹아가리단사선토기와 같은 토기와 숫돌, 박편 석기, 갈돌, 갈판, 간돌검, 반달돌칼, 갈돌, 간돌화살촉, 간돌도끼, 부리형석기, 공이, 원판형석기, 몸돌, 돌창, 가락바퀴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널무덤과 독무덤에서는 민무늬토기와 와질토기, 두형토기 대각, 항아리형토기, 주머니호, 단경호, 소호, 조합식쇠뿔모양손잡이항아리, 흑도장경호, 점토대옹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도끼, 철모, 철촉, 철겸, 철착, 철도자, 따비 등의 철기류 한국식동검, 검파두식, 청동투겁창, 동과, 환형동기, 칼집부속구와 같은 청동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이외에도 석제 가락바퀴, 숫돌, 구슬, 골제 구슬, 유리제 구슬, 토제 장식구, 그물추 등이 있다.
팔달동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대규모 마을 유적으로 집자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무덤이 조사되어 대구지역 선사와 고대사, 철기문화의 유입 및 국가성립 과정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널무덤과 독무덤이 동일묘역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예는 매우 드물어 무덤 연구에 있어 획기적 자료가 되었다.
팔달동유적은 해발 35~55m의 낮은 구릉지대로 유구는 정상에서 사면부에 조성되어 있다. 팔달동유적 주변의 구릉지대와 충적대지에는 평리동유적,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칠곡3택지 생활유적, 서변동 고분군, 연암산유적, 침산유적 등이 위치한다.
1980년 예비군 훈련 중 참호를 파다가 토기가 발견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이후 여러 차례 조사보고가 이루어지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92~1993년에 걸쳐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널무덤, 돌방무덤, 돌덧널무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후 경북대 박물관 조사구간의 서쪽 능선에 해당하는 145번지 일대가 아파트건설 부지에 해당하여 1996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집자리와 나무널무덤, 돌덧널무덤 등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 기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청동기시대 집자리 19기와 구덩유구 4기를 비롯하여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널무덤 103기, 독무덤 139기, 삼국시대 덧널무덤 22기와 돌덧널무덤 31기, 통일신라시대 돌방무덤 1기와 골호 1기, 조선시대 움무덤 146기가 확인되었다.
집자리는 해발 35~50m 구릉 정상 평탄부와 구릉 동사면에 분포하는데 대개 능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평면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생활면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바닥면 중앙에는 원형으로 얇게 굴착하여 조성한 화덕자리가 1~2기가 열을 지어 조성되어 있다. 13호와 14호는 깬돌을 돌려놓아 조성한 방형의 위석식 화덕자리가 확인된다. 바닥면 중앙과 벽가, 벽가 내측에는 기둥구멍이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다. 모서리 벽면에는 평면 원형의 저장공이 확인된다. 벽면에는 단면 U자형의 벽도랑과 외부돌출구가 시설되었다. 벽도랑 내부에는 벽체를 세우기 위한 기둥구멍이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다. 모서리 벽면에는 평면 원형의 저장공이 확인된다. 자연 폐기된 것과 화재 폐기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 중 몇몇 집자리에서는 집석행위가 확인된다. 가장 규모가 큰 집자리는 1호로 길이 1,638㎝, 너비 390㎝, 면적은 82㎡이다.
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지점에서 널무덤과 독무덤은 각각 103기, 139기가 조사되었다. 능선의 정상부와 서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주축방향은 대개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지만 몇몇은 나란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무덤은 통나무널 덧널무덤, 통나무널 돌널무덤, 판재식 널무덤, 판재식 돌널무덤, 움무덤, 덧널무덤으로 구분된다. 26호와 50호의 매장주체부 둘레에는 눈썹모양의 주구가 확인된다. 부장유물은 나무널 내, 충전토 상면, 충전토 내부, 나무널 내부, 나무널 하부, 묘광 바닥, 요갱 및 부장갱, 나무뚜껑 위 등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독무덤은 구릉 능선부와 사면부에 분포한다. 조합 형태에 따라 단옹식과 이음식으로 구분되는데 이음식은 2개의 토기를 합구한 2옹식과 3개의 토기를 연결한 3옹식으로 세분된다.
집자리에서는 민무늬토기, 그물추, 구멍무늬토기, 점토대토기, 기대, 항아리형토기, 골아가리토기, 손잡이, 겹아가리단사선토기와 같은 토기와 숫돌, 박편 석기, 갈돌, 갈판, 간돌검, 반달돌칼, 갈돌, 간돌화살촉, 간돌도끼, 부리형석기, 공이, 원판형석기, 몸돌, 돌창, 가락바퀴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널무덤과 독무덤에서는 민무늬토기와 와질토기, 두형토기 대각, 항아리형토기, 주머니호, 단경호, 소호, 조합식쇠뿔모양손잡이항아리, 흑도장경호, 점토대옹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도끼, 철모, 철촉, 철겸, 철착, 철도자, 따비 등의 철기류 한국식동검, 검파두식, 청동투겁창, 동과, 환형동기, 칼집부속구와 같은 청동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이외에도 석제 가락바퀴, 숫돌, 구슬, 골제 구슬, 유리제 구슬, 토제 장식구, 그물추 등이 있다.
팔달동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대규모 마을 유적으로 집자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무덤이 조사되어 대구지역 선사와 고대사, 철기문화의 유입 및 국가성립 과정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널무덤과 독무덤이 동일묘역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예는 매우 드물어 무덤 연구에 있어 획기적 자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