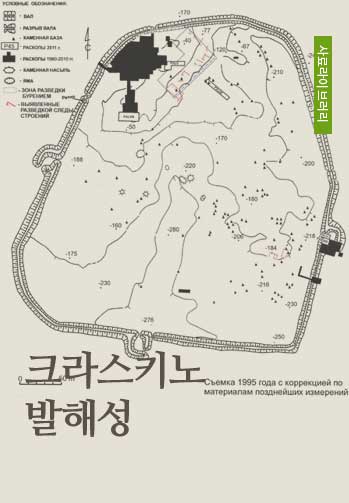(8) 와당
2017년도에는 와당편들이 제51구역과 제53구역 2개의 발굴구역 모두에서 출토되었지만, 대부분은 사찰구역 바로 곁의 제51구역에서 출토되었다.
제53구역에서는 까(К)-2방안(제2인공층)과 엘(Л)-1방안(제3인공층)에서 모두 2점의 와당편이 발견되었다(도면 508, 509; 도면 540). 까(К)-2방안에서 출토된 와당편은 문양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크라스키노 성 출토 와당에 제5형식에 해당되는 문양이다. 이 와당에는 좁은 부분이 가운데로 향하는 심엽형의 연판이 반복되고 그 사이에 3개의 잎사귀로 이루어진 삼엽형 간식이 배치되어 있다. 이 유물의 잔존 크기는 58×44×10mm이다. 두 번째 와당편에는 주연부와 일부 원판이 남아 있는데 문양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잔존 크기는 97×24mm이고, 주연부의 높이는 15mm, 주연부 너비는 10mm이다.
제51구역에서는 와당편들이 제4~제6인공층에서 출토되었다.
① 제4인공층
1점의 와당편(No. 12, 레벨 -193cm)은 도로 유구를 조사할 때에 제4인공층의 상면에서 출토되었다(도면 88, 89). 이 와당편은 잔존 크기가 48×49×9mm이다. 주연부는 너비가 14mm, 높이가 10mm이고, 원판의 두께는 10~11mm, 주연부와 원판을 합한 두께는 19mm이다. 일부 잔존하는 문양의 형태는 문양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문양은 크라스키노 성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제1형식의 문양이다. 이 문양은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늦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발해의 도성들에서 출토된 와당 문양들에서도 비슷한 것을 많이 찾을 수 있다(아스따쉔꼬바, 볼딘 2004: 122~129).
② 제5인공층
제5인공층을 조사할 때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문양을 가진 와당편들이 출토되었다. 그 중 첫 번째 와당편(No. 39, 레벨 -194cm)은 도로 유구를 조사할 때에 베(Б)-7방안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51, 152). 이 와당편은 잔존 크기가 52×36×9~11mm이다. 중앙 돌기의 직경은 15mm이다. 중앙 돌기 주변으로 4개의 작은 연자(직경 5mm)가 남아 있으며, 그 둘레로 융기선으로 된 권선이 일부 남아 있고, 권선에서 뻗어 나온 융기선 하나가 심엽형 연판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 모양의 와당 문양은 크라스키노 성에서 가장 늦은 제1형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와당편(No. 16, 레벨 -205cm)은 줴(Ж)-6방안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43~145). 잔존 크기는 66×58×16mm이고, 주연부는 너비 9mm, 높이 4~5mm이다. 원판의 두께는 15mm, 주연부를 포함한 두께는 20mm이다. 와당 가운데 부분을 감싸고 있는 권선의 일부가 잔존한다. 권선의 바깥 부분에는 자그마한 반구 모양의 연주 2개와 돌기 2개가 각각 남아 있다. 연주는 크기가 직경 3mm이다. 돌기는 모양이 하나는 원형이고 다른 하나는 타원형인데 모두 융기선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원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직경이 2~3mm인 반구 형태의 연자들이 한 줄 더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연자들은 다시 융기선으로 된 원권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이 문양은 제6형식에 해당하며 연구자들에 의해 크라스키노 성에서 가장 늦은 문양의 한 형식으로 간주된다. 뒷면에는 와당을 수키와 부분에 고정시킨 흔적이 남아 있다. 세 번째의 와당편(No. 45, 레벨 -200cm)은 붸(В)-8방안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57, 158). 잔존 크기는 68×23×33mm이다. 주연부는 너비 13~14mm, 높이 3mm이다. 와당의 두께는 41mm이다. 주연부의 뒤쪽은 바로 수키와 부분과 연결된다. 주연부 안쪽에 남은 직경 5mm의 연주 1개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양도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주연부 안쪽에 연주가 있는 와당은 두 개 형식에서만 보이는데 이 와당편은 아마도 제6형식 혹은 제7형식에 해당될 것이다(아스따쉔꼬바, 볼딘 2004: 122~129).
다른 1점의 와당편(No. 44, 레벨 -199cm)은 붸(В)-8방안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55, 156). 이 유물은 와당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된다. 잔존 크기는 52×28~30×12~13mm이다. 중앙 돌기와 그 바깥쪽에 배치된 2개의 잔존하는 긴 융기 삼각형 문양으로 볼 때에 이 와당은 제8형식에 해당한다. 제8형식 와당은 사찰구역에서 이른 단계와 늦은 단계의 유구들에서 함께 발견된 바 있다(아스따쉔꼬바, 볼딘 2004: 125~126).
다른 3점의 작은 와당편들은 베(Б)-4방안(No. 46, 레벨 -200cm)(도면 159, 160), 아'(А')-7방안(No. 47, 레벨 -197cm)(도면 161, 162), 그리고 줴(Ж)-7방안(No. 40, 레벨 -210cm)(도면 153, 154)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잔존 크기는 첫 번째의 것은 34×28×11mm, 두 번째의 것은 43×35×15mm, 세 번째의 것은 28×27×11mm이다. 첫 번째 와당편의 문양은 확정하기가 힘든데 제6형식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와당편은 문양이 뒤집어진 심엽형 연판과 삼엽형의 간식을 가진 제5형식에 속한다. 세 번째 와당편에는 권선으로 둘러싸인 직경 16mm의 중앙돌기만 확인된다. 때문에 이 와당편은 문양이 어떤 형식에 속하는지 판단하기가 힘들다. 다만 이 문양은 제1형식과 제5형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제5인공층을 조사할 때에 다른 2점의 와당편이 발견되었는데 좁은 쪽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심엽형 연판과 삼엽형 간식이 있는 것이다. 그 중 첫 번째의 와당편(No. 20, 레벨 -206cm)은 아(А)-5방안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48~150). 이 유물은 잔존 크기가 69×36×9mm이다. 주연부는 너비가 12~14mm, 높이가 6~9mm이다. 원판의 두께는 11mm, 주연부를 포함하는 원판의 두께는 17mm이다. 뒷면에는 주연부 쪽으로 짧게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와당을 수키와 몸통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형식 와당의 문양은 얇은 융기선으로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제5형식의 문양을 가진 와당은 크라스키노 성의 사찰구역에서 아래 건축면의 건물 기단과 종각을 조사할 때에 발견된 바 있는데, 이 사실은 이 형식 와당이 제8형식 와당과 함께 이른 단계는 물론이고 늦은 단계의 건축면에서도 사용이 되었음을, 다시 말해서 오랜기간에 걸쳐 사용이 되었음을 말한다. 이 형식 와당은 위 건축면의 19호 주거지 구들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③ 제6인공층
제5형식 문양으로 장식된 와당편들이 수점 제6인공층을 조사할 때에 발견되었다. 그 중의 1점(No. 63, 레벨 -210cm)은 게(Г)-5방안에서 출토되었다(도면 281, 282). 이 유물은 잔존 크기가 52×92mm이고, 주연부는 너비가 15mm, 높이는 17mm이며, 원판의 두께는 16mm, 주연부를 포함하는 원판의 두께는 22mm이다. 다른 1점(No. 64, 레벨 -210cm)은 붸(В)-7방안에서 출토되었다(도면 283~285). 이 유물은 잔존 크기가 129×34~45mm이다. 주연부의 크기는 너비가 13~16mm, 높이가 6mm이다. 원판의 두께는 15mm, 주연부를 포함하는 원판의 두께는 14~18mm이다. 비슷한 문양이 있는 다른 1점의 와당편(No. 66, 레벨 -210cm)은 제(З)-7방안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잔존 크기가 36×39×11m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