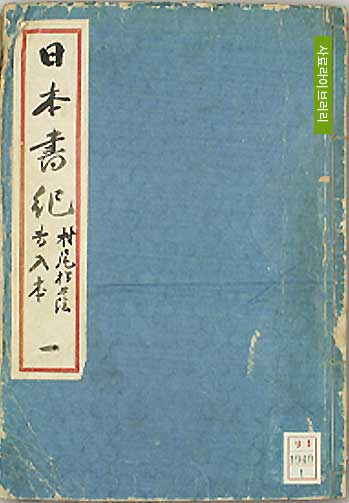백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해서 7국을 평정함
49년 봄 3월주 001에 황전별(荒田別;아라타와케), 녹아별(鹿我別;카가와케)주 002
번역주 002)

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정돈하여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군사의 수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백개로(沙白蓋盧)주 003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곧 목라근자(木羅斤資)주 004, 사사노궤(沙沙奴跪)주 005[이 두 사람의 성(姓)주 006은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령하여 정병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 후 모두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比自㶱)주 007, 남가라(南加羅)주 008, 탁국(㖨國)주 009, 안라(安羅)주 010, 다라(多羅)주 011, 탁순(卓淳), 가라(加羅)주 012 7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古奚津)주 013에 이르러 남만(南蠻)주 014
침미다례(忱彌多禮)주 015 두 사람은 『日本書紀』 응신천황 15년 추8월조에 王仁을 데리러 백제로 갔다는 上毛野君의 선조인 荒田別, 巫別과 동일한 인물로서 『新撰姓氏錄』 河內國 臣別 止美連條에 「豐城入彦命之後也. 四世孫荒田別命男. 田道公被遣百濟國. 娶止美邑吳女. 生男之君. 」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續日本紀』 연력 9년(790) 추7월 신사조의 百濟王仁貞의 상표문에는 ‘上毛野氏遠祖荒田別’이 백제로 파견되어 有識者를 구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들은 河內 지방을 중심으로 백제와의 교섭에 관여한 上毛野氏의 조상으로서, 『日本書紀』 편찬자가 상모야씨의 계보 또는 家記에서 인용한 인명으로 여겨진다. 上毛野氏는 지통천황 5년(691) 「墓記」 제출 18씨족 중의 하나이다.

번역주 015)

를 무찌르고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주 016 또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그때 비리(比利), 벽중(辟中), 포미지(布彌支), 반고(半古) 4읍(四邑)주 017 『日本書紀』 계체천황 2년(508) 12월조에 보이는 南海의 ‘耽羅’와 ‘忱彌多禮’가 음이 비슷하고, ‘南海’라는 방위도 백제에서 忱彌多禮를 볼 때의 ‘南蠻’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忱彌多禮를 제주도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 한편 忱彌多禮를 古奚津의 요충지인 강진으로 보거나,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에 보이는 新彌國으로 보고 영산강 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 왜가 백제에게 영토를 할양했다는 기사는 『日本書紀』에 종종 언급되고 있다. 『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 49년 춘3월조를 비롯해서 同50년 5월조의 多沙城 사여, 응신천황 8년 춘3월조의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등 東韓之地의 奪取, 웅략천황 21년 춘3월조의 久麻那利 사여, 계체천황 6년 12월조의 任那 4縣사여, 同7~10년 己汶, 帶沙 사여, 同23년조 多沙津 사여 등의 예가 있다. 『日本書紀』의 영토 하사와 같은 표현은 율령제하의 일본의 국가관에 기초한 역사 서술로, 백제왕은 천황의 外臣으로 백제왕의 통치지역과 백성은 모두 천황에 의해 하사된 것으로 규정한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번역주 017)

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에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목라근자 등은 함께 의류촌(意流村)에 모였다[지금은 주류수기(州流須祇)주 018라고 한다.]. 서로 보며 기뻐하며 예를 두텁게 하여 보냈다. 다만 천웅장언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가서 벽지산(辟支山)주 019에 올라 맹약하였다. 그리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주 020에 올라서 함께 반석(磐石) 위에 앉았다. 그때 백제왕이 “만일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 갈 것 같아 두렵다.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지금부터는 천추만세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西蕃)이라 칭하며 해마다 조공하겠다.”라고 맹세하였다주 021. 그리고는 천웅장언을 데리고 백제의 도읍에 이르러 더욱 두터이 예우하고 구저 등을 딸려서 보냈다. 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 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여러 곳으로 비정되어 왔는데, 크게 현재 전라남도 일원으로 보는 견해와 충남 및 전북 일원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 4邑을 比利, 辟中, 布彌, 支半, 古四의 5읍으로 끊어 읽어 이를 각각 保安, 金堤, 井邑, 扶安, 古阜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각 지명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比利:『삼국사기』 지리지의 「完山[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완산(현재 전북 전주)으로 보거나 同 지리지의 ‘發羅郡’(현재 전남 나주)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에 보이는 卑離國을 비롯하여 卑離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마한소국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광개토왕비」에는 永樂 6年條(396)와 守墓人條에 고구려군이 공파한 58城의 하나이자 광개토왕릉의 수묘를 담당케 하였던 新來韓濊의 출신지로 比利城이 보인다.
辟中:『삼국사기』 지리지에 「金堤郡. 本百濟碧骨縣. 」이라는 기사를 참고하면 현재 전북 김제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辟骨, 辟城縣, 碧骨郡, 碧骨縣 등은 모두 辟中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되며, 후문에서 백제와 왜가 맹약하였다는 辟支山이 辟中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밖에 『日本書紀』 천지천황 원년(662) 12월조에는 避城으로 나온다.
布彌支:현재 전남 나주 근방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今新豐縣. 」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伐音支가 布彌支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공주시 維鳩(新豐) 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의 不彌國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半古:『삼국사기』 지리지의 「潘南郡. 本百濟半奈夫里縣. 」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현재 전남 나주시 반남면으로 비정되고 있다. 여기서 半奈와 潘南은 서로 音이 통한다. 한편 布彌支와 半古를 布彌와 支半으로 끊어 읽고, 支半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나오는 支半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전북 부안, 태인 방면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지명 비정을 기초로 신공 49년 춘3월조의 4읍 항복 기사를 백제의 근초고왕이 전라도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기사는 근초고왕대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5세기 후반, 즉 웅진시대 이후의 사실이 투영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比利:『삼국사기』 지리지의 「完山[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완산(현재 전북 전주)으로 보거나 同 지리지의 ‘發羅郡’(현재 전남 나주)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에 보이는 卑離國을 비롯하여 卑離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마한소국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광개토왕비」에는 永樂 6年條(396)와 守墓人條에 고구려군이 공파한 58城의 하나이자 광개토왕릉의 수묘를 담당케 하였던 新來韓濊의 출신지로 比利城이 보인다.
辟中:『삼국사기』 지리지에 「金堤郡. 本百濟碧骨縣. 」이라는 기사를 참고하면 현재 전북 김제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辟骨, 辟城縣, 碧骨郡, 碧骨縣 등은 모두 辟中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되며, 후문에서 백제와 왜가 맹약하였다는 辟支山이 辟中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밖에 『日本書紀』 천지천황 원년(662) 12월조에는 避城으로 나온다.
布彌支:현재 전남 나주 근방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今新豐縣. 」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伐音支가 布彌支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공주시 維鳩(新豐) 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의 不彌國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半古:『삼국사기』 지리지의 「潘南郡. 本百濟半奈夫里縣. 」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현재 전남 나주시 반남면으로 비정되고 있다. 여기서 半奈와 潘南은 서로 音이 통한다. 한편 布彌支와 半古를 布彌와 支半으로 끊어 읽고, 支半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나오는 支半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전북 부안, 태인 방면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지명 비정을 기초로 신공 49년 춘3월조의 4읍 항복 기사를 백제의 근초고왕이 전라도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기사는 근초고왕대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5세기 후반, 즉 웅진시대 이후의 사실이 투영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 번역주 001)
-
번역주 002)
두 사람은 『日本書紀』 응신천황 15년 추8월조에 王仁을 데리러 백제로 갔다는 上毛野君의 선조인 荒田別, 巫別과 동일한 인물로서 『新撰姓氏錄』 河內國 臣別 止美連條에 「豐城入彦命之後也. 四世孫荒田別命男. 田道公被遣百濟國. 娶止美邑吳女. 生男之君. 」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續日本紀』 연력 9년(790) 추7월 신사조의 百濟王仁貞의 상표문에는 ‘上毛野氏遠祖荒田別’이 백제로 파견되어 有識者를 구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들은 河內 지방을 중심으로 백제와의 교섭에 관여한 上毛野氏의 조상으로서, 『日本書紀』 편찬자가 상모야씨의 계보 또는 家記에서 인용한 인명으로 여겨진다. 上毛野氏는 지통천황 5년(691) 「墓記」 제출 18씨족 중의 하나이다.
- 번역주 003)
- 번역주 004)
- 번역주 005)
- 번역주 006)
- 번역주 007)
- 번역주 008)
- 번역주 009)
- 번역주 010)
- 번역주 011)
- 번역주 012)
- 번역주 013)
- 번역주 014)
-
번역주 015)
『日本書紀』 계체천황 2년(508) 12월조에 보이는 南海의 ‘耽羅’와 ‘忱彌多禮’가 음이 비슷하고, ‘南海’라는 방위도 백제에서 忱彌多禮를 볼 때의 ‘南蠻’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忱彌多禮를 제주도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 한편 忱彌多禮를 古奚津의 요충지인 강진으로 보거나,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에 보이는 新彌國으로 보고 영산강 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 왜가 백제에게 영토를 할양했다는 기사는 『日本書紀』에 종종 언급되고 있다. 『日本書紀』 신공황후 섭정 49년 춘3월조를 비롯해서 同50년 5월조의 多沙城 사여, 응신천황 8년 춘3월조의 枕彌多禮, 峴南, 支侵, 谷那 등 東韓之地의 奪取, 웅략천황 21년 춘3월조의 久麻那利 사여, 계체천황 6년 12월조의 任那 4縣사여, 同7~10년 己汶, 帶沙 사여, 同23년조 多沙津 사여 등의 예가 있다. 『日本書紀』의 영토 하사와 같은 표현은 율령제하의 일본의 국가관에 기초한 역사 서술로, 백제왕은 천황의 外臣으로 백제왕의 통치지역과 백성은 모두 천황에 의해 하사된 것으로 규정한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 번역주 016)
-
번역주 017)
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 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여러 곳으로 비정되어 왔는데, 크게 현재 전라남도 일원으로 보는 견해와 충남 및 전북 일원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 4邑을 比利, 辟中, 布彌, 支半, 古四의 5읍으로 끊어 읽어 이를 각각 保安, 金堤, 井邑, 扶安, 古阜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각 지명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比利:『삼국사기』 지리지의 「完山[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완산(현재 전북 전주)으로 보거나 同 지리지의 ‘發羅郡’(현재 전남 나주)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에 보이는 卑離國을 비롯하여 卑離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마한소국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광개토왕비」에는 永樂 6年條(396)와 守墓人條에 고구려군이 공파한 58城의 하나이자 광개토왕릉의 수묘를 담당케 하였던 新來韓濊의 출신지로 比利城이 보인다.
辟中:『삼국사기』 지리지에 「金堤郡. 本百濟碧骨縣. 」이라는 기사를 참고하면 현재 전북 김제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辟骨, 辟城縣, 碧骨郡, 碧骨縣 등은 모두 辟中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되며, 후문에서 백제와 왜가 맹약하였다는 辟支山이 辟中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밖에 『日本書紀』 천지천황 원년(662) 12월조에는 避城으로 나온다.
布彌支:현재 전남 나주 근방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今新豐縣. 」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伐音支가 布彌支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공주시 維鳩(新豐) 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 馬韓條의 不彌國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半古:『삼국사기』 지리지의 「潘南郡. 本百濟半奈夫里縣. 」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현재 전남 나주시 반남면으로 비정되고 있다. 여기서 半奈와 潘南은 서로 音이 통한다. 한편 布彌支와 半古를 布彌와 支半으로 끊어 읽고, 支半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나오는 支半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전북 부안, 태인 방면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지명 비정을 기초로 신공 49년 춘3월조의 4읍 항복 기사를 백제의 근초고왕이 전라도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기사는 근초고왕대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5세기 후반, 즉 웅진시대 이후의 사실이 투영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 번역주 018)
- 번역주 019)
- 번역주 020)
- 번역주 021)
색인어
- 이름
- 황전별, 녹아별, 구저, 사백개로, 목라근자, 사사노궤, 목라근자, 사백개로, 초고, 귀수, 황전별, 목라근자, 천웅장언, 천웅장언, 구저
- 지명
- 탁순,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라, 다라, 탁순, 가라, 고해진, 침미다례,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 의류촌, 주류수기, 벽지산, 고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