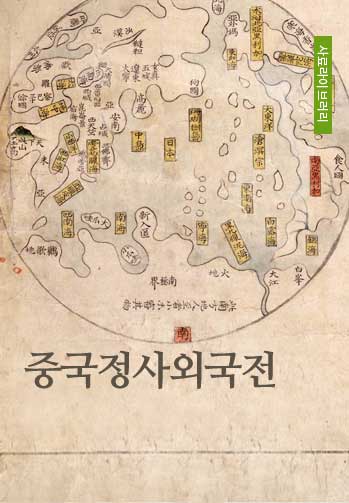왜(倭)의 여왕(女王) 비미호(卑彌呼) 등극
한의 영제(靈帝)
주 001광화 연간(光和, 178∼183)주 002에, 왜국에 난이 일어나,주 003서로 공격하여 여러 해가 지나서, 드디어 비미호(卑彌呼)
주 004
각주 004)

라는 여자를 공립(共立)주 005하여 왕으로 삼았다. 미호(彌呼)
주 006는 남편[夫壻]이 없었으며, 귀도(鬼道)주 007卑彌呼: 히미코(日命, 日尊의 略稱) 또는 히메코(姬子)라고 읽는다. 新井白石은 ‘日御子’로 보아 天皇으로 간주하고 있다(『古史通或問』). 야마타이국이 大和에 있었다는 입장에서는 『日本書紀』에 기재되어 있는 神功皇后, 倭姬命 그리고 崇神天皇의 여동생 倭迹迹日百襲姬命(笠井新也) 등에 비정하고 있다. 한편 九州說에서는 熊襲女酋, 『日本書紀』 神代卷에 보이는 火之戶幡姬兒千千姬命 및 ‘萬幡姬兒玉依姬命 그리고 土蜘蛛田油津媛의 조상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더불어서 那珂通世와 白鳥庫吉 등의 熊襲 혹은 隼人族의 女酋란 설도 있다(末松保和, 1962: 23∼43; 石原道博, 1985: 49∼50).

각주 007)

로써 능히 무리들을 미혹할 수 있었으므로, 나라사람들[國人]이 [왕으로] 세운 것이다. 남동생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 왕이 되고나서는 [그녀를] 본 자가 적었으며, 여종 천명으로써 자신을 시중들게 하고, 다만 한 남자로 하여금 출입하여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거처하는 궁실은 항상 병사를 두어 지켰다. 위나라 경초(景初) 3년(239)에 이르러, 공손연(公孫淵)이 주살된 후, 비미호는 비로소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는데, 위는 친왜왕(親倭王)주 008으로 삼고, 금인자수(金印紫綬)주 009를 내렸다. [위 소제] 정시 연간(正始, 240~249)에 비미호가 죽고, 다시 남왕을 세웠으나, 나라 안[國中]이 따르지 않아, 다시 서로 죽이므로, 비미호의 일족[宗女]인 대여(臺與)
주 485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 후 다시 남왕을 세웠는데, 모두 중국의 작명을 받았다. 진(晉)
주 011의 안제(安帝)
주 012때, 왜왕 찬(贊)
주 013鬼道: 일반적으로 ‘惑世誣民하는 術法’을 가리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넓게는 중국의 신선사상, 보다 직접적으로는 후한 말에 유행하였던 張魯의 五斗米道와도 일정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志』의 張魯傳에서는 漢中地域에서 교세를 떨쳤던 張魯에 대하여, “魯는 漢中에 거점을 두고, 鬼道로써 백성을 가르치고 스스로 師君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森浩一, 1985: 137). 한편 魏가 여왕에게 하사한 동경은 三角緣神獸鏡인데, 이 거울은 神仙과 상서로운 동물을 배치한 道敎的인 성격의 거울이다. 이전 시대까지 일본열도에서 제기로 사용된 銅鐸을 대신하여 銅鏡이 새로운 祭儀 특히 葬送儀禮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 무렵 일본열도의 수장층들이 신선사상을 수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각주 013)

이 있었다.주 014
찬이 죽고, 아우 미(彌)
주 015를 세웠다. 미가 죽자, 아들 제(濟)
주 016를 세웠다. 제가 죽자, 아들 흥(興)
주 017을 세웠다. 흥이 죽자, 아우 무(武)
주 018를 세웠다. 제(齊) 건원(建元)주 019연간에, 무에게 지절(持節),주 486독(督)주 021
왜·신라·임나
주 022·가라
주 023·진한
주 024·모한
주 025·육국제군사(倭新羅任那伽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주 026을 제수하였다.주 027贊: 5세기 왜왕의 이름이다. 『宋書』에는 ‘讚’으로 되어 있다. 왜는 5세기 대에 중국 南朝에 조공하였는데 다섯 명의 왜왕의 이름이 보인다. 이를 倭五王이라고 한다. 찬은 첫 번째로 중국 남조에 조공한 왜왕으로, 421년, 425년, 43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조공하였다. 『日本書紀』에 보이는 倭王 중에서 제17대 履中, 제16대 仁德, 제 15대 應神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履中으로 보는 견해는 讚이 그의 諱인 ‘이자호와케’의 ‘자’라는 음가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고, 仁德으로 보는 견해는 그의 諱인 ‘오오사사기’의 ‘사’를 나타낸다고 보고, 應神으로 보는 견해는 ‘호무다’의 ‘호무’ 즉 ‘譽’와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倭五王의 계보 등에 대해서는 『宋書』 倭國傳 참조.

각주 027)

고조(高祖)
주 028가 즉위하자, 무의 호를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으로 올렸다.주 029
『宋書』에 따르면, 왜왕 武는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自稱하였으나(『宋書』 卷97 「夷蠻·東夷·倭國」: 2395),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조정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도독군사의 범위에서 ‘백제’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유송대에도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김한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까닭은 이미 백제왕에게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백제왕’으로 책봉해 주었기 때문이며, 신라 등 6국에 대한 왜왕의 도독권을 인정해준 까닭은 신라 등은 아직 유송이 주도하는 막부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송 등 남조의 국가들은 고구려와 백제, 왜 등의 군주에게 그 제도적 서열이 1등급씩 차등이 나는 征東(大)將軍과 鎭東(大)將軍, 安東(大)將軍의 칭호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3국의 국제적 위상을 차별화 했다. 남북조 시대 중국의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의 군장을 책봉하는 내용, 특히 장군 칭호를 선택하고 도독권의 범위를 조작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한규, 2005: 179∼180).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卑彌呼: 히미코(日命, 日尊의 略稱) 또는 히메코(姬子)라고 읽는다. 新井白石은 ‘日御子’로 보아 天皇으로 간주하고 있다(『古史通或問』). 야마타이국이 大和에 있었다는 입장에서는 『日本書紀』에 기재되어 있는 神功皇后, 倭姬命 그리고 崇神天皇의 여동생 倭迹迹日百襲姬命(笠井新也) 등에 비정하고 있다. 한편 九州說에서는 熊襲女酋, 『日本書紀』 神代卷에 보이는 火之戶幡姬兒千千姬命 및 ‘萬幡姬兒玉依姬命 그리고 土蜘蛛田油津媛의 조상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더불어서 那珂通世와 白鳥庫吉 등의 熊襲 혹은 隼人族의 女酋란 설도 있다(末松保和, 1962: 23∼43; 石原道博, 1985: 49∼50).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鬼道: 일반적으로 ‘惑世誣民하는 術法’을 가리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넓게는 중국의 신선사상, 보다 직접적으로는 후한 말에 유행하였던 張魯의 五斗米道와도 일정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志』의 張魯傳에서는 漢中地域에서 교세를 떨쳤던 張魯에 대하여, “魯는 漢中에 거점을 두고, 鬼道로써 백성을 가르치고 스스로 師君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森浩一, 1985: 137). 한편 魏가 여왕에게 하사한 동경은 三角緣神獸鏡인데, 이 거울은 神仙과 상서로운 동물을 배치한 道敎的인 성격의 거울이다. 이전 시대까지 일본열도에서 제기로 사용된 銅鐸을 대신하여 銅鏡이 새로운 祭儀 특히 葬送儀禮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 무렵 일본열도의 수장층들이 신선사상을 수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485)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贊: 5세기 왜왕의 이름이다. 『宋書』에는 ‘讚’으로 되어 있다. 왜는 5세기 대에 중국 南朝에 조공하였는데 다섯 명의 왜왕의 이름이 보인다. 이를 倭五王이라고 한다. 찬은 첫 번째로 중국 남조에 조공한 왜왕으로, 421년, 425년, 43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조공하였다. 『日本書紀』에 보이는 倭王 중에서 제17대 履中, 제16대 仁德, 제 15대 應神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履中으로 보는 견해는 讚이 그의 諱인 ‘이자호와케’의 ‘자’라는 음가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고, 仁德으로 보는 견해는 그의 諱인 ‘오오사사기’의 ‘사’를 나타낸다고 보고, 應神으로 보는 견해는 ‘호무다’의 ‘호무’ 즉 ‘譽’와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倭五王의 계보 등에 대해서는 『宋書』 倭國傳 참조.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 각주 019)
- 각주 486)
- 각주 021)
- 각주 022)
- 각주 023)
- 각주 024)
- 각주 025)
- 각주 026)
-
각주 027)
『宋書』에 따르면, 왜왕 武는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自稱하였으나(『宋書』 卷97 「夷蠻·東夷·倭國」: 2395),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조정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도독군사의 범위에서 ‘백제’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유송대에도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김한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까닭은 이미 백제왕에게 ‘사지절 도독백제제군사 백제왕’으로 책봉해 주었기 때문이며, 신라 등 6국에 대한 왜왕의 도독권을 인정해준 까닭은 신라 등은 아직 유송이 주도하는 막부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송 등 남조의 국가들은 고구려와 백제, 왜 등의 군주에게 그 제도적 서열이 1등급씩 차등이 나는 征東(大)將軍과 鎭東(大)將軍, 安東(大)將軍의 칭호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3국의 국제적 위상을 차별화 했다. 남북조 시대 중국의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의 군장을 책봉하는 내용, 특히 장군 칭호를 선택하고 도독권의 범위를 조작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한규, 2005: 179∼180).
- 각주 028)
- 각주 029)
색인어
- 이름
- 영제(靈帝), 비미호(卑彌呼), 미호(彌呼), 공손연(公孫淵), 비미호, 비미호, 비미호, 대여(臺與), 안제(安帝), 찬(贊), 찬, 미(彌), 미, 제(濟), 제, 흥(興), 흥, 무(武), 무, 고조(高祖), 무
- 지명
- 한, 왜국, 위나라, 위, 위, 중국, 진(晉), 제(齊),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