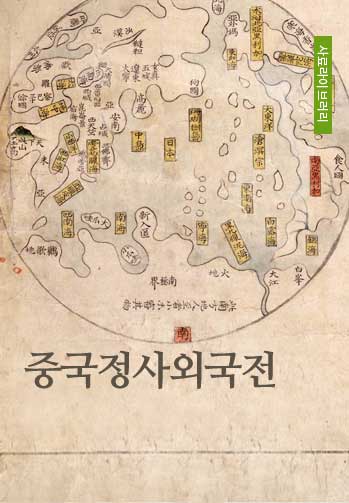왜(倭)의 위치 및 소국에 대한 설명
왜인(倭人)주 001은 대방군(帶方[郡])
주 002
[대방]군(帶方郡)에서 왜(倭)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한국(韓國) 주 009을 거쳐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동쪽으로 나아가면 그 북쪽 대안[北岸]주 100
또 바다 하나를 건너서 1천여 리를 가면 말로국(末盧國) 주 027에 이른다. [이 나라에는] 4천여 호(戶)가 있는데,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고, 초목이 무성하여, 길을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물고기와 전복을 잘 잡는데, 바닷물이 깊든 얕든 간에,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잡는다. [말로국에서] 동남쪽으로 육상으로 5백 리를 가면, 이도국(伊都國) 주 028
[투마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야마일국(邪馬壹國) 주 042
각주 002)

동남쪽의 대해(大海) 중에 살고 있는데, 주 003산이 많은 섬에 의지하여 나라와 마을[國邑]을 이루었다.주 004帶方郡:2세기 말경부터 遼東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펴고 있던 公孫氏가 公孫康의 치세인 204년경에 樂浪郡 屯有縣(지금의 북한 黃州) 이남의 옛 辰番郡의 땅에 설치한 郡이다. 2세기 초부터 고구려가 점차 강성해지고, 그 중엽에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三韓이 강성해지면서 樂浪郡이 그 지배력에 한계를 보이자,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樂浪郡과 帶方郡에 대한 지배권이 曹魏 明帝 景初 연간(237~239)인 公孫淵의 치세에 魏로 돌아가고, 다시 그것을 계승한 西晉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高句麗와 百濟가 세력을 신장하면서 계속 樂浪郡과 帶方郡에 압박을 가하자, 2郡의 세력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그 결과, 고구려 美川王(재위 300~330)은 313년에 樂浪郡을 먼저 통합하였고, 그 이듬해 帶方郡이 역시 고구려에 의해 소멸되었다. 이리하여 漢 武帝가 기원전 108년에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中國의 郡縣은 422년 만에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三國志』 권30 「東夷傳」:830;그리고 李基白·李基東, 1982:69~70 및 石原道博, 2005:39). 韓과 倭는 帶方郡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간주되었으므로, 한과 왜는 낙랑군이 아니라 대방군을 기점으로 하여 그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각주 004)

이전에는 100여 나라였는데, 한대(漢代)에 [이들 중에서 한의] 조정에 알현(朝見)주 005하는 나라가 있었고, 지금은주 006『漢書』 「地理志」에 “百餘國”으로 되어 있고, 顔師古의 주에 인용된 『魏略』에는 “依山島爲國”으로 되어 있어, “國邑”이라고 한 것은 『三國志』뿐이다(주375) 참조). 중국 고대에는 사람이 집주한 곳을 ‘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몇 호로 이루어진 것부터 어느 정도 도시화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규모, 나아가서는 왕이 있는 都邑까지 다양하다. ‘國’은 도읍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국가구조를 都市國家 또는 邑制國家라고 하였으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체제의 영토국가로 전환되면서 邑은 점차 縣으로 편제되었고, 邑 내부는 몇 개의 里로 나누어졌다(森浩一, 1985:103). 한편 國邑은 都城이나 國의 首邑 혹은 제후들의 封地를 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기사의 ‘國邑’이란 표현은 國과 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주 006)

사역(使譯)주 007이 통하는 곳이 30개 나라이다.주 008
“今”이라는 용어는 『三國志』 권30 중 烏丸과 鮮卑 관련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東夷傳〉에만 13사례가 나온다. 그러나 이 ‘今’이 반드시 陳壽의 『三國志」 편찬 당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今句麗王宮是也”에서 고구려왕 궁은 236~247년 사이에 『三國志』에 보이며 3세기 중엽에 재위하였던 왕이다. 그러므로 ‘今’은 陳壽가 사용한 원사료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수는 「東夷傳」의 찬술에서 원사료에 큰 첨삭을 가하지 않고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森浩一, 1985:104~105).

[대방]군(帶方郡)에서 왜(倭)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한국(韓國) 주 009을 거쳐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동쪽으로 나아가면 그 북쪽 대안[北岸]주 100
각주 100)

인 구야한국(狗邪韓國)
주 011에 도착하는데, [거리가] 7천여 리(里)주 012“其北岸”이라고 하여 마치 狗耶韓國이 왜의 강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으나, 아래 문장에서 “王遣使詣京都·帶方郡·諸韓國, 及郡使倭國”이라 하여 諸韓國이 魏의 京都나 帶方郡과 마찬가지로 왜의 일부가 아니라 外國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쪽 기슭이 아니라 북쪽 대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那珂通世는 “‘其’字는 왜를 받는 말로, 皇國으로부터 북쪽에 해당하는 대안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였고, 日野開三郞도 바다를 기준으로 그 남북안을 결정하는 용례가 당송대에 있었음을 지적하여 那珂의 해석을 보완한 바 있다(森浩一, 1985:108).

각주 012)

이며, 처음으로 바다 하나주 013를 건너는데, 1천여 리를 가면주 014
대마국(對馬國)
주 015에 도착한다. 그 대관(大官)은 비구(卑狗)주 016里:『春秋穀梁傳』을 위시한 고대 중국의 典籍 등에 따르면, 거의 모두 1里는 300步라고 기재되어 있다. 魏의 1尺은 24.5cm로 복원되고 있으므로 1里의 실제 거리는 435m 정도이다. 『三國志』의 道程이나 日程에 관한 전체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하루 평균 육로로 40里, 수로로도 40里를 여행하였다(山尾幸久, 1972:62~70). 한편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 7000里라고 한 것은 실제 거리가 아니라 郡에서 구야한국까지 여행하는 데 걸린 날짜에 40里를 곱해서 얻은 수치일 가능성도 있다. 〈韓傳〉에서 “方四千里”라고 한 기록과 함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거나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대마도로 가는 일정이나 대마도의 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된다.

각주 016)

라 부르고, 그 부[관](副官)은 비노모리(卑奴母離)주 017라 부른다. 살아가는 곳은 절도(絶島)주 018로서, 사방이 4백여 리 정도이고, 주 019토지는 산이 많아서 험하고 우거진 수풀이 많으며, 주 101도로는 새와 사슴과 같은 짐승들이 다니는 길과 같다. 1천여 호(戶)가 있으나, 주 021卑狗:‘히코’라고 읽을 수 있다면, 比跪(히코)나 彦(히코) 등으로 표기되는 수장에 대한 존칭이라고 생각된다. 埼玉縣 稻荷山古墳 철검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철검의 명문은 “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上祖 名意富比垝 其兒多加利足尼 其兒名弓已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弖比 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臣 世世爲杖刀人首 奉事來至今 獲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인데, 그중에 “比垝”가 바로 ‘히코’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이 명문 속에는 “스쿠네(足尼, 宿禰)”, “와케(獲居, 別)” 등과 같은 존칭이 보인다. 이처럼 히코, 스쿠네, 와케 등은 일본열도에서 널리 쓰이던 호족이나 수장에 대한 존칭이었다.

각주 021)

좋은 농경지가 없어서주 022해물을 먹으며 생활하면서, 배를 타고 남쪽과 북쪽으로 가서 곡물을 사온다.주 023또 [대마국에서] 남쪽으로 바다 1천여 리를 건너는데, 주 024[이 바다의] 이름은 한해(瀚海)
주 025라고 한다. [1천여 리를 건너면] 일대국(一大國)
주 026에 이른다. [그 대]관(大官) 역시 비구(卑狗)라 부르고, 부[관](副官)도 비노모리(卑奴母離)라 부른다. 사방은 3백 리 정도이고, 대나무와 울창한 숲이 많으며, 3천 정도의 가(家)가 있다. 약간의 전지(田地)가 있지만, 농사를 지어도 여전히 먹고 살기에 부족하므로, 역시 [그] 남쪽과 북쪽으로 다니면서 곡물을 사온다.『三國志』 〈東夷傳〉의 각국 호수 기재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여·고구려·동옥저처럼 “戶八萬”과 같이 기재한 경우, 마한·변한·진한처럼 “大國 萬餘家, 小國 數千家, 總十餘萬戶”와 같이 기재한 경우, 그리고 “有千餘戶”(對馬國), “有三千許家”(一支國), “有四千餘戶”(末盧國), “有千餘戶”(伊都國), “有二萬餘戶”(奴國), “有千餘家”(不彌國), “可五萬餘戶”(投馬國), “可七萬餘戶”(邪馬臺國)와 같이 기재한 경우다. 특히 왜에 관한 기록이 다소 장황한 경향이 있다. 특히 投馬國과 邪馬臺國의 경우는 “有”라고 하지 않고 “可”, 즉 “대략”이라고 한 점도 특징이다. 이는 직접 이곳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傳聞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바다 하나를 건너서 1천여 리를 가면 말로국(末盧國) 주 027에 이른다. [이 나라에는] 4천여 호(戶)가 있는데,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고, 초목이 무성하여, 길을 가면서 앞에 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물고기와 전복을 잘 잡는데, 바닷물이 깊든 얕든 간에,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잡는다. [말로국에서] 동남쪽으로 육상으로 5백 리를 가면, 이도국(伊都國) 주 028
각주 028)

에 도착한다. [이 나라에서 대]관(大官)은 이지(爾支)주 029라 부르고, 부[관](副官)은 설모고(泄謨觚)주 102혹은 병거고(柄渠觚)주 031라 부른다. 1천여 호(戶)주 032가 있는데, 대대로 왕(王)이 있었지만주 033모두 여왕국(女王國)에 통속되어 있어서, 군사(郡使)주 034가 왕래하면서 항상 주재(駐在)하는 곳이다. [이도국에서] 동남쪽의 노국(奴國)
주 035伊都國:이전의 怡土郡(이토군)으로, 지금은 糸島郡(이토시마군)의 深江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伊都(이토)는 伊斗, 伊蘇, 伊覩라고 쓰기도 한다(末松保和, 1962:23~43 및 石原道博, 2005:40~41). 1974·1975년에 糸島郡 前原町 三雲 南小路에서 조사된 옹관묘에서는 前漢時代 銅鏡 22면, 비취곡옥 1개, 유리곡옥 12개, 유리제 목걸이 등이 발굴되었다. 인접한 옹관묘에서도 전한 동경 35매가 출토되어, 彌生時代와 古墳時代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동경이 발굴된 무덤이 되었다. 墓壙의 규모도 긴 변 5.2m, 짧은 변 4.2m로 彌生時代 분묘 중 가장 크다. 묘역 역시 폭 24m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옹관묘들이야말로 이도국의 국왕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森浩一, 1985:202~207)

각주 035)

에 이르는 [거리는] 1백 리이다. [그 대]관(大官)은 시마고(兕馬觚)주 036라 부르고, 부[관](副官)은 비노모리라 부른다. [이 나라에는] 2만여 호가 있다. [노국에서] 동쪽으로 가면 불미국(不彌國)
주 037에 이르는데, [그 거리는] 1백 리이다. [그 대]관(大官)은 다모(多模)주 038라 부르고, 부[관](副官)은 비노모리(卑奴母離)라 부른다. [이 나라에는] 1천여 가(家)가 있다. [불미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투마국(投馬國)
주 039에 이르는데, 바닷길로 20일을 간다. [그 대]관(大官)은 미미(彌彌)주 103라 부르고, 부[관](副官)은 미미나리(彌彌那利)주 041라 부른다. 5만여 호 정도이다.奴國:『後漢書』의 奴國으로, 이전의 儺縣과 那津으로 지금의 福岡縣 博多 부근이다(石原道博, 2005:40~41). 1784년에 北九州 博多灣 志賀島에서 발견된 金印 “漢委奴國王”의 나라이다. 이 奴國은 甕棺, 箱式石棺, 돌멘 등이 발견되는 北九州 연안에 있는 諸國 聯盟體의 盟主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後漢書』 〈倭傳〉에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光武帝] 中元 2年(57)에 倭의 奴國이 貢物을 바치고 朝賀하였는데, 使人은 大夫를 자칭하였다. [노국은] 倭國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이다. 光武帝는 奴國의 사자에게 印綬를 하사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福岡平野 남쪽에 위치한 春日市 岡本의 통칭 須玖岡本 유적에서는 역시 前漢鏡 30매 전후, 동검, 동모, 동과, 유리제 곡옥, 유리제 관옥 등이 수습되어, 三雲 南小路 무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다만 이 유적은 三雲 유적에 비하여 대·중·소형의 거울이 함께 나왔으며, 무기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須玖岡本 유적 역시 奴國의 국왕묘급으로 생각된다(森浩一, 1985:207~208).
福岡平野 남쪽에 위치한 春日市 岡本의 통칭 須玖岡本 유적에서는 역시 前漢鏡 30매 전후, 동검, 동모, 동과, 유리제 곡옥, 유리제 관옥 등이 수습되어, 三雲 南小路 무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다만 이 유적은 三雲 유적에 비하여 대·중·소형의 거울이 함께 나왔으며, 무기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須玖岡本 유적 역시 奴國의 국왕묘급으로 생각된다(森浩一, 1985:207~208).

[투마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야마일국(邪馬壹國) 주 042
각주 042)

에 이르는데, 여왕(女王)이 도읍(都邑)한 곳으로 바닷길로 20일 동안 가고 [다시] 육상으로 1개월 동안 간다.주 043[그 대]관(大官)으로 이지마(伊支馬)주 044가 있고, 그 다음은 미마승(彌馬升)주 045이라 부르며, 그 다음은 미마획지(彌馬獲支)주 046라 부르고, 그 다음은 노가제(奴佳鞮)주 047라 부른다. 7만여 호 정도가 있다.주 048邪馬壹國:3세기 전반 일본열도에 있었던 伊都國 등의 여러 소국들을 통솔하였던 나라. 여왕 卑彌呼가 주재하였던 나라이며 大和政權의 前身으로 보고 있다. 邪馬壹國은 『後漢書』에 “邪馬臺國”으로 되어 있고, 이 “邪馬壹”이 “邪馬臺”의 誤字란 것이 定說이었으나, 근래에는 ‘邪馬壹(야마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나라가 九州에 있다는 주장 내부에서도 日向이나 大隅 지역에 해당된다는 설과 薩摩나 豊前 지역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大和說에서도 瀨戶內海航行說과 東海(日本海)航行說이 있다(末松保和, 1962:23~43 및 石原道博, 2005:41~42, 55). 그리고 『後漢書』에서는 “其大倭王居邪馬臺國. 樂浪郡徼, 去其國萬二千里, 去其西北界拘邪韓國七千餘里(그 大倭王은 邪馬臺國에 거주하고 있다. 樂浪郡治에서 그 나라는 12, 000里 떨어져 있고, 그 나라의 서북방에 있는 拘邪韓國에서는 7, 000여 리 떨어져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 048)

여왕국(女王國)의 이북주 049(에 있는 나라)은 그 호구의 숫자[戶數]와 [여왕국에서의] 거리[道里]를 대략적이라도 기재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주변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얻을 수 없다. 다음으로 사마국(斯馬國)이 있고, 다음으로 이백지국(已百支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이사국(伊邪國)이 있고, 다음으로 도지국(都支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미노국(彌奴國)이 있고, 다음으로 호고도국(好古都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불호국(不呼國)이 있고, 다음으로 저노국(姐奴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대소국(對蘇國)이 있고, 다음으로 소노국(蘇奴國)있으며, 다음으로 호읍국(呼邑國)이 있고, 다음으로 화노소노국(華奴蘇奴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귀국(鬼國)이 있고, 다음으로 위오국(爲吾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귀노국(鬼奴國)이 있고, 다음으로 야마국(邪馬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궁신국(躬臣國)이 있고, 다음으로 파리국(巴利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지유국(支惟國)이 있고, 다음으로 오노국(烏奴國)이 있으며, 다음으로 노국(奴國)
주 050이 있는데, 이것이 여왕의 경계(境界) 안에 있는 것을 다 열거한 것이다.주 051그 [여왕국] 남쪽에는 구노국(狗奴國)
주 052이 있는데, 그 관직으로는 구고지비구(狗古智卑狗)주 053가 있고, 여왕에 소속되지 않았다. 군(郡)주 054에서 여왕국에 이르는 [거리는] 1만 2천여 리이다.주 055지금까지 기록한 구야한국~이도국과 노국~야마대국의 두 그룹에 대한 방위와 일정 기록방식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과 같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어느 국에 도착한다는 실제 여정에 따라 누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후자는 “東南至奴國百里”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가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후자에 대한 일정은 이도국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읽어야 하며, 그 이유는 위의 사신이 원칙적으로 이도국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직접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森浩一, 1985:111~113).

각주 055)

魏 조정 내에서 曺爽과 司馬懿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曺爽이 229년에 서역의 大月氏國을 불러들였다. 당시 위의 수도에서 대월지국의 수도까지의 거리는 16, 370리라고 한다. 晉代에 들어서 『삼국지』를 편찬하게 된 陳壽의 입장에서는 司馬懿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晉의 정통성을 밝히는 방편이 될 수 있었다. 司馬懿는 요동의 公孫淵을 토벌하였고, 요동지역 평정의 최종적인 결과로 倭의 사신을 낙양으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낙양에 온 倭라는 나라도 역시 大月氏國처럼 먼 곳의 국가라고 주장하려고 대방군에서 邪馬臺國까지의 거리를 12, 000리로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三韓보다 倭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 이유도 사마의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본다(森浩一, 1985:109).

- 각주 001)
-
각주 002)
帶方郡:2세기 말경부터 遼東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펴고 있던 公孫氏가 公孫康의 치세인 204년경에 樂浪郡 屯有縣(지금의 북한 黃州) 이남의 옛 辰番郡의 땅에 설치한 郡이다. 2세기 초부터 고구려가 점차 강성해지고, 그 중엽에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三韓이 강성해지면서 樂浪郡이 그 지배력에 한계를 보이자,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후 樂浪郡과 帶方郡에 대한 지배권이 曹魏 明帝 景初 연간(237~239)인 公孫淵의 치세에 魏로 돌아가고, 다시 그것을 계승한 西晉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후 高句麗와 百濟가 세력을 신장하면서 계속 樂浪郡과 帶方郡에 압박을 가하자, 2郡의 세력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그 결과, 고구려 美川王(재위 300~330)은 313년에 樂浪郡을 먼저 통합하였고, 그 이듬해 帶方郡이 역시 고구려에 의해 소멸되었다. 이리하여 漢 武帝가 기원전 108년에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中國의 郡縣은 422년 만에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三國志』 권30 「東夷傳」:830;그리고 李基白·李基東, 1982:69~70 및 石原道博, 2005:39). 韓과 倭는 帶方郡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간주되었으므로, 한과 왜는 낙랑군이 아니라 대방군을 기점으로 하여 그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 각주 003)
-
각주 004)
『漢書』 「地理志」에 “百餘國”으로 되어 있고, 顔師古의 주에 인용된 『魏略』에는 “依山島爲國”으로 되어 있어, “國邑”이라고 한 것은 『三國志』뿐이다(주375) 참조). 중국 고대에는 사람이 집주한 곳을 ‘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몇 호로 이루어진 것부터 어느 정도 도시화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규모, 나아가서는 왕이 있는 都邑까지 다양하다. ‘國’은 도읍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국가구조를 都市國家 또는 邑制國家라고 하였으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체제의 영토국가로 전환되면서 邑은 점차 縣으로 편제되었고, 邑 내부는 몇 개의 里로 나누어졌다(森浩一, 1985:103). 한편 國邑은 都城이나 國의 首邑 혹은 제후들의 封地를 뜻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기사의 ‘國邑’이란 표현은 國과 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100)
“其北岸”이라고 하여 마치 狗耶韓國이 왜의 강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으나, 아래 문장에서 “王遣使詣京都·帶方郡·諸韓國, 及郡使倭國”이라 하여 諸韓國이 魏의 京都나 帶方郡과 마찬가지로 왜의 일부가 아니라 外國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쪽 기슭이 아니라 북쪽 대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那珂通世는 “‘其’字는 왜를 받는 말로, 皇國으로부터 북쪽에 해당하는 대안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였고, 日野開三郞도 바다를 기준으로 그 남북안을 결정하는 용례가 당송대에 있었음을 지적하여 那珂의 해석을 보완한 바 있다(森浩一, 1985:108).
- 각주 011)
-
각주 012)
里:『春秋穀梁傳』을 위시한 고대 중국의 典籍 등에 따르면, 거의 모두 1里는 300步라고 기재되어 있다. 魏의 1尺은 24.5cm로 복원되고 있으므로 1里의 실제 거리는 435m 정도이다. 『三國志』의 道程이나 日程에 관한 전체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하루 평균 육로로 40里, 수로로도 40里를 여행하였다(山尾幸久, 1972:62~70). 한편 대방군에서 구야한국까지 7000里라고 한 것은 실제 거리가 아니라 郡에서 구야한국까지 여행하는 데 걸린 날짜에 40里를 곱해서 얻은 수치일 가능성도 있다. 〈韓傳〉에서 “方四千里”라고 한 기록과 함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거나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대마도로 가는 일정이나 대마도의 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된다.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卑狗:‘히코’라고 읽을 수 있다면, 比跪(히코)나 彦(히코) 등으로 표기되는 수장에 대한 존칭이라고 생각된다. 埼玉縣 稻荷山古墳 철검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철검의 명문은 “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上祖 名意富比垝 其兒多加利足尼 其兒名弓已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弖比 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臣 世世爲杖刀人首 奉事來至今 獲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인데, 그중에 “比垝”가 바로 ‘히코’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이 명문 속에는 “스쿠네(足尼, 宿禰)”, “와케(獲居, 別)” 등과 같은 존칭이 보인다. 이처럼 히코, 스쿠네, 와케 등은 일본열도에서 널리 쓰이던 호족이나 수장에 대한 존칭이었다.
- 각주 017)
- 각주 018)
- 각주 019)
- 각주 101)
-
각주 021)
『三國志』 〈東夷傳〉의 각국 호수 기재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여·고구려·동옥저처럼 “戶八萬”과 같이 기재한 경우, 마한·변한·진한처럼 “大國 萬餘家, 小國 數千家, 總十餘萬戶”와 같이 기재한 경우, 그리고 “有千餘戶”(對馬國), “有三千許家”(一支國), “有四千餘戶”(末盧國), “有千餘戶”(伊都國), “有二萬餘戶”(奴國), “有千餘家”(不彌國), “可五萬餘戶”(投馬國), “可七萬餘戶”(邪馬臺國)와 같이 기재한 경우다. 특히 왜에 관한 기록이 다소 장황한 경향이 있다. 특히 投馬國과 邪馬臺國의 경우는 “有”라고 하지 않고 “可”, 즉 “대략”이라고 한 점도 특징이다. 이는 직접 이곳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傳聞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 각주 022)
- 각주 023)
- 각주 024)
- 각주 025)
- 각주 026)
- 각주 027)
-
각주 028)
伊都國:이전의 怡土郡(이토군)으로, 지금은 糸島郡(이토시마군)의 深江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伊都(이토)는 伊斗, 伊蘇, 伊覩라고 쓰기도 한다(末松保和, 1962:23~43 및 石原道博, 2005:40~41). 1974·1975년에 糸島郡 前原町 三雲 南小路에서 조사된 옹관묘에서는 前漢時代 銅鏡 22면, 비취곡옥 1개, 유리곡옥 12개, 유리제 목걸이 등이 발굴되었다. 인접한 옹관묘에서도 전한 동경 35매가 출토되어, 彌生時代와 古墳時代를 통틀어 가장 많은 동경이 발굴된 무덤이 되었다. 墓壙의 규모도 긴 변 5.2m, 짧은 변 4.2m로 彌生時代 분묘 중 가장 크다. 묘역 역시 폭 24m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옹관묘들이야말로 이도국의 국왕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森浩一, 1985:202~207)
- 각주 029)
- 각주 102)
- 각주 031)
- 각주 032)
- 각주 033)
- 각주 034)
-
각주 035)
奴國:『後漢書』의 奴國으로, 이전의 儺縣과 那津으로 지금의 福岡縣 博多 부근이다(石原道博, 2005:40~41). 1784년에 北九州 博多灣 志賀島에서 발견된 金印 “漢委奴國王”의 나라이다. 이 奴國은 甕棺, 箱式石棺, 돌멘 등이 발견되는 北九州 연안에 있는 諸國 聯盟體의 盟主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後漢書』 〈倭傳〉에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光武帝] 中元 2年(57)에 倭의 奴國이 貢物을 바치고 朝賀하였는데, 使人은 大夫를 자칭하였다. [노국은] 倭國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이다. 光武帝는 奴國의 사자에게 印綬를 하사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福岡平野 남쪽에 위치한 春日市 岡本의 통칭 須玖岡本 유적에서는 역시 前漢鏡 30매 전후, 동검, 동모, 동과, 유리제 곡옥, 유리제 관옥 등이 수습되어, 三雲 南小路 무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다만 이 유적은 三雲 유적에 비하여 대·중·소형의 거울이 함께 나왔으며, 무기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須玖岡本 유적 역시 奴國의 국왕묘급으로 생각된다(森浩一, 1985:207~208).
- 각주 036)
- 각주 037)
- 각주 038)
- 각주 039)
- 각주 103)
- 각주 041)
-
각주 042)
邪馬壹國:3세기 전반 일본열도에 있었던 伊都國 등의 여러 소국들을 통솔하였던 나라. 여왕 卑彌呼가 주재하였던 나라이며 大和政權의 前身으로 보고 있다. 邪馬壹國은 『後漢書』에 “邪馬臺國”으로 되어 있고, 이 “邪馬壹”이 “邪馬臺”의 誤字란 것이 定說이었으나, 근래에는 ‘邪馬壹(야마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나라가 九州에 있다는 주장 내부에서도 日向이나 大隅 지역에 해당된다는 설과 薩摩나 豊前 지역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大和說에서도 瀨戶內海航行說과 東海(日本海)航行說이 있다(末松保和, 1962:23~43 및 石原道博, 2005:41~42, 55). 그리고 『後漢書』에서는 “其大倭王居邪馬臺國. 樂浪郡徼, 去其國萬二千里, 去其西北界拘邪韓國七千餘里(그 大倭王은 邪馬臺國에 거주하고 있다. 樂浪郡治에서 그 나라는 12, 000里 떨어져 있고, 그 나라의 서북방에 있는 拘邪韓國에서는 7, 000여 리 떨어져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각주 043)
- 각주 044)
- 각주 045)
- 각주 046)
- 각주 047)
-
각주 048)
지금까지 기록한 구야한국~이도국과 노국~야마대국의 두 그룹에 대한 방위와 일정 기록방식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과 같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어느 국에 도착한다는 실제 여정에 따라 누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후자는 “東南至奴國百里”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가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후자에 대한 일정은 이도국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읽어야 하며, 그 이유는 위의 사신이 원칙적으로 이도국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직접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森浩一, 1985:111~113).
- 각주 049)
- 각주 050)
- 각주 051)
- 각주 052)
- 각주 053)
- 각주 054)
-
각주 055)
魏 조정 내에서 曺爽과 司馬懿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曺爽이 229년에 서역의 大月氏國을 불러들였다. 당시 위의 수도에서 대월지국의 수도까지의 거리는 16, 370리라고 한다. 晉代에 들어서 『삼국지』를 편찬하게 된 陳壽의 입장에서는 司馬懿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晉의 정통성을 밝히는 방편이 될 수 있었다. 司馬懿는 요동의 公孫淵을 토벌하였고, 요동지역 평정의 최종적인 결과로 倭의 사신을 낙양으로 불러들였다. 이렇게 낙양에 온 倭라는 나라도 역시 大月氏國처럼 먼 곳의 국가라고 주장하려고 대방군에서 邪馬臺國까지의 거리를 12, 000리로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三韓보다 倭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 이유도 사마의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본다(森浩一, 1985:109).
색인어
- 지명
- 대방군(帶方[郡]), 한, 한, [대방]군(帶方郡), 왜(倭), 한국(韓國), 구야한국(狗邪韓國), 대마국(對馬國), 대마국, 한해(瀚海), 일대국(一大國), 말로국(末盧國), 말로국, 이도국(伊都國), 여왕국(女王國), 이도국, 노국(奴國), 노국, 불미국(不彌國), 불미국, 투마국(投馬國), 투마국, 야마일국(邪馬壹國), 여왕국(女王國), 여왕국, 사마국(斯馬國), 이백지국(已百支國), 이사국(伊邪國), 도지국(都支國), 미노국(彌奴國), 호고도국(好古都國), 불호국(不呼國), 저노국(姐奴國), 대소국(對蘇國), 소노국(蘇奴國), 호읍국(呼邑國), 화노소노국(華奴蘇奴國), 귀국(鬼國), 위오국(爲吾國), 귀노국(鬼奴國), 야마국(邪馬國), 궁신국(躬臣國), 파리국(巴利國), 지유국(支惟國), 오노국(烏奴國), 노국(奴國), 여왕국, 구노국(狗奴國), 여왕국